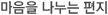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승완
- 조회 수 3733
- 댓글 수 0
- 추천 수 0
* 본 칼럼은 변화경영연구소 1기 연구원 김미영 님의 글입니다.
글쓰기란 게, 뭔가 고였다가 넘치기를 기대했던 모양이다. 꿈도 야무져라.
삶은, 일상은, 꿈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아무 것도 고일 새 없이 바닥인 채로 팍팍하게 흘러만 간다. 핑계, 아니다.
그래서였을까. 삶이, 심드렁했다.
평일엔 아침부터 오밤중까지의 고된 일도 나름 익숙해져서 그럭저럭 굴러갔다. 맘에 내키지 않는 말이나 행동도 무심하게 내뱉으며 시큰둥했다. 어차피 보내야 할 시간이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며 별다른 욕심 없이, 서두를 일 없이, 내게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지나고 있었다. 유독 눈이 커지는 일이 있다면 쑥쑥 커가는 아이들이 신기해서 바라보는, 그 정도였다. 그러다 휴일이 되면 남편과 둘이서 다시 사랑하며 견디고 있었다.
부산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 여름, 둘이서 손잡고 서울역에서 기차타고 떠났던 그때로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친구였던 그때, 큰아이가 찾아온 그때, 광안리를, 부대 앞을, 수영구 이름 모를 밤거리를, 걷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그러마고 답했다.
내가 여름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의 내 사랑을 만나고 싶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웠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오른 그 기억들이 새삼스레 참 고마웠다.
결혼기념일을 앞둔 주말,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카페인 「크리에이티브 살롱 9」 오픈 파티가 있었다.
우리의 부산여행은 미뤄졌다.
실직 상태인 남편은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두 번째 인생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오랜 학원 강사 생활을 접고 몇 년째 노래만 했던 요식업 관련 정보를 모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은 후회했다.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을. 그러나 어쩌랴. 지나간 버스를 세우려면 버스보다 빨리 달리는 수밖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맨땅에 헤딩이리라. 게다가 있는 그대로의 실체는 언제나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
12월 4일. 결혼기념일. 그가, 떠났다.
내가 또 그의 삶에 개입하였다.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해낼 순 없으니까.
갑작스런 우연이었을까. 뭔가 막 눈 앞을 휙 지나가는 걸 잡아버렸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겠다. 남편에게 닿은 인연은 지방에 있는 24시간 음식점이다. 밤10시부터 아침10시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한단다. 아마 설거지를 하려나. 아님 야채를 씻으려나. 배달을 하려나. 고시원은 춥다던데. 배는 곯지 않겠지. 미안해라.
아기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도 남편도 지금의 이 삶이 뭔지 모른다. 그저 뭔지 모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마흔 다섯이란 적지 않은 나이, 이제쯤 어디서든 자리를 잡았다면 좋았을 예쁜 나이에 연고 없는 객지에서 낯선 이들과 보내야 할 힘겨운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서러울까. 곧 또 한 살을 더할 텐데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 새옹지마. 위로를 삼자면,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고 했다. 치열하게 나이를 더하는 것보다 더 서글픈 건 징징대는 어린아이로 남아 있는 것이겠지. 다행히 우린 어른이니까. 지금의 이 눈물쯤은 각자 닦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하니까. 아주 많은 걸 서로 견딜 수 있겠지. 아니, 그래야겠지. 아님 말고.
다음날, 혼자 맞는 추운 아침이 더 시렸다. 눈물이 함박눈 되어 내렸다.
쌓인 눈은 녹기 마련이다. 기다려야지.
삶의 묘미는 고통이란다. 나니까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묻는다.
우린,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
- 김미영 mimmy386@hanmail.net
***
손은 손을 찾는다
- 이문재
손이 하는 일은
다른 손을 찾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에게 지고
내가 나인 것이
시끄러워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네가 아닌 것이
견딜 수 없이 시끄러울 때
그리하여 탈진해서
온종일 누워 있을 때 보라
여기가 삶의 끝인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손을 보라
왼손은 오른손을 찾고
두 손은 다른 손을 찾고 있었다
손은 늘 따로 혼자 있었다
빈손이 가장 무거웠다
겨우 몸을 일으켜
생수 한 모금 마시며 알았다
모든 진정한 고마움에는
독약 같은 미량의 미안함이 묻어 있다
고맙다는 말은 따로 혼자 있지 못한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엊저녁 너는 고마움이었고
오늘 아침 나는 미안함이다
손이 하는 일은
결국 다른 손을 찾는 것이다
오른손이 왼손을 찾아
가슴 앞에서 가지런해지는 까닭은
빈손이 그토록 무겁기 때문이다
미안함이 그토록 무겁기 때문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16 |
토크 No.4 - MBA는 필수 아닌가요? | 재키 제동 | 2013.01.13 | 3530 |
| 215 | 돌이킬 수 없는 약속 [4] | 진철 | 2013.01.12 | 2833 |
| 214 | 스마트웍 다시 보기 [7] [2] | 희산 | 2013.01.11 | 2578 |
| 213 | 지금은 실수할 시간 [11] | 김미영 | 2013.01.10 | 2720 |
| 212 |
사랑이 끓는 온도. 원데이(One Day) | 효우 | 2013.01.09 | 3516 |
| 211 |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 뫼르소 | 2013.01.08 | 3918 |
| 210 |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 아닌데 | 옹박 | 2013.01.07 | 3810 |
| 209 | 이보다 더 좋을순 없다 (한명석) | 경빈 | 2013.01.03 | 3020 |
| 208 | surprise me! (by 김미영) | 승완 | 2012.12.31 | 2921 |
| 207 | 어머니와 아버지 (정경빈) [1] | 경빈 | 2012.12.25 | 2943 |
| 206 | 생각 없이 (by 이선이) | 승완 | 2012.12.24 | 3163 |
| 205 | 친구 회사로 찾아가 점심 먹기(강미영) | 경빈 | 2012.12.18 | 3973 |
| 204 | 마흔, 흔들리며 피는 꽃 (by 오병곤) | 승완 | 2012.12.17 | 3426 |
| 203 | 저렴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 (한명석) | 경빈 | 2012.12.11 | 3168 |
| » | 고마워요 내 사랑 (by 김미영) | 승완 | 2012.12.10 | 3733 |
| 201 | 상생 - 더불어 사는 삶 (도명수) [1] | 경빈 | 2012.12.04 | 3249 |
| 200 | 너의 외면 (by 이선이) | 승완 | 2012.12.02 | 3512 |
| 199 | 너, 니체 (by 정재엽) [1] | 경빈 | 2012.11.27 | 4085 |
| 198 | [뮤직 라이프] 그림자 (by 오병곤) | 승완 | 2012.11.25 | 3679 |
| 197 | 불만기록부 쓰기 (강미영) [1] | 경빈 | 2012.11.19 | 3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