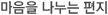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김미영
- 조회 수 2809
- 댓글 수 0
- 추천 수 0
가을이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소설을 쓰기로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소설이 되든 쓰레기가 되든, 일단 가보자.
파보지 않으면 바닥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한계도 모르고 날뛰기만 할테니.
***
동네방네, 산으로, 바다로, 심지어 하늘까지 싸돌아다니며 사냥질에 여념이 없던 그가, 돌아왔다. 사냥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이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그때, 그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눈 튀어나오고 목 부러져서 잠이 들던 그 수많은 하얀 밤들. 하늘 두어 번 보고 별 두개 딴 이후, 그 별들만 들여다보며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아갈 꿈을 키웠더랬다.
사방팔방 온천지에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믿음을 검은 머리카락이 하얘지도록 철석같이 심어놓고는 강산이 두 번째 변하려고 모습을 반쯤 바꾼 순간, 혜성처럼 짠하고 나타났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나의 그림에는 도무지 등장하지 않았던 그가, 지금껏 길들여진 나와 별 두개, 딱 셋만 있는 그림에 은근슬쩍 궁딩이를 디민 비상사태다. 나를 엄마로 착각까지 한다. 배가 고파서 젖을 찾듯 수시로 울어재낀다. 사방에서 공습경보 싸이렌이 마구 울린다.
모성본능이라는 기적의 무기는 별 두개 전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10개월이라는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 수유와 육아 등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몸이 지쳐도, 제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팽개치지 못한다.
모든 걸 포기하고 매달리게 했던 엄마라는 이름의 모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기적의 무기는, 이미 종쳤다. 나와 그의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것도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듯이 모든 관계는 선택이니까.
목숨 걸고 일하다 목숨까지 버리는 대한민국에서 송곳니 없는 호랑이가 되어 돌아온 그.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그토록 날카롭던 송곳니를 뽑혔을까. 아니, 어쩌면 스스로 뽑아버렸을까? 겨우 이빨 몇 개 빠진 것뿐인데 송곳니 없는 호랑이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 현관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나마도 고양이로 변하고 만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 것도 갖지 않겠다는 소유욕으로 그를 내팽개쳤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가 없이도 잘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내곤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옥신각신 치열한 부부싸움의 종말은 이혼이었고, 싱글 맘과 주말아빠와 한부모 자녀가 탄생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고, 바로 그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내 이름 따윈 까맣게 잊은 그와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이야기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가깝다. 이빨이 빠지면서 같이 빠져나간 정신의 일부는 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의 8할은 “알면서 뭘 물어?”다. 대체 내가 뭘 안단 말인가. 그냥 귀찮아서 아는 척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그에 대해서 모조리 몽땅 다 안다는 착각을 일삼는다.
휴일도 없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온, 뭔지 모를 것에 청춘을 바친, 자신에 대한 회의 탓일까. 요즘 부쩍 말수가 줄고 행동도 굼뜨고 잠도 없이 tv 앞에서 멍하니 딴생각에 빠져 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재활용품 의류수거함에서나 구경할 수 있을 무릎이 툭 튀어나온 그놈의 체육복 바지만 자나깨나 입고 있는 그를 보니 문득 짜증이 났다.
그 바지 좀 버리지 그래.
버리긴 아깝잖아.
보기 싫어서 그래. 다른 옷도 있잖아.
볼 사람도 없는데, 뭘.
누가 없어? 난 사람 아냐? 난 그 바지 정말 싫단 말이야.
뭐가 싫다는 거야? 첨 봤어? 새삼스럽게 왜 야단이야?
친구도 안 만나? 왜 맨날 집에만 있어?
그거였어?
그거였다.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게 짜증의 원인이었다. 왜 그가 밖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건 사실이다. 게다가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과 행동에는 슬그머니 화가 솟기 시작한다.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닌 어정쩡한 생물체 하나가 늘어난 느낌이다.
결국 남는 건 이야깃거리 없이 마주 앉아 침묵하는 것뿐이다. 그러다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때때로 그에게 묻는다. “지금 무슨 생각해?” 한참을 뜸들이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 별 것 아냐.”다.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말이란 게 고작, “그게 다야?” 그리곤 대화 끝이다. 말을 꺼내지 않느니만 못한 경험이 쌓이면서 나만의 요령이 하나 생겼다.
나에게 그는 이제 투명인간이다. 보고 싶을 때만 보인다. 그 외엔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그에게 나는 이미 투명인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래 전 그날부터.
IP *.136.119.158
파보지 않으면 바닥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한계도 모르고 날뛰기만 할테니.
***
동네방네, 산으로, 바다로, 심지어 하늘까지 싸돌아다니며 사냥질에 여념이 없던 그가, 돌아왔다. 사냥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이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그때, 그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눈 튀어나오고 목 부러져서 잠이 들던 그 수많은 하얀 밤들. 하늘 두어 번 보고 별 두개 딴 이후, 그 별들만 들여다보며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아갈 꿈을 키웠더랬다.
사방팔방 온천지에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믿음을 검은 머리카락이 하얘지도록 철석같이 심어놓고는 강산이 두 번째 변하려고 모습을 반쯤 바꾼 순간, 혜성처럼 짠하고 나타났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나의 그림에는 도무지 등장하지 않았던 그가, 지금껏 길들여진 나와 별 두개, 딱 셋만 있는 그림에 은근슬쩍 궁딩이를 디민 비상사태다. 나를 엄마로 착각까지 한다. 배가 고파서 젖을 찾듯 수시로 울어재낀다. 사방에서 공습경보 싸이렌이 마구 울린다.
모성본능이라는 기적의 무기는 별 두개 전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10개월이라는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 수유와 육아 등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몸이 지쳐도, 제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팽개치지 못한다.
모든 걸 포기하고 매달리게 했던 엄마라는 이름의 모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기적의 무기는, 이미 종쳤다. 나와 그의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것도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듯이 모든 관계는 선택이니까.
목숨 걸고 일하다 목숨까지 버리는 대한민국에서 송곳니 없는 호랑이가 되어 돌아온 그.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그토록 날카롭던 송곳니를 뽑혔을까. 아니, 어쩌면 스스로 뽑아버렸을까? 겨우 이빨 몇 개 빠진 것뿐인데 송곳니 없는 호랑이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 현관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나마도 고양이로 변하고 만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 것도 갖지 않겠다는 소유욕으로 그를 내팽개쳤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가 없이도 잘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내곤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옥신각신 치열한 부부싸움의 종말은 이혼이었고, 싱글 맘과 주말아빠와 한부모 자녀가 탄생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고, 바로 그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내 이름 따윈 까맣게 잊은 그와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이야기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가깝다. 이빨이 빠지면서 같이 빠져나간 정신의 일부는 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의 8할은 “알면서 뭘 물어?”다. 대체 내가 뭘 안단 말인가. 그냥 귀찮아서 아는 척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그에 대해서 모조리 몽땅 다 안다는 착각을 일삼는다.
휴일도 없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온, 뭔지 모를 것에 청춘을 바친, 자신에 대한 회의 탓일까. 요즘 부쩍 말수가 줄고 행동도 굼뜨고 잠도 없이 tv 앞에서 멍하니 딴생각에 빠져 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재활용품 의류수거함에서나 구경할 수 있을 무릎이 툭 튀어나온 그놈의 체육복 바지만 자나깨나 입고 있는 그를 보니 문득 짜증이 났다.
그 바지 좀 버리지 그래.
버리긴 아깝잖아.
보기 싫어서 그래. 다른 옷도 있잖아.
볼 사람도 없는데, 뭘.
누가 없어? 난 사람 아냐? 난 그 바지 정말 싫단 말이야.
뭐가 싫다는 거야? 첨 봤어? 새삼스럽게 왜 야단이야?
친구도 안 만나? 왜 맨날 집에만 있어?
그거였어?
그거였다.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게 짜증의 원인이었다. 왜 그가 밖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건 사실이다. 게다가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과 행동에는 슬그머니 화가 솟기 시작한다.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닌 어정쩡한 생물체 하나가 늘어난 느낌이다.
결국 남는 건 이야깃거리 없이 마주 앉아 침묵하는 것뿐이다. 그러다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때때로 그에게 묻는다. “지금 무슨 생각해?” 한참을 뜸들이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 별 것 아냐.”다.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말이란 게 고작, “그게 다야?” 그리곤 대화 끝이다. 말을 꺼내지 않느니만 못한 경험이 쌓이면서 나만의 요령이 하나 생겼다.
나에게 그는 이제 투명인간이다. 보고 싶을 때만 보인다. 그 외엔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그에게 나는 이미 투명인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래 전 그날부터.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투명인간 | 김미영 | 2013.09.26 | 2809 |
| 355 | 예서/ 타자의 다름 | 효우 | 2013.09.25 | 2911 |
| 354 | 토크 No.22 - '나'라는 퍼즐이 풀리는 순간 | 재키제동 | 2013.09.23 | 3297 |
| 353 | 범해 4.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2] | 범해 좌경숙 | 2013.09.22 | 3088 |
| 352 | 예서/ 망운지정 『望雲之情』 | 효우 | 2013.09.18 | 3492 |
| 351 | 토크 No.21 - 쥐꼬리 월급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 | 재키제동 | 2013.09.16 | 3332 |
| 350 | 범해 3 . 나는 지금 웰다잉 중이다 [4] | 범해 좌경숙 | 2013.09.15 | 5334 |
| 349 | 몰입과 쾌락의 상관관계 | 김미영 | 2013.09.12 | 2923 |
| 348 |
마지막 편지 | 효우 | 2013.09.11 | 2715 |
| 347 | 토크 No.20 - 경력계발의 정석 [2] | 재키제동 | 2013.09.09 | 3040 |
| 346 | 범해 2. 한 줄도 너무 길다 [4] | 범해 좌경숙 | 2013.09.08 | 3663 |
| 345 | 비교를 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다 | 김미영 | 2013.09.05 | 5476 |
| 344 | 버드나무가지 말고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그때 [1] | 효우 | 2013.09.04 | 2838 |
| 343 | 토크 No.19 - 임원의 자격 | 재키제동 | 2013.09.02 | 8119 |
| 342 | 범해 1. 아버지의 여행가방 [6] | 범해 좌경숙 | 2013.09.01 | 2892 |
| 341 | 가시 | 김미영 | 2013.08.29 | 2720 |
| 340 | 평화주의자의 위경련 [1] | 효우 | 2013.08.28 | 3158 |
| 339 |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방법 | 재키제동 | 2013.08.26 | 2969 |
| 338 | 전단지 [2] | 김미영 | 2013.08.22 | 2869 |
| 337 | 그대를 돕는 조력자 | 효우 | 2013.08.21 | 3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