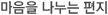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김미영
- 조회 수 3536
- 댓글 수 0
- 추천 수 0
***
카트만두(1,300m) - 샤브루베시(1,400m) - 라마호텔(2,400m) - 랑탕마을(3,300m) - 캰진곰파(3,800m) - 체르코리(5,000m)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다. 호흡이 가쁘고, 두통과 답답함이 심하다.
숨쉬기가 일이다. 추운 건 잘 모르겠다. 침낭 안은 꽤 견딜 만하다.
얼굴이 퉁퉁 부은 느낌이다. 만져보면 탱탱함이 느껴진다.
높은 고도에 적응하느라 힘든 모양이다. 이제 이틀 정도 남았다. 조금만 더 견뎌주렴.
잠을 자기도 힘들고, 돌아다니긴 더 힘들다. 두통약을 아침과 점심때 먹었다.
불편하니까, 자다 깨니까, 잠결에 익숙한 남편이 떠오른다.
그래, 20년 넘게 내 곁에서 챙겨준 건 고마워, 진심으로.
이제는 혼자 감당하는 일상을 살아야지.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볼 거야. 이제 시작이야.
마지막 롯지인 캰진곰파에 오른 날, 다음 날 체르코리에 대비해서 가까운 동산?에 올랐다.
고도에 적응하기 위한 시험 산행쯤이었는데, 고도고 나발이고 발톱이 망가졌다.
내리막이 문제였다. 온통 흙길인 4천m 동산은 스틱에 의지해서 내려올 수 없었다.
미끄러워서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발끝으로 내려온 거였다. 걸음마가 안 됐다.
내리막을 못 타는 걸 4천m에서 알았다. 그리곤 5천m를 향했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리고 또 알게 되었다. 산의 맨 꼭대기 따위는 없다는 것을. 산은, 끝도 정상도 없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누군가가 정한 지점이었다. 순간,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했다.
내가 끝을 정해야 했다. 더 오를지 말지를 나에게 물었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했으니까.
모래로 이어진 오르막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 길을 다시 어떻게 내려가지? 답이 없었다.
스틱에 의지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물론 얘도 힘들어 죽는다.
내 진짜 숙제는 내리막이었다. 이미 겁을 잔뜩 먹은 상태여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손을 들어 스틱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한 천사 포터가 내 곁에 남아서 웃었다.
둘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숨을 돌리며 싸 온 점심을 꺼냈다. 삶은 계란 하나를 까먹었다.
심호흡하고 내려오는데, 발톱이 나갔다. 하나, 둘, 셋, 정신도 따라서 나가려고 했다.
망연자실 당황하고 있을 때, 스틱도 나도 믿지 못했을 때, 믿을 건 내 곁의 천사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야 했다. 포터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결국, 그녀가 나를 살렸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나?
그냥 단지 가볍게 손을 잡은 것밖에는 없었다.
손을 잡는 것, 내가 원한 건 그거였던 거다. 그녀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고 나는 가벼워졌다.
그 뒤로는 날아서 내려왔다.
**
손을 잡았더니 다리에 힘이 생긴다는 걸 그때 알았다. 발톱 3개와 바꾼 깨달음이다.
그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냥 거기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 충격에서 깨어나느라 한참을 울었다. 멍한 정신을 차릴수록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놀라서 달래던 그녀도 자꾸만 우니까 따라서 울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예쁜 천사 ‘밍마 셰르파’, 그 친구가 내게 지어준 이름은 ‘소남’이다. ‘lucky’라는 뜻이란다.
우리는 하산하는 내내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했다. 내게 히말라야는 그 친구의 따스함이다.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다.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에 존재했다.
고마운 인연에 감사한다. Mingma Sherpa, 그녀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나마스테.
*
12:30 과채 주스(토마토, 포도), 아몬드, 호두
이건 이제 껌이다. 눈 감고도 갈아 마신다. 그럼 된 거다. 몸이 기억할 테니까.
6:00 오이, 부추, 피망, 상추, 고구마, 채소 구이(호박, 양파, 마늘, 버섯, 두부), 된장국(멸치, 미역, 버섯, 감자, 양파)
어제의 채소 구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더 화려하게 구웠다. 호박과 양파는 조금 더 두껍게 썰었고, 버섯과 두부, 마늘도 부드럽게 노릇노릇했다. 제일 큰 접시에 우아하게 담았다. 혼자 먹기 아까웠지만, 혼자서 야금야금 그릇을 비워갔다. 된장 샤부샤부는 감칠맛이 났다. 멸치와 미역이 어우러진 바다 내음이 비릿하게 고소했다. 이틀만 지나면, 한잔할 거다. 꼭!
운동을 나가볼까 하고 저녁을 일찍 먹었다.
운동이랄 것도 없다. 그냥 걷는 거다.
나가기만 하면 한강 변을 거니는 호사를 누린다.
‘운동’이라는 세상도 두루 구경해봐야 할 텐데 말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16 | 정예서/ 쪽파 다듬는 남자 | 효우 | 2017.09.14 | 3849 |
| 615 | 정예서/소비의 쾌감 | 효우 | 2017.08.23 | 3471 |
| 614 | 정예서/ 시간의 가치 | 효우 | 2017.08.17 | 3630 |
| 613 | 정예서/ 아버지의 초상 | 효우 | 2017.08.09 | 3478 |
| 612 | 정예서/ '나는' 이라 쓰고 | 효우 | 2017.07.12 | 3600 |
| 611 | 정예서/ 고수와 허수 | 효우 | 2017.07.05 | 3473 |
| 610 | 정예서/ 제구포신 | 효우 | 2017.06.28 | 4029 |
| 609 | 정예서/ 한 사람의 생 | 효우 | 2017.06.21 | 3690 |
| 608 | 정예서/ 순한 者 | 효우 | 2017.06.14 | 3665 |
| 607 | 정예서/침묵의 시간 | 효우 | 2017.05.31 | 3728 |
| 606 | 디톡스 다이어리 24 - 꿈 토핑, 10대 풍광 [2] | 김미영 | 2017.05.23 | 3663 |
| 605 | 디톡스 다이어리 23 - 다시 디톡스 | 김미영 | 2017.05.22 | 3593 |
| 604 | 디톡스 다이어리 22 - 노는 게 제일 좋아 | 김미영 | 2017.05.21 | 3518 |
| 603 | 디톡스 다이어리 21 - 엉뚱한 일상, 여행여락 | 김미영 | 2017.05.19 | 3816 |
| 602 | 디톡스 다이어리 20 - 정양수 선생님께 [2] | 김미영 | 2017.05.18 | 3783 |
| » | 디톡스 다이어리 19 - 닿지 못한 체르코리 | 김미영 | 2017.05.17 | 3536 |
| 600 | 정예서/ 왜 배우는가 [1] | 효우 | 2017.05.17 | 3978 |
| 599 | 디톡스 다이어리 18 - 랑탕마을 [2] | 김미영 | 2017.05.16 | 3583 |
| 598 | 디톡스 다이어리 17 - 포스트 디톡스 | 김미영 | 2017.05.15 | 3601 |
| 597 | 디톡스 다이어리 16 - ‘엄마’라는 가면 | 김미영 | 2017.05.14 | 3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