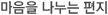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경빈
- 조회 수 3891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선풍기를 켜도 더운 바람만 나오는 뜨거운 날씨였다. 얇은 이불 한 장을 배에 돌돌 말고 드러누워 낮잠을 잤다. 휴일 날 혼자 있는 집에, 그것도 낮잠을 자면서 에어컨을 틀어대는 것이 괜히 미안해서 선풍기 바람으로만 버티고 있었다. 다리가 선풍기 쪽으로 향하게 누워 있다가 너무 더워서 머리가 선풍기 쪽으로 향하게 돌아 누웠다. 등으로 바닥을 쓸며 빙글빙글 각도를 맞춰봤지만 덥기는 마찬가지였다. 흐르는 땀 때문에 팔과 다리가 자꾸 방바닥에 들러붙어서 돌아누울 때마다 깼다. 에이씨. 짜증을 내면서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욕실로 들어가 냉수샤워로 끈적함을 씻어냈다. 조금 살 것 같았다.
다시 잠을 자려고 베개를 챙겨 드는데 전신 거울에 내가 보였다. 피곤함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얼굴은 방금 세수 했으나 전혀 깔끔하지 않았다. 몸만 씻기 위해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머리는 제멋대로 삐쳐 나와 있었다. 기운 없이 축 늘어진 몸은 유난히 등이 굽고 키가 작아 보였다. 목이 늘어난 남색 티셔츠, 보푸라기가 잔뜩 일어난 회색 트레이닝 반바지 차림이었다. 츄리닝의 허리끈은 챙겨 묶지도 않고 티셔츠 밖으로 늘어져 있었다. 이보다 더 칙칙해 보일 수 없었다. 집에 있는 날이면 항상 그러했기에 이상할 것 없는 그 우중충한 모습이 갑자기 서러웠다.
베개를 그대로 방바닥에 던져두고 옷장을 뒤져 지난 여행에서 입었던 분홍색 반바지를 꺼내 입었다. 왠지 그러고 싶었다. 소녀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선명한 핑크색이었다. 해변가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과 어울릴만한 옷이었다. 친구들이 봤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입을 나이는 아니잖니? 라고 어이없는 웃음을 던졌을 것이다. 여행할 때 아니면 언제 이런 바지를 입어 보겠나 싶어 지난 여행에서 미친 척 사 입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는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옷장 깊숙이 넣어 두었던 반바지였다.
그 바지를 입는 순간 내 인생이 살짝 화려해진 느낌이 들었다. 거울에 뒷모습을 비춰보며 옷 맵시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했다. 같이 입었던 보라색 티셔츠도 꺼내 입었다. 머리도 다시 곱게 빗어 묶었다. 아무도 봐 주는 사람 없이 어깨를 펴고 혼자 거울을 보며 웃어봤다. 그대로 다시 잠들기 아까워 냉커피를 한잔 마셨다. 다리를 꼬고 책상 앞에 앉아 다리를 끄덕끄덕 흔들어 봤다. 여행할 때 그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우중충했던 일상이 특별한 일 없이도 기분이 좋아졌다. 항상 밖에 나갈 때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잘 보이기 위해서만 예쁜 옷을 챙겨 입던 내가 비로소 나를 위한 옷 하나를 챙겨 입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 있을 때 입는 옷은 항상 목이 늘어진 티셔츠와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복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다. 그것이 당연했다. 어차피 보는 사람들도 없으니 대충 껴입고 지냈다. 밖에서 입고 다니다가 소매가 헐거나 목이 늘어졌거나 유행이 지나서 더 이상 입고 다닐 수 없는 옷들을 집에서 입곤 했다. 집에서 입는 옷은 내 취향과는 상관 없이 떼가 잘 타지 않는 어두운 색깔로 골라 입었다. 물이 심하게 빠지거나 얼룩이 져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라는 생각이 집에서의 내 스타일을 후줄근하게 만들어놨다. 그것이 내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당연한 자유라고 생각했다.
일상에 비하면 여행에서 입는 옷들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다. 입어보고 싶은 스타일의 옷을 마음껏 입어 볼 수 있었다. 감히 용기를 내어 가슴 위쪽을 아예 날린 반쪽 짜리 티셔츠나 아슬아슬한 길이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화려한 플라워 프린팅이나 한번도 입어볼 생각을 못 했던 튀는 색깔의 옷도 과감하게 입을 수 있었다.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혹시나 누가 보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내 모습을 기억할 사람이 없기에 입고 싶은 대로 마음껏 스타일을 즐겨보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여행에서의 우리를 그토록 들뜨게 만들었다.
여행과 집에서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똑같은 자유로움이 여행에서 입는 옷은 화려하게 만들었고, 집에서 입는 옷은 칙칙하고 우중충하게 만들었다. 여행에서는 내 맘에 드는 색깔로 골라 입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게 유독 허름한 옷을 입고 지냈던 것일까. 어쩌면 여행이어서 그렇게 화려한 반바지를 입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옷을 입었기에 여행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일상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항상 자유를 꿈꾸면서 정작 자유로움이 주어졌을 때 아무렇게나 사는 것으로 그 시간을 오해했다. 내 마음대로 입는다는 것이 무조건 편하거나 늘어진 옷은 아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고, 원래 그런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일상을 무기력한 무채색으로 만들었다. 그래 놓고선 어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칙칙하니 하는 한숨을 내쉬곤 했다.
회색과 남색 트레이닝복을 번갈아 가며 입었던 내 일상에도 화려한 색깔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바지를 사 입는 것은 꼭 여행지가 아니라 집에서도 입어 볼 수 있다. 집에서 입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만 예쁘면 됐지. 라는 소심한 도발을 저지를 자유는 누구나 갖고 있다. 여행에서 입던 쉬폰 드레스나 짧은 스커트를 집에서 입는 건 활동하기 불편하니까 곤란할 수도 있지만, 여행에서만 입을 수 있을 거라며 겨우 용기 내어 입어 보았던 예쁜 색깔 반바지를 챙겨 입는 것 정도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여행할 때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했을 뿐이다.
일상에서 산뜻한 색깔의 바지 하나만 챙겨 입어도 일상의 색깔이 달라진다. 일상이 답답하고 빛을 잃은 무채색처럼 우중충해 보인다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바지를 입어보는 거다. 이왕이면 여행갈 때 입었던 추억이 있는 옷이라면 더 좋겠다.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든 꺼내서 탁탁 털고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색깔의 바지를 하나쯤 챙겨 놓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화사해지는 일이 조금은 쉬워질 것이다.
언젠가는 흥분하면서 이 얘기를 아는 오빠한테 했더니, 그도 회사 갈 때면 항상 남색바지, 회색바지를 입는 것이 지겨워서 집에서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미 일상의 작은 공간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두고 즐기고 있었는데 나만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억울해지기까지 했다.
우리의 일상을 허름하고 아무렇게나 어질러놨던 것은 다름아닌 내 자신이었다. 내 일상이 칙칙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방치했기 때문이다. 내 일상도 돌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여행에서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으란 법은 없다. 여행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상이라고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 일상이 산뜻해지는 일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들, 그러나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예 꺼내놓지도 못했던 일들을 조금만 마음을 열어 나에게 허락해 주면 된다.
아무도 보지 않기에 허름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지내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자유라면, 아무도 보지 않기에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의 옷을 입어보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자유다. 자유로움을 ‘아무렇게나’로 해석할지 ‘나다움’으로 해석할지는 나의 선택인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일상을 무채색으로 만들어 놓을지 내가 좋아하는 산뜻한 색깔을 넣을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일상을 조금 더 나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96 | 여행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1) | 최코치 | 2012.04.05 | 3095 |
| 595 | 말바위로 가는 숲길에서 | 승완 | 2012.04.09 | 3733 |
| » | 내 일상은 왜 이렇게 칙칙해? - 좋아하는 색깔 바지 입기... | 경빈 | 2012.04.10 | 3891 |
| 593 | 영혼이 있는 공무원 - 최영훈 | 옹박 | 2012.04.11 | 3853 |
| 592 | 은남 언니에게 | 승완 | 2012.04.16 | 3419 |
| 591 |
일상에 스민 문학- 이동 축제일 (정재엽) | 경빈 | 2012.04.17 | 5672 |
| 590 | 자신의 미래를 보는 사람 - 한정화 [1] | 옹박 | 2012.04.18 | 6044 |
| 589 | 쌍코피 르네상스 (by 좌경숙) | 희산 | 2012.04.20 | 3529 |
| 588 | 그는 과연 변할 것인가 (by 선형) | 은주 | 2012.04.20 | 7428 |
| 587 | 그 여자는 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by 오병곤) | 승완 | 2012.04.23 | 3466 |
| 586 | 몰입 : 창조적 인재의 핵심키워드 (도명수) | 경빈 | 2012.04.24 | 4243 |
| 585 | 내 삶의 거울 - 송창용 | 옹박 | 2012.04.26 | 3322 |
| 584 | Oh! my GOD, Oh! my DOG (by 춘향이) [8] [1] | 은주 | 2012.04.27 | 3927 |
| 583 |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 - 김민선 | 옹박 | 2012.05.02 | 3486 |
| 582 | 먼 길 (by 이선이) | 승완 | 2012.05.07 | 3662 |
| 581 | 고양이에게 먼저 고백하다 - 이은남 | 옹박 | 2012.05.09 | 3315 |
| 580 | 4차원 성철이 (by 김연주) | 은주 | 2012.05.12 | 3318 |
| 579 | [오리날다] 뒤뚱거려도 눈부시다 (by 김미영) [1] [3] | 승완 | 2012.05.14 | 3403 |
| 578 |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을 읽고 (한명석) | 경빈 | 2012.05.15 | 6978 |
| 577 | 나의 아멘호테프 - 최정희 | 옹박 | 2012.05.16 | 3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