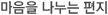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김미영
- 조회 수 2714
- 댓글 수 4
- 추천 수 0
그 무엇이 나에게 일어났다. 떠나야 했다. 단 하루만이라도.
두 아이는 하루 세 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남편은 밤마다 기어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나가기 바빴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 죽을 것 같았다.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먹는지, 왜 사는지, 왜 남들처럼 지저귀는지, 텅 빈 껍데기일 뿐인 나를, 일상을 참아내는 나를, 견딜 수 없었다. 나 아닌 남들과 같아지길 원하며 살아온 삶에 멀미가 났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아내로 엄마로 사는 일상이, ‘나’는 어디에도 없는 하루하루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누가 내 준 지도 모르는 결혼이란 숙제를 해치운 30대의 나는, 나를 감당할 수 없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별거였다. 유부녀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는 건 용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가슴이 다시 뛰었다는 것도. 우리는 인사동의 거리에서 만났고 삼청동의 어디쯤에서 마주 앉았다. 어릴 적 좋아했었다고 이제는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보겠다고 아이가 몇이냐고 와이프랑 사이는 좋으냐고 묻고 나니 더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그 날의 그 하늘이 눈부셨고 그 날의 그 바람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그 날의 공기는 나를 많이 웃게 했다. 나는 나를 그렇게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러나, 나는 돌아왔다. 집으로 향하는 게으른 발걸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한 끼 식사뿐인 그 일탈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눈이 부신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견딜 수 없이 낯설었다. 왜 그 하늘은 달리 보였을까? 그 공기는, 그 웃음은, 왜 나를 다시 집으로 향하게 했을까?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뻔한 시간표의 멀미나는 껍데기를 뒤집어쓴 나를 받아들인 것이었을까? 나 아닌 채인 일상도, 나를 만난 일탈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도, 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를 찾아 떠나기엔 그동안의 일상이 너무 무거웠다. 그때의 나는 거기까지였다.
그때가 가을이었다.
지난 10년간, 그 가을을 잊지 못해서 해마다 가을을 탄다.
다시 떠나고 싶어서, 다시 가슴 뛰고 싶어서, 어쩌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채우는 것만이 아닌 누군가가 내 삶에 애정인지, 우연인지, 하여간 뭔가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 그리웠던게 아닐까 하네요.
혼자사는 저는 제가 켜지 않으면 보일러는 안돌아요. 그런데 전 퇴근할 때쯤에 누군가가 방에 불을 좀 때줬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는 따뜻한 방이 더 그리워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56 | 예서/ 젊은 그대 [1] | 효우 | 2014.04.16 | 2702 |
| 455 |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 | 효우 | 2015.01.21 | 2702 |
| 454 |
토크 No.39 -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 재키제동 | 2014.02.17 | 2708 |
| 453 | 예서/ 일상화된 열정 | 효우 | 2013.11.20 | 2709 |
| » | 가을 [4] | 김미영 | 2013.10.03 | 2714 |
| 451 |
마지막 편지 | 효우 | 2013.09.11 | 2716 |
| 450 | 가시 | 김미영 | 2013.08.29 | 2720 |
| 449 | 지금은 실수할 시간 [11] | 김미영 | 2013.01.10 | 2721 |
| 448 |
[그만둬도 괜찮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재키제동 | 2013.06.24 | 2723 |
| 447 | 좋은 관리자 [2] | 희산 | 2013.05.03 | 2725 |
| 446 | 마지막 인사 [3] | 정재엽 | 2013.11.19 | 2725 |
| 445 | 새로운 리더로의 변화 방안 [1] | 희산 | 2013.03.29 | 2726 |
| 444 |
예서/1인기업가, 절연과 집중 | 효우 | 2014.06.18 | 2733 |
| 443 | 욕망 [2] | 김미영 | 2013.08.15 | 2734 |
| 442 |
쥐꼬리 월급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7기 유재경) | 차칸양 | 2018.04.20 | 2734 |
| 441 |
살아야 하는 이유 | 김미영 | 2013.03.14 | 2740 |
| 440 | 예서/ 나만의 속도 | 효우 | 2014.05.07 | 2742 |
| 439 | 예서/ 전할 수 있는 진실 | 효우 | 2014.12.03 | 2745 |
| 438 | 의자, 아니 원칙을 사수하라_신종윤 | 옹박 | 2012.07.11 | 2747 |
| 437 | 정예서/방황이 아닌 여행 | 효우 | 2015.02.25 | 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