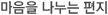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경빈
- 조회 수 3665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회사에 있던 나는 아버지의 전화로 부고를 들었다.
요 근래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꽤 오래 병원에 계셨기에,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죽음이었다.
일단 회사일이 정리가 되는 대로 집에 빨리 가겠다고 전화를 끊고, 마음이 산란해졌다.
오랫동안 가까이서 뵙지 못한 할머니인데, 예상한 것과 달리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몇 가지 실수를 하고, 서류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상사에게 괜히 화가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거의 따지다 시피 물었다. 결국 그 일은 선배에게 넘기고 떠나야했지만.
허둥지둥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계속 심장이 뛰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그랬다. 이럴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외조모상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사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잘 알 만한 사람이 마침 통화가 되지 않아 그냥 휴가를 내고 회사를 빠져나왔다.(알고 보니 이번 달부터 외조모상도 3일 휴가가 나온다고 하더군.)
사실 계획된 휴가였다. 일요일이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이라 지방에 내려갔다올 겸 해서 3일간 휴가를 쓰겠노라고 상사에게 보고를 해 놓은 상태였고, 일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마무리를 해 놓고 있었기에 수월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돌아가셨을까.
집에 와서, 간단히 씻고 옷을 챙기고, 입은 정장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와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다.
완전 맨얼굴로 정장을 입은 것도 처음이고,
정장을 입고 심야버스를 탄 것도 처음이고,
상 때문에 밤에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가까운 이의 상도 처음이다.
새벽에 울산에 도착해서, 낯선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스며들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 어머니의 형제들과 외사촌들이 깨어있었다.
지난 팔순 잔치 때 찍은 할머니의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올려져 있고, 아버지가 향을 피우셨고, 기도를 올렸다. 큰외삼촌과 맞절을 했다.
아흔 다섯이시다, 호상이다, 하셨다.
어째 그리 멀리서 다같이 왔노. 하나만 올 것이쟤.
오느라 고생했다.
회사는 잘 다니나.
네.
그 회사가 일은 되게 시키쟤. 그래도 요즘 세상에 직장이 있는 게 복이다. 열심히 다녀라.
네. 그렇죠.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가요?
자리를 옮겨 외숙모가 떠주는 육개장에 밥을 말아먹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막내 외삼촌이 잠에서 깨어나고, 목소리 큰 어머니 형제들, 웃기도 하고, 언쟁도 벌이시고, 옆에서 지켜보니 재미있다.
새벽 4시쯤 되어서, 애인이 도착했다. 심야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장난삼아 너도 와-그랬더니 정말 왔다. 말끔한 정장에 은색 안경을 끼고 인물도 훤하게 들어서는 애인을 보니, 기분이 좋다. 어머니는 싫어하시는 눈치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왜 상에 오니. 친척들한테 뭐라고 소개하려고.
그러게요 엄마. 그래도, 나중에 바뀌어도 아무도 눈치 못 차릴 거에요.
애인에게 육개장 한 그릇을 먹이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다가, 애인 무릎을 베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깨우신다. 동이 어슴푸레 터오고, 할머니 입관하신단다.
나는 입관이 무언지 몰랐다. 집안에 어른이 외할머니 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른의 상을 가까이서 본 게 이번이 처음이기에. 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니까, 일단 따라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의 작은 머리가 보인다. 장의사 두 분이 열심히 닦고, 삼베옷을 입히고 있다. 두 명이서 열심히, 힘을 들여서, 아무렇게나 흐트러지는 힘없는 할머니의 몸을 싸매고 있다. 옷을 입히고, 발에도 삼베를 씌우고, 손에도 삼베를 씌우고, 두 팔을 가슴 앞으로 모아 묶는다. 여자 장의사 분이 할머니 얼굴에 화장을 하신다. 아버지는, 참 정성스럽게 화장을 해준다고 옆에서 감탄하시지만, 나는 장의사 손에 들린 지저분한 퍼프가 눈에 거슬린다.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라고, 들어오라고 한다.
외할머니의 얼굴이 보인다. 생전에 볼 수 없었던, 연한 볼터치까지 한 할머니의 작은 얼굴. 이모들이 우신다. 외삼촌도 우신다. 아버지도 우시고, 제일 멀리 살았던 막내 딸, 우리 엄마가 제일 많이 우신다. 그리고 나도, 드디어 눈물이 난다.
어렸을 적, 울산에서도 할머니 집에서 제일 멀리 살던 막내딸 집에 외할머니는 종종 놀러오셨다. 할머니가 오시면 나는 항상 ‘할머니 언제 가?’하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왜, 빨리 갔으면 좋겠냐“ 하셨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할머니가 내일 간다고 하시면 내일 모래 가라고, 모래 가신다면 그 다음날 가라고 조를 셈이었다. 왜 20년이 다 되도록, 그때 할머니가 섭섭하지 않게 말씀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있는 걸까.
입관이 끝나고, 어머니는 이제 그만 서울에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 전에 밥은 먹고 가라는 이모에게 밀려 밥상 앞에 앉았다. 애인을 앞에 두고, 나는 밥상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눈물이 차오르는 까닭을, 나는 잘 모르겠다.
외할머니,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근래 몇 년 동안은 정말 거의 뵙지 못했었는데.
왜 나는 그녀의 죽음에 이렇게 눈물이 날까. 슬프다는 느낌인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상을 치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출근을 하고, 밀린 일에 정신없이 하루가 가고, 집에 오면 별 까닭 없이 피곤해 쓰러진다. 죽은 듯 잠이 든다.
일상은 변함이 없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76 | 그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 효우 | 2013.05.29 | 3631 |
| 175 | 인생, 그 서글픈 미학- 오스카 와일드 (정재엽) [1] | 경빈 | 2012.07.10 | 3632 |
| 174 | 주말부부 (by 김미영) | 승완 | 2012.07.30 | 3646 |
| 173 | 먼 길 (by 이선이) | 승완 | 2012.05.07 | 3658 |
| 172 |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by 박상현) | 은주 | 2012.11.10 | 3660 |
| 171 | '굿바이 게으름'과 '여관' (by 정재엽) | 경빈 | 2012.10.09 | 3661 |
| 170 | 범해 2. 한 줄도 너무 길다 [4] | 범해 좌경숙 | 2013.09.08 | 3662 |
| 169 | 겁나는 반성문(by 김연주) | 은주 | 2012.10.21 | 3665 |
| » | 상(喪) (by 박소정) | 경빈 | 2012.09.25 | 3665 |
| 167 |
꽃보다 아름다워질 사람들에게 - 이희석 | 옹박 | 2012.03.28 | 3672 |
| 166 | [뮤직 라이프] 그림자 (by 오병곤) | 승완 | 2012.11.25 | 3677 |
| 165 | 뼈가 많아야 진국이다 | 옹박 | 2013.01.21 | 3684 |
| 164 | 과거로의 외출 - 이은남 | 옹박 | 2012.02.29 | 3687 |
| 163 | 보험 컨설턴트를 위한 변명 (by 박중환) [1] | 최코치 | 2012.07.11 | 3690 |
| 162 | 모자란 당신에게 캠벨이 | 로이스 | 2012.01.26 | 3693 |
| 161 | [뮤직라이프] 회상의 힘 [4] | 승완 | 2012.01.30 | 3696 |
| 160 |
교황 비밀투표 콘클라베 - 로베르토 파치, <콘클라베> | 뫼르소 | 2013.03.12 | 3707 |
| 159 |
당신의 하늘에는 몇 개의 달이 떠 있습니까? - 무라카미 ... | 정재엽 | 2013.06.25 | 3712 |
| 158 | 드디어 방송을 타다 - 송창용 | 옹박 | 2012.02.15 | 3713 |
| 157 | 정예서/ 토끼와 잠수함/ 아이 엠 어 마케터 | 효우 | 2015.03.04 | 3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