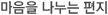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은주
- 조회 수 4161
- 댓글 수 1
- 추천 수 0
이 컬럼은 변화경영연구소 6기 연구원 신진철님이 쓴 글입니다.
바람을 타고 봄소식이 왔다. 아직 사나흘이 멀다하고 변덕스러운 꽃샘추위탓인지 꽃소식은 이른데, 버들강아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겨울 내내 얼마나 조바심이 났던 것일까. 마음을 따라 몸이 가는 것이 순리라지만, 이른 봄소식에 선뜻 꽃눈을 열고, 마음 내어준 버들강아지의 그리움이 춥지 않을까 싶다. 조심스레 가지 하나를 꺾어들어 사무실 한 켠에 있던 빈병에 꽂아 두었다. 아무리 햇볕이 인색한 사무실이라지만 세상 밖 봄소식을 가까이 두고 싶었다.
물이 오르기 시작한 갯버들은 피리를 만들어 불기에 제격이다. 지난 해 웃자란 가지의 마디가 긴 부분을 적당히 자르고, 껍질을 살짝 비틀어 돌리면 쉽게 버들껍질을 얻을 수 있다. 피리를 불 한 쪽 끝을 칼로 다듬거나 이로 살짝 깨물어 거친 겉껍질을 벗겨내면 버들피리가 만들어진다. 입술 사이로 가볍게 피리를 물고, 입천장을 거쳐 바람을 불면 그만이다. 몸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좀 굵고 길면 적당히 낮은 음도 낼 수 있다. 제 몸을 떨어서 내는 버들피리 소리는 좀 구슬프게 들린다. 피리 소리를 듣다보면, 왠지 누렁소 한 마리 정도 끌고 나와 나른한 봄볕에 풀이라도 뜯겨야 할 것만 같다. 아니면 뉘엿뉘엿 지는 해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동무를 해도 좋을 것만 같다. 물가 언저리에서 노란 꽃에 살짝 빨간 입술단장을 한 버들강아지를 보면 맘이 설레는 이유이다. 돌다리 사이를 빠르게 지나 자갈자갈 소리를 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랑살랑 제 몸 흔들어 대는 폼이 영락없이 고향 집을 찾을 때마다 반겨 맞던 멍멍이 꼬리 같기도 하고... 이제 막 처녀티를 내기 시작한 계집아이의 수줍은 웃음같이 와 닿기도 한다.
십여 년 전이었다. 도심하천인 전주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둔치를 새 단장하면서 심었던 갯버들이 이제는 제법 무성해졌다. 멀리 상관계곡을 흘러온 물길이 한벽당寒碧堂이 있는 절벽에서 몸을 뒤틀었다. 시내로 흘러드는 그 길을 따라 심겨진 갯버들은 해마다 긴 겨울 끝에서 맨 먼저 봄을 맞았다. 여름철 큰물이 질 때도 끄떡없었다. 오히려 질긴 생명력으로 깊이 뿌리 내릴 줄 알았고, 꼿꼿이 저항하기보다는 제 몸 먼저 뉠 줄도 알았다. 한 삼년 정도 지나면서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 오년가량 지나자 우거진 모습이 장관이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른 새벽에는 남부시장으로 봄나물 몇 줌 사가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나른한 오후 봄볕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이 없는 주말이라도 되면, 돌다리에 주저앉아 아이들의 수다처럼 재잘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면 잠시 시간을 잊기도 했다.
시집을 가게 되었다. 장독대 뒤 봉숭아 꽃잎에 손톱물을 들이며 사랑을 기다려 오던 누이에게도 꽃 소식이 왔다. 어린 동생을 앉혀놓고 붉은 벽돌가루를 갈아 고춧가루를 만들고, 신맛이 나던 괭이밥을 찧어 소꿉놀이를 하던 누이에게도 매파가 찾아왔다. 몇 차례 입심 좋은 매파가 다녀갈 때마다 누이는 달라졌다. 멀리 마을길을 돌아 멀어져가는 버스를 쳐다보기도 했다가 파란 하늘 끝자락에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막가지로 맨 땅바닥을 헤집다가도 어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했다. 닭장에 모이를 내어주다가도 알지 못할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 누이의 신경질에 꼬리를 살살 내리던 멍멍이는 탱자나무 울타리 밑으로 자취를 감추곤 했다. 어느 볕이 좋던 봄날, 입던 옷 몇 가지를 챙겨든 보따리 하나 만을 달랑 들고 낯선 사내를 따라 누이가 갔다. 문을 나서며 고개를 한 번 돌리더니, 다시 고샅길을 돌고 뒤를 한 번 보고 버스가 지나는 큰 길까지 내내 훌쩍거리기만 했다. 제대로 된 인사도 한 마디 남기지 못했다. 누이가 가던 뒤를 따라 두어 걸음 따라나서던 멍멍이도 두어 번 길바닥에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되돌아 왔다. 늘어진 수양버들이 봄 노란 빛을 띠고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댓돌 위에 덜렁 얹힌 한 켤레 신발만 남고,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편지를 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새로 정비를 한 장수천의 어느 한 구간에 ‘전주천 갯버들’을 옮겨 심고 싶다고 했다. 생명의 숲에서 일하는 해설사들과 시민행동21의 회원들의 하루 품을 팔았다. 잘 자란 갯버들을 골라 어른 손으로 한 뼘 반 남짓하게 잘라 노란 고무줄로 묶었다. 3월 하순이면 늘 해오던 ‘물의 날’ 행사에 맞추어 빨간 다라이 가득 시집 보낼 꺾꽂이를 준비했다. 전주천 하류에 새로 공사를 한 구간에 심기도 하고, 삼천하고 합류되는 서신동에도 심고, 반딧불이 나온다는 삼천 상류에도 옮겨 심었다. 멀리 만경강 제방이 약한 구간에도 몇 백주를 보냈다. 인천에서는 머리가 희끗한 사내 둘과 젊은 공무원이 차를 몰고 왔다. 시장님이 인사를 했고,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위원장이라는 분이 갯버들을 넘겨받았다. 행사를 마치고, 전주비빔밥 한 그릇씩을 비우고서야 전주를 떴다.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바삐 정신 팔려 살다가도, 불현 듯 다시 돌아오는 계절이 되면 잊은 듯 했던 것들이 되살아오는 것이 이제 나도 나이를 먹나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 어느 강가 한 자리에서 그들도 흘러가는 물소리를 듣고 있겠지. 누군가는 또 제 몸을 떨며 그리운 피리 소리를 내기도 하겠지. 버들피리가 구슬피 우는 것은 그리움 때문이겠지. 올 봄도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으려나 보다.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가 없나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6 | 작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1] | 은주 | 2012.03.11 | 4029 |
| 115 |
깊은 인생 - 성녀 에디트 슈타인 | 정재엽 | 2013.06.04 | 4040 |
| 114 | 신발끈을 다시 매고 (by 정세희) | 희산 | 2012.03.09 | 4043 |
| 113 | 바쁠수록 단순하게 살아라 (by 오병곤) | 승완 | 2012.09.17 | 4046 |
| 112 | 크로아티아 여행을 기다리며 1 & 2 [1] | 희산 | 2012.01.20 | 4052 |
| 111 | 경청: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도명수) | 경빈 | 2012.09.03 | 4053 |
| 110 |
토크 No.28 - 일이란 무엇인가 | 재키제동 | 2013.12.01 | 4056 |
| 109 | 활짝 웃지 그래? [1] | 승완 | 2012.03.12 | 4058 |
| 108 | 양수리 가는 길 [5] | 진철 | 2014.10.31 | 4062 |
| 107 |
삶을 바꾼 만남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 | 정재엽 | 2013.05.21 | 4072 |
| 106 | 너, 니체 (by 정재엽) [1] | 경빈 | 2012.11.27 | 4080 |
| 105 | 나에게는 성환이라는 친구가 있다 (by 정철) [2] | 희산 | 2012.02.24 | 4084 |
| 104 |
결코 위대할 수 없는 <위대한 개츠비> | 정재엽 | 2013.06.11 | 4119 |
| 103 |
[출간기획안] 나는 오늘도 출근이 즐겁다 | 재키제동 | 2014.03.30 | 4124 |
| 102 | 나의 강점 혁명 - 장성우 | 희산 | 2012.03.23 | 4158 |
| » |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서 [1] | 은주 | 2012.01.21 | 4161 |
| 100 |
라이프 오브 파이 - 얀 마텔 <파이 이야기> | 뫼르소 | 2013.03.05 | 4186 |
| 99 | 오늘을 살기 - 박승오 | 옹박 | 2012.03.07 | 4188 |
| 98 | 황석영 원작, 오래된 정원 | 효우 | 2013.03.27 | 4203 |
| 97 | 까만 토끼를 위하여 - 한정화 | 옹박 | 2012.02.08 | 4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