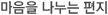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경빈
- 조회 수 4203
- 댓글 수 0
- 추천 수 0
내 서른 살이 어땠냐고? 이제 막 나이의 앞자리를 갈아치우고 서른 살이 된 후배와 마주앉아 서른 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친구는 지금, 내가 서른을 막 들어설 때쯤 그랬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서른에 대해 묻고 이야기 하고 싶어 한다.
똑같은 일년을 보내면서도 서른을 맞는 해는 특별하다. 큰 문턱을 넘는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 인생의 대단한 것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비워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할 것 같은 거창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도 서른을 넘을 때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기는 있는지, 매일 궁금하고 또 궁금해 했다. 불안한 마음이 앞서갈 때쯤이면 이런 저런 처세서들을 들춰보며 미래 계획을 세우고 뭘 하면 좋은지 정리하기도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답을 찾을 수 없어 실망하긴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서른에만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너 이제 서른이니? 좋을 때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너무 가벼운 대답이 튀어 나온다. 좋을 때라고요? 너무 늙었잖아요. 후배는 서른 살이 무슨 큰 경계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커다랗게 뜨고 대답한다. 나는 그저 빙긋이 웃고 만다.
아니. 서른이 너무 늙었다니. 내가 보기엔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 좋은 시기에 스스로 벌써 너무 늙었다며 조급해 하고 있다. 내가 서른이 되면서 상담한답시고 찾아갔던 언니들도 지금의 나처럼 어이없어 했을까. 겨우 서른에, 나이는 너무 많은데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 앉아 있던 언니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서른 살은 보는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른 나이다. 서른이 훨씬 넘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 뭐든지 할 수 있는 젊은 나이로 보이지만, 아직 서른의 문턱에 서 있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이기도 하고 이 나이까지 내가 뭐 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커다란 나이로 느껴진다. 나도 서른 즈음에는 그랬으니까. 또 대학생 조카가 보기에는 저 나이에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답답한 나이이기도 하고 말이다.
내가 중학생 때 스물아홉 살 미혼 영어 선생님이 계셨다. 우리는 그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노처녀, 노처녀 …”를 부르며 따라 다녔다. 나는 지금 그녀보다 훨씬 많은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 나이 때는 뭘 모르고 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철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나에게도 이런 나이가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 한 채 스물 아홉의 영어 선생님을 대했다. 지금 서른 셋이 되어 스물아홉 살을 다시 보면 너무 어리다 못해 풋풋한 냄새까지 난다. 스물 아홉 살은 상황과 입장에 따라 너무 나이 들었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너무 어린 나이로 해석되기도 한다.
나이만큼 공평하고 절대적인 숫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먹은 밥 공기수처럼 때가 되면 차곡차곡 늘어가는 게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나이라는 것은 너무도 상대적이다. 누군가 나에게 몇 살이냐고 묻고, 내가 서른세 살이요, 혹은 79년생이요, 혹은 98학번이요, 혹은 양띠요, 혹은 … 이라고 대답할 때, 내 나이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재해석된다. 어? 이 일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이 일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적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어? 어리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 나랑 친구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 보기보다 나이 먹었네. 어? 아줌만가? 어? 서른 넘게 먹고 저게 뭐야. 어? 우리 이모랑 동갑이다. 어? …
나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나이를 밝힐 때 내 상황과 입장과 내 나이에 맞춰 빠르게 상대방의 나이를 재해석한다. 나랑 몇 살 차이인가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 내가 대학생 때 저 친구가 몇 살이었나를 세어보기도 하고, 내가 몇 살 때 저 친구가 태어났나 손꼽아 세기도 한다. 한때는 70년대 생과 80년대 생을 구분해 보기도 했고, 올림픽을 누워서 봤느냐 앉아서 봤느냐를 두고 너무 어리네 소리를 하기도 했다. 88 서울올림픽을 모르는 친구들과 책상을 나란히 두고 같이 일을 한다는 사실에 조금 충격을 받기도 했다. 나는 저 나이 때 무얼 했나 생각하고 내 모습과 그 친구의 모습을 겹쳐보기도 하면서.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한 사람 안에서도 자신이 지나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내가 중학교 때 스물아홉 살의 선생님을 노처녀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다가 이제 막상 내가 그 나이를 지나고 보니 스물아홉은 너무도 어린 나이가 된 것처럼 말이다. 대학생 때는 복학생 오빠를 보면 왠지 안 씻고 다니고 냄새 날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군대에서 갓 제대한 대학생들을 보면 머리도 바짝 깎아 자른 것이 그러게 귀여울 수가 없다. 복학생이 늙었다고 아저씨 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고 보니 그들은 아직도 너무 어린 나이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는 4학년 선배들이 너무도 어른스러워 보였는데, 막상 내가 4학년이 되니까 하나도 안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또 대학생 때는 서른이 그렇게 높고 멀게만 보였는데 막상 서른이 되고 보니 내가 막연히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나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서른을 훌쩍 넘긴 지금 나에게 서른이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젊음이 가득한 나이로 해석된다. 한 사람에게서도 같은 나이가 하나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오죽하겠는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된다. 70년생과 소개팅을 하고 어떻게 70년생이 79년생에게 에프터 신청을 안 하냐고 버럭버럭 하던 친구도 그럴게 아니다. 그 70년생 입장에서는 79년생이 뭐 벼슬이냐. 생각할 수도 있고, 벌써 서른 세 살이네.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내 친구는 스물 여섯에 여덟 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너, 어린 거 아니다. 라고 했다면서 충격과 상처를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다. 본인 아들 나이는 생각도 않고 자기 더러 나이 많다고 한다며 섭섭하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 했는데 그럴게 아니네. 그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스물 여섯의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늦은 나이일 수도 있다.
나이만큼 상대적인 것도 없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혹은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하려는 일에 따라서,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지기도 한다. 서른 살에 대한 나의 시선은 계속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어렸을 때는 나에게도 이런 나이가 올까 싶은 까마득한 늙은 나이였지만, 이제는 내가 서른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 넘치는 나이로 보인다. 언젠가는 지금의 내 나이 서른 셋 또한 그렇게 돌아보겠지.
내 나이를 새롭게 바라보니 못할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다. 상대나이를 계산해 보니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가방을 끌고 혼자 여행도 다니고, 몇 번을 시도 하다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 포기 했던 춤도 배우고, 머리도 혀도 완전 굳어 불가능 할거라 생각했던 어학공부도 시작해야지. 그 어떤 일이든 더 이상 나이가 나를 묶어 둘 수는 없다.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 나이를 해석해 본다. 또 내가 열 살이 되어, 마흔 살이 되어 지금의 내 나이를 바라본다. 그때마다 나의 서른 셋은 전혀 다른 나이로 해석이 된다. 마흔세 살의 내가 서른세 살의 나에게 말한다. 마음 먹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늦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딱 서른셋만 됐으면 좋겠다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6 | 까만 토끼를 위하여 - 한정화 | 옹박 | 2012.02.08 | 4205 |
| 95 | 몰입 : 창조적 인재의 핵심키워드 (도명수) | 경빈 | 2012.04.24 | 4228 |
| 94 | 아주 오래된 병 [1] | 승완 | 2012.01.23 | 4231 |
| 93 | 라미아, 흡혈요부에서 풍요와 번영의 여신으로 (by 박미옥) | 은주 | 2012.08.26 | 4234 |
| 92 | 정예서/ 새길을 모색하며 | 효우 | 2015.01.28 | 4269 |
| 91 | 신성한 소가 더 맛있다 [4] [1] | 옹박 | 2013.01.14 | 4291 |
| 90 |
몽고메리 <빨간머리 앤>, 강미영 <숨통트기> | 뫼르소 | 2013.01.29 | 4295 |
| 89 | 가면나라 이야기 (양재우) [2] | 로이스 | 2012.01.05 | 4316 |
| 88 |
토크 No.5 - 누가 갑(甲)일까? | 재키제동 | 2013.01.20 | 4320 |
| 87 |
당신의 아침에 여유는 누가 줄 것인가? | 경빈 | 2012.01.17 | 4322 |
| 86 | 내가 찾는 사람, 이상형 (by 이선형) | 은주 | 2012.01.28 | 4336 |
| 85 | 스타벅스 커피 천 잔을 마시면 미국 영주권이 공짜! (by ... [9] | 희산 | 2012.07.06 | 4419 |
| 84 | 무기력 학습 하나: 호스피탈리즘 | 은주 | 2012.02.25 | 4435 |
| 83 | 청춘의 풍경들 [6] | 은주 | 2011.12.30 | 4448 |
| 82 | 장하도다 스텐카라친 [2] | 진철 | 2013.04.13 | 4486 |
| 81 | 좌뇌형 인간의 죽음 [1] | 옹박 | 2013.03.11 | 4508 |
| 80 | 자전거와 일상의 황홀 [3] | 옹박 | 2012.01.11 | 4523 |
| 79 | 신뢰-훌륭한 일터의 핵심가치 [1] | 경빈 | 2012.01.31 | 4528 |
| 78 | 우뇌를 회초리로 내리쳐라 [1] [1] | 옹박 | 2013.03.18 | 4530 |
| 77 |
터키 탁심광장에 내리는 눈- 오르한 파묵 <눈> | 정재엽 | 2013.06.18 | 4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