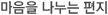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경빈
- 조회 수 3748
- 댓글 수 1
- 추천 수 0
* 강미영 2기 연구원의 글입니다.
힘들 땐 하늘을 봐.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그렇게 씨익 웃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 서로의 다이어리에 좋은 글을 써 주고 나누던 시절, 수없이 쓰고 읽었던 글이다. 지금 다시 읽어보면 조금 유치하고 웃기기까지 하지만, 그때는 저 문장을 읽으며 감동하고 언제든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화창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 그때는 나도 순진했다.
도시에서 하늘을 바라봐 본 사람은 안다. 하늘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뻣뻣한 고개를 뒤로 젖혀 눈부신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힘들어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는 고개마저 아래로 푹푹 쳐진다. 그 목에 힘을 줘 치켜 올리라니. 그 동안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라는 말로 너무 쉽게 위로 했던 것을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진다.
언제부터 하늘을 바라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상의 배경에서 하늘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디에든 있으되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하늘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바삐 걸어가는 걸음을 반성하면서 살았다. 하늘을 보려면 크게 마음을 내어 여행이라도 떠나야 했다.
이상하게도 여행을 떠나고 보면 정말 하늘을 자주 보게 된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해서 체코 프라하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다. 빈에서 같은 숙소에 머물던 친구와 우연히 일정이 맞아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며칠째 흐리다 비 왔다 반복하던 날씨는 드디어 맑게 갰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대로 한 장의 엽서 사진이었다.
기차 유리창에 파란 하늘과 초록 들판이 가로로 누워 반반씩 차지했다. 파란 하늘은 지치지도 않고 들판 위로 햇빛을 쏘아붙이고 있었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풀들은 기차의 속도만큼 빠르게 뭉개졌다. 가끔 나타나는 노란 꽃이 유채꽃처럼 보여서 반가웠다. 끊임없이 같은 장면이 이어지는 영화 같았지만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았다.
“여행 오니까 유난히 하늘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혼잣말처럼 눈은 기차 창문에 고정시킨 채 말했다. “그러게. 우리가 여행 와서 여유가 생기긴 했나 봐!” 굳이 어떤 대답을 원하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친구는 나름 진지하게 의미를 부여해가며 정성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보며 계속 달렸다.
기차 창문으로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자니 이상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하늘은 항상 위에 있었다. 하늘은 높고 높은 어떤 것의 상징이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러러보는 포즈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만난 하늘은 옆에 있었다. 내가 하늘 위로 날아오른 것도 아닌데 뭉게구름이 나와 함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고개를 뒤로 젖혀 위를 보지 않아도 내 눈높이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였다.
하늘 바라보기의 비밀은 드디어 풀렸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행 오면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 진짜 이유였다. 우리가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높이에서 하늘이 보였다. 하늘이 항상 우리 눈높이에 있었기에 하늘을 보기 위해 고개를 꺾으며 애쓰지 않아도 쉽게 하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행 오면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여유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내 눈앞에서 바로 펼쳐지기 때문이었다. 기차 창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고마웠다.
같은 이유로 나는 그 동안 하늘 보기를 어려워했다. 서울에서는 하늘이 내 머리 바로 위에만 존재했다. 사방이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 없었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 위에서도 오로지 내 머리 위로만 하늘이 보였다. 하늘을 보려면 여유를 갖고 위로 올려다봐야만 잠깐의 눈맞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애써 그런 하늘을 올려다봐봤자 높게 솟은 빌딩으로 나뉘어진 작은 조각 하늘뿐이다. 감옥이 따로 없다.
언젠가는 달리는 버스에서 작정하고 하늘을 보려고 애써봤다. 여행하면서 기차에서 봤던 것처럼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닭갈비, 현대약국, 엄마손 김밥, 중개인 사무소, 동물병원, 모텔, pc방, lotto, 노래방, 바둑 이런 간판들이었다. 하늘로 가던 시선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막혀 다시 감옥 안을 향하고 말았다. 아무도 나를 가두지 않는데도 절로 숨이 막혔다.
하늘을 보려면 항상 위를 쳐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고개를 젖혀야 한다는 생각이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 너무 건물로만 가득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구나. 분명 우리 옆에도 하늘이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늘은 바로 그런 하늘이었을 텐데. 내 옆으로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잊고 살았구나.
우리를 위로해 주고 안아 주는 하늘은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다. 하늘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개를 위로 드는 것이 아니다. 하늘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하늘을 우리가 있는 높이까지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탁 트인 곳으로 가야 한다. 하늘이 공중에서 건물에 가려 갑자기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을 볼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바다만 넓은 것이 아니라 하늘도 넓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내 옆의 하늘을 만나야 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늘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하늘을 볼 수 있다. 내 눈높이에서 하늘이 보이는 자리를 몇 개 찾아 둔다면 우리의 가슴이 뚫리는 일은 지금보다 조금 쉬워질 것이다. 일상에서도 쉽게 하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드라마에서 가슴 답답한 사람들이 회사 옥상을 찾아가 넥타이를 풀어헤치는 장면이 왜 자주 등장하는지 이해가 된다. 퇴근길에 건너는 육교 위에서 나는 또 왜 그토록 서성였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다. 슬프지만 어쩌면 그게 도시라는 건물 감옥에 갇힌 우리가 옆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지도 모른다.
내 옆의 하늘들을 찾아야 한다. 가방을 둘러 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을 지나는 기차를 타거나 먼 바닷가를 찾아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쉽지 않다. 떠난다는 것은 길든 짧든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떠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디든 내 몸의 위치에너지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 높은 건물 옥상도 좋고, 가까운 산도 좋다. 퇴근길에 건너는 육교 위에서 잠깐 멈춰서도 좋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어딘가에서 하늘과 눈높이를 나란히 하고 설 수 있는 곳을 찾았다면 잘 기억해 둬야 한다. 내 머리 위만이 아니라 앞뒤좌우에 사방으로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가 원할 때 쉽게 하늘을 만날 수 있다. 내 머리 위가 아닌 내 옆으로 펼쳐진 넓디 넓은 하늘을.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36 | 갈림길에서 길찾기 | 경빈 | 2012.02.14 | 3183 |
| 635 | 드디어 방송을 타다 - 송창용 | 옹박 | 2012.02.15 | 3713 |
| 634 | 어느 사부(射夫)의 일기 | 최코치 | 2012.02.16 | 3388 |
| 633 | 나의 보물창고, '동대문 종합시장' (by 심신애) | 희산 | 2012.02.17 | 8232 |
| 632 | 마켓팅의 시작 (by 김인건) | 은주 | 2012.02.17 | 3403 |
| 631 |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 승완 | 2012.02.20 | 6127 |
| 630 | 권태 | 경빈 | 2012.02.21 | 3269 |
| 629 | You raise me up - 김민선 [1] [13] | 옹박 | 2012.02.22 | 3871 |
| 628 | 기회는 기회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 [3] | 최코치 | 2012.02.22 | 3985 |
| 627 | 나에게는 성환이라는 친구가 있다 (by 정철) [2] | 희산 | 2012.02.24 | 4088 |
| 626 | 무기력 학습 하나: 호스피탈리즘 | 은주 | 2012.02.25 | 4439 |
| 625 | [뮤직 라이프] 나에게 쓰는 편지 | 승완 | 2012.02.27 | 3976 |
| » |
하늘은 네 머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 경빈 | 2012.02.28 | 3748 |
| 623 | 과거로의 외출 - 이은남 | 옹박 | 2012.02.29 | 3688 |
| 622 | 파우스트와의 거래 – 어느 화가의 이야기 | 최코치 | 2012.03.01 | 3760 |
| 621 |
[소셜빅뱅] 3. 소유에서 공유로, 소셜 쉐어링 | 승완 | 2012.03.05 | 5122 |
| 620 |
일상에 스민 문학 - 책 읽어주는 여자 (by 정재엽) | 경빈 | 2012.03.06 | 4810 |
| 619 | 오늘을 살기 - 박승오 | 옹박 | 2012.03.07 | 4193 |
| 618 | 강을 지나 바다에 닿은 그들 | 최코치 | 2012.03.08 | 3336 |
| 617 | 신발끈을 다시 매고 (by 정세희) | 희산 | 2012.03.09 | 4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