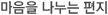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최코치
- 조회 수 3335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이 글은 4기 정예서 연구원(wast47@hanmail.net)의 글입니다.
한 달 내내 주말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나를 견디던 가족들의 볼멘소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어 늦은 점심을 먹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문밖을 나서자 온 천지가 꽃들의 축제였다. 연구소에 몰두해 있는 동안 한껏 자태를 뽐내는 봄을 짐짓 못 본체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내 눈길을 잡아 끈 것은 연하디 연한 새순으로 단장한 ‘산’의 맵시였다.
그것을 보자 지난밤에 참석한 행사에서 만났던, 그 이미지와 닮은 이들이 떠올랐다.
그 행사의 주인공들은 변화경영 연구소 연구원들이었다. 이제 막 일 년간의 연구원 과정, 그들에 의하면 ‘궁둥살’이 붙을만큼 지옥의 레이스를 끝낸 참인데 숨고를 틈도 없이 그들을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무대에 올라 있었다.
조셉 캠벨은 “ 한 차례의 통과 제의가 있은 다음에는 다소 느슨한 휴지 기간이 뒤따르는데, 이 기간에는 인생을 살아갈 당사자를 새로운 시대의 형식과 적절한 감정 상태로 유도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마침내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입문자 initate를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캠벨의 말대로라면 휴지기를 거쳐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르는 그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부, 부지깽이의 추임새에 힘입어 이제까지 건너 온 강보다 더 큰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Pre-book Fair 는 1년간의 연구원 과정을 수료하고, 필수 졸업 요건인 저자가 되기 위한 졸업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 행사에 관심을 가진 출판 전문가들,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동료들과 외부 손님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 동석한 자리였다.
발표자들의 뺨은 발그레 상기되었고, 목소리 톤의 높낮이는 고르지 않았으며, 준비한 원고는 쉬이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꿈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그 최선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시종 유쾌하고 감동이 있는 자리를 선물했다.
발표자는 모두 6명 이었는데 연령층은 오십대에서 이십대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저마다의 콘텐츠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 하고자 무대에 선 그들은 다 같은 풋풋한 청춘이었다. 똑 같은 세상일지라도 새롭게 보려고, 매해 연두빛으로 애써 싹을 틔워 다시 오는 어린 새순처럼 그들은 어제까지의 세상이 아닌 새 세상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피어난 어린 새순이었다.
출판전문가들의 피드백은 다 달랐는데 ‘누구나 쓸 수는 있으나 누구나 책을 낼 수는 없다' 는 피드백도 있었다.
뒤풀이 자리에서 그들의 스승은 말했다. “써라, 이젠 쓸 때이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 되어 있었다. 연구원 1년차 과정을 끝낸 것처럼 이제 연구원 평생차 과제는 오직 쓰는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쓰다 보면 바다에 닿을 것이란 가르침이었다.
캠벨은 영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리아드네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 사람에게로 달려가 보자. 그는 실타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마(亞麻)를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들판에서 거두었다. 수세기에 걸친 경작, 수십 년에 걸친 채집, 수많은 가슴과 손의 힘겨운 작업…… 이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를 훑고, 간추리고 헝클어진 실무더기에서 실을 자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서는 이 모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시대의 영웅들은 우리에 앞서 미궁으로 들어갔고, 미궁의 정체는 모두 벗겨졌으며, 우리는 단지 영웅이 깔아놓은 실만 따라가면 되는데도 그렇다. 추악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는 신을 발견할 것이고, 남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던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것이며,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던 곳을 통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외로우리라고 생각하던 곳에서 우리는 세계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꽃구경을 끝내고 돌아오느라 강을 건너던 봄 밤, 한강변에 가등이 하나 둘, 나리꽃처럼 피어나 빛나기 시작했다.
나룻배를 손수저어 저편에 도달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내건 등불이 저처럼 세상을 빛나게 하리란 걸 문득 믿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막 강을 건너기 시작한 나이지만 ‘궁둥살’이 붙을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강을 건너고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한 가지는 분명히 선배들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연구원 과정 읽기, 1년차를 지나 전생애차, 쓰기의 바다로 간 그들, 선배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36 | 갈림길에서 길찾기 | 경빈 | 2012.02.14 | 3181 |
| 635 | 드디어 방송을 타다 - 송창용 | 옹박 | 2012.02.15 | 3713 |
| 634 | 어느 사부(射夫)의 일기 | 최코치 | 2012.02.16 | 3388 |
| 633 | 나의 보물창고, '동대문 종합시장' (by 심신애) | 희산 | 2012.02.17 | 8230 |
| 632 | 마켓팅의 시작 (by 김인건) | 은주 | 2012.02.17 | 3402 |
| 631 |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 승완 | 2012.02.20 | 6124 |
| 630 | 권태 | 경빈 | 2012.02.21 | 3269 |
| 629 | You raise me up - 김민선 [1] [13] | 옹박 | 2012.02.22 | 3870 |
| 628 | 기회는 기회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 [3] | 최코치 | 2012.02.22 | 3983 |
| 627 | 나에게는 성환이라는 친구가 있다 (by 정철) [2] | 희산 | 2012.02.24 | 4086 |
| 626 | 무기력 학습 하나: 호스피탈리즘 | 은주 | 2012.02.25 | 4438 |
| 625 | [뮤직 라이프] 나에게 쓰는 편지 | 승완 | 2012.02.27 | 3975 |
| 624 |
하늘은 네 머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 경빈 | 2012.02.28 | 3747 |
| 623 | 과거로의 외출 - 이은남 | 옹박 | 2012.02.29 | 3687 |
| 622 | 파우스트와의 거래 – 어느 화가의 이야기 | 최코치 | 2012.03.01 | 3758 |
| 621 |
[소셜빅뱅] 3. 소유에서 공유로, 소셜 쉐어링 | 승완 | 2012.03.05 | 5120 |
| 620 |
일상에 스민 문학 - 책 읽어주는 여자 (by 정재엽) | 경빈 | 2012.03.06 | 4809 |
| 619 | 오늘을 살기 - 박승오 | 옹박 | 2012.03.07 | 4192 |
| » | 강을 지나 바다에 닿은 그들 | 최코치 | 2012.03.08 | 3335 |
| 617 | 신발끈을 다시 매고 (by 정세희) | 희산 | 2012.03.09 | 4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