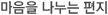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은주
- 조회 수 3357
- 댓글 수 1
- 추천 수 0
섬진강 연가
- 섬진강 벚꽃따라 사랑도 지고
가슴에 이별을 품고 바라다 본 강은 눈물이었다.
2010년 봄, 섬진강은 벚꽃 이파리 날리는 연분홍 빛깔이 흘렀다.
잔가지 끝 파리한 목숨들이 아직도 차가운 바람 끝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설움이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소중한 사랑,
기나 긴 겨울 같던 외로움 끝에 맞은 너무 성급한 봄이었나 보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인연이었건만, 속절없이 놔버려야 했던 원망스러운 운명이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딱, 그만큼이었다.
잠시
섬진강 꽃그늘에
주저앉는다
바람은 자꾸만
벗은 가지를 흔드는데
꽃잎 따라 웃음이 진다
눈물이 떨어진다
섬기던 사랑도 진다
섬진강
꽃그늘 아래서
그댄 전화를 하네
받고 싶은 전화가 있었겠지
그늘진 낮꽃에
짧은 목숨같던
연분홍 벚꽃이 피네
바람이 지네
바람만-지네
수줍은 미소가
꽃잎처럼 날리네
바람타고 흐르네
강을따라 떠나네
담고 싶은 사랑
닮고 싶은 사람
재첩소리 밟히네
울음이 부서지네
전주에서 남원으로 그리고 다시 시인이 살고 있다는 지리산 악양마을까지. 마흔을 넘게 살아 오면서도 그저 그렇게 지나쳐 온 섬진강이었지만, 그날 그녀와의 동행은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다. 얼굴이라곤 단 한번 마주친 지인의 부탁으로 맺어진 동행이었다. 잠시 서점에 들러 박남준의 <산방일기>를 고르고, 내겐 복효근의 여섯 번째 시집인 <마늘촛불>을 선물했다.
그녀에겐 아픔이 있었다. 불과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사랑을 잃었다. 늦은 귀가 길을 염려했던 그가 그녀를 바래다주고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지만 다행히 그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차마 죽을 것 같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파리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17번국도 따라
강이 흐르고
멀리 구름마을에서
여기 섬진강까지
노루귀 복수초 깽깽이풀마저 피었는데...
봄은 강을 거슬러 오네
매화 피고
산수유 피고
이젠 벚꽃마저 피는데
관광버스로 사람들은 오는데
소식이 없네
그대 소식만 없네
바람이 주루룩
눈물이 지네
앞마당 붉은 눈물만 피네
대문대신 노란 산수유가 우리를 반겨 맞았다. 시인의 집 앞마당엔 막 홍매가 붉었다. 치맛자락 차마 펼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은근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얄미울 정도로 고운 빛깔이었다. 시인의 손끝에서.. 막 우려낸 녹차 향기 위로 피었다. 이야기 꽃이 붉게 피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물었다. 그를 위해, 그의 무덤에 나무 하나 심고 싶어두고 싶다고 했다. 배롱나무가 좋겠다고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도 여전히 간지럼을 타고, 보고 싶은 여름 한철 내내 붉은 그리움을 피우다가 늦은 가을이면 뼈만 앙상히 남은 외로움을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만 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젊어...
채... 무슨 말도 남기지 못하고
소주병이 쓰러져
방안을 뒹군다
별도 함께 진다
석 달 열 흘
여름 한 철 내내 보고파서
아니, 차라리 붉은 피 토하고
너와 함께 스러지고 싶어서
살도 없이 뼈만 남은
너를 닮아서
붉은 배롱나무
하나 심었다
좀 더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아쉬움이었다.
매 번 만나고도 또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것이 아직도 낯설기 만한 마흔 셋 봄날이었다.
주제 넘는 일이 아니라면... 함께해서 나눌 수 있다면.. 섬진강 그리움께 드릴 수 있다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내 시가 그럴 수만 있다면...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76 | 내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 (by 오병곤) | 승완 | 2012.05.21 | 3958 |
| 575 | 승진에서 물 먹었을 때 [1] | 경빈 | 2012.05.21 | 3552 |
| 574 | 손님이 나를 만든다 (by 김인건) [3] | 오방주 | 2012.05.25 | 3098 |
| 573 | 숟가락 베이비슈 (by 이선이) [1] | 승완 | 2012.06.04 | 3887 |
| 572 | 믿음과 의심, 그 양날의 칼을 동시에 사용하라 (by 박경... | 오방주 | 2012.06.17 | 3239 |
| 571 | [오리날다] 평범함의 가치 | 승완 | 2012.06.18 | 3471 |
| 570 | 절실함으로 길을 떠나자 (by 오병곤) | 승완 | 2012.06.25 | 3190 |
| 569 | 한 달 (by 박소정) | 경빈 | 2012.06.25 | 5362 |
| 568 | 글쓰기는 여름날 쌀독의 뉘 고르기 (by 정예서) | 최코치 | 2012.06.28 | 2984 |
| 567 | 단식(斷食)과 단식(斷識)_박승오 | 옹박 | 2012.06.28 | 3439 |
| 566 | 수갑을 풀다 (by 박정현) | 희산 | 2012.06.29 | 3485 |
| » | 섬진강 연가 (by 신진철) [1] | 은주 | 2012.06.30 | 3357 |
| 564 | 양배추 꼬마 (by 이선이) | 승완 | 2012.07.02 | 3822 |
| 563 | 픽업산책 (강미영) | 경빈 | 2012.07.02 | 3205 |
| 562 | '나'다운 승리_박소라 | 옹박 | 2012.07.04 | 3104 |
| 561 | 잘 다듬은 창조성 (by 이한숙) | 최코치 | 2012.07.04 | 3234 |
| 560 | 스타벅스 커피 천 잔을 마시면 미국 영주권이 공짜! (by ... [9] | 희산 | 2012.07.06 | 4414 |
| 559 | 아직 전하지 못한 편지 | 은주 | 2012.07.08 | 3030 |
| 558 |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by 김미영) [1] | 승완 | 2012.07.09 | 3439 |
| 557 | 인생, 그 서글픈 미학- 오스카 와일드 (정재엽) [1] | 경빈 | 2012.07.10 | 3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