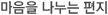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최코치
- 조회 수 3346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이 글은 4기 오현정 연구원의 글입니다.
Chapter 4.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된다 : 인생 뭐 별거 있나? 물 흐르는 데로 사는 거지.
인생엔 무언가 성취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문제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제대로 된 노력은 취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들을 부러워 하기만 하는 나의 태도에 있었다. 그게 나의 불행의 근원이었다. 달성하지 못한 목표만을 나는 잔뜩 늘어 놓고 늘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었다.
그 때 나는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 폴리스가 등 뒤로 보이는 유스 호스텔에 머물고 있었다. 겨울인데도 지중해의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 따뜻한 햇볕에 누워 잠이라도 자고 싶었다.
나는 별로 의욕이 없는 여행자였다. 아크로 폴리스도, 시내 구경에도, 수니온 곶도, 시내에 있다는 박물관에도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유스 호스텔을 어슬렁 거리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어딘가 내가 낄 곳이 없을까 유심히 사람들을 바라 보고만 있었다.
유스 호스텔 데스크에는 잘 생긴 호스텔 지기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영어가 안 통하는 그리스에서 그들은 아주 명확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잘 생기기 까지 했다. 근육이 약간 있는 건장한 체격에 어디 한군데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이목구비. 나는 그가 연극배우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유스 호스텔을 드나들면서 그에게 어떻게든 말을 걸어 보려고 노력했다. 여기 저기 관광지에 가는 방법들을 그에게 물었고 거실에 놓인 유료 인터넷 이용법을 그에게 물었었다. 그리고 또 근처에 슈퍼마켓에 가는 길을 그에게 물었다. 그가 몇 번이고 설명을 했는데도 나는 잘 알아 듣지 못했다. 그건 언어의 문제라기 보다는 나의 길 찾기 감각의 문제였다.
내가 몇 번이고 물어 본 길을 또 물어보자 그의 얼굴에는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친절하게도 밤에 유스 호스텔에 필요한 빵을 사러 갈 예정이니 시간 맞추어 자기를 따라 오라고 했다.
그의 사연이 있어 보이는 눈과 매우 멋진 런던식 영어 발음이 나를 재미나는 이야기로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밤이 왔고 나는 그를 따라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슈퍼마켓 가는 길에 내가 슬쩍 그에게 물었다.
“근데, 원래 고향이 어디야? 너 그리스 사람은 아니지?”
“영국”
“영국 어디?”
“런던 근처”
“그랬구나.”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는 텔레파시를 보냈다.
“우와, 근데 여기까지 와서 사는 구나!”
“그렇게 됐어. 어찌하다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지.”
“혹시 그리스 말은 하니?”
“전혀 모르지”
“살기에 불편하진 않아?”
“별로….”
그는 피우던 담배를 끄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내가 유태인 여자 아이와 사귀고 있었을 때였어. 참, 난 런던에서 연극 배우를 했어. 그리 잘 나가는 배우는 아니었지만 무대에 섰었어. 그 때 그 아이를 만난 거야.”
“진짜? 우와 내 예측이 맞았네. 난 너를 보자 마자 연극 배우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었어.”
“그 여자 애랑 몇 년 같이 살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리스를 오겠데. 그래서 특별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랑을 따라서 여기 온 거야.”
“근데 넌 연극 배우 다 그만두고 온 거야?”
“응, 뭐 그리 잘 나가지도 않았쟎아.”
“근데?”
“그 아이랑 여기 와서 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 날씨가 정말 좋더라. 그냥 그게 좋았어. 그러다가 여기 유스 호스텔에서 이 직업을 얻었지 뭐야. 그런데 이 직업이 싫지 않았어.”
“응. 근데 너 그리스 말 못해도 살기에 불편하진 않아?”
“아니, 전혀.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유스 호스텔에선 늘 새로운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내 적성엔 잘 맞았어.”
“그렇구나.”
나랑 그 아이는 빵을 몇 봉지 사고 맛있어 보이는 그리스 오렌지를 몇 알 샀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말을 꺼냈다.
“여기 와서 몇 년 살다가 그 아이랑 헤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혼자야. 그 아이 땜에 여기 오긴 했지만 난 여기서 새로 얻은 직업이 좋고 그래서 여기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여기 사는 거야.”
“너 여기 유스 호스텔 일이 재미있구나?”
“응, 여기 일은 재미있어. 전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사실, 태어나 30년 정도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온 나에게 그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왠지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쓸데없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스르르 나를 떠나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삶이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하나씩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정말 물 흐르듯이 특별한 목적 없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그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거운 명예, 돈, 지위, 목적 따위는 놓아 버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가슴을 따르다가 나름대로의 자신이 제일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아 보였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마 내 속엔 히피가 자라기 시작했을 거다. 인생 그리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된다. 물 흐르듯이 가슴이 말하는 데로 살아도 된다. 다만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왜 이리 힘든거지? 아마 가슴의 말하는 소리를 잘 듣지 않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머리에서 지저귀는 그 많은 소리들을 놓아 버리고 가슴을 따라 사는 삶.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그 아이를 보면.
Chapter 5. 부모 맘에 드는 자식은 많지 않아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지만 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엄마는 나만 보면 시집가라고 성화였다. 가만 보면 우리 엄마 눈에 나는 상당히 맘에 들지 않는 딸임에 틀림이 없었다. 곱게 키워서 멀쩡하게 좋은 대학 보내 두었더니 월급도 쥐꼬리 만큼 버는 회사를 다니면서 날마다 밤을 세운다. 그 놈의 잘 난 회사 다니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살은 푹푹 찌고 얼굴도 못나 졌다. 도대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아하신 우리 엄마가 날 보기엔 딱 미친년이다.
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길이 무언지 잘 몰라서 항상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한다. 매번 실패하면서도 나는 언젠가는 내 앞에 내 길이 보일 것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우기면서 고집을 피운다. 그 길을 찾기 전에는 난 다른 것에 한 눈 팔기도 싫다. 시집가서 해결되는 거라면 당장에 갔을 테지만 그것은 시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조차도 혼란스러운데 내 인생에 또 다른 혼란을 끄집어 들이기가 벅찼다. 그래 벅찼다는 표현이 나에게는 딱 맞는 표현이었다.
이래저래 나는 미친년이었다. 그 표현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삭막한 니스의 겨울 바닷가에서 나는 엄마가 내게 했던 불렀던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로부터도 이해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파도가 달려들고 바람이 달려 들어 정신이 없는 그 바닷가에서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차라리 ‘자아’가 이리 강하지 않았다면 ‘착한 딸’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 흔한 ‘착한 딸’도 되지 못하고 ‘미친년’이 되어 여기까지 흘러 온 것이다.
그 날 나는 알래스카에서 온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다. 보잘 것 없는 내 영어를 그녀는 칭찬해 주었다. 가끔 가다 내가 어려운 단어라도 쓸라 치면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곤 했다. 인류학을 공부해선지 마음이 많이열려 있었다. 그녀는 더듬더듬 내 영어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는 그녀와 언덕배기에 있는 마티즈 미술관에 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살아 온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 놓았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글 쓰는 게 좋아서 인류학을 공부 했다고 한다. 집 안에선 그녀를 제외하곤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미국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글 쓰고 공부해서 밥 먹고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며 게다가 수요가 많지 않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수지 맞지 않는 장사라고 했다. 고등학교 이후엔 집 밖의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시던 그녀의 어머니는그녀를 절대 이해 하시지 못하신단다. 돈도 안 되는 인류학이라는 공부를 죽자고 하고 그것도 모잘라 시집도 안 가고 밥도 안 나오는 글을 쓰는 그녀를 이해하시지 못한단다. 그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하다가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눈에는 내가 미친년인 거지.”
“우하하하”
순간 내 웃음 보따리가 함께 터졌다.
“너 그거 아니? 우리 엄마 눈에도 나는 미친년이야.”
“그래? 너도 미친년이었어?”
“응. 하하하하,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미친년이었었네.”
우린 둘 다 웃음이 터져서 더 이상 걷질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우하하…너도 미친년이었었구나”
“너도 그랬구나” 그러고는 한참을 웃어댔다.
그 웃음과 함께 나는 미친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던 내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버렸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모양이다. 엄마들 눈에는 그들의 세대에 하지 않던 일을 하고 다니는 딸들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보이나 보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그에 맞추어 딸 세대들의 생각도 변해 가는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세대를 기준으로 자신의 딸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엄마들 눈에는 우리가 ‘미친년’이 될 수 밖에 없나 보다.
이래저래 부모님 맘에 맞는 자식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삶에 대한 해답 하나를 얻은 것 같았다. 나는 그냥 ‘미친년’이 되기로 했다. 그 단어를 상처받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모님 세대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때문이다.
“나는 내 세대를, 그리고 내 시대를 살아야 하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언젠가 내가 다음 세대를 바라 볼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그래, 너희들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친년’으로 아주 잘 살아주길 바래. 멋지게! 그게 너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최선의 삶이야”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56 | 의자, 아니 원칙을 사수하라_신종윤 | 옹박 | 2012.07.11 | 2735 |
| 555 | 보험 컨설턴트를 위한 변명 (by 박중환) [1] | 최코치 | 2012.07.11 | 3687 |
| 554 | 샤먼이 되고 싶은 소녀 (by 박정현) | 희산 | 2012.07.12 | 3360 |
| 553 | 내 존재에 대한 조감도를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 (by ... | 은주 | 2012.07.14 | 3532 |
| 552 | 직장을 내 인생 반전의 기회로 삼아라 (by 오병곤) | 승완 | 2012.07.16 | 3113 |
| 551 | 감사(感謝)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도명수) | 경빈 | 2012.07.16 | 4909 |
| 550 | 창조할 수 없는 예술가여,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 (by 박... [1] | 은주 | 2012.07.19 | 3006 |
| 549 | 노화가 멈춰버린 나 (by 양재우) | 최코치 | 2012.07.20 | 2887 |
| 548 | 너도 해볼래? (by 이선이) | 승완 | 2012.07.23 | 3149 |
| 547 |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 지는 법 (한명석) | 경빈 | 2012.07.23 | 2942 |
| 546 | 신화 속으로 들어가다_김도윤 | 옹박 | 2012.07.25 | 3218 |
| » | 여행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2) (by 오현정) | 최코치 | 2012.07.26 | 3346 |
| 544 | 선조의 붉은 편지 (by 박정현) | 희산 | 2012.07.27 | 2924 |
| 543 |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 망설이지 않기 (by 이은주) | 은주 | 2012.07.28 | 2975 |
| 542 | 주말부부 (by 김미영) | 승완 | 2012.07.30 | 3643 |
| 541 | 나를 설득시켜야 남에게 다가갈 수 있다 | 경빈 | 2012.07.30 | 3078 |
| 540 | 베트남과 두바이의 아름다움에 대하여_최영훈 | 옹박 | 2012.08.01 | 3583 |
| 539 | 회사 인간 (by 오병곤) | 승완 | 2012.08.06 | 2994 |
| 538 | 나의 연구원 1년 (박소정) | 경빈 | 2012.08.07 | 3052 |
| 537 | 손 내미는 아티스트_한정화 | 옹박 | 2012.08.08 | 3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