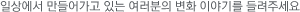
- 한명석
- 조회 수 2359
- 댓글 수 2
- 추천 수 0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리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아생존율이 낮던 3,40년대, 6개월 간격으로 동생을 잃어야 했던 시절. 또 동생 하나를 파묻고 온 날, 네 살짜리가 ‘유진의 머리가 놓여 있던 베개에 움푹 팬 흔적’을 오십 년 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
모든 장면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리얼하다. 책을 좋아하여 이야기를 잘 해 주던 아빠는 경제적인 능력은 꽝이었다. 체면치레가 강하여 날품을 팔면서도 반드시 칼라와 넥타이를 챙겨 입던 그. 동네사람이 편지를 써 준 대가로 푼돈이라도 줄라치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고 설레발을 치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면 엄마에게서 그 돈을 타내 술을 마시고, 어렵게 취직을 하면 주급으로 밤새 술을 퍼마시느라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해 두어 달을 못 채우고 짤리곤 하던 아버지. 그는 죽은 아이의 관을 구하러 나가서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빠를 찾아 술집을 헤매다 보면 동생의 관으로 쓸 하얀 상자에 맥주잔을 얹어놓고 술을 마시는 아빠.
그에게는 조국을 위해 싸운 것밖에 자랑스러운 기억이 없다. 무력한 비분강개형이 갖는 전형적인 허장성세. 그래서 술만 마시면 한 살배기 까지 깨워, ‘아일랜드를 위해 죽을 것을 맹세’시킨다.
“허튼 소리 집어 치우고 어서 잠이나 자요.”
“맨날 그놈의 잠, 잠, 잠. 잠을 자면 뭘 해, 엉? 자고 나면 어차피 또 일어나야 하는걸. 난 뿌연 안개 속으로 독약을 뿜어내는 강물 옆에선 잠을 잘 수가 없어.”
소리치는 엄마에게 대고 하는 이 서정적인 대답은 또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사실과 허구, 기억과 상상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나 한 시절과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나도 한 번 흉내 내고 싶어진다. 나는 살아온 날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또 기억과 망각을 갈라놓는 기준은 어떤 것일까. 무책임할 정도로 모호한 기억의 뼈대에 살을 붙여 이처럼 생생하게 복원해낼 수 있다면, 나는 헛산 것이 아니다. 무수한 회상과 상상을 통해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삶이 펄떡거리며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고 그 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내일은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현실과 상상이 하나가 된다.
저자의 감성은 아빠에게서 온 것이리라. 저자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동생이 아빠에게서 듣곤 하던 쿠후린 이야기를 골목 친구에게 들려주자, “그 얘긴 내 거야.” 하며 달려들어 동생과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 대는 그. 친구는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웬일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대로 그만두면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빼앗아 버릴 것 같아서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천성에 세월을 보태 그는 우리에게 슬프도록 아름다운 자서전 한 권을 선물한다. 그의 책은 ‘인간과 삶에 대한 종합보고서’이다. 그는 지극히 유려한 문장으로 지리와 사회와 문학을 섞어 놓는다. 가령 이런 문장.
무엇보다 우리는 늘 젖어 있었다. 대서양 위에서 꾸역꾸역 한데 모인 거대한 비구름은 새넌 강 줄기를 따라 천천히 떠내려 오다 리머릭Limerick에서 아예 터를 잡고 떠날 줄을 몰랐다. 그리스도 할례제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온 도시가 축축하게 비에 젖어 있었다. 그런 탓에 콜록콜록 기침 소리, 가르랑가르랑 가래 끓는 소리, 색색 숨가쁜 소리, 폐병 환자의 목쉰 소리가 내는 불협화음이 그칠 새가 없었다. 비는 코를 콧물샘으로 만들었고, 폐를 박테리아 빨아들이는 해면체로 만들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경험들이 그의 펜을 통해 한 편의 그림이 되고 동화가 되었다. 먼 이국땅에서 가난하게 자란 한 아이가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 가게에서 바나나를 훔치던 네 살부터, 미국에 가기 위해 죽은 노파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열아홉 살까지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간결하고 속도 빠른 진행도 좋지만 책의 전면에 흐르는 해학이 일품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세월의 덕분이다.
네 살 된 나에게 동네 아줌마들이 아기 돌보는 법을 일러 준다. 누구는 기저귀를 diaper라고 부르고, 누구는 nappy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쌍둥이 녀석들이 거기다 똥을 싸기는 마찬가지니까 뭐라고 부르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 그 세월에는 ‘지각했다고 때리고, 펜촉에서 잉크가 샌다고 때리고, 웃는다고 때리고, 떠든다고 때리고, 하느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모른다고 때리고, 19 더하기 47을 모른다고 때리고, 47 빼기 19를 모른다고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갔으나 우리는 다시 한 번 그것들을 불러올 수 있다. 글쓰기는 마법의 도구이고, 자서전은 그 중에서도 힘이 아주 세다. 이 책은 쉰이 넘어 글을 쓰기 시작한 프랭크 맥코트의 자서전이다. 그는 이 책으로 63세에 퓰리처상을 받았다.
참고도서: 프랭크 맥코트, 프랭키, 200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96 | 우울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2] | 맑은 | 2008.12.09 | 2387 |
| 795 | 나의 글쓰기 도구. [2] | 맑은 | 2011.11.02 | 2389 |
| 794 |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1] | 맑은 | 2010.03.09 | 2392 |
| 793 |
경영을 그리다._얼마나 잘 보는가? | 맑은 | 2010.09.18 | 2392 |
| 792 | 재미있는 전략이야기18- 전략의 meme 謨 II [5] | crepio | 2010.01.18 | 2395 |
| 791 |
아마데우스 | 날개달기 | 2010.05.11 | 2396 |
| 790 | <라라12> 만나야만 만난 것이다 [3] | 한명석 | 2010.02.20 | 2397 |
| 789 | 약점 시간 [2] | 숲속나무 | 2010.04.12 | 2401 |
| 788 | 인재의 조건, 열정 [2] | 날개달기 | 2010.12.03 | 2401 |
| 787 | 생소한 직업 '재능세공사' 사용후기 (5) | 이기찬 | 2008.11.19 | 2402 |
| 786 | 앞쪽뇌를 훈련하다. | 맑은 | 2009.07.22 | 2402 |
| 785 | 모방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 [2] | crepio | 2011.03.05 | 2404 |
| 784 | 1 : 1 회화 [3] | 맑은 | 2010.04.08 | 2406 |
| 783 | 열 세번째_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 민들레꿈 | 2010.09.15 | 2410 |
| 782 | 변화는 수작업이다. | 맑은 | 2009.02.19 | 2413 |
| 781 | 재미있는 전략이야기 20-전략가의 조건, 面厚心黑 II [5] | crepio | 2010.02.01 | 2415 |
| 780 | 동화책의 미래. [3] | 맑은 | 2010.10.19 | 2416 |
| 779 | 자아성취와 풍성한 삶을 위한 도구 [3] | 날개달기 | 2010.11.15 | 2416 |
| 778 | 커뮤니티로 변화하다. [2] | 맑은 | 2009.01.05 | 2417 |
| 777 | <라라55호> 내 취미는 공저 | 한명석 | 2010.12.06 | 2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