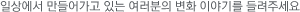
- 나리
- 조회 수 2505
- 댓글 수 2
- 추천 수 0
전화가 걸려 왔다. 이 밤에 무슨 전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경질적으로 재촉을 했지만 상대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잘못 걸린 건가? 다시 한 번, 여보세요?
아....... 아....... 막내 삼촌. 한참의 휴지기 끝에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영락없는 막내 삼촌의 것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지루한 시간을 예감하고 반사적으로 몸을 뒤틀며 양미간을 찌푸렸다.
한 쪽 발로 몸무게를 지탱하고 다른 발로는 방바닥에 의미 없는 동그라미를 그리며 전화기 속의 삼촌을 무시하려 애쓰는 내가 거실 거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화난 사람처럼 무뚝뚝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점점 지루해 지고 있다. 방바닥에 그려지는 모양도 이제는 제각각이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어눌하고 뭉글한 음성이 답답한 가슴을 더욱 죄어 왔다.
"어,엄마 어디…… 가셨니?"
“지금 주무시는데요.”
"나, 나리는 몇, 몇 살…… 이지?"
"휴우…….."
"여기……는 너, 너무 추워. 잠을 잘 수가…… 없어. 나, 나는 이제 다 나았으니까 나 좀…… 나가게 해줘. 여기는 정말 추, 추워"
"네."
삼촌은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엄마를 깨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연결 안 되는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몇 십 분을 질질 끌면서 말이다. 한 동안 잠잠하다 싶다가도 이렇게 불쑥 사람을 놀래키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삼촌의 특기다. 사실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
삼촌의 동전이 다 되었나 보다. 뚜뚜 거리는 신호음에 되려 안심을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 놓았다.
그러나 수화기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몇 십 분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기억 저 편으로 쓸어 버리는 나였다.
막내 삼촌. 어쩐지 개운치 않은 뒤끝에 마음이 불편하다.
가물거리며 나타날 듯 나타나지 않던 삼촌의 얼굴이 마침내 정지화면 영상처럼 줌 인 되어 보인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과 병약해 보이는 마른 다리, 검게 그늘진 눈 아래가 서글프게 야위었다. 게다가 삼촌은 말을 더듬었다. 인내심 없는 나는 삼촌과의 대화를 시도하다 답답한 마음에 혼자 화만 삭이기 일쑤였다.
삼촌이 어렸을 적엔 삼촌의 가늘고 맑은 목소리 때문에 멋진 가수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삼촌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심하게 맞아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 후, 갑자기 변해 버린 어눌한 음성과 더듬거리는 말투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엔 역부족이 되어 버렸다. 그 시절엔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한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외할머니는 억울한 고통을 한 평생 혼자 감내하셨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나는 삼촌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서 삼촌 주위를 빙글빙글 잠자리처럼 맴돌곤 했다. 그러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이내 곁에서 떨어져 나오고 말았지만.
엄마는 내게 삼촌은 머리가 아파서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순진하게도 나는 아픈 삼촌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곁을 피해 다녔다. 혹시라도 동생이 시끄럽게 울거나 떠들기라도 하면 얼른 달려가 입술을 동그랗고 오므리고 쉿! 하며 동생을 조용히 다독였다.
사실 막내 삼촌과 나는 둘만의 작은 비밀을 간직한 특별한 사이다.
아무도 없는 집에 삼촌과 나만이 덩그러니 앉아서 할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한여름의 어느 날 밤. 어찌나 길고 무서운 밤이었던지 나는 그 날 밤 끈질기게 울었다. 큰 비가 내렸었는지 엄청난 천둥이 쳤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머리가 아픈 삼촌과 단 둘이 있다는 불안감은 일곱 살 어린이가 느끼기에 굉장한 공포였던 것 같다.
멍하니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삼촌을 피해 부엌으로, 방으로, 또다시 부엌으로 숨바꼭질을 했던 나는 두어 시간도 안되어 금새 지쳐버렸다.
밖은 이미 어두워 진지 오래였고 할머니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잠투정처럼 칭얼대다가 어느새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나는 엉엉 울음보를 터트리고 말았다.
눈물이며 콧물이며 온통 범벅이 되어도 할머니는 오시지 않고 악을 쓰며 방을 뒹굴어도 어두컴컴한 창 밖은 가로등 하나 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때까지 멍하니 텔레비젼만 보고 있던 삼촌이 내 곁에 다가왔다. 혼자 우느라 지쳐버린 탓에 다가오는 삼촌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나였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삼촌이 내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훌쩍거리며 누워 있던 나는 어느새 삼촌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삼촌은 한참 동안 내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나도 삼촌의 노래를 들으며 곤한 잠에 빠져 들었다.
정말 이상한 건 그 때 막내 삼촌의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도, 어눌하지도 않았으며 맑고 청아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정말 멋진 가수가 될 수도 있었을 막내 삼촌의 노래를, 삼촌이 아픈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은 나와 삼촌 외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비밀이랄 것도 없는 일이지만 특별히 떠들어댈 일도 아니었기에 지금껏 둘만의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알게 되었다. 삼촌의 두통은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삼촌의 두통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님을.
전화기 앞에서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 어째서 삼촌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한 것일까? 어째서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 한 마디 못했던가?
마흔을 훌쩍 넘긴 막내 삼촌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병약한 몸집, 웃음이 사라진 희멀건 표정이 하나씩 오버랩되자 가슴이 마른 밀가루처럼 뻑뻑하게 말려 들어가는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제는 내가, 머리가 아파 잠조차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삼촌을 무릎에 누이고 자장가를 불러 드려야 할 차례인가보다. 아주 먼 옛날, 삼촌이 불러 주었던 그 노래를 가만히 입 속으로 불러 본다. 그것은 아마도 삼촌에 대한 나의 턱없이 부족한 고해성사가 될 것이다. 잔뜩 성난 사람처럼 부아가 났던 내 얼굴에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어떤 이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영 낯설고도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36 | 2009년 독서목록 [8] | 햇빛처럼 | 2009.01.08 | 2774 |
| 435 | 인생 키워드 히스토리 & 나의 모습 (1) [1] | 신재동 | 2009.01.07 | 2458 |
| 434 | 변화한다는 것 | 은도끼 | 2009.01.07 | 2377 |
| 433 | 커뮤니티로 변화하다. [2] | 맑은 | 2009.01.05 | 2417 |
| 432 | 지혜 | 은도끼 | 2009.01.05 | 2213 |
| 431 | My salad day [1] | 나리 | 2009.01.03 | 2288 |
| 430 | 참 잘했어요! | 나리 | 2009.01.02 | 2819 |
| 429 | 그가 오다. [5] | 맑은 | 2009.01.02 | 2434 |
| 428 | 담론 Chatting [3] | 백산 | 2009.01.01 | 1952 |
| 427 | 말장난, 글장난 [1] | 나리 | 2008.12.31 | 2354 |
| 426 | 자기다움 실천가들의 흥겨운 레인보우 파티 후기 by 이재... [1] | 이기찬 | 2008.12.30 | 2369 |
| » | 막내 삼촌 [2] | 나리 | 2008.12.30 | 2505 |
| 424 | 작가가 되지 않은 이유 [4] | 나리 | 2008.12.29 | 2462 |
| 423 |
나를 사랑하다. | 맑은 | 2008.12.29 | 2572 |
| 422 | 신이 바라시는 사람 | 은도끼 | 2008.12.22 | 2306 |
| 421 | 당연한 존재는 당연하지 않다. [8] | 맑은 | 2008.12.22 | 2686 |
| 420 | 자신을 믿는게 최우선 입니다. | 책벗 | 2008.12.17 | 2282 |
| 419 | 사랑 예찬 | 은도끼 | 2008.12.16 | 2336 |
| 418 | 시련이 기회가 될 때. [6] | 맑은 | 2008.12.16 | 2530 |
| 417 | '일을 사랑한다'는 의미 [3] | 맑은 | 2008.12.15 | 2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