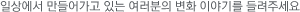
- 나선
- 조회 수 1991
- 댓글 수 0
- 추천 수 0
그 봄, 떠들썩 했던 도시를 온전히 잊어 버린 듯 들어선 산 길은 적막이다.
벚꽃 화장을 지워버린 진해는 상상하기 힘드나 그녀, 진해가 멋들어지게 보여주는 속살, 시루봉 가는 길은 지금이 축제다.
자은초등학교를 왼쪽으로 보며 걷는 길은 처음부터 쉬 허락하지 않으려는 시루봉의 새침함이요, 자생하는 녹차나무가 열병한 길을 굴하지 않고 오른 자에게 중간 중간 내어주는 정자는 농도 짙은 유혹이다.
생전 처음 해보는 산과의 ‘밀당’놀이에 푹 빠져 걷다 보면 언제부터 흘렀는지 모를 태곳적 물터를 만난다. 쏟아지는 땀인지 그녀가 씻겨주는 세안인지 분간하지 못해 급하게 돌아본 전경에 외마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진해만이 박힌다.
아름다운 진해만의 해안선은 군사지역이라는 이유와 벚꽃의 유명세에 가려 평가 절하 되어 있지만 시루봉 중턱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예부터 ‘천연의 양항(良港)’이라 일컬어진 이유를 실감하게 된다. 구릉성의 크고 작은 반도와 곶 그리고 유인도 4개를 포함한 26개의 섬이 이루어내는 오케스트라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며 ‘섬마에’가 되어 볼 일이다.
이후의 길은 마치 웃는 듯 거칠게 호흡하며 오르는 길이다. 길인데… 백발의 어르신 한 분이 가뿐하게 오르신다. 머쓱해진 자칭 알피니스트, 전북 무안이다. 이로써 그 분은 알게 모르게 또 하나의 숙제를 충남 부여 하신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항상 나에게 경북 구미 당기는 일이다. 이쯤 해서 말장난으로 이 글도 쉬어 가지 않으면 반듯하게 솟은 시루봉 정상을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
8부 능선 안부에 다다르면, 이제는 멀리 시루봉을 정면에서 보며 걷는다. 또렷한 봉우리와 오냐 이제는 허락한다는 듯 가지런히 놓여있는 지그재그 나무 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 길을 버리고 우측으로 가파르게 우회하는 길을 잡는다. 나 또한 그대를 쉬 취하진 않을 작정이다.
오르는 길, 트인 시야는 멀리 거제와 가덕, 바다 위 그네들을 잇는 문명의 이기(利器) 거가대교를 조망한다. 맑은 날 눈을 씻고 바라보는 풍광은 ‘나에게 안긴 자여 보아라’ 하는 시루봉의 선물이다. 뿐 인가. 눈을 떨구어 앞을 보면 힘차게 뱃고동 울리며 달릴 듯한 큰 배들이 도열해 있는 국내 대형 조선소(stx)의 그 규모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
여러 상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느덧 큰 바위 앞에 마주하게 되는데 이곳이 진해의 속살, 시루봉이다. 애꿎은 ‘밀당’은 여기서 끝난다.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킨 우뚝 솟은 바위는 매우 신기하다. ‘어떻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이 산을 오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질
학자들도 품은 의문이었다. 정상의 바위는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한다.
언제인지도 모를 과거에 ‘강력한 화산폭발이 있었고 그로 인해 화산쇄설물과 간간이
흘러나온 용암층이 진해지역의 병품처럼 감싸안은 환상형 산악구조’를 이루게 했다. 용암
이 솟구친 자리에 바위가 들어 앉았으니 그 바위를 덮은 퇴적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깎이고 깎이어서 시루봉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랬을 것이라 짐작만 될 뿐 현재 한국의 지질학계에서도 정확히 시루봉의 생성
원인을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명이 범하지 못한 ‘멈춘 시간’이다.
그러나 세월을 견디며 깎이어 가는 동안 이 바위는 우리네 땅에서 벌어진 역사의 여러 장면을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연기(緣起)의 시선으로 묵묵히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진해’가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온 때를 이 바위는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을 게다.
서기 48년 멀리 인도 아유타국에서 허왕후를 태운 배가 진해만을 비껴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여 금관가야의 찬란한 전성기를 굽어보았을 것이고
‘근래’ 1592년 임진년에는 왜국의 대마도를 발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선(戰船)이 한반도 남쪽 바다를 까맣게 뒤덮는 장면을 이 바위는 몸서리 치며 목도 했을 것이다.
또한, 이 바위는 자신의 아랫도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제사를 신라시대부터 기분 좋게 봐 왔을 것이고 그 중 명성왕후가 순종을 낳고 지낸 백일제에서는 기울어 가는 조선의 어두운 명운을 일찌감치 예감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 저러한 어설픈 감상을 뒤로 하고 내려서는 길에 자꾸만 돌아봐 지는 것은 내가 그랬듯 그녀도 나와의 교감을 잊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내리막의 빠른 걸음을 애써 늦추며 이 산, 축제 같은 시루봉의 속살을 부여 잡는다.
세속은 정전으로 모든 이가 아우성이나 내려가는 길, 눈을 감으니 온 세상이 밝아진다.
그녀가 주는 선물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16 | 여중생 둘이, 화장품을 훔치다. | 맑은 | 2011.10.29 | 2178 |
| 915 | 마음을 얻는다. [1] | 봄날의곰 | 2011.10.29 | 2067 |
| 914 |
당신의 핵심가치. | 맑은 | 2011.10.28 | 2654 |
| 913 | 내가 후져서.. | 봄날의곰 | 2011.10.28 | 1998 |
| 912 | '더하기와 빼기' 10월27일분. | 맑은 | 2011.10.28 | 2156 |
| 911 | 핵심가치는 어떻게 일상에서 드러나는가? | 맑은 | 2011.10.26 | 5969 |
| 910 | 스티븐 잡스 전기 구입하다. | 맑은 | 2011.10.25 | 2110 |
| 909 | 유명해질 것. | 맑은 | 2011.10.24 | 1994 |
| 908 | 사업의 시작. | 맑은 | 2011.10.23 | 1970 |
| 907 | 패러다임의 전환 | 봄날의곰 | 2011.10.23 | 1975 |
| 906 |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타인도 원한다. | 맑은 | 2011.10.22 | 2219 |
| 905 | 내려서고 내려서라 | 나선 | 2011.10.22 | 2157 |
| » | 그 주인을 만나 붉어진 얼굴에 내어 놓은 속살 | 나선 | 2011.10.22 | 1991 |
| 903 | 돌을 던지고, 길을 묻다. | 맑은 | 2011.10.21 | 2030 |
| 902 | 혁신과 인문학 [2] | 맑은 | 2011.10.20 | 1989 |
| 901 | 황금,소금, 지금. | 봄날의곰 | 2011.10.20 | 3234 |
| 900 | 재능과 영업력 | 맑은 | 2011.10.19 | 1993 |
| 899 | 지금 당장 예술가가 되어라. [2] | 맑은 | 2011.10.18 | 2024 |
| 898 | 책 덮고, 장사하자. [2] | 맑은 | 2011.10.17 | 2003 |
| 897 | 소명에 대해서. [3] | 맑은 | 2011.10.16 | 2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