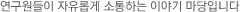
- 한정화
- 조회 수 2816
- 댓글 수 7
- 추천 수 0
리뷰와 칼럼을 15개를 쓰고 난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3기 연구원들의 글을 읽다보니, 몇몇은 편안하게 글쓰기가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아닌 것 같아서 입니다.
책을 한권 읽고 나면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와글와글 합니다. 여러가지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느라 덜그덕 거립니다. (덜그럭 거리는 중에 과거에 읽은 책과 이번에 읽은 책을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뚜렷히 형체가 보이지 않고 그냥 느낌만 남을 뿐이어서요.)
머리 속으로 스치는 생각들 중에 막상 글로 옮길 때는 그 중에 1~2개를 골라서 글을 쓰는 데, 쓰고 나면 너무 짧습니다.
짧은 이유를 생각해 봤는 데, 그것을 기술할만한 기반(재료로 써 먹을 기본지식, 재료들의 연관성 파악)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요점 말하면 그것으로 됐어'라는 저의 성향이 두번째 이유 같습니다.
복잡한 것을 엮어낼 만한 실력은 안되고,
그러니 그중에 1~2개 잡아서 뽑아내고, 그러면, 5~6개 정도의 문장으로 무척 짧아져 버립니다. 살이 없다고 해야하나.....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쓴다도 해보았는데, 어느새 다시 짧은 것으로 돌아가 있곤 합니다. 생각난 것 서로 얽어매지는 못해도 그거라도 쓰고나면 그래도 짧습니다. 살붙이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기 선배님들은 어떠셨어요? 이미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간 3기들은 어때요?
언제쯤 이런 고민이 해결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풀어갔는지 등등....
글을 쓸 때 계속해서(학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안되는 것은 무언인지도?
자꾸 바꾸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써지는 대로 써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시도해 보겠습니다.
IP *.72.153.12
고민에 빠졌습니다.
3기 연구원들의 글을 읽다보니, 몇몇은 편안하게 글쓰기가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아닌 것 같아서 입니다.
책을 한권 읽고 나면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와글와글 합니다. 여러가지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느라 덜그덕 거립니다. (덜그럭 거리는 중에 과거에 읽은 책과 이번에 읽은 책을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뚜렷히 형체가 보이지 않고 그냥 느낌만 남을 뿐이어서요.)
머리 속으로 스치는 생각들 중에 막상 글로 옮길 때는 그 중에 1~2개를 골라서 글을 쓰는 데, 쓰고 나면 너무 짧습니다.
짧은 이유를 생각해 봤는 데, 그것을 기술할만한 기반(재료로 써 먹을 기본지식, 재료들의 연관성 파악)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요점 말하면 그것으로 됐어'라는 저의 성향이 두번째 이유 같습니다.
복잡한 것을 엮어낼 만한 실력은 안되고,
그러니 그중에 1~2개 잡아서 뽑아내고, 그러면, 5~6개 정도의 문장으로 무척 짧아져 버립니다. 살이 없다고 해야하나.....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쓴다도 해보았는데, 어느새 다시 짧은 것으로 돌아가 있곤 합니다. 생각난 것 서로 얽어매지는 못해도 그거라도 쓰고나면 그래도 짧습니다. 살붙이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기 선배님들은 어떠셨어요? 이미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간 3기들은 어때요?
언제쯤 이런 고민이 해결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풀어갔는지 등등....
글을 쓸 때 계속해서(학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안되는 것은 무언인지도?
자꾸 바꾸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써지는 대로 써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시도해 보겠습니다.
댓글
7 건
댓글 닫기
댓글 보기
써니
쓰려고 하는 마음보다 느낌을 그리듯이 휘둘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쓰려고 했는 데 잘 안 걸려서 밖으로 나갔더니 이러저러한 장면들이 펼쳐졌을 경우 그것들을 들여다 보는 느낌이랄지
또는 책을 읽다가 꽂히는 단어, 문장, 풍경이 떠 오를 때 그것을 독주마신 향인마냥 일필휘지로 끝까지 가보는 것.
그것들을 적어 두었다가 바로 써먹거나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어쩌다보면 살을 붙이거나 떼면 써먹을 수 있는 글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가 향산이 한 말이 요즘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뭐냐면 글을 읽다가 떠오르는 단어 문구들을 조합을 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데 요즘 그것이 조금 골라지기도 해요. 나도 아직 그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단어 수집을 해가게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여행자 김성주처럼 즉시에서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시간없고 더디게 읽어서 잘 못 하는 데 다른 이의 글을 읽다가도 무언가가 더러 잡힐 때가 있어요. 부지깽이님의 글을 읽다가 생각난 것인데 '매롱이다' 하는 문구에서 나는 '부지깽이 똥꾸' 하는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말 배우면서 좋을 때 잘 쓰는 표현이죠. 아빠 똥구, 엄마 똥구 하는, 그러면 그 장면이랑 분위기랑 어울리는 모습들이 마구 떠오르지요. 재롱 떠는 아이모습, 표정, 빙 둘러 앉아 지켜보며 웃고 있는 할아버지 손뼉, 할머니의 뻐등렁니, 향산의 자지러질 듯한 얼굴의 미소 그것을 지켜보는 그의 아내...
저녁을 먹고난 이 집안의 풍경에 TV는 따로 없다 등등. 아이에게는 그 안의 공간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장난감이고 지켜보는 우리 역시도 무대보로 연출되는 그 가족만의 유일한 그림이 되는 경우, 그런 장면을 스케치 하듯 바로바로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요.
논리적인 글이 모자란 나는 칼럼은 짧게 리뷰는 다양하게 써볼까 생각해요.
가령 소설 형식을 빌어볼까 아니면 수필처럼 더러는 시처럼 구사해 보려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보지요. 그러다가 쓰다보면 잡히는 글이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또, 언젠가 써먹어볼 작정인 기발한(?) 그러나 누군가 이미 써먹은 그렇지만 내가 시도하는, 그게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거에요. 그러면 쿡!하고 웃음을 참았다가 뽕!하고 질러 버리는 거죠. 눈치를 보거나 조언에 너무 충실하다보면 이게 잘 안 되요. 그래서 화딱지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것 저것 배우기도 전에 가리다보면 어떻게 읽고 쓰겠어요.
나는 정직하기로 했어요. 우선 꼴리는 대로 살자. 내 과정을 숨기지 않는 약간의 무모함이 저의 경우에는 필요하던 걸요. 그래서 난 우선은 책이랄지 뽑히는 글에 관심두기 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내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너무 대책없음인가요? 조언을 남겨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따지기인데(시비도 좋구요) 가령 꽁지머리님은 왜 머리를 묶을까? 폼나려고, 색시해 보이게 끄롬, 은연중 튀려는 애정 결핍일지도, 머리를 안 감아서, 사실은 속 알머리가 빠져서 덮으려고, 때로는 그 안에 머리 묶은 순이가 들어있기 때문 등등.. 놀면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될까요?
이 글도 너무 생각이 모자란단 느낌이 드네요. 그냥 올리고 정리를 해야 겠네요. 순서가 뒤바뀌었나요???
예를 들어 쓰려고 했는 데 잘 안 걸려서 밖으로 나갔더니 이러저러한 장면들이 펼쳐졌을 경우 그것들을 들여다 보는 느낌이랄지
또는 책을 읽다가 꽂히는 단어, 문장, 풍경이 떠 오를 때 그것을 독주마신 향인마냥 일필휘지로 끝까지 가보는 것.
그것들을 적어 두었다가 바로 써먹거나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어쩌다보면 살을 붙이거나 떼면 써먹을 수 있는 글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가 향산이 한 말이 요즘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뭐냐면 글을 읽다가 떠오르는 단어 문구들을 조합을 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데 요즘 그것이 조금 골라지기도 해요. 나도 아직 그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단어 수집을 해가게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여행자 김성주처럼 즉시에서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시간없고 더디게 읽어서 잘 못 하는 데 다른 이의 글을 읽다가도 무언가가 더러 잡힐 때가 있어요. 부지깽이님의 글을 읽다가 생각난 것인데 '매롱이다' 하는 문구에서 나는 '부지깽이 똥꾸' 하는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말 배우면서 좋을 때 잘 쓰는 표현이죠. 아빠 똥구, 엄마 똥구 하는, 그러면 그 장면이랑 분위기랑 어울리는 모습들이 마구 떠오르지요. 재롱 떠는 아이모습, 표정, 빙 둘러 앉아 지켜보며 웃고 있는 할아버지 손뼉, 할머니의 뻐등렁니, 향산의 자지러질 듯한 얼굴의 미소 그것을 지켜보는 그의 아내...
저녁을 먹고난 이 집안의 풍경에 TV는 따로 없다 등등. 아이에게는 그 안의 공간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장난감이고 지켜보는 우리 역시도 무대보로 연출되는 그 가족만의 유일한 그림이 되는 경우, 그런 장면을 스케치 하듯 바로바로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요.
논리적인 글이 모자란 나는 칼럼은 짧게 리뷰는 다양하게 써볼까 생각해요.
가령 소설 형식을 빌어볼까 아니면 수필처럼 더러는 시처럼 구사해 보려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보지요. 그러다가 쓰다보면 잡히는 글이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또, 언젠가 써먹어볼 작정인 기발한(?) 그러나 누군가 이미 써먹은 그렇지만 내가 시도하는, 그게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거에요. 그러면 쿡!하고 웃음을 참았다가 뽕!하고 질러 버리는 거죠. 눈치를 보거나 조언에 너무 충실하다보면 이게 잘 안 되요. 그래서 화딱지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것 저것 배우기도 전에 가리다보면 어떻게 읽고 쓰겠어요.
나는 정직하기로 했어요. 우선 꼴리는 대로 살자. 내 과정을 숨기지 않는 약간의 무모함이 저의 경우에는 필요하던 걸요. 그래서 난 우선은 책이랄지 뽑히는 글에 관심두기 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내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너무 대책없음인가요? 조언을 남겨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따지기인데(시비도 좋구요) 가령 꽁지머리님은 왜 머리를 묶을까? 폼나려고, 색시해 보이게 끄롬, 은연중 튀려는 애정 결핍일지도, 머리를 안 감아서, 사실은 속 알머리가 빠져서 덮으려고, 때로는 그 안에 머리 묶은 순이가 들어있기 때문 등등.. 놀면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될까요?
이 글도 너무 생각이 모자란단 느낌이 드네요. 그냥 올리고 정리를 해야 겠네요. 순서가 뒤바뀌었나요???
한정화
생각의 단편들을 기록하다 보니, 너무 조각조각 나있어서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아서 모아두기 싫은 느낌 정도. 그것을 칼럼으로 하자니 서운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중하게 써볼까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제겐 아니더군요. 무척 어려웠습니다. 진도가 안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느낌.
리뷰에서는 저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읽은 사람이 자기 말로 리뷰를 쓰는 데,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결국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쓰게 되니까.....
리뷰 쓰고, 연구원들의 리뷰 읽으면서 알게된 것. 저는 초반에 너무 제 자신에 묻혀 있어서 저자의 의도를 빗나가서 아주 작은 것 하나 붙들고 궁시렁 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책을 전체로 보고 싶었고, 그렇게 전체로 보니 유학자의 경전보면서 깨달은 것 마냥 한 두 문장으로 정리되고 할말 없데요.
한편은 너무 작아서 맘에 안 들고, 한 편은 너무 커서 더 할말 없고.
딜레마에 빠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진중하게 써볼까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제겐 아니더군요. 무척 어려웠습니다. 진도가 안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느낌.
리뷰에서는 저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읽은 사람이 자기 말로 리뷰를 쓰는 데,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결국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쓰게 되니까.....
리뷰 쓰고, 연구원들의 리뷰 읽으면서 알게된 것. 저는 초반에 너무 제 자신에 묻혀 있어서 저자의 의도를 빗나가서 아주 작은 것 하나 붙들고 궁시렁 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책을 전체로 보고 싶었고, 그렇게 전체로 보니 유학자의 경전보면서 깨달은 것 마냥 한 두 문장으로 정리되고 할말 없데요.
한편은 너무 작아서 맘에 안 들고, 한 편은 너무 커서 더 할말 없고.
딜레마에 빠져 버린 거죠.
명석
고미숙이 어느 일간지에 글을 썼는데, 필자소개에 간단하게 ‘수유+너머’ 연구원이라고 되어있는거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연구원들도 조만간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지요. 하긴 엊그제 소장님께서 어느 사보에 기고할 기회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썼지요. 얼마만에 해 보는 경제활동인지 감개무량했답니다. ^^; 저술인력 풀이 형성되어 있으면, 출판기획자들이 연구소에 줄서는 것은 시간문제이겠지요.
정화씨의 SOS에 평소 생각을 몇 마디 적어봅니다. 자신의 책을 가진 이후에야 정식 연구원이 되는거라는 소장님 말씀처럼, 선배 노릇할 처지는 못되고, 단지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네요. 종윤의 안부에 대한 대답이구도 하구요.
일단 3기 연구원들의 글이 일신우일신 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도 좋을듯 싶어요. 일주일에 꽤 긴 시간을 투입해서 읽기, 쓰기에 진력하고 있는데 발전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문장이 완연하게 매끄럽고 부드러워지고, 소재가 다양해져 읽기가 아주 편해요. 13명의 개성과 일상이 한 눈에 잡힐듯 화려한 것이 마치 꽃구경 하는 것같아요. 좋은 팀웍에서 오는 상호학습과 상호지지의 힘인듯 합니다.
사건과 느낌을 상세하고 진솔하게 쓰되, 그 안에 자기다운 향기나 성찰이 들어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미소 한 번 짓게 하면 좋은 글이 아니겠어요? 정화씨의 음악회에 관한 글도 아주 좋네요. ^^
컬럼의 경우, 초반에 필독서에서 물리적으로 소재를 취하던 방식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눈에 띄네요. 훨씬 유연해진 겹눈으로 필독서를 일상과 접목시키기 시작한 것같아요. 단지 할 수 있다면, 일상적인 소재와 느낌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떨까 권해봅니다. 꿈과 사랑, 회한과 페이소스가 꿈틀거리는 글로 읽는 이의 마음에 무늬를 드리우자는 거지요. 여러분의 글이 한 주가 다르게 상향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깊이, 더 절실하게 감성을 건드리느냐가 문제일 것같아요. 물론 감동은 진실에서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진실이란 솔직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같아요. 꿈벗 전체모임에서 옹박이 15분 강의를 해 준 방법이 줄리아 카메론이 말한 ‘모닝페이지’와 통하지요. 일단 자기검열 없이 나올 수 있는 것, 빼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쓴 다음에 퇴고하는 방법이지요. 퇴고와 편집이 같은 뜻은 아니라고 봐요. 매주 격렬한 글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은 나라는 인간을 심층까지 내려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요. 늘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과하는 사람은 조금은 가벼운 톤의 글을, 비교적 가벼운 톤의 글에 익숙해진 사람은 조금은 치열한 내면을 탐사하는 식으로, 글쓰기의 영역을 넓혀보는 것,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능소능대한 표현력을 키우면서 내 스타일 찾기.
결국에는 사람이 커야 글이 큰다고 생각해요. 글은 표현력+@가 아니겠어요. 적절한 체험과 연륜이 글 속에 녹아들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때, 우리의 글이 존재의의를 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좋은 글의 전제조건은 좋은 삶이지요. 열심히 글쓰는 사이사이 열심히 살 수밖에요. ^^
에고~~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가 쉽지 않네요. 정화씨는 훨씬 구체적인 방법론을 궁금해했지만, 그것은 같은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있는 3기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이 나을듯 하네요.
연암 박지원의 문체론으로 글을 맺을께요.
“남을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범범하고 데면데면하여 우유부단하기만 하다면 이런 글을 대체 얻다 쓰겠는가?”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88 | 또 저에요. [3] | 소라 | 2007.06.04 | 2636 |
| 587 | 두번째 수업......... 후기 [3] | 한정화 | 2007.06.06 | 2385 |
| 586 | 오늘 밥먹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7] | 박승오 | 2007.06.08 | 2699 |
| 585 | 이상하다. [21] | 신종윤 | 2007.06.14 | 3207 |
| 584 | 사랑이 그랬다구? [8] | 香仁 이은남 | 2007.06.18 | 2544 |
| 583 | -->[re]또 너냐 ? [3] | 회초리 | 2007.06.19 | 2431 |
| 582 | 여러분이 좋습니다. [6] | 옹박 | 2007.06.19 | 2748 |
| 581 | 緣을 생각하다가... [5] | 香仁 이은남 | 2007.06.22 | 2373 |
| 580 | 깍쟁이 공주의 말, 눈치쟁이의 해석 [3] | 교정 한정화 | 2007.06.22 | 2957 |
| 579 | 윤이의 근황 [8] | 오윤 | 2007.06.22 | 3002 |
| 578 | 비가 오면 더 생각나는 3기 [9] | 써니 | 2007.06.25 | 2875 |
| 577 | 사악한 우리의 또 다른 작전 [40] | 옹박 | 2007.06.25 | 3429 |
| 576 | 징기즈칸 책 관련하여 [1] | 옹박 | 2007.06.26 | 2642 |
| » | 질문이요~ 글이 안써질 때 [7] | 한정화 | 2007.06.27 | 2816 |
| 574 | 긴급연락!!! 우제 최정희님께!!! [1] | 써니 | 2007.06.27 | 2390 |
| 573 | 서글픈 날의 훈훈한 단상 [5] | 써니 | 2007.06.27 | 2886 |
| 572 | 백범기념관 나들이 가실 분~ ^^ [6] | 현운 이희석 | 2007.07.03 | 2709 |
| 571 | 우덜 조교 옹박에게 [12] | 써니 | 2007.07.03 | 3485 |
| 570 | 좀더 잘 쓰고 싶어서, 좀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 한정화 | 2007.07.04 | 2200 |
| 569 | 처음엔 그냥 걸었어 [23] | 한정화 | 2007.07.04 | 39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