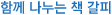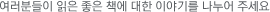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김미영
- 조회 수 5812
- 댓글 수 2
- 추천 수 0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창비, 2008)
후두둑 겨울비가 지나간 뒤 칼바람이 불어대는 긴 하루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쯤이었다. 주린 배에 뭐라도 채우려 냉장고를 뒤적이며 밥상을 차리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아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렸을 아이들 수다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받아 먹어야했다. 높다랗게 쌓인 설거지를 끝내고 가방에 담아온 일거리를 정리하니 아이들은 잠이 들고 난 후였다. 남편이 귀가하기 전, 그 짧은 혼자만의 시간에 ‘엄마를 부탁해’를 만지작거리며 갈등했다. 읽고 싶었다. 하지만 내 체력은 바닥이어서 밤을 새울 자신도 울 힘도 없었다. 게다가 내 엄마를 떠올리니 그만 눈을 감고만 싶었다.
전날보다 훨씬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이불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토요일 아침, 수건 한 장을 옆에 놓고 책장을 펼쳤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로 시작하는 소설 속의 ‘너’는 지하철 서울역 구내에서 동행하던 아버지를 놓친 뒤 길을 잃고 사라져버린 칠순 엄마의 큰딸이다. 글을 쓰는 사람인 ‘너’는 이제야 ‘봄날 새싹들처럼 솟아나는 기억’으로 엄마를 말한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말도 없이 뇌졸중을 앓았고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을 도려낸, 정신마저 고장 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나선다. 신이 모두에게 찾아갈 수 없어 엄마를 보냈다고 했던가. 평생 베풀기만 하고도 평생 미안해하는 ‘너의 엄마’를 읽으며 수건 반쪽은 콧물로 나머지 반쪽은 눈물로 젖었다. 내 삶의 고단함과 반성이 더해져서 엉엉, 꺼이꺼이, 제대로 통곡까지 했다.
작가 자신이 투영된 ‘너’는 자신의 엄마에게 ‘엄마’ 대신 ‘나’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나’에게도 꿈이 있고, 비밀이 있고,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고,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고마운 일이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가 팔도를 떠돌아다니다가 제사 때가 되면 돌아오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당신’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아들. 그들이 잃어버린 ‘엄마’는 누구인가? ‘아내’는 누구인가? 그들이 찾는 ‘엄마’는? ‘아내’는? 한 인간에 대한 기억은 어디까지일까? 엄마(아내)에 대한 기억은?
다음은 큰아들이 기억하는 엄마다.
도시로 방을 얻어 나간 큰아들에게 줄 것들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양손에 들고도 모자라 허리에 찬 채 주머니엔 풋고추나 알밤, 신문지에 싼 깐마늘 들을 넣고 서울역 플랫폼을 걸어 나오는 엄마. 신문지와 비닐과 호박잎에 싼 밑반찬들을 찬장의 그릇에 옮겨 담아놓은 뒤 얼른 이불홑청을 뜯어 빨고 절여서 물을 빼온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연탄불이나 곤로에 그을린 밥솥을 쇠솔로 박박 문질러 윤이 번쩍나게 닦고 그사이 옥상에 널어놓아 볕에 마른 홑청을 꿰매주고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여 저녁상을 보아주고는 물린 상을 치우는 엄마. 남편의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샛문으로 집을 나갔다가 큰아들이 여자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가지도 않고 밥도 굶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와 여자를 부엌에서 밀어내고 밥을 지은 엄마. 먼저 국밥을 먹자 해놓고 국밥 속의 쇠고기 건더기를 아들 그릇에 옮겨주며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않는 엄마.
다음은 남편이 기억하는 아내다.
바깥일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나, 왔네! 하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얼굴을 내밀던 아내. 읍에 좀 다녀오려는디 양말이 어디 있나? 하면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다가도 얼른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와 입고 나갈 옷가지들을 챙겨주는 아내. 언제 올랑가? 라고 묻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면 무슨 볼일을 보러 서울에 갔든 그길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아내. 고추꼭지를 따거나 깻잎을 개거나 배추를 간하다가도 당신이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주저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 곁으로 와서는 산에 두릅이 났길래 좀 캐왔는디 두릅전 부쳐볼까? 자실라요? 하던 아내. 도망치듯 뛰쳐나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온 겨울밤, 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을 꺼내고 상보로 덮어둔 밥상을 끌어와 앞으로 밀어주며 화롯불에 들기름 바른 김을 구워주는 아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희생과 감동의 결정판이다. 그런데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눈물이 쏘옥 들어갈 황당한 글을 발견했다. 분명 남자였으리라. 희생과 양보와 포기의 상징인 ‘엄마’가 사라졌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시대에 붕괴된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엄마’를 찾아주길 부탁했다. 아마도 책 속의 큰아들이 기억하는 ‘엄마’와 남편이 기억하는 ‘아내’를 그리워했나보다. 불쌍한 사람, 만약 그가 ‘그런 엄마’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면 좋겠다.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구개월째다.’로 시작되는 에필로그로 마무리된다. ‘너’는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방 안에 구겨져 있는 동생의 편지를 꺼내 읽는다. 세 아이의 엄마인 약사 동생이 싱글 언니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이다.
언니, 나는 엄마를 모르겠어. 특히 엄마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생각해봐. 엄마는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해내며 살았던 것 같아. 그러느라 엄마는 텅텅 비어갔던 거야. 종내엔 자식들의 집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엄마가 우리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 상황이 그렇다고 쳐. 그런데 우리까지도 어떻게 엄마를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으로 여기며 지냈을까. 난 어떻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을까.
나는 엄마처럼 못사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도 하지 않았을까. 딸인 내가 이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다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세월의 갈피 어딘가에 파묻혀버렸을 엄마의 꿈을 위로하며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올까?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에게 말할 테야.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을,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엄마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책장을 덮으며 나는 내가 ‘딸’임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에 안도했다. 그리고 나에게 ‘딸’이 있음에 감사했다. 내 엄마와 내 딸들. 내 배꼽들. 내 몸이 기억하는 그들을 떠올리며 한참을 울었다. 그저 눈물뿐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 화가 나고 귀찮다가도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지치고 쓰러졌을 때 그 땅을 짚고 일어서게 하는, 아침마다 다시 시작하자 다짐하게 하는, 어쩌면 내가 사는 이유일 내 엄마와 내 딸들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안쓰러움이 눈물이 되었을까? 그리고 다시 내게 물었다. 나는 내 엄마를 잊은지 얼마나 되었던가? 하고. 그리고 작가는 좋겠다, 했다. 혼.자.서. ‘엄마’를 추억하는 ‘너’가 부러웠단 얘기다. 나는? 나는 책 읽고 정리했더니 주말이 다 갔다. 또 다시 새로운 한주를 시작해야한다.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내달려야하는 내가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다. 이게 행복이라고? 난 잘 모르겠다.
***
엄마는 부엌이 좋아?
부엌에 있는 게 좋았냐고. 음식 만들고 밥하고 하는 거 어땠었냐고.
부엌을 좋아하고 말고가 어딨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던 거지. 내가 부엌에 있어야 니들이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믄서 사냐? 좋고 싫고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지.
(……)
끝이 보여야 말이지. 그래두 농사일은 봄에 씨앗을 뿌리믄 가을에 거두잖여. 시금치씨를 뿌린 곳에선 시금치가 나고 옥수수씨를 뿌린 디선 옥수수가 나고……한디 그놈의 부엌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아침밥 먹음 곧 점심때고 또 금세 저녁때고 날 밝으면 또 아침이고……반찬이라도 뭐 다른 것을 만들 여유가 있음 덜했겄는디 밭에 심은 것이 똑같으니 맨 그 나물에 그 반찬. 그걸 끝도 없이 해대고 있으니 화딱증이 날 때가 있었지. 부엌이 감옥 같을 때는 장독대에 나가 못생긴 독 뚜껑을 하나 골라서 담벼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단다. 내가 그랬다는 것을 니 고모는 모른다. 알면 미친년이라고 하지 않았겄냐, 멀쩡한 독 뚜껑을 집어던지곤 했으니.
헛돈 좀 썼단다. 새 뚜껑을 사러 갈 적에는 돈이 아까워 쩔쩔 맸는디도 멈출 수는 없더구나. 독 뚜껑 깨지는 소리가 내겐 약이었어. 속이 후련허구 답답증도 가시고.
너도 밥하기 싫음 접시라두 하나 던져서 깨보련? 아구, 저 아까운 거 싶은디도 속이 뻥 뚫리기도 헐 것이다. 하긴 결혼도 안했으면서 밥하기 싫고 말고가 있겠냐마는. (p.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