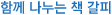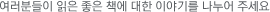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부지깽이
- 조회 수 4507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숲에게 길을 묻다, 김용규, 비아북, 2009
(이코노믹 리뷰)
작가는 글과 유리되어도 좋을까 ? 소설을 쓴 작가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으려니 기대하지 않는다. 작가는 작품 속에 늘 살아있는 신처럼 군림하지만 그의 작품이 그의 삶은 아니다. 그러나 사상은 다르다. 이것이 옳다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해놓고 막상 그 삶은 그 생각을 배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 책은 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내의 자기 발견의 성찰이다. 살아있는 이야기다.
저자는 그윽한 목소리로 숲에서 가장 자신을 닮은 나무 하나를 찾아 그 밑에 서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크고 잘 생긴 소나무 아래 서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가 잘린 나무 밑에 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덩굴이 휘감겨 보기에도 고통스러운 나무 밑에 선다고 한다. 작가 역시 자신을 닮은 나무 아래 선다. 자신이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나무는 음나무나 두릅나무 같은 가시나무라고 말한다. 음나무는 그 몸통이 마치 가시가 가득한 도깨비 방망처럼 생겨 대문 위에 달아두고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액운 퇴치용 부적처럼 쓰이기도 한다. 그만큼 가시가 사납다. 저자는 젊은 시절 그 가시나무 같았다고 말한다.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평에 시비를 걸고 걸핏하면 분노를 터뜨리고 싸움을 걸었으니 상대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 일수였다고 한다. 그러나 상처는 늘 자신에게 되돌아 오곤 했다. 세상의 불합리와 맞설 힘도 지혜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이 많았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때의 자기가 음나무의 가시투성이 모습과 닮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숲을 만난 다음 두릅나무를 보다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두릅나무가 자라날 때는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온 몸을 가시로 감싼다. 그러나 점점 자라 키가 커지고 스스로 쉽게 꺽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시로 가는 수분과 에너지를 끊어 제 몸의 가시를 다 떨어뜨린다. 비로소 매끈한 수피를 가진 큰나무가 되는 것이다. 요즈음 저자를 옆에서 지켜보면 그의 가시도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괴산의 산자락에서 자신의 꿈을 따라 행복숲을 만들어 가면서 그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제는 자신이 있어야할 아름다운 곳에 서있게 되었다. 세상을 향한 가시가 사라지자 가시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 자신이 숲에서 길을 물어 제 삶에 스스로 깨달은 바를 적용해 가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 책이 진짜인 이유다.
책을 읽으며 내 마음에 오래 머물던 그의 숲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한다. 자식은 모든 부모의 희망이고 사랑이다. 그래서 집착한다. 나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인생의 패러독스는 사랑하는 것을 멀리두라 말한다. 식물의 생존과 번성은 자식을 멀리 보내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식의 계발에 의존해 왔다. 단풍나무는 자식을 멀리 보내기 위해 프로펠러 모양의 날개를 만들어 바람에 날려 보낸다. 소나무는 비가 오면 솔방울을 오므려 씨앗이 비에 젖지 않게 한다. 비에 젖으면 씨앗을 멀리 날려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맑은 날 다시 솔방울을 벌려 적당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린다. 가을에 산에 가 본 사람은 모두 안다. 스치기만 해도 바지에 달라 붙은 수 많은 씨앗들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나를 붙들고 따라오는 지를 말이다. 도깨비바늘, 도꼬마리. 진득찰 같은 놈들이다. 더 심한 전략을 계발한 경우도 있다. 도토리는 다람쥐가 좋아하는 먹이다. 나무는 자식을 동물의 먹이로 주기도 한다. 가을이 되면 다람쥐는 도토리들을 모은다. 여기저기 숨겨두는데, 종종 이 놈들이 제가 숨겨둔 도토리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견되지 않은 도토리는 여기서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 식물의 삶은 오래전부터 자식에 집착하려는 나를 멈춰서게 만들곤 했다. 멀리가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 그들의 제국이 만들어 진다.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야 비로소 스스로 서기 위해 애를 쓴다.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숲에서도 경쟁은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그 경쟁의 내용이 우리와 다르다. 예를들어 딱따구리와 동고비는 모두 나무의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끼리의 경쟁의 방식이 있다. 딱따구리는 나무 속의 벌레를 먹고 살고 동고비는 나무 밖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먹고 산다. 나무 하나의 벌레를 나누어 먹지만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먹고 사는 것이다. 철쭉과 진달래도 마찬가지다. 봄이 막 지나고 있으니 그 사이에 숲을 찾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본 사람은 쉽게 알겠지만 4월 중순이면 진달래는 이미 만발하여 지기 시작한다. 진달래가 지기 시작하면 철쭉은 서둘러 개화를 준비한다. 대략 두 꽃은 보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만발한다. 학자들은 비슷하게 생긴 이 두 꽃들의 개화시기가 처음에는 같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다가 진달래와 철쭉은 봄철에 일찍 나온 곤충의 수는 적은데 두 꽃이 경쟁적으로 피면 꽃가루받이에 어려움이 있음을 서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달래가 조금 더 일찍 피게 되었거나 철쭉이 조금 더 늦게 핌으로 수분의 성공률을 높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경쟁은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숲은 경쟁하되 다투지 않는다. 기본 원칙이 다른 것들을 죽여 나를 살리는 방법을 쓰는 대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바꾸어 생존하고 번영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울창한 숲 속에서 발아한 어떤 신갈 나무는 잎을 오동잎 만큼이나 크게 키운다. 빛이 모자라는 곳에서 조금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함이다. 어떤 단풍나무는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자신의 허리를 휘어 햇빛이 쏟아지는 빈 공간으로 열심히 가지를 뻗는다. 저자는 숲의 경쟁은 먼저 자신을 바꾸어 주어진 환경 속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남을 누름으로써 이기는 것을 선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숲에도 칡넝쿨처럼 남을 휘감아 제 삶을 살아가는 놈도 있지만 그것이 경쟁의 근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 식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과거와 경쟁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숲의 경쟁 방식인 것이다.
특히 나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깊이 공감한다. 저자는 노씨 어르신과의 마지막 날 대화를 자세히 적고 있다. 그 날이 마지막인지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마음 선한 한 촌로는 저자의 삶을 축복해 주고 갔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저 아름다운 풍경과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듣는 삶이 참 좋을 것입니다. " 그 착한 사람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맛을 참으로 잘 알고 있었고, 서울서 살다 내려와 혼자 애쓰는 한 사내를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준 것이다. 사람끼리의 축복은 아름답다.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한 부분이다. 언제 부턴가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을 몸무림치게 그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음의 순간에서 삶을 볼 때, 어떤 삶도 살아볼 만한 것이니 정말 한 번 사랑하며 배우며 열정을 쏟아 보고 싶게 만든다. 육체의 유한함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유한함이 우리를 치열하게 살게 한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을 낭비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참기 어려운 삶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숲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책을 보지 마라. 숲의 지혜를 얻으려면 숲으로 가라. 서울을 버리고 숲으로 간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책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사는 괴산으로 어느 날 좋은 날을 골라 찾아가라. 그러면 진짜 그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 그때는 이 책을 보지 마라. 그 대신 삶에 지쳤을 때, 내 마음이 질투로 가득할 때,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르지 않을 때, 오직 하나의 삶의 방식이 나를 지배할 때, 그리하여 하루가 늘 새로운 빛처럼 쏟아져 들지 못할 때 이 책을 보라. 그때, 이 책의 한 페이지는 제 구실을 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책을 놓고,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고 가까운 숲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윽한 눈으로 숲과 숲 속에 사는 것들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눈으로, 새와 벌레와 벚나무의 눈으로 숲을 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다 마치기 전에 나도 잠시 뒷산을 다녀왔다. 산에 다녀온 후, 숲의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었기 때문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북리뷰 안보이시는 분들 일단 파일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 관리자 | 2009.03.09 | 84511 |
| 697 | 제국의 미래 - 에이미 추아 [2] | 좌경숙 | 2009.03.09 | 5913 |
| 696 | 제국의 미래(파일이 열리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 이승호 | 2009.03.09 | 4566 |
| 695 | 제국의미래(파일미개봉시구본형선생님메일로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승호 | 2009.03.09 | 4218 |
| 694 |
제국의 미래(첨부 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 이승호 | 2009.03.09 | 10315 |
| 693 | 제국의 미래 [2] | 신아인 | 2009.03.09 | 4315 |
| 692 | <제국의 미래>를 읽고 (1부:저자 & 3부 저자라면) [2] | 수희향 (박정현) | 2009.03.09 | 5210 |
| 691 |
<제국의 미래>를 읽고 (2부: 인용문) - 파일로 첨부 | 수희향 (박정현) | 2009.03.09 | 6009 |
| 690 | 제국의 미래 | 김미성 | 2009.03.09 | 4286 |
| 689 | 추천사 - 시야, 너는 참 아름답구나 | 부지깽이 | 2009.06.02 | 4354 |
| » | 숲에게 길을 묻다 | 부지깽이 | 2009.06.02 | 4507 |
| 687 | 게릴라 마케팅 | 부지깽이 | 2009.06.02 | 4705 |
| 686 | 너 만의 길을 가라 [1] | 차칸양 | 2009.06.04 | 5908 |
| 685 |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 차칸양 | 2009.06.04 | 6331 |
| 684 | 행복한 달인 [1] | 차칸양 | 2009.06.04 | 6403 |
| 683 | 그로잉 [1] | 구본형 | 2009.06.05 | 5941 |
| 682 | 서른, 내 꽃으로 피어라 | 구본형 | 2009.06.05 | 4668 |
| 681 | 하프타임 - 밥 버포드 | 나리 | 2009.06.06 | 6335 |
| 680 | 몰입의 즐거움 [2] | 나리 | 2009.06.11 | 5387 |
| 679 | 10가지 자연법칙(1) [1] | 나리 | 2009.06.14 | 5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