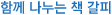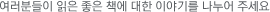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길수
- 조회 수 5575
- 댓글 수 1
- 추천 수 0
1. 저자에 대하여
저자에 대한 기록
정 민
박사학위 논문 : 조선 후기 문장이론
한양대학교 국문학과교수, 한양대 대학원 국문학 박사
'79년 국어국문학과 입학, ‘85년 국어국문학 석사, ‘90년 문학박사
학회활동 :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한국한문학회, 한국18세기학회, 한국도교문화학회. 한국시가학회
논문: 국내 50여 편. [고전문장이론에서 ‘법’의 문제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16,7세기
당시풍에 있어서 낭만성의 문제] [한국시가연구]등
저자가 이야기하는 본인의 정체성: 고전의 ‘트랜스레이터translator’. 국학자의 역할은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맥락을 짚어주고 해설을 하는 것
저서 :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꽃피자 어데선가 바람불어와] [한시미학산책][숲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숲] [마음을 비우는 지혜] [돌 위에 새긴 생각][삶을 바꾼 만남]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조선의 차문화]
36종 38권의 책을 냄
저자의 큰 스승 : 연암
저자의 학문에 관한 생각들
한문학: 선조들의 삶의 갈피를 하나하나 들춰내는 작업,
고전을 연구하는 의미 : 인간의 정신이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기본적으로 같은 것. 고전은 디지털 문화와 달리 인간의 체온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 있음. 인간의 체온을 가진 정보가 고전의 힘
첫 번째 책은 1996년 고전에 담긴 전통의 가치와 멋을 현대의 언어로 되살린 ‘한시미학산책’, 2010년 개정판 출간. 저자의 글쓰기 지론은 상동구이尙同求異, 옛 것을 그대로 따라 해서도 안되고, 옛 것과 완전히 달라서도 안 된다’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짧은 시간에 내는 방법,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에 소개된 촉류방통법(觸類蒡通法 묶어 생각하고 미루어 확장하라) 어망득홍법(魚網得鴻法 동시에 몇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라)이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잡지에 연재를 하고 그것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책일 냄.
글쓰기 자세: 자료보다는 자료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글을 쓰면서 대중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고. 다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언어로 쓴다. 그 결과 대중적인 될 수 있음. 두 번 소리 내어 읽어본다. 소리 내어 읽을 때 자연스러워야 그 리듬이 살아있고 내용도 전달이 잘 된다.
자료관리 : 삼단으로 된 둥근 자료집이 있음. 원통형으로 된 것인데 파일이 빼곡히 꽂혀있다. 일명 종자모음이다. 필요한 정보를 모아 분류해 놓다 보면 그것이 다 책이나 논문의 종자로 소용된다. 그런 파일에 담긴 정보, 자료가 ‘그 때 거기’ 와 ‘지금 여기’ 댣힌 물꼬를 트는 종자역할을 한다.
저자에 대한 인문학계의 평가 : 학계에서는 주석이 주저리주저리 달린 논문식 문체를 학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저자의 책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불만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무리 학계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해도 이를 읽어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
취미 : 붓글씨, 다산과 연암의 글을 따라 적는 연습을 한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할때는 경기도 마석의 수종사를 찾는다고 한다. 다산이 즐겨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스승에 대한 생각….
배움의 시작은 무지의 자각. 자신의 모자람을 모르면 배움을 청할 겸손을 지니기 어렵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시작은 스승의 크기를 인식하는 순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지에서 몇 걸음 나아가야 한다. 나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스승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다. 스승의 크기를 볼 눈이 없다면 마중물 정도의 배움에서 자기의 잘난 맛에 스승을 이리저리 재단하게 된다. 그쯤에서 그친다면 스승에게서 무지의 갈증을 해소할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 스승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스승의 흉허물을 바라보게 된 후부터. 그때 등을 돌리는 자와 스승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인간인 스승을 품고 사랑하는 자로 패가 나뉜다.
저자의 연구방법에서 조지프 캠벨이 했던 독서방법과 비슷한 면이 있다. 연암을 10년 넘게 공부하다 박제가 이덕무를 보게 되었고 18세기 지식정보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메커니즘의 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왜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사고가 어떻게 용인 되었을까? 기존의 가치와 어떻게 대립하고 융화했을까?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 그 끝에 다산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가 교육자로 가지고 있는 원칙…
연암의 말을 인용한다.
시비와 이해의 두 저울이 있고, 행동에는 네 개의 결과가 나온다.
첫째: 옳은 일을 해서 좋게 되는 경우
둘째 : 옳은 일을 해서 해롭게 되는 경우
셋째 :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
넷째 : 나쁜 짓을 해서 해롭게 되는 경우
첫째와 넷째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선택인데 오늘날의 교육은 세 번째를 요구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여야 하고, 옳은 일을 하다 손해 보는 것은 바보라고 말한다. 교육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중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다.
첫 번째 선택은 드물다. 두 번째는 싫다. 세 번째를 하려다가 네 번째가 되어 버리는 게 인생이다. 두 번째 판단에서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두느냐에서 삶이 엇갈린다/ 내가 손해 보면서도 옳은 신념으로 버티는 힘을 공부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본인의 교육법 : 다산보다 연암처럼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기존의 관념적인 사고, 타성적 사유를 깨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라고 요구한다. 학생들이 워낙 개성적인 개체다 보니 그 개성을 틔워주고 사고를 흐트러뜨리려고 노력한다. 늘 질문의 경로를 바꾸라고 얘기한다.
저자의 전공은 문장이다. 박사학위 논문이 조선 후기 문장론이다.
풍부하게 쓰되 한 글자도 남기지 마라
간략하게 쓰되 한 글자도 빠뜨려선 안 된다
어떻게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쓸데 없는 말, 빠뜨리는 말이 없을까 고민하고 연구했다.
조선 시대는 논술 시험으로 과거를 뽑았던 시대다. 글쓰기가 관인으로 출세하는데 가장 기본 요건이었다.
저자 글쓰기의 핵심은 형용사, 부사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 것이다. 접속사와 긴 문장을 어떻게 더 쥐어짤까 고민한다. 글 쓰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면, 독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몰입하되, 절제와 거리 두는 일이 글쓰기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고전을 공부하기 전화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깊이가 생겼다. 표피적으로 일히 일비 하기보다는 깊은 지점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근원적인 사유가 늘 바탕에 깔리게 된 셈이다. 연암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고, 다산의 합리적인 자료배열, 논리적 사고를 내 글쓰기에 더해보려고 한다.
登高自卑등고자비, 높은데 올라가려면 낮은 데부터 밟아서 올라가야 한다.는 말
중용의 진리. 공부는 돌탑 쌓는 일이다. 돌과 돌 사이에 여백 없이 촘촘하게 쌓아 올라가면, 마이산의 탑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출처 :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
http://jungmin.hanyang.ac.kr/ 저자 홈페이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22048005&code=900308
http://www.yes24.com/chyes/ChYesView.aspx?title=003001&cont=7137
http://blog.naver.com/gomunb\hak/70120962599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ld=nabasic&logNo=8000312655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1082517441&n
개인적 평가
‘정민. 1960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다’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에 적혀있는 저자프로필이다. 고등학교 때 처음 한시의 매력에 빠져 교과서와 참고서에 나오는 한시를 다 외웠다고 한다. 공식기록에는
“지금 네 앞에 영어로 된 책이 있다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니? 영어로 된 동화책을 우리말로 옮겨서 읽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해할 수가 있지? 이와 마찬가지로 한자로 쓰인 한시도 아빠가 한글로 옮겨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 네가 읽고 이해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야.”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서문 중에서- 저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정체성 ‘고전의 트렌스레이터’를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는 말이다.
초등학생 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자상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로 보인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글자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다. 작가의 작품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일. 작품이 가지고 있는 떨림을 온전하게 살려내는 일, 어쩌면 처음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작품을 온전히 살려 내는 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들 곁에 한시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저자가 위대해 보인다. 또 있다. 다작…지금까지 많을 책을 써왔다. 어떻게 책을 쓰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접한 책은 불과 3권이다. 그 동안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많은 책들을 접해볼 생각이다. 다산이나 연암을 스승으로 모실 수는 없으나 저자가 통역해내는 고전은 다가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오랜만에 가슴 설레는 책을 만나 친구와 나누었다. 저자는 스승께 배우고,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사랑한 제자였고. 또한 존경 받고 사랑 받을 만한 스승이다.
2.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첫 번째 이야기
허공 속으로 난 길 – 한시의 언어 미학
연암
동네 꼬마가 <천자문>을 배우다가 게으름을 부리자, 선생이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늘을 보면 푸르기만 한데, ‘하늘 천天’자는 푸르지가 않으니, 그래서 읽기 싫어요!”
<천자문>을 펼치면 처음 나오는 말이 ‘천지현황天地玄黃’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했다. 꼬마의 생각에는 암만해도 하늘이 검지 않고 푸른데, 책 첫머리부터 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고 만 것이다.
저 까마귀를 보라. 깃털이 그보다 더 검은 것은 없다. 하지만 홀연 유금乳金빛으로 무리지고, 다시 석록石綠빛으로 반짝인다. 해가 비치면 자줏빛이 떠오르고, 눈이 어른어른하더니 비췻빛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이를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챦고,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까마귀는 본디 정해진 색깔이 없는데,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버린다. 어찌 눈으로 정하는 것뿐이겠는가. 보지 않고도 그 마음으로 미리 정해버린다.
연암이 [능양시집서 菱洋詩集序]에서
<천자문>이 푸른 하늘을 검다고 가르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았던가? 까마귀의 색깔 속에 감춰진 많은 빛깔을 관찰한 적이 있었던가? 연암은 이렇듯 시인에게 죽은 지식이나 고정된 선입견을 훌훌 털어버리고, 건강한 눈과 열린 가슴으로 세계와 만날 것을 요구한다. 17P
[답경지 答京之]에서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뜨락에 이따금 새가 지저귄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쳤다. ‘이것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이고 서로 울고 화답하는 글相鳴相和之書이로다.’
오색 채색을 문장이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나은 문장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 18P
이른 아침 나무 그늘에서 노니는 새들의 날개짓과 지저귐 속에서 연암을 글자로 쓰이지 않고 글로 표현되지 않는 문장을 읽는다. 새들의 날개짓이 주는 터질 듯한 생명력, 조잘대는 울음소리가 들려주는 약동하는 봄날의 흥취興趣를 어떤 언어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옛 사람들은 이를 ‘생취生趣’ 또는 ‘生意생의’라 하였다. 말 그대로 살아 靈動영동하는 운치인 것이다.
생취나 생의가 없는 시는 결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사물의 심장부에 곧장 들어가 핵심을 찌르려면 죽은 정신, 몽롱한 시선으로는 안 된다. 시인은 천지현황의 나태한 관습을 거부하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 선입견에 붙박여 간과하고 마는 까마귀의 날개 빛깔을 살피는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생동하는 물상 속에서 순간순간 포착되는 秘儀비의를 날카롭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시는 언어의 사원이다. 시인은 그 사원의 제사장이다. 시는 촌철살인의 미학이다. 18P
시인은 天機천기를 누설하는 자이다. 시를 쓰는 능력은 누구나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하지 않고 절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송나라의 유명한 평론가 嚴羽엄우는 그의 [滄浪詩話창랑시화]에서
무릇 시에는 별도의 재주가 있다. 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에는 별도의 旨趣지취가 있다. 이치와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이치를 많이 궁구하지 않으면 지극한 경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른바 이치의 길에 빠지지 않고, 언어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윗길이 된다. 시라는 것은 성정을 읊조리는 것이다. 盛唐성당의 여러 시인들은 오직 흥취에 주안을 두어, 영양이 뿔을 거는 것과 같아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마치 공중의 소리와 형상 속의 빛깔, 물속의 달, 거울 속의 형상과 같아서, 말은 다함이 있어도 뜻은 다함이 없다. 19P
언어를 매만지며 단어들의 질량을 느끼는 일은 시인의 큰 기쁨이다. 20P
영양이 뿔을 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본래 禪家선가의 비유로, [傳燈錄전등록]에 雪峯尊者의 말로 전해진다. 영양은 뿔이 둥글게 굽은 양이다. 잠을 잘 때 외적의 해를 피하기 위해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허공에 매달려 잔다고 한다. 그래서 영양의 발자취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어느 순간 발자취는 끊어져버리고 영양은 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시인이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영양의 발자취뿐이다. 발자취가 끝난 곳에서도 영양은 그 실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정작 시인이 전달하려는 의미는 문면에 있지 않고 글자와 글자의 사이, 행과 행의 사이, 혹은 아예 그것을 벗어난 공중에 매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독자 또한 영양의 발자취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시인이 쳐놓은 언어의 통발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된다. 20P
흥취를 지닌 시는 어떤 시인가. 空中之音공중지음, 相中之色상중지색, 水中之月수중지월, 鏡中之象경중지상이 그것이다.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나 형상 속에 깃들어 있는 미묘한 색채, 물속에 찍힌 달, 거울 속의 형상은 모두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물속의 달은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흔들려 사라지고 만다. 22P
시는 독자로 하여금 읽는 행위가 끝나는 순간부터 정말로 읽는 행위를 시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의 언어는 젓가락으로 냄비 뚜껑을 두드리듯 해서는 안 된다. 범종의 소리와 같은 유장한 여운이 있어야 한다. 22P
시는 시인이 짓는 것이 아니다. 천지만물이 시인으로 하여금 짓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물이 직접 말을 건넨다. 이옥은 <이언인>이란 글에서
“시는 만물이 사람에게 기탁하여 짓게 하는 것이다. 물 흐르듯 귀와 눈으로 들어와서 단전 위를 맴돌다가 끊임없이 입과 손을 따라 나오니, 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물은 제 스스로 聲色情境성색정경을 갖추고 있다.23P
이웃집 꼬맹이가 대추 서리 왔는데
늙은이 문 나서며 꼬맹이를 쫓는구나
꼬맹이는 되돌아서 노인에게 소리친다
“내년 대추 익을 때까진 살지도 못할걸요”
이달 <대추 따는 노래>
파란 하늘 아래 빨갛게 대추가 익어가는 촌가의 가을 풍경을 소묘했다. 이웃집 대추를 욕심 내 서리를 하러 온 아이와 “네 이놈! 게 섰거라.”하며 작대기를 들고 나서는 늙은이가 있다. 그 서슬에 놀라 달아나던 꼬맹이가 약이 올랐다. 달아나다 말고 홱 돌아서더니 소리를 지른다. 그래야 내년엔 마음 놓고 대추를 따먹을 수 있을 테니까. 늙은이가 아무리 잰 걸음으로 쫓아온대도 얼마든지 붙잡히지 않고 달아날 자신이 있었던 게다.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 문면에 드러난 것은 대추 서리를 하다가 들킨 꼬맹이의 버르장머리 없는 말버릇이다. 그렇다고 이 시의 주제를 꼬맹이의 행동에 맞춰 ‘윤리의 타락을 슬퍼함’으로 읽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파란 가을 하늘과 빨갛게 익은 대추의 색채 대비, 커가는 어린 세대와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늙은 세대의 낙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정감 넘치는 시골의 정겨운 풍경이 마치 단원 김홍도의 붓끝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듯하다. 26P
시인은 글자로 말하고 있는 지시적 사실은 시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 행간에 감춰진 울림, 언어의 발자취를 벗어나 허공에 매달려 있는 떨림이 중요하다. 28P
한시는 이미지의 구성이 탄탄하고, 언외의 함축이 유장하다. 그로 인해 한시의 감상은 매우 지적이고 감성적인 바탕이 요구된다. 그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도 없고, 누구나 알 수도 없다.
홍양호는 <疾雷진뢰>에서. 렛소리에 산이 무너져도 귀머거리는 못 듣는다. 해가 중천에 솟아도 소경은 못 본다. 도덕과 문장의 아름다움을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속인은 왕도와 패도, 義와 利를 변별하지 못한다. 아아! 세상 사람들이여, 눈과 귀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총명은 눈과 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조각 靈覺영각에 있다.29P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바라볼 수 있는 눈 앞에서만 예술은 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눈과 귀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신의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일러 靈覺이라고 한다. [채근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고작 有字書유자서나 읽을 줄 알았지 無字書무자서를 읽을 줄은 모르며, 有絃琴유현금이나 뜯을 줄 알았지 無絃琴무현금은 뜯을 줄 모른다. 그 정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껍데기만 쫓아다니는데 어찌 琴書금서의 참 맛을 알 도리가 있겠는가?” 29P
이규보가 시로써 시를 논한 <論詩>
시 지음에 특히나 어려운 것은
말과 뜻이 아울러 아음다운 것
머금어 쌓인 뜻이 깊어야지만
씹을수록 그 맛이 순수하다네.
뜻만 서고 그 말이 껄끄러우면
뻑뻑해 뜻조차 펼 수 없으리
그 중에도 나중으로 해야 할 것은
아로새겨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
아름다움 어이 굳이 마다하랴만
또한 자못 곰곰이 생각해볼 일
꽃만 따고 그 열매를 버리게 되면
시 속에 담긴 뜻은 잃게 되느니
오늘날 시 쓴다는 저들 무리는
시의 바른 의미는 생각지 않고
겉으로만 꾸며서 치장 일삼아
한때 기호 맞추기만 구하고 있다
뜻은 본시 하늘에서 얻는 것이라
갑작스레 이루기는 쉽지가 않네
얻기가 어려운 줄 가만 헤아려
인하여 화려함만 일삼는구나
이로써 여러 사람 현혹하여서
담긴 뜻의 궁핍함을 가리려 한다
이런 버릇 어느새 습성이 되어
문학의 정신은 실추되었다.
이백 두보 다시는 나지 않으니
뉘와 함께 진짜 가짜 가리어볼까
무너진 터 내 다시 쌓으려 해도
한 삼태기 흙조차 돕는 이 없네
시경 시 삼백 편을 외운다 한들
어디에다 풍자함을 보탤 것인가
홀로 감도 괜챦다 말은 하지만
외론 노래 사람들은 비웃으리라.
다산 정약용도 <초의승 의순을 위해 준 말爲草衣僧意洵贈言>에서
“뜻이 본시 낮고 더럽고 보면 비록 억지로 맑고 높은 말을 하더라도 알맹이가 없게 된다. 뜻이 좁고 비루하면 비록 툭 터진 말을 한다고 해도 사정이 꼭 들어맞지 않는다. 시를 배우면서 그 뜻을 온축하지 않는 것은 거름흙에서 맑은 샘물을 긷고, 고약한 가죽나무에서 기이한 향기를 구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31P
이명은 자기만 알고 남은 결코 알 수가 없다. 코골기는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만 모른다. 사람들이 안목이 없어 나의 이 훌륭한 작품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시인이 있다면 그는 이명증에 걸린 꼬마다. 남의 적절한 지적에도 공연히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는 사람은 코를 고는 버릇이 있는 시골 사람이다. 정작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명에는 쉽게 도취되면서, 자기의 코 고는 습관만은 좀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암의 말을 더 흉내 내면 이렇다. 이명은 병인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화이니, 만약 그가 병 아닌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면 그 으스대는 양을 어찌 볼 것인가. 코골기는 병이 아닌데도 남이 먼저 안 것에 발끈하니, 정말 그의 병통을 지적해준다면 그 성내는 꼴을 또 차마 어찌 보겠는가. 32P
예전 요동 땅에 정령위란 사람이 신선술을 익혀 신선이 되었다. 그 뒤800년 만에 학이 되어 돌아왔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또 한나라 때 양웅이 [太玄經태현경]을 지을적에 뒷날 자신이 저술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장독대의 덮개로나 쓰일 것을 생각하며 탄식하였다. 막상 그가 죽고 나자 [태현경]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저술이 되어 낙양의 종이 값을 올렸다. 런데 당사자인 양웅은 이를 보지 못하고 불우하게 세상을 떴다. 세상의 시인들이여! 그대들의 시는 정령위의 불로장생을 원하는 가? 양웅의 기림을 받고 싶은가? 양웅의 盛譽성예를 정령위처럼 살아서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나친 욕심일 것이다. 33P
두 번째 이야기
그림과 시-寫意傳神論사의전신론
시와 그림은 전통적으로 서로 연관이 깊다. 시는 ‘소리 있는 그림 有聲之畵유성지화’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 無聲之詩무성지시’란 말도 있다. 특히 한시는 경물의 묘사를 통한 情意정의의 포착을 중시한다. 이는 마치 화가가 화폭 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과 같다. 경물은 객관적 물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얹을 수 있는가. 화가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경물이 직접 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寫意傳神사의전신’이라 한다. 말 그대로 경물을 통해 ‘뜻을 묘사하고 정신을 전달’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立像盡意입상진의’이니, 상세한 설명 대신 형상을 세워 뜻을 전달한다.
송나라 徽宗휘중 황제는 그림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이었다. 그는 곧잘 유명한 시 가운데 한두 구절을 골라 이를 畵題화제로 내놓곤 했다. 한 번은 “어지러운 산이 옛 절을 감추었네. 亂山藏古寺”란 제목이 출제되었다. 깊은 산 속의 옛 절을 그리되, 드러나게 그리면 안 된다는 주문이었다. 화가들은 무수한 봉우리와 계곡, 그리고 그 구석에 보일 듯 말 듯 자리 잡은 퇴락한 절의 모습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그림은 화면 어디를 둘러보아도 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숲 속 작은 길에 중이 물동이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그렸다. 중이 물을 길러 나왔으니 가까운 곳 어딘가에 분명히 절이 있겠는데, 어지러운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절을 그리라고 했는데, 화가는 물 길러 나온 중을 그렸다. 화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藏장’의 의미를 화가는 이렇게 포착했던 것이다. 38P
유성兪成의 [螢雪叢說형설총설]에
한 번은 그림대회에서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내 나네.踏花歸去馬蹄香”라는 화제가 주어졌다. 말발굽에서 나는 꽃 향기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희한한 요구였다. 모두 손대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다. 달리는 말의 꽁무니로 나비 떼가 뒤쫓는 그림이었다. 말발굽에서 향기가 나므로 나비는 꽃인 줄 오인하여 말의 꽁무니를 따라간 것이다.
“여린 초록 가지 끝에 붉은 빛 한 점, 설레는 봄빛은 굳이 많을 것이 없네. “라는 시가 출제된 적도 있었다. 화가들은 너나없이 초록빛 가지 끝에 붉은 꽃잎 하나를 그렸다. 모두 등수에는 들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푸른 산허리를 학 한 마리가 가르고 지나가는데, 그 학의 이마 위에 붉은 점 하나를 찍어 ‘紅一點홍일점’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정작1등으로 뽑힌 그림은 화면 어디에서도 붉은 색을 쓰지 않았다. 다만 버드나무 그림자 은은한 곳에 자리 잡은 정자 위에 한 소녀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그렸을 뿐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흔히 여성을 ‘홍紅’으로 표현한다. 화가는 그 소녀로써 ‘홍일점’을 표현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홍일점이란 말의 연원이다. 陳善진선의 [捫蝨新語문슬신어]에 나온다.39P
대낮 섬돌 위에 남녀 신발이 한 켤레씩 놓였고, 방문은 굳게 닫혔다. 사방은 고요하고 인적도 끊겼다. 노골적인 남녀의 性愛를 그린 것은 春畵圖라 하고, 에로틱한 분위기만 나타낸 것은 춘의도라 한다. 40P
동양화의 화법 가운데 ‘烘雲托月法홍운탁월법’이란 것이 있다. 수묵으로 달을 그릴 때 달은 희므로 색칠할 수 없다. 달을 그리기 위해 화가는 달만 남겨둔 채 그 나머지 부분을 채색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저것을 그리는 방법이다. 시에서 시인이 말하는 법도 이와 같다. ‘聲東擊西성동격서’란 말처럼 소리는 이쪽에서 지르면서 정작은 저편을 치는 수법이다. 나타내려는 본질을 감춰두거나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41p
화가가 그리지 않고 그리는 방법과 시인이 말하지 않고 말하는 수법 사이에는 공통의 정신이 있다. 구름 속을 지나가는 神龍신룡은 머리와 꼬리만 보일 뿐 몸통은 다 보여주지 않는다. “한 글자도 덧 붙이지 않았으나 풍류를 다 얻었다.” 는 말이 있다. 또 “단지 경물을 묘사했는데도 情意정의가 저절로 드러난다”고도 말한다. 요컨데 한 편의 훌륭한 시는 시인의 진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통한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로써 독자와 소통한다.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건네는 대신, 대상 속에 응축시켜 전달한다. 그래서 “산은 끊어져도 봉우리는 이어진다. 山斷雲連”는 말이 나왔다. 지금 눈앞에 구름 위로 삐죽 솟은 봉우리의 끝만 보인다 해서 그 아래에 봉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시 속에서는 “말은 끊어져도 뜻은 이어진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름 위에 솟은 봉우리의 끝뿐이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시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구름 아래 감춰져 있다. 43P
1920년대 이미지즘 시인 아치볼드 매글리시Archibald MacLeish는 <시의 작법Ars Poetica>이란시에서 “시는 의미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존재할 뿐이다. A Poem should not mean/But be”라고 했다. 그는 또 “시는 그 자체를 진술해서는 안 되고 등가적이어야 한다. A Poem should be equal to/Not true”고 했다. 시는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意境을 전달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43P
한시에서 이러한 원칙은 이미 천 년이 넘는 문학 전통 속에서 불변의 준칙으로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다시 말해 시인은 할 말이 있어도 직접 말하지 않고 사물을 통해 말한다는 것이다. 아니. 사물이 제 스스로 말하게 한다. 시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시는 언어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생물체여야 한다. 시인은 외롭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독자를 외로움에 젖어 들게 해야 한다. 괴롭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도 독자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시인이 직접 나서서 시시콜콜한 자신의 감정을 죽 늘어 놓는다면 넋두리나 푸념일 뿐, 시일 수는 없다. 44P
다 말하지 않고 말하기. 다 그리지 않고 그리기, 시와 그림은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50P
마음은 미인 따라가고 있는데
이 몸은 부질없이 문 기대섰소
넋은 이미 그대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는 빈 몸뚱이만 남아 문에 기대섰노라는 애교 섞인 푸념이었다. 그녀가 답장을 보내왔다.
노새는 짐 무겁다 투덜대는데
그대 마음 그 위에 또 얹었으니
그녀의 대답은 아무래도 뚱딴지 같다. 당신이 내 마음을 온통 가져가버렸으니 책임지라는 말에 그녀는 온통 나귀 걱정만 한다. 늙은 나귀는 등에 태운 미인도 무겁다고 연신 가쁜 숨을 씩씩 몰아쉰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의 넋을 더 얹었으니 나귀만 죽어나게 생겼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녀의 대답은 기실, ‘나를 향한 그대의 마음을 접수했노라’는 의미다. 그대의 눈길에 내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고, 그 내려앉은 무게만큼 노새만 더 무거워 괴롭겠다는 멋들어진 응수이다. 일상적인 예상을 빗겨가는 이러한 비약에는 참으로 사람을 미혹케 하는 예술적 매력이 넘쳐흐른다. 글자는 스무 자에 지나지 않는데,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감정과 씩씩대는 나귀의 숨소리, 그와 함께 커져가는 두 사람의 맥박 소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 54P
대겨 형상을 그릴 때는 반드시 정신을 전해야 하고, 정신을 전하려면 마음을 그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군자와 소인이 모습은 같지만 마음은 다른데, 귀하고 천하며 충성스럽고 사악한 것을 어찌 스스로 구별하겠는가? 겉모습이 비록 닮았다 한들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을 그리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59P
매화 창가에 봄빛 이른데
판잣집엔 빗소리만 요란하구나
매화가 막 피는 계절이니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다, 판다 지붕 위에는 벌써 빗소리가 자못 요란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섬나라의 기후와 풍정을 잘 묘사하였다. 정작 이 시의 묘처는 ‘板屋판옥’이란 표현에서 찾아진다. 판옥, 즉 판잣집은 우리에게는 낯선 풍물로, 읽는 이에게 이국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또 판자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의 경쾌한 울림은 창 밖으로 매화를 바라보는 시인의 설렘까지 담아 독자의 정서 속으로 파고든다. 떠나올 때는 가을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해를 넘겨 이역만리 타국 땅 여관에서 봄비 소리를 듣는다. 시인의 마음속에는 절로 떠오르는 아련한 고향 생각이 묻어 있다. 이것이 이 시가 일본을 노래한 절창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래 오르내리게 된 연유이다. 64P
목은 이색은 <浮碧樓부벽루>에서
성은 텅 비었고 달만 한 조각
바위는 늙어도 구름은 천 년 64P
시는 본바탕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덕지덕지 화장한 여인의 분내를 경멸한다. 66P
사진과 똑같이 그려진 영화관의 간판은 결코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가끔 그 기교에 감탄할 뿐이다. 예술과 기술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66P
세 번째 이야기
언어의 감옥-입상진의론 立象盡意論
삼천 리 밖에서 한 조각 구름 사이 밝은 달과 마음으로 친히 지내고 있소.
三千里外, 心親一片雲間明月
고작 이만 한 사연 전하자고 천릿길에 편지를 띄웠더란 말인가. 그러나 음미할수록 새록새록 정감이 넘쳐나는 뭉클한 사연이다. 한 조각 구름 속에 밝은 달이라 했으니, 달은 달이로되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달이다. ‘心親심친’이라 하여 그 밖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月印千江월인천강’이랬거니, 달은 나 있는 안변이나 너 있는 한양이나 가뭇없이 비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널 보듯이 달을 보고, 달 보듯이 너를 생각한다는 사연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은 보일 듯 구름 사이로 숨기 일쑤이니 이 아니 안타까운가. 단지 열 두 자의 편지가 심금을 울린다. 69p
“매화꽃 졌다 하신 편지를 받자옵고, 개나리 한창이라 대답을 보내었소.
둘이 다 봄이란 말은 차마 쓰지 못하고”라고 한 것이 있다. 70p
옛 글에는 야단스러움이 없다. 간결하게 할 만한 하고, 때로 아무 말 않기도 한다. 그래도 마음은 글자 사이로 흘러, 행간에 고여 넘친다. 예전 중국의 곽휘원이란 이가 먼 데로 벼슬 나가 있다가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착각하여 백지를 넣고 봉하였다. 그 아내가 오랜만에 온 남편의 편지를 꺼내보니 달랑 백지 한 장 뿐이었다. 답 시를 보냈다.
푸른 깁창 아래서 봉함을 뜯어보니
편지지엔 아무것도 써 있질 않더이다
아하! 우리 임이 이별의 한 품으시고
말 없는 가운데 그리는 맘 담으셨네
-청나라 원매의 [隨園詩話]- 72p
본래 동양의 예술 정신은 다변과 요설을 싫어한다. 긴장을 머금은 함축을 소중히 여긴다. 72p
실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는 부질없는 군더더기일 뿐이다. 73P
언어란 본시 부질없는 것이기에 큰 진리는 언제나 언어를 초월하여 전해지고, 깨달음은 언어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捨筏登岸사벌등안’의 법을 말한다. 언덕을 오르려면 뗏목을 버려라. 장자는 ‘得魚忘筌득어망전’을 말한다. 고기를 얻었으면 통발을 잊어라. 또 ‘得意忘言’즉 뜻을 얻었거든 말을 잊으라고 주문한다.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는 누가 쫓아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야 한다. 유용한 진리는 언젠가는 버려야 할 연장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말이다. 그래서 도연명은 시 <飮酒>에서 “이 가운데 참다운 뜻이 있으나, 말하려 하니 이미 말을 잊었네. 比中有眞意, 欲辨己忘言.”라 했다. 78P
“성인 상象을 세워서 그 뜻을 다하고, 괘卦를 세워서 참과 거짓을 다하며, 문사를 이어서 그 말을 다한다.” 여기에서 ‘立象盡意입상진의’ 말이 나왔다. 말로 뜻을 다할 수 없다면 형상으로 써 뜻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78P
[주역]에서 입상진의하고 있는 몇 예를 보자. 中孚卦중부괘 九二의 爻辭효사에는 “우는 학은 그늘에 있고, 그 새끼가 화답한다. 내게 좋은 술잔 있어, 그대와 함께 나누리라”라 하였다. 무슨 말인가? 괘는 이를 ‘군자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어미 학이 산기슭에서 울면 그 새끼는 어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화답하여 운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뜻 없이 던지는 한마디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좋은 술잔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언행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군자는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79P
말하는 이의 ‘立象입상’이 듣는 이에게 ‘盡意진의’되기까지는 이렇듯 몇 차례의 유추와 비약이 감행된다. 박지원은<이중존에게 보낸 답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속담에 꿈에 중을 보면 부스럼이 생긴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중은 절에 살고, 절은 산에 있고, 산에는 옻나무가 있으며, 옻나무는 사람에게 부스럼이 나게 하니, 꿈속에서 서로 인하게 되는 것이다.” 중과 부스럼, 이 두 ‘象상’ 사이에는 ‘중-절-산-옻-부스럼’이라는 여러 단계의 유추가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이 여러 단계를 복원시켜야만 의미가 비로소 파악된다. 78P
[土亭秘訣토정비결]이 일러주는 점괘는 모두 ‘입상’만으로 되어 있다. 그 안에 담긴 뜻은 그래서 사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풀이된다. [토정비결]이 언제든지 신통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입상’들은 흔히 뒷사람들의 견강부회를 낳게 마련이다. 땅이름에서 이러한 오해를 자주 본다. 문경에 가면 새재가 있다. 한자로는 鳥嶺조령이다. 새재가 먼저고 조령은 한자로 옮긴 말이다. 조령이 입에 굳어지자 새도 날아 넘어가지 못하는 못하는 고개라는 식의 견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재란 ‘사이재’, 즉 ‘샛고개’라는 뜻이다.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에는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므로 생긴 이름이다. 80P
-가끔 연초면 토정비결을 본다. 몇 해 전부터 발길을 끊었지만, 잘 아는 분이라 한번 여쭤보았다.
생년월시 이름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입상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 아무이야기 하지 않고 알아맞춰보라고 하는 것보다 답답하여 찾아온 사람이 무슨 일이 궁금한지 대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 이야기는 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그때 대강 알아들었던 말이 위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의 염려 때문에 입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직설적 언어의 나열보다 전달 면에서 더욱 훌륭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허균의 [閑情錄한정록]에서
상용은 어느 때 사람인지 모른다. 그가 병으로 눕자 노자가 물었다.
“선생님! 제자에게 남기실 가르침이 없으신가요?”
“고향을 지나거든 수레를 내리거라. 알겠느냐?”
“고향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높은 나무 아래를 지나거든 종종걸음으로 가거라. 알겠느냐?”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상용이 입을 벌리며 말했다.
“내 혀가 있느냐?”
“있습니다.”
“내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강한 것은 없어지고 약한 것은 남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천하의 일을 다 말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상용은 돌아누웠다. 81P
이것이 입상진의이다. 상용이 노자에게 준 가르침은 자신의 본 바탕을 잊지 말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기라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싱겁기 짝이 없는 주문 이다. 하지만 이것을 비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니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생동하는 깨달음이 되었다. 본래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알아듣고, 모를 사람에게는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준댔자 더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다. 81P
비가 오면 천지가 구분되지 않고 동서를 알 수가 없다. 바람만 불고 비는 오지 않으면 단지 나무의 가지만 보인다. 비는 오지만 바람이 없으면, 나무 끝이 축 처지고, 행인은 우산이나 삿갓을 쓰고, 어부는 도롱이를 걸친다. 82P
차운 밤 고양이는 가까이 붙고
갠 하는 제비는 높이 나누나.
남은 해 문을 깊이 닫아걸고서
맑은 새벽 나 홀로 뜰을 걸으리
[謏聞琐錄소문쇄록]에서 閑寂詩한적시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 목은 이색의 작품이다. 서늘해진 가을밤, 추위를 못 이긴 고양이는 자꾸 사람 곁을 찾아 들고, 하늘 높이 제비는 강남 가는 길을 서두른다. 시인은 고양이와 제비를 끌어와 가을이 깊어감을 말했다. 유난히 추위를 타는 고양이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외롭고 춥기야 고양이나 나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나뭇잎이 지듯 모든 것들은 훌훌 떠나버리고, 남은 생애도 하잘 것 없어 사립문을 닫아 걸었다. 닫아건 사립 안에서 맑은 새벽 홀로 뜰을 거니는 시인의 심사는 안으로 잔잔한 서글픔과 허탈함을 담았으면서도, 새벽 공기처럼 맑고 깨끗하다. 그러나 세상과 어그러져 닫은 사립문은 밖에서 열기 전에는 스스로도 열 수가 없다. 사립문 속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치열한 자기 갱신이 있다. 85P
봄바람 문득 이미 청명이 가까우니
보슬비 보슬보슬 늦도록 개이쟎네
집 모퉁이 살구꽃도 활짝 피어나려는 듯
이슬 먹은 몇 가지가 날 향해 기울었네
권근의 <봄날 성남에서 春日城男卽事>란 작품이다. 청명이 가까워진 어느 봄날 성남의 소묘다. 굳이 杜牧두목의 저 유명한 “청명 시절 부슬부슬 비가 내리니淸明時節雨紛紛”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시절에는 꽃 소식을 재촉하는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신다. 이른바 杏花행화의 시절이 온 것이다. 가을날의 근심이 덧없이 스러진 청춘의 꿈을 애상하는 허탈한 독백이라면, 봄날의 근심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꼼지락대는 설렘을 동반한다. 늦도록 개지 않고 내리는 보슬비를 맞으며 그는 뜰로 내려선다. 집 모퉁이 살구꽃은 망울이 부풀어. 이제 막 꽃송이를 일제히 터뜨릴 기세다. 그 위에 봄비의 빗방울이 얹히니, 꽃가지는 그만 제 무게를 못 이겨 기우뚱하다. 4구의 ‘向人傾향인경’, 즉 ‘날 향해 기울었네’라는 말은 기실 ‘날 향해 인사하네’의 뜻이다. 88P
해묵은 절 문 앞에서 또 한 봄을 보내니
남은 꽃 비를 따라 내 옷 위에 점을 찍네
돌아올 제 맑은 향내 소매에 가득하여
무수한 산벌들이 먼 데까지 따라오네
임억령의 <자방에게 示子芳>셋째 수이다. 봄이 떠나는 옛 절 문 앞에서 시인은 봄비에 젖어 숲을 걷는다. 가는 봄과 지는 꽃잎. 거기에 어우러진 이끼 낀 옛 절의 모습. 비는 내리고 걷는 옷깃 위로 자꾸 묻어나는 꽃잎. 이러한 몇 개의 겹쳐진 장면 속에 봄을 보내는 울적한 심사는 어디에도 없다. 꽃잎이 묻은 소매라서 맑은 향기가 가득하고, 벌은 꽃으로 오인하여 잉잉대며 쫓아온다. 가는 봄에 져버린 꽃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꽃이 되고 봄이 되어 벌을 몰고 돌아오는 것이다.
네 구 가운데 어디에도 시인의 정은 드러남이 없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서술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미 많은 이야기가 독자에게 건네지고 있다. 경물 속에 몰입하면서 독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숲 속을 거니는 듯한 흥취를 만끽한다. 벗과 헤어져 있음을, 봄이 떠나감을, 떠나감이나 헤어짐으로 인식치 아니하고, 꽃잎이 묻은 소매로 내가 꽃이 되고 봄이 되는 인식의 갱신에서 시인은 몰아의 희열 속으로 빠져든다. 89P
섬돌 쓰는 대 그림자, 먼지는 그대로요
못을 뚫는 달빛에도 물에는 흔적 없네
대나무 그림자는 바람에 일렁이며 섬돌 위를 빗질한다. 그래도 섬돌 위의 먼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달빛은 연못 밑바닥을 뚫고 비친다. 물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푸른 바다 배 간 자취 찾기가 어렵고
청산에는 학 난 흔적 보이지 않는구나.
시란 이와 같은 ‘眞空妙有진공묘유’의 세계와 닿아 있다. 무언가 꼬집어 말하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느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노래한다. 효용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저편에서 울려오는 떨림. 그 떨림의 미묘함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인간에게는 단지 입상을 통해서만 진의할 수 있는 妙悟묘오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90P
명나라의 사진은 그의 [四溟詩話사명시화]에서
시를 지을 때 실제와 똑 같은 것은 마땅치 않다. 아침에 나가 멀리 바라보면 청산의 아름다운 빛이 은은하여 사랑스럽고, 안개와 노을은 변화무쌍하여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막상 올라가보면 별반 기이한 경치가 아니고, 오직 바위 덩어리와 몇 그루 나무뿐이다. 멀고 가까움도 본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묘는 어렴풋함에 있으니 그 속에서 비로소 솜씨가 드러난다. 91P
시에서 입상진의를 귀히 여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막상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놓고 보면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몇 줄의 교훈이거나,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미묘하고 추상적인 느낌의 단편뿐이다. 마치 멀리서 본 산이 아름답지만, 막상 올라서서 보면 바윗돌 몇 개, 나무 몇 그루뿐인 것과 같다. 그렇다고 멀리서 바라보는 산의 아름다움을 거짓이라고 거부할 일은 아니다. <어부사시사>에서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에 더욱 좋다.”고 노래한 孤山고산 尹善道윤선도는 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다. 소월이 말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도 그 뜻이다. 양파의 껍질은 아무리 벗겨도 알멩이가 나오지 않는다. 시를 낱낱이 해부하여 파헤치고 나면, 남는 것은 언어의 시체뿐이다. 멀리서 바라보이던 은은하고 아름다운 산의 모습은 간곳없게 된다. 91P
네 번째 이야기
보여주는 시, 말하는 시-당시와 송시
심의沈義(1475~?)가 지은 <기몽記夢>은 <大觀齋夢遊錄대관재몽유록>이란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은이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가 홀연 금빛으로 번쩍이는 화려한 궁궐에 이르렀다. 궁궐에는 天聖殿천성전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선계에 자리 잡은 시의 왕국이었다. 이 나라의 왕은 최치원이고 수상은 을지문덕이며, 이제현과 이규보가 左右相좌우상을 맡고 있다. 그 밖에 내로라하는 역대의 쟁쟁한 시인들이 한자리씩 차지했다. 이 나라에서 지위의 높고 낮음은 단지 시를 쓰는 능력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당대에 쟁쟁하던 선배인 서거정, 성현, 어숙권등은 지방의 미관말직을 전전하고 있는 데 반해, 현세에서 불우를 곱씹던 그는 자신이 꿈속에 세운 시의 왕국에서 전자에게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승승장구한다. 다른 대신들이 손을 못 대는 문제도 척척 해결한다. 대개 현세의 불우에 대한 보상심리의 반영인 셈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천 군수 김시습의 반란 사건이 우리의 흥미를 끈다. 지은이가 시 왕국의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난데없이 김시습의 반란 소식이 전해진다. 천자 최치원이 당시풍만 좋아하여 자기와 같이 송시풍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박대하여 등용치 않으므로 참을 수 없어 거병했다는 사연이니, 참으로 시 왕국다운 반란 이유다. 이에 이색의 천거로 토벌의 임무를 맡게 된 심의는 몇만의 군대를 주겠다는 천자의 제의를 거절하고, 嘯永秘術소영비술만으로 대적하겠다며 尖頭奴첨두노 몇을 데리고 혼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 소영비술이란 천지의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피리 부는 비술로 다름 아닌 시를 말함이요, 첨두노란 머리가 뾰족한 하인이니 붓의 다른 말이다.
적진에 다다른 심의가 한 곡조 피리를 불자 반란군은 그만 간담이 서늘해지고 기운이 꺾이며, 두 번 불자 그만 몇 겹의 포위를 풀고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장 김시습은 손을 뒤로 묶고는, “사단의 노장이신 심영공께서 이르실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며 투항하고 만다. 반란군의 토벌치고는 싱겁기 짝이 없다.
이 작품은 소설적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심의의 시관과 역대 시인에 대한 평가가 잘 드러난 글이다. 두보를 천자로 하는 중국의 시 왕국에 천자 최치원이 초청되어 두 나라의 시인들이 시로써 재주를 겨루는 내용 등 적잖은 흥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김시습의 반란 사건이다. 최치원은 당나라, 특히 화려하고 유미한 시풍으로 대표되는 만당 시기의 인물이니, 그가 당시풍을 추구한 것은 당연하다. 그가 천자로 군림하는 시 왕국에서 신하들도 당시를 추구했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반면 송시풍을 추구했던 김시습은 자신의 뛰어난 역량에도 벼슬길에서 소외된 것이 불만스러웠고, 급기야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시풍과 송시풍은 도대체 어떤 시풍을 말하는 걸까?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두 시풍은 타협이나 공존이 어려울 듯함. 고전 시비평서를 읽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당시에 핍진한다’거나 ‘송시에 가깝다’는 표현을 만나게 된다. 또 이 두 가지가 함께 거론될 때면 대부분 당시풍을 더 높이 평가했다. 비평 현장에서 당시나 송시는 왕조 개념이 아닌 시의 취향 혹은 성향을 말하는 풍격 용어로 쓰인다. 달리 말해 당나라 시인의 시에서도 송시풍을 찾아볼 수 있고, 청나라 시인의 시에서도 당시풍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95P~97P
송대의 유명한 화가 곽희는 그의 [林泉高致임천고치]에서 이렇게 말한다.
진짜 산수의 안개와 이내는 네 계절이 같지 않다. 봄 산은 담박하고 아름다워 마치 웃는 듯하고, 여름 산은 자욱이 푸르러 물 방물이 듣는 듯하다. 가을 산은 맑고 깨끗하여 단장한 듯하고, 겨울 산은 어두침침하고 희미하여 잠자는 듯하다. 가을 산은 맑고 깨끗하여 단장한 듯하고, 겨울 산은 어두침침하고 희미하여 잠자는 듯하다. 97P
산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날마다 그 모습을 바꾼다. 봄 산이 좋아도 여름 산의 짙푸름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가을 산의 조촐함과 겨울 산의 담박함은 또 그것대로의 매력이 있다. 사람마다 기화가 같지 않으므로, 꼬집어 어느 산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시 또한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당시를 두고 흔히 중국 고전시가의 꽃이라고 말하여 계절로 치면 봄에 해당한다고들 하고, 이에 반해 송시는 가을에 비긴다. 백화난만한 고궁의 봄 뜰을 친구와 어울려 산책하는 정취를 당시의 세계에 견주고, 들국화 가득히 필 가을 들판을 홀로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것을 송시의 세계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당시는 호탕한 기개를 지닌 장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같고, 송시는 달밤에 호수에 배를 띄우고 선비가 마주앉아 학문을 논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당시와 송시의 차이는 보여주기와 말하기의 차이로도 설명한다. 98P
무월은 <論宋詩논송시>란 글에서
당시는 작약이나 해당처럼 짙은 꽃과 화려한 색채가 있다. 송시는 寒梅한매나 秋菊추국처럼 그윽한 운치와 서늘한 향기가 있다. 당시는 여지荔枝를 씹는 것처럼 한 알을 넣으면 단맛과 향기가 양 볼에 가득 찬다. 송시는 橄欖감람을 먹는 것처럼 떨떠름한 맛을 느끼지만 뒷맛이 빼어나고 오래 간다. 이것을 산수에 노는 것에 비유하면 당시는 곧 높은 봉우리에서 멀리 바라보매 의기가 드넓어진 것과 같고, 송시는 곧 그윽한 골짜기의 냇물을 찾아가 정경이 서늘한 것과 같다. 100P
작약이나 해당화의 화려한 색채는 화려하게 성장한 미인의 우아한 자태를 연상시킨다. 이것이 당시이다. 반면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나 서리를 이겨내는 국화의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는 화장을 하지 않고 소복 입은 여인의 얼음 같은 아름다움을 떠올린다. 이것이 바로 송시이다. 100P
당시의 특징으로 거론한 ‘영모影描’란 글자 그대로 그림자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닌 것을 어떻게 묘사해낸다는 말인가. 대상과 마주하여 일어나는 시인의 감정은 시로 그림자와 같아서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시는 그 무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느낌을 언어로 옮겨내는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 ‘포진鋪陳’이라 함은 있는 그대로 펼쳐 진술한다는 의미이다. 시인이 의론을 세워 자신의 주의 주장을 전달하려 할 때 흔히 이 방법을 사용한다.
당시가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취향이라면, 송시는 고전적이고 이성적인 취향이다. 감성의 욕구는 자칫 무절제로 흐르기 쉽고, 이성의 욕구는 논리의 함정에 쉬 빠진다. 한시사의 전개에서 당시풍과 송시풍의 변화 교체가 쟁점이 되어온 것은 그 시대 문학의 풍격과 성향의 자연스런 변화와 관계된다. 101P
전종서가 [談藝錄담예록]에서 “사람의 일생에서 소년 시절에는 재기가 발랄하여 마침내 당시의 기풍을 띠게 되고, 노년 시절에 이르면 사려가 깊어져서 송시의 기풍을 띠게 마련이다.”라고 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이럴진대, 문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풍의 변모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이러한 점은 현대의 시인도 비슷하다. 젊은 시절 격동하는 감정의 분출과 화려한 비유로 독자를 사로잡던 시인도 만년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담한 언어에 담아 노래하는 것을 흔히 본다. 이로 보면 당시와 송시의 구분은 실제로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101~102P
-시인은 시로 화가는 그림으로 자연과 사람을 읽어낸다고 한다면 요즘은 사진으로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사진가라고 한다. 언젠가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광각렌즈와 망원렌즈를 선호하는 연령대에 좀 다르다.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젊은 시절에는 역동적인 사진을 담아내는 광각렌즈를 선호하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편안하고 부드러운 자연을 담아내기에 좋은 망원렌즈를 선호한다고…당시와 송시의 차이도 한 개인의 세월의 흐름도 담아내는 것이 아닐까.
홍만종은 그의 <詩話叢林證正시화총림증정>에서 이렇게 적었다.
당시를 존중하는 사람은 송시를 배척하여 비루하여 배울 바가 못 된다고 한다. 송시를 배우는 사람은 당시를 배척하여 나약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모두 편벽된 언론이다. 당이 쇠퇴하였을 때에는 어찌 속된 작품이 없었겠으며, 송이 성할 때에도 어찌 고아한 작품이 없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103P
당시는 가슴으로 쓴 시이다. 여기에는 시인의 웃음과 눈물이 있어 마음으로 전해오는 인간의 체취가 물씬하다. 이에 반해 송시는 머리로 쓴 시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깊고 담담한 관조와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조망이 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위안과 인간의 정신을 고원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에서 서정 함축을 중시하고 의흥意興이 뛰어난 시를 ‘唐音당음’이라 하고, 생각에 잠기고 이치를 따지며 유현한 맛을 풍기는 시를 ‘宋調송조’라고 일컬어왔다. 103P
저물어 외로운 객점에 드니
산 깊어 사림도 닫지를 않네
닭 울어 앞길을 물으려는데
누런 잎 날 향해 날려 오누나.
선조 때 시인 권필權韠(1569~1612)의 <도중途中>이란 작품이다.
권필은 우리나라 역대 시인 가운데 두시杜詩의 경지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당시풍에 정통한 시인이다. 깊은 산속에는 주막이 있고, 지친 걸음을 쉬어가는 나그네가 있다. ‘황엽黃葉’이라 했으니 늦가을이다. 종일 걷기에 지친 나그네는 해가 서산을 넘어간 뒤에야 산속 주막에 들었다. 밤중에도 뎔린 사립문이 시인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불안과 초조의 심리가 엿보인다. 깊은 밤까지 도둑 걱정 없이 문을 열어둘 수 있는 평온함을 그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닭이 우는 가을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나그네는 다시 쫓기듯 길을 재촉한다. 뼈를 저미는 추위.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을 묻는 나그네 앞에 들려오는 대답은 공허한 바람 소리와 자신을 향해 날려오는 누렇게 시든 낙엽뿐이다. 그러고 보면 애초에 갈 길은 있지도 않았다. 인생이란 결국 길을 찾아 헤매는 과정의 연속일 뿐이 아니겠는가. 길을 가로막고 달려드는 낙엽은 시인에게 인생은 이와 같이 덧없는 것이라고, 길은 어디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것만 같다. 스무 자에 불과하지만 길 가는 나그네의 辛苦신고와 뼈에 저미는 외로움이 생생하게 마음을 파고든다. 106P
당시는 가슴으로 전해오는 정감의 세계를 노래한다. 때로 들뜬 어감으로, 간혹 슬픔에 젖어 노래하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는 법은 좀체 없다. 이런 까닭에 당시풍의 시는 이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보다는 감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즐겨 불린다. 당시풍과 송시풍이 시사의 전개에서 반복 교체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8~109P
당시풍에 대비되는 송시풍의 특징을 일괄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송시는 이 시기 발달한 禪宗선종과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생에 대한 철학적 음미를 내용으로 하는 경향이 짙다. 또 쓸데없는 수식을 배제하고 섬세한 관찰과 개성적 표현을 중시하였으며, 제재 상 일상생활에의 관심과 밀착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시의 공용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표현은 다분히 산문적이고 서술적이 되었다. 정감이 풍부하고 유려한 당시에 비해 송시는 이지적이고 심원한 풍격을 갖추고 있다. 또 송대에 발달한 사문학詞文學은 시에 비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세계를 노래하여, 이때에는 시와 사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도 간과할 수 없다. 109P
온종일 짚신 신고 발길 따라 가노라니
한 산을 가고 나면 또 한 산이 푸르도다.
마음에 생각 없어 형상 부림 안 당하니
도는 본시 무명커늘 어찌 빌려 이룰까.
간밤 이슬 마르쟎아 산새는 기저귀고
봄바람 다하기 전 들꽃이 피었구나.
지팡이로 돌아올 때 천봉이 고요터니
푸른 절벽 안개 속에 저녁 햇살 비쳐든다.
김시습의 <무제無題>라는 작품이다.
그저 풍경을 노래한 것 같지만 3.4구로 보아 뭔가 묵직한 주제를 말하여 한 듯도 한데 그것이 무었일까?
1구에는 짚신을 신고 종일 길을 가는 나그네가 나온다. 그의 생각에 눈앞에 있는 저 산마루만 넘어가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겠지 싶었다. 그러나 산은 산에 연하여 끝없이 펼쳐져 있다. 1.2구는 옛 시에서 “저 들판 끝난 곳이 곧바로 청산인데, 행인은 다시금 청산 밖에 있도다. 平蕪盡處是靑山, 行人更在靑山外.”라 한 탄식을 일깨운다. 3.4구는 의론이다. 1.2구의 체험이 이끌어낸 깨달음을 노래했다. 종일 길을 걸었던 것은 산 끝 간 데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내 마음의 집착 때문이었다. 다만 그 집착을 마음에서 걷어내 전미개오轉迷開悟 하고 나면 공연히 육신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 4구에서 시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느닷없이 도는 본래 무명한 것인데 이것을 어찌 이루고 말고 하는 이치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도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욕망, 즉 성도成道 성불成佛에의 욕망은 한 산을 가고 나면 또 한 산이 막아서듯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 빚어낸 허망한 집착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1.2구의 언술이 구도의 행각에 나선 구도승의 수행 과정을 비유하고 있고, 3.4구는 그 과정 끝에 도달한 어떤 깨달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110P
5.6구에서 다시 시적 화자는 숨고 사물의 세계를 노래한다. 간밤의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새들은 어느새 날이 샌 것을 알아 노래한다. 봄바람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꽃들은 망울을 터뜨린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알아 지저귀고 망울 부푸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구도의 깨달음도 이와 같다. 누가 알려주어서 관념으로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통연자득洞然自得, 활연관통豁然貫通해야 한다.
먼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던 화자는 이제 왔던 길로 발걸음을 돌린다.
7구에서 ‘천봉이 고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 앞서의 깨달음이 가져온 내면의 고요, 내면의 평정을 말하려 함이다. 돌아온다는 것은 밖을 향해 있던 집착에서 놓여나 본래의 자신에게 되돌아옴을 뜻한다. 8구의 푸른 절벽 앞을 가로막고 있던 어지러운 안개는 무슨 말인가. 절벽은 아득한 높이로 사람의 길을 막는다. 앞선 행각의 길에서 이 절벽은 무문無門의 관문처럼 앞길을 막았고, 어지러운 안개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끔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제 모든 미망을 던져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늦저녁의 햇살’이 비쳐들어 이전 나를 괴롭히던 망집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아 이 시는 자연을 서성이는 나그네의 노래로 보기 쉽다. 하지만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뜻밖에 이같이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와 만나게 된다. 마치 어느 고승의 상승법문을 접한 느낌마저 든다. 흔히 큰 사찰의 대웅전 둘레에 그려진 심우도尋牛圖의 이치를 시로 표현한다면 이보다 적절한 것이 있을까. 111P
김시습의 시는 송나라 어느 비구니가 지은 <오도시悟道詩>의 분위기와 흡사하다. 오도시란 도를 깨달은 순간의 법열을 노래한 시이다.
종일 봄을 찾았어도 봄은 보지 못했네 終日尋春不見春
짚신 신고 산머리 구름 위로 가보았지. 芒鞋踏破嶺頭雲
돌아올 때 우연히 매화 향기 맡으니 歸來偶把梅花臭
봄은 가지 위에 어느새 와 있었네. 春在枝上已十分
그녀는 하루 종일 봄을 찾아 온 산을 헤맸다. 산꼭대기 구름 위까지 가보았지만 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친 그녀는 생각을 접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코끝에 매화의 향기가 스쳐오는 것이 아닌가. 정작 봄은 자기 집 뜰 매화가지 위에 와 있었던 것이다.
봄을 찾으려고 온 산은 헤매는 것은 도를 깨닫고자 구도의 행각에 나섬을 뜻한다. 그녀는 온갖 고행을 무릅쓰며 일념으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온 산 어디에도 없는 봄처럼, 도의 실체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112p
송시풍의 시는 담담한 가운데 깊이를 지녔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시가 대상 그 자체에 몰입함으로써 자연스레 시인의 정의情意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송시는 시인이 자신의 정의를 대상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을 위한다. 114p
시는 우선 시가 되어야 한다. 당시와 송시의 구분이나 참여니 순수니 하는 변별은 그 다음 문제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이므로 좋고 싫음의 판단이 있을 뿐 우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시인이 시적 언어의 규율을 무시하고 목청만 높이면 한때 대학가에 요란스레 나붙었던 대자보나 근엄한 목회자의 설교와 다를 바 없다. 웅변이나 설교를 시의 형식을 빌려 듣고 싶은 독자는 없다. 시는 결코 관념의 퇴적장이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몽환적 어휘의 나열이나 이미지의 배합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혹세무민의 연금술사에 지나지 않는다. 시는 결코 독해할 수 없는 상형문자이거나 암호문일 수가 없다. 115p
그러나 어찌하리. 현세에서 시인의 삶이란 곁에 누운 병든 아내의 신음처럼 고달프고 괴로운 것을, 그러고 보면 시란 까맣게 잊고 있던 신선세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피안의 세계를 향한 회귀의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 천상의 백옥루가 준공되었으나 상량문을 지을 사람이 없자 옥황상제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하李賀를 하늘나라로 불렀던 것처럼, 티끌세상의 귀양살이가 끝나 천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뱃속의 먹물이 다 마르도록 시인은 다만 깨어 노래할 뿐이다. 116p
다섯 번째 이야기
버들을 꺾는 뜻은-한시의 정운미情韻味
비 개인 긴 둑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테나니
정지상(~1135)의 <송인送人>이란 작품이다. 정지상의 <송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안타까운 심정을 절묘하게 포착한 작품이다. 떠난 이를 그리며 흘리는 눈물로 대동강 물이 마를 날 없다는 엄살은 허풍스럽기는커녕 그 곡진한 마음새가 콧날을 찡하게 한다. 이 섬세한 시심만으로도 과연 신운절창의 감탄은 있음 직하다. 다만 중국 사신들이 결정적으로 무릅을 치며 감탄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2구의 ‘송군남포送君南浦’라는 표현에 있었다. 이 구절은 흔히 임을 남포로 떠나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남포란 단어에는 유장한 연원이 있다. 굴원屈原은 일찍이 <구가九歌> 중 <하백河伯>에서 “그대의 손을 잡고 동으로 가서, 고운 임을 남포에서 떠나보내네.”라고 노래한 바 있다. 그 뒤 많은 시인들이 실제 헤어지는 포구가 동포이든 서포이든 북포이든 간에 남포라고 말하곤 했다. 굴원의 이 노래가 있은 뒤로 ‘남포’란 말은 시인들에게 으레 ‘이별’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정운情韻이 담긴 말이 되었다. 121p
위성의 아침 비가 가는 먼지 적시니
객사엔 파릇파릇 버들 빛이 새롭다.
그대에게 다시금 한 잔 술 권하노라
양관을 나서면 아는 이가 없을지니.
위성은 당나라 때 수도인 장안의 서쪽, 지금의 섬서성 함양시 동편 일대이다. 이른바 실크로드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당나라 때 장안에는 동쪽에는 파교가 있고 서쪽에는 위교가 있어, 동쪽으로 길 떠나는 나그네는 파교에서, 서쪽으로 길 떠나는 나그네는 위교에서 전별의 자리를 가졌다. 양관은 지금의 감숙성 돈황현에 있다. 당시에는 서역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황량한 사막 길을 오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인들은 이 길을 오가며 구슬픈 새하塞下의 노래를 불러 오늘까지 전하는 명편이 적지 않다. 124p
작품을 감상해 보자. 여기서도 새봄을 재촉하는 빗속에 이별을 노래한다. 아침부터 내린 보슬비로 사람이 지날 때마다 길 위로 풀풀 날리던 먼지가 차분히 가라 앉았다. 그러나 실제로 촉촉이 젖은 것은 흙먼지이기보다 사랑하는 벗을 멀리 떠나보내는 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비에 씻기어진 버들잎이 푸르다. 버들을 보면서 시인은 이별을 예감하고, 다시금 한 잔 술을 권한다. ‘다시금更進’이라 했으니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거나해질 만큼의 대작이 오갔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척박한 땅, 인적도 없는 사막을 지나 아득한 안서 땅까지 가야 할 벗이 이제 말에 오르려 한다. 이별이 아쉬운 시인은 “내 술 한 잔 더 받고 가게.” 하면서 소매를 잡는다. 양관 땅을 나서면 다시는 한 잔 술을 권해줄 벗은 없을 테니 하는 말이다. 붙잡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두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우리 옛 시조에,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임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란 것이 있다. 바로 이 정황에 꼭 맞을 듯하다. 2구에서 시인은 파릇파릇한 버들 빛을 헤아리며 이별을 예감한다. 당나라 때는 벗과 헤어지며 버들가지를 꺾어 이별의 정표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절류折柳’, 즉 ‘버들가지를 꺾는다’는 말에는 앞서 본 ‘남포’와 마찬가지로 ‘이별’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버들가지가 이별의 신표가 된 사정은 이러하다 125p
버드나무는 꺾꽂이가 가능하다. 신표로 받는 버들가지를 가져다 심어두면 뿌리를 내려 새 잎을 돋운다. 보내는 사람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하는 심정으로 버들가지를 꺾어주었고, 또 꺾이어 가지에서 떨어졌어도 다시 뿌리를 내려 생명을 구가하는 버들가지처럼, 우리의 우정도 사랑도 그와 같이 시들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도 담겼다. 또 ‘류柳’의 중국 음은 머무른다는 의미의 ‘류留’와 똑 같다. 그러니 버들가지에는 가지 말고 머물러달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홍랑의 시조에, “멧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계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봄비에 새 잎 곳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라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당나라 때 시인 저사종은 <증별贈別>에서, “동성엔 봄풀이 푸르다지만, 남포의 버들은 가지가 없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남포’ 와 ’버들’ 이 이별을 상징하는 어휘로 동시에 쓰였다. 봄이 와서 풀은 푸른데, 떠나는 임에게 버들가지를 꺾어주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죄다 꺾어버려 남은 가지가 없다는 말이다.
내 낀 버들 어느새 금실을 너울대니
이별의 징표로 꺾이어짐 얼마던고
숲 아래 저 매미도 이별 한을 안다는 듯
석양의 가지 위로 소리 끌며 오르누나
-고려 시인 김극기의<통달역通達驛> 126p
여러 해 전 신문에서 어느 조경학자가 우리나라 한시에 자주 나오는 초목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통계 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은 소나무도 국화도 아닌 바로 버드나무였다. 그는 이 결과를 놓고 버드나무가 우리 생활공간 가까이에 많이 있었으므로 빈번하게 시의 제재로 쓰인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그는 버드나무가 봄날의 서정을 촉진시키는 환기물인 동시에 ‘이별과 재회에의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버드나무가 빈도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면, 그것은 봄날의 서정이나 이별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제일 많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129p
이별하는 사람들 날마다 버들 꺾어 離印日日折楊柳
천 가지 다 꺾어도 가시는 임 못 잡았네 折盡千枝人莫留
어여쁜 아가씨들 하많은 눈물 탓에 紅袖翠娥多少淚
부연 물결 지는 해도 수심에 겨워 있네. 烟波落日古今愁
제목은 <패강곡浿江曲>, 쉽게 말해 ‘대동강 노래’다. 10수의 연작 가운데 한 수이다.
이별하는 사람들은 재회에의 염원 때문에 날마다 대동강변에 나와서 떠나는 임에게 버들가지를 꺾어 보낸다. 허구한 날 꺾다 보니 대동강 버드나무는 아예 대머리가 될 지경이다.129p
‘가을 부채’는 한시에서 으레 ‘버림받은 여인’을 상징한다. 부채는 더운 여름날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이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오면, 여름내 애지중지하던 부채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힌다. 마찬가지로 한때 내게 그토록 다정하던 임은 어느 덧 나를 까맣게 잊고 돌아보지 않으신다. 시인은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을 부채’를 손에 쥐었다는 말만 가지고 이미 그녀가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131P
한시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중 하나가 누각 또는 난간에 기댄다는 말이다. 누각 위에는 왜 오르는가? 누간의 난간은 높은 곳에 있어, 그곳에서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난간에는 왜 기대는가? 기다림에 지친 까닭이다. 그래서 누각에 오르거나 난간에 기댄다는 뜻의 ‘등루登樓’, ‘의루倚樓’, ‘의란倚欄’ 혹은 ‘빙란憑欄’등의 표현 속에는 ‘그리움’의 의미가 담긴다. 135p
임은 서울 계시고 첩은 양주 있는데
날마다 임을 그려 취루에 오릅니다.
방초는 짙어지고 버들은 늙어가니
석양엔 흘러가는 강물만 보입니다.
최경창(1539~1583)의 <무제無題>란 작품이다. 한시에서 ‘무제’를 표제로 내거는 것은 마땅히 붙일 만한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목을 붙이지 않은 채 오히려 독자의 적극적인 독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무제시는 이상은李商隱이래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염정풍艶情風의 분위기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137p
특정 어휘가 특수한 정운을 띠게 되면 요즘 식으로 말해 사은유 dead metaphor가 된다, 이것이 진부한 표현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시인은 늘 새로운 감성과 참신한 생각으로 이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진부한 것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 익숙한 것을 새롭게 만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시인의 창조적 정신이 만들어 내는 하나의 마술이다. 143P
여섯 번째 이야기
즐거운 오독 –모호성에 대하여
일상의 언어에서 의미는 어느 하나가 옳으면 나머지는 그른 것이 되지만, 시의 언어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 이 대목에서 모호성ambigu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면에서 시인은 이러한 언어의 모호성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다. 시 속에서 이러한 의미들은 오히려 풍부와 함축이 된다.
150P
시의 어휘나 구절들은 대개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포용력과 융통성을 지닌 문맥을 형성한다. 특히 한시 언어에서 이러한 점은 놀라울 정도로 잘 발휘된다. 뛰어난 시는 어떤 의미에서 언어의 포용력과 융통성을 극대화한 시라고 말해도 괜챦다. 152P
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어
봄이 와도 봄 온 것 같지가 않네
저절로 옷 허리띠 느슨해지니
몸매를 가꾸기 위함 아닐세. 152P
오랑캐 땅 화초야 없으랴마는
봄이 와도 봄 온 것 같지가 않네. 152P
조선시대의 일이다. 어떤 고을의 향시鄕試에 제목이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로 내걸렸다. 응시생들은 모두 왕소군의 고사를 들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막상 장원에 뽑힌 작품은 덩그러니 제목을 네 번 반복해서 쓴 한 서생의 작품이었다.
오랑캐 땅 화초가 없다고 하나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엔들 화초 없을까? 胡地無花草
어찌 땅에 화초가 없으랴마는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네. 胡地無花草
어떤가? 같은 글자의 풀이가 모두 제가끔이다. 한문 해석의 모호성을 말할 때 인용하곤 하는 이야기이다. 위 시는 김삿갓金炳淵(1807~1863)의 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53P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인이 언어의 미로 위에 숨겨놓은 코드를 독자가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진진한 지적.감성적 여정이어서 때로는 오독도 즐겁다. 시인은 부러 말꼬리를 흐려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독자는 잠시 멍해 있다가 다시 코드를 찾아 나선다. 설사 가다가 길을 잠시 잃은들 어떠랴. 아니 애초부터 길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172P
일곱 번째 이야기
사물과 자아의 접속 – 정경론情景論
명나라 때 사진은 [사명시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景은 시의 매개이고, 정情은 시의 배아다. 이 둘이 합하여 시가 된다. 몇 마디 말로 만 가지 형상을 부려서 원기가 혼성渾成하니 그 넒음이 가없다.” 무심히 경물과 마주하여 마음속에 정이 일어난다. 경이 정의 매개가 되는 까닭이다. 가슴에 자욱한 정을 품고 경을 바라보면 무심한 경물이 내 마음의 빛깔로 물든다. 정은 경에 의미를 불어넣는 배아인 셈이다. 정만으로는 시가 되지 않는다. 경만 가지고 시가 되는 법도 없다. 청나라 왕부지는 [석당영일서론夕堂永日緖論]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정과 경은 이름이 둘이나 실제로는 나눌 수 없다. 시에 뛰어난 자는 이 둘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가장자리가 없다. 빼어난 시는 정 가운데 경이 있고, 경 가운데 정이 있다.” 이른바 ‘묘합무은妙合無垠’의 주장이다. 선녀의 옷은 꿰맨 자취를 찾을 수 없어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정과 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도 이와 같다. 어디까지가 경이고 어디부터가 정인지 그 가장자리를 찾기 어렵다. 정을 말하는가 싶은데 어느새 경을 묘사하고 있고, 경을 그려 보이는가 싶어 보면 다시금 정을 토로한다. 176P
빗속에 누렇게 잎 시든 나무
등불 아래 하얗게 머리 센 사람
이것은 경이 정과 합하여 하나가 된 예다. 추적추적 가을비가 하염없다. 마당엔 잎이 누렇게 시든 나무 한 그루 내일 아침이면 가지의 잎도 모두 지리라. 화려하던 인생의 잎사귀들도 이제는 시들어 다 졌다. 삶의 얼룩을 지우지 못한 채 근심 겨운 가을밤이 또 깊어 간다. 본시 이는 경물일 뿐인데, 시인의 정이 뭉클 묻어나 가슴을 에인다. 177P
산에는 꽃 피고 언덕엔 수양버들
이별의 정 안타까워 홀로 한숨 내쉰다.
지팡이 굳이 짚고 문 나서 바라봐도
그대는 오지 않고 봄날 해만 저문다.
조선 중기의 문인 송희갑의<봄날 사람을 기다리며 春日待人>란 작품이다. 봄이 왔다. 언덕 수양버들에 파르라니 물이 올랐다. 산에는 붉게 꽃이 피었다. 무심히 경물을 바라보던 시인은 문득 먼 곳으로 마음이 끌렸다. 사물에 정이 접촉하는 순간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으로 변한 것이다. 그리움이 먼저였을까. 꽃을 보는 설램이 먼저였을까?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앓아누웠던 몸을 추슬러 대문께로 나선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딱히 누구랄 것도 없는 막막한 기다림이다. 봄날의 하루해는 뉘엿뉘엿 기운다. 그리움처럼 그림자가 길어진다. 180P
위 시를 지은 송희갑은 일찍이 권필의 명성을 사모하여 강화까지 찾아갔다. 10년을 기약하고 시 공부를 시작했다. 180P
-10년이란 시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효험이 있는 시간이었나보다.
육시옹은 [시경총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을 잘 말하는 자는 말이 깊은 듯 얕고 드러날 듯 감추어져서 그 마음의 무한함을 깨닫게 한다. 경을 잘 말하는 자는 형용함을 생략한 채 약간만 보태도 참모습이 또렷하고 생기가 넘쳐난다.” 드러낼 듯 감추는 데서 정의 맛이 깊어진다. 시시콜콜한 묘사를 버리자 경이 한층 살아난다. 사실 녹아든 정과 경의 경계를 갈라 구분해내기는 쉽지가 않다. 189P
시인이 아무리 경만 말해도 그 속에 어느새 정이 녹아든다. 시인은 눈앞의 여러 대상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 렌즈야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초점을 맞추는 시인의 선택에 감정이 스민다. 시 속에서는 어떤 경물도 포착과 동시에 주관의 색채로 물들고 만다. 197P
‘시언지詩言志’, 즉 시가 뜻을 말한다는 말은 [시경詩經]이래 가장 친숙한 시의 정의다. 시란 무엇인가? 품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뜻은? 나아가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는가? 198P
서거정은 [동인시화東人詩話]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뜻이란 마음이 가는 바이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198P
시는 찬 샘물이다. 시를 잘 쓰려면 물의 선변善變을 배워야 한다. 202P
수다스럽게 말하고 아프다고 끙끙대는 소리가 시의 내용이 되고 말았다. 심상尋常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 그러나 진정한 시법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최후의 ‘현관玄關’이 있다. 그 현관 앞에 서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 문을 여는 법은 아무도 일러줄 수가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제 손으로 직접 열고 들어가야 한다. 202P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문을 열고 나오는 것도 어느 것 하나 타인이 해 줄 수는 없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일자사一字師이야기-시안론詩眼論
서거정이 [동인시화]에서 말했다 “시는 묘함이 한 글자에 달려 있다. 옛사람은 한 글자를 가지고 스승으로 삼았다.” 호자도 [초계어은총화]에서 “시구는 한 글자가 공교로우면 절로 빼어나게 된다. 마치 한 낱의 영단靈丹으로 돌을 두드려 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다. 원매가 [수원시화]에서 “시는 한 글자만 고쳐도 경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도 다 같은 뜻이다. 205P
청나라 유희재는 시안이란 시의 어느 글자가 좋고 어느 구절이 뛰어나다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시의 핵심이 집중되어 ‘신묘한 빛이 엉겨 붙은 지점’을 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안은 글자 그대로 시의 눈알이다. 시안은 시에서 가장 정채롭고 시인의 정신이 집약된 지점, 하나만 건드려도 나머지가 따라 움직이는 일동만수一動萬隨의 경락이다. 시안은 단순히 수사적으로 자구를 단련하는 기교의 문제가 아니다. 시가예술의 의경미意境美를 형성하는 핵심처인 것이다.
장승요가 금릉金陵 안락사安樂寺벽에 네 마리 용을 그렸다. 그림 속 용은 눈동자에 점이 찍혀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점을 찍으면 용은 그 즉시 하늘로 날아 올라가버린다고 했다. 사람들이 못 믿고 비웃었다. 그가 용 한 마리의 눈에 점을 찍었다. 그 순간 천둥 벽력이 쳐서 벽을 쪼개더니 용이 구름을 타고 솟구쳐 올랐다. 점을 찍지 않은 나머지 세 마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른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고사이다.
화가 고개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곱고 추함은 솜씨와 무관하다. 그림으로 정신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눈동자에 달려 있다.” 눈동자로 정신이 전달된다는 ‘아도전신阿堵傳神’의 유명한 주장이다. 210P
아홉 번째 이야기
작시, 즐거운 괴로움
고음론苦吟論’
대상을 향한 미친 듯한 몰두 없이 위대한 예술은 이룩되지 않는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 했다. 미쳐야 미친다. 비록 하챦은 기예라 해도 자신을 온전히 잊은 몰두가 있어야 비로소 성취를 말할 수 있다. 예술의 천재들에게는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광기가 있다. 그들 안에서는 열정이 뿜어내는 거친 호흡과 다른 사람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느껴진다.
최홍효는 조선 초의 명필이다. 그가 일찍이 과거를 보러 갔다. 답안지를 쓰는데 우연히 한 글자가 왕희지의 글씨와 같게 되었다. 평소에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던 글자였다. 그는 답안을 쓰다 말고 자기 글씨에 도취되어 종일 가만히 앉아 그 글자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글씨가 아까웠던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품에 넣고 돌아왔다. 우연히 같게 써진 한 글자 앞에서 그는 입신출세의 꿈마저도 까맣게 잊고 말았던 것이다. 235P
당나라 때 주박은 경물과 만나면 괴로이 시구를 찾으며 읊조렸다. 산에서 해가 지는데 돌아오기를 잊은 적도 있었다. 좋은 시구를 얻으면 더욱 신이 나서 기뻐했다. 한 번은 들판에서 나무 해서 돌아오는 나무꾼을 만났다. 그 순간 퍼뜩 시상이 떠올랐다. 주박은 나무꾼을 붙잡고 “잡았다!”고 소리쳤다. 나무꾼이 너무 놀라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나무를 진 채로 땅에 엎어지고 말았다. 순찰 돌던 나졸이 그 광경을 보고 도적인 줄 알고 나무꾼을 붙잡았다. 주박이 급히 말했다. “내가 저 나무꾼을 보자마자 갑작스레 기막힌 영감이 떠올라 좋은 시구를 얻었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를 붙잡았던 것이오.”라 하였다. 우무의 [전당시화全唐詩話]에 보인다. 241P
당나라의 천재 시인 이하는 매일 아침 파리한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섰다. 나귀 등에는 낡아 해진 비단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길가다 시상이 떠오르면 즉시 써서 주머니 속에 넣곤 했다. 저물어 돌아오면 그 어머니가 계집종을 시켜 주머니를 꺼내 보았다. 써놓은 것이 많으면 “이 애가 심장을 다 토해야만 그만두겠구나.”하며 한숨 쉬었다. 이하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쪽지를 가져다가 정성스레 먹을 갈아 또박또박 옮겨 썼다. 그러고는 다른 주머니에 담아 보관하였다. 술에 크게 취하거나 초상이 있는 날이 아니면 언제나 이같이 했다. 예전 원고는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듯 작시에 골몰한 나머지 건강을 해쳐 그는 스물일곱 살의 아까운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죽기 전 비단 옷 입은 사람이 나무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말했다. “옥황상제께서 백옥루가 완공되어 그대를 불러 상량문을 짓게 하려 하신다.” 그는 얼마 뒤에 죽었다’ 그후 세상 사람들은 아까운 인재가 요절하면, 천상에 또 백옥루가 완공된 모양이라고 말하곤 했다. 242P
구양수는 글을 지으면 벽에다 붙여놓고 볼 때마다 이를 고쳤다. 완성 후에 보면 처음 것은 한 글자도 남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한다.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짓자, 사람들은 그가 고치지 않고 단숨에 지은 줄 알았다. 막상 이를 짓느라 버린 초고가 수레 석 대에 가득하였다. 그 사이의 고심참담이야 따져 무엇하겠는가.[사문유취]에 나온다. 송자경이 매요신에게 말했다. “나는 예전 지은 글을 볼 때 마다 보기 싫어 불태워버리고 싶어진다네.” 매요신이 기뻐하며 말했다. “자네의 글이 진보하는 것일세, 나의 시도 그렇다네.” 매요신은 앞서 여러 시인처럼 시에 고질이 든 시인이었다. 그는 아예<시벽詩癖>을 제목으로 한 시를 남겼다. 252P
인간의 시벽이 돈 욕심보다 더하니
애 졸이며 시구 찾다 몇 봄을 보냈던고
주머니 빔 상관 않아 가난은 변함없고
시 읊어 새 시구 많은 것만 기뻐했네.
괴롭게 층층 하늘 만져보려 했을 뿐
곤궁 속에 저승 갈 일 따지지도 않았다.
시에 대한 고질이 이쯤 되면 편작이 열이라도 고칠 방도가 없다. 일상의 모든 행동이 시와 무관한 것이 없다. 시를 쓰는 일은 이들에게 있어 매 순간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원동력인 셈이다. 253P
이이는 <인물세고서仁物世藁序>에서 “말이란 것은 소리의 정체로운 것이고, 문사란 것은 말의 정채로운 것이며, 시란 것은 문사의 빼어난 것이다.”라고 했다. 권필도 “시라는 것은 말 중에 정채로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시는 또 인간의 언어 중 가장 빛나는 금강석이다. 사실 세상에는 쓸모만으로 따지면 맥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258P
열 번째 이야기
미워할 수 없는 손님
시마론詩魔論
시마는 ‘시 귀신’이다. 시마는 어느 순간 시인에게 들어와 살면서 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를 생각하고 시만 짓게 하는 귀신이다. 시마가 한번 붙으면 다른 일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시에만 몰두하게 된다. 더욱이 짓는 시마다 절창 아닌 것이 없다. 시마는 시인에게 즐거운 괴로움을 선사하는 모순적인 존재다. 263P
시인이 자신에게 시마가 붙었는지 여부를 감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규보는 시마가 자신에게 들어온 뒤 나타난 이상 증세를 이렇게 적었다.
네가 오고부터 모든 일이 기구하기만 하다. 흐릿하게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바보가 되며, 주림과 목마름이 몸에 닥치는 줄도 모르고, 추위와 더위가 몸에 파고드는 줄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계집종이 게으름을 부려도 꾸중할 줄 모르고, 사내종이 미련스러운 짓을 해도 타이를 생각을 않는다. 동산에 잡초가 우거져도 깎아낼 줄 모르고, 집이 쓰러져가도 고칠 마음이 없다. 재산 많고 벼슬 높은 사람을 깔보며, 방자하고 거만하게 언성을 높여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면박을 주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지도 못하고 여색에 쉬 혹하며, 술을 만나면 행동이 더욱 거칠어진다.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268P
<구시마문>에서 이규보가 제시한 시마의 다섯 가지 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붓만 믿고 찧고 까불게 만드는 죄다.
둘째, 천기를 누설하면서도 당돌하여 그칠 줄 모르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죄다.
셋째, 삼라만산의 온갖 형상을 닥치는 대로 남김없이 옮겨내서 겸손할 줄 모르는 죄다.
넷째, 제멋대로 상 주고 벌 주며, 정치를 평론하고 만물을 조롱하여, 뽐내며 거들먹거리는 죄다.
다섯째, 목욕을 싫어하고 머리 빗기를 게을리 하며, 공연히 끙끙대고 인상을 써서 갖은 근심을 불러들이는 죄다. 271P
이규보와 최연이 제시한 시마의 죄상을 뒤집어 읽어보면 바로 시인 예찬론에 지나지 않는다. 시인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시로 자신의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날카로운 예지로 드러나지 않은 사물의 깊은 의미를 파헤쳐 사람들의 인식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다. 그뿐인가? 사물을 관찰하여 감춰진 의미를 찾아내고, 세속의 질서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시를 통해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 겉모양의 꾸밈을 우습게 보고 한 편의 훌륭한 시를 창작하기 위한 고초를 더욱 소중히 여긴다. 한마디로 이규보와 최연등이 꼽은 ‘시마의 죄상’은 오로지 시만 생각하고 시에 죽고 시에 사는 전업 시인으로 누리는 특권에 대한 ‘즐거운 비명’일 뿐이다. 결국 시마란 놈은 이마에 뿔 달린 귀신이 아니라,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272P
열한 번째 이야기
시인과 궁핍
시궁이후공론詩窮而後工論
시는 왜 쓰는가? 말로는 풀리지 않을 시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름도 노래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진다.
무릇 물건은 화평함을 얻지 못하면 운다. 초목은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흔들면 운다. 물은 소리가 없지만 바람이 움직이면 운다. 솟구치는 것은 부딪치기 때문이요. 달리는 것은 막는 까닭이며, 끓는 것은 불로 덥히기 때문이다. 금석은 소리가 없으나 이를 치면 소리가 난다. 사람의 말 또한 그러하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은 뒤에야 말하게 되니, 노래에 생각이 담기고 울음에는 품은 뜻이 있다. 무릇 입에서 나와 소리가 되는 것은 모두 불평함이 있기 때문이다. 287P
화평한 소리는 담박하고, 근심이 담긴 소리는 아름답다. 떠들썩 즐거운 말은 공교하기 어렵고, 곤궁한 말은 쉬이 좋다. 이런 까닭에 문장을 짓는 것은 늘 길 위의 나그네나 초야에 묻혀 사는 인사에게 있었다. 왕공이나 귀한 신분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기운이 가득 하고 득의 한지라, 타고난 성품이 원래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힘쓸 겨를이 없다. 288P
천지는 만물이 다 좋게만 하는 법이 없다. 뿔 있는 놈은 이빨이 없고, 날개가 있으면 다리가 두 개뿐이다. 이름난 꽃은 열매가 없고, 채색 구름은 쉬 흩어진다. 사람에 이르러서도 그러하다. 기특한 재주와 화려한 기예가 뛰어나면 공명이 떠나가서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치가 그러하다. 288P
고려말 이색의 <유감有感>
시가 사람 궁하게 함이 아니라
궁한 이의 시라야 좋은 법일세
내 길이 지금과는 맞지가 않아
괴로이 광막함을 찾아 헤맨다
얼음과 눈 살과 뼈를 에이듯 해도
기꺼워 마음만은 평화롭다네
옛사람 말 이제야 비로소 믿네
빼어난 시 떠돌이에 있다던 그 말 300P
열 두번째 이야기
시는 그 사람이다
기상론 氣象論
산에 눈이 하얗게 쌓을 때, 검은 돈피 갖옷을 입고 흰 깃이 달린 기다란 화살을 허리에 차고, 팔뚝에는 백 근짜리 센 활을 걸고, 철총마를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골짜기로 들어서면, 긴 바람이 골짜기에서 일어나 초목이 진동하는데, 느닷없이 큰 멧돼지가 놀라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곧 활을 힘껏 잡아당겨 쏘아 죽이고, 말에서 내려 칼을 빼서 이놈을 잡고, 고목을 베어 불을 놓아 기다란 꼬챙이에 그 고기를 꿰어 구우면, 기름과 피가 지글지글 끓으면서 뚝뚝 떨어지는데, 걸상에 걸터앉아 저며 먹으며 큰 은대접에 술을 가득히 부어 마시고, 얼근히 취할 때에 하늘을 쳐다보면 골짜기의 구름이 눈이 되어 취한 얼굴위로 비단처럼 펄펄 스친다네. 이런 맛을 자네가 아는가. 311P
문여기인文如基人. 즉 글은 그 사람과 같다고 한다. 무심히 내뱉는 말 속에 이미 그의 인생관이나 처세의 방식이 드러난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나그네는 긴 밤을 앉아 새우고
외로운 절 빗소리 듣는 가을밤.
동해 물의 깊이를 재어봅시다
내 근심과 어느 것이 깊고 얕은지.
당나라 때 시인 이군옥의 시다. 314P
“하늘과 땅 사이에 물건은 각기 주인이 있나니,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면 비록 터럭 하나도 취하지 말 일이다. 오직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밝은 달은 귀가 이를 얻어 소리가 되고, 눈은 이를 보아 빛깔을 이루나니, 이를 취함이 금함이 없고, 이를 써도 다함이 없다. 이는 조물주의 다함없는 곳집이다.” 바야흐로 때는 5월, 강물은 넘실댄다. 과거 영웅들의 체취 어린 산과 언덕을 지나는 감개야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빈털터리의 처지에도 풍월을 끌어들이는 여유가 자못 거나하다. 321P
열세 번째 이야기
씨가 되는 말
시참론詩讖論
인간의 잗단 일들 언제나 들쭉날쭉
일마다 어그러져 마땅한 구석 없네
젊을 땐 집 가난해 아내가 늘 구박하고
늙어 녹이 후해지자 기생이 따르누나
주룩주룩 비 오는 날 놀러 갈 약속 있고
개었을 땐 언제나 할 일 없어 앉아 있다.
배불러 상 물리면 좋은 고기 생기고
목 헐어 못 마실 때 술자리 벌어지네
귀한 물건 싸게 팔자 물건 값이 올라가고
묵은 병 낫고 나니 이웃집이 의원이라
자질구레 맞지 않음 오히려 이 같으니
양주 땅 학 탄 신선 어이 기약하리오
이규보의 <위심시違心詩>이다. 세상일이 어디 뜻같이 될까마는, 하는 일마다 하도 엇박자로 되고 보니 이런 푸념도 있을 법하다. 그렇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쉬 떠들 것은 아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고, 농담이 진담 된다는 농가성진弄假成眞의 성어도 있다. 335P
우홍적은 어려서 재주로 이름이 높았다. 일곱 살 때 어른이 ‘로老’자와 ‘춘春’자로 연구聯句를 짓게 하니 즉시 다음과 같이 지었다.
늙은이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봄바람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고작 일곱 살 먹은 아이가 봄바람도 녹이지 못하는 삶의 근심을 말하니 사람들이 몹시 기이하게 여겼다. 337P
열네 번째 이야기
놀이하는 인간
마음을 맑게 할 수가 있고 可以淸心也
맑은 마음으로 마셔도 좋다 以淸心也可
맑은 마음으로도 괜챦으니 淸心也可以
마음도 맑아질 수가 있고 心也可以淸
또한 마음을 맑게 해준다. 也可以淸心
둥근 찻주전자에 돌려가며 쓴 mf이라 사실 어느 글자부터 읽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 글자부터 읽더라도 뜻이 통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자자회문시字字廻文詩,라고 한다. 371P
김삿갓은 없다. 세간에 그의 시로 일컬어지는 시는 김삿갓이 아니고 누가 이런 시를 지으랴 싶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응수는 1939년에 처음으로 김삿갓의 시집을 간행했다. 김삿갓이 세상을 뜬 지 근 70년 뒤의 일이다. 이응수는 이곳 저곳에서 구전되던 김삿갓의 시 183수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대부분 전해들은 기록이어서 진위를 따지는 일은 애초에 바랄 게 못 된다. 453P
김삿갓이 문 앞에서 나그네를 내쫓는 주인을 풍자해서 지었다는 <사람이 사람 집에 왔는데>에 다음 구절이 있다. 사람이 사람 집에 왔는데 사람대접 않으니
주인의 인사가 사람 되기 어렵도다. 455P
열여덟 번째 이야기
바라봄의 시학
관물론觀物論
지렁이를 두고 사람들은 수미首尾도 없고 배도 등도 없다고들 말한다. 찬찬히 살펴보면 실지로는 머리와 꼬리, 배와 등이 있어 해를 피하고 이利에 나아가며, 정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옹翁말한다. 물건의 어리석고 굼뜬 것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사람처럼 칠규七竅와 오장五臟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것에 있어서겠는가? 말을 듣고 빛깔을 보아 지각이 어둡지 않은데도 사람 중에 간혹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는 자가 있으니 슬프다.
지렁이의 머리는 어느 쪽인가? 해를 피해 나아가는 쪽이다. 배는 어느 쪽인가? 바닥에 닿는 쪽이다. 성호 이익의 [관물편觀物篇]에 보인다. 성호의 관찰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칠규.오장을 갖추지 못한 지렁이도 제 몸의 해를 피해 이로움을 향해 나아갈 줄 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패망이 뻔히 보이는데도 눈뜨고 그 길을 가서 제 몸을 망치고 일을 그르치는 이가 있다. 지렁이만도 못하다. 475P
- 자주 본다. 정말 앞이 안보일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곁에서 보면 보이는 것을 본인만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잘하고자 하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주 보는 것이 슬프다
12월8일 아침.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하셨다. 날씨는 맑았다. 오후 다섯 시가 되자 갑자기 흰 구름이 집 위로 몰려들더니 눈이 한치가량 내렸다. 조금 뒤 선생께서 누울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므로 부축해 일으키자 앉으신 채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걷혔다.
문인 이덕홍(1541-1596)이 쓴 <퇴계선생고종기退溪先生考終記>이다. 묘한 느낌을 주는 글이다. 스승의 죽음을 지켜본 제자의 기록으로는 투며하리만치 담담하다. 슬픔이 묻어날 빈틈이 없다. 스승의 용태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창 밖의 날씨로 쏠려 있었다. 그는 과연 무슨 마음으로 스승의 서거하던 날의 기후 변화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479P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 모두는 ‘눈뜬장님’일 뿐이다.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려 한다고 보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깨달음은 결코 거져 얻어지지 않는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아무렇게나 열리지 않는다. 손끝이 갈라지는 연습 없이, 그저 기타 들고 동해 바닷가에 서 있다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순식간에 변해버린다. 차원이 달라진다. 속인과 달사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499P
깨달음의 바다
선시禪詩
배고파 밥 먹으니 밥맛이 더욱 좋고
잠 깨어 차 마시자 차 맛이 한층 달다.
땅이 후져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고
텅 빈 암자 부처님과 함께함이 기쁘다.
충지의<한가한 중에 우연히 적다>란 작품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 외진 암자엔 찾는 이 없어 사립문은 늘 걸린 그대로다. 그 속에 한 스님이 부처님과 함께 불당에 앉아 있다. 그는 ‘기쁘다’고 말한다. 513P
상추꽃 핀
아침
자벌레가
기어가는
지구 안쪽이
자꾸만
간지럽다
마당에 핀 상추꽃을 보는 5월의 아침은 싱그럽다. 자벌레 한 마리가 활처럼 제 몸을 굽혔다가 쭉 펴고, 굽혔다가 쭉 펴며 지구의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 시인은 자꾸만 간지럽다고 말하는데, 정작 간지러운 것은 지구의 안쪽인가, 아니면 시인 자신인가? 조그만 자벌레가 지구를 간질인다. 이 놀라운 깨달음 앞에 세계는 한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다. 517P
일상에 찌들어 생기를 잃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자연은 인간에게 소생의 원기를 불어 넣어준다.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때의 고금을 떠나서 자연이 예술의 변함없는 경배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연이 아무나 자신의 품에 끌어안는 것은 아니다.
대저 천하의 온갖 물건을 다 끌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은 부귀한 사람의 즐거움이다. 장송長松 그늘에서 다복한 풀을 깔고 앉아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를 듣다가 돌샘의 물을 떠 마시는 것은 산림에 사는 사람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산림에 사는 선비는 천하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간혹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따져보아 얻을 수 없어 그만둔 자는 물러나 이곳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저 부귀한 사람은 능히 온갖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오직 산수의 즐거움이 그것이다.
구양수가 <부사산수기>에서 한 말이다. 537P
실낙원의 비가悲歌
유선시遊仙詩
한나라 때 악부시<해로薤露>는 풀잎 끝에 맺힌 이슬만도 못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한다
풀잎 위 이슬
너무 쉽게 마르네.
내일 아침 이슬은 다시 내리겠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올 줄 모르누나. 557P
시사詩史 와 사시史詩
흰둥이 앞서가고 누렁이 따라가니
들밭 풀 주변에는 무덤들 늘어섰네.
제사 마친 늙은이는 밭 사이로 난 길에서
손자의 부축 받고 취하여 돌아오네.
이달의 <제총요祭塚謠>란 작품이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흰둥이가 컹컹 짖으며 저만치 앞서 간다. 누렁이도 뒤질세라 쫓아간다. 두놈의 장난을 쫓던 카메라가 그 뒤에 즐비하게 늘어선 무덤으로 초점을 당긴다. 다시 무덤들이 원경으로 밀려나면서 개 짖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이 나타난다. 해질 무렵 저녁 볕이 빗기는 가운데 술에 취한 할아버지와 부축한 손자의 모습니다.
슬픔을 느끼기에는 목가적이고 평화스럽다. 이 시의 주제는 뭘까? 할아버지와 손자는 누구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러 갔던 걸까? 할아버지는 왜 저물도록 무덤가를 맴돌다가 급기야 술에 취하고 말았나? 시의 주제를 인생무상쯤으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 속에는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없다. 소년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들이다. 시인은 시치미를 뚝 뗐지만 소년의 아버지야말로 바로 두 사람이 제사지낸 무덤의 주인공이었다. 579P
사랑이 어떻더냐
정시情詩
사랑은 아름답다. 슬퍼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슬프다. 평소 한시를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하던 이도 사랑을 노래한 정시情詩를 읽고는 뜻밖에라는 표정을 짓곤 한다. 흔히 염정시艶情詩 또는 향렴체香匳體라고도 불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정시를 감상해보자
비단 버선 물결 걷듯 사뿐사뿐 가더니
중문 한번 들어서곤 아득히 사라졌네.
다정할사 잔설이 그래도 남아 있어
그녀의 발자국이 담장 가에 찍혔구나.
강세황의 <노상소견路上所見>이란 작품이다. 앞서가는 어여쁜 아가씨의 뒷모습에 온통 마음을 뺐겼다. 저도 몰래 뒤를 쫓아왔건만 그녀는 무정하게 눈길 한 번 주는 법 없이 대문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 갈 길도 잊은 채 그는 서있다.혹시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담장 너머로나마 그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는 없을까. 두근대며 서성이다가, 채 녹지 않은 담장 밑 그늘의 잔설 위로 또렷이 찍힌 그녀의 발자국을 보았다. 눈 위의 발자국. 그녀가 남기고 간 발자국. 그러나 그녀가 밟고 간 것은 아무래도 눈이 아니라 그의 가슴이었던 것 같다. 607P
모란꽃 진주 같은 이슬을 머금으니
미인이 그 꽃 꺾어 창가를 지나간다.
방긋이 웃으면서 임께 하는 말
“꽃이 어여쁜가요, 제가 어여쁜가요?”
신랑은 일부러 장난치느라
“당신보다 꽃이 훨씬 어여쁘구려.”
그 말에 미인은 뽀로통해서
꽃가지 내던져 짓뭉개더니,
“꽃이 진정 저보다 좋으시거든
오늘 밤은 꽃과 함께 주무시구려.”
신혼의 사랑싸움을 재미있게 엮어냈다. 614P
한시와 현대시, 같고도 다르게
사동구이론尙同求異論
“낮은 소리 가만히 그리웠냐 물어보니, 금비녀 매만지며 고개만 까닥까닥.” 여기에 동양의 수법이 있다. 서양의 시인은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시도 잊을 수 없어요.” 하고 빨간 입술을 내밀었을 것이다. 어느 것이 낫다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표현방법에서도 동양의 수법은 신비롭다.
조히훈이 <또 하나의 시론>에서 한 말이다. 그가 말한 동양의 수법이란 한시의 수법이다. 직접 말하지 않는다. 다 보여주지 않는다. 이미지를 세워 대신 말한다. 현대시도 같다. 현대시와 한시는 여러모로 참 닮았다.
한시와 현대시의 관련을 찾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표현의 유사로 논하는 것이다.
김상용의<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감상한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갈이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1934년 <문장>지에 발표한 작품이다. 남쪽으로 창을 낸 집에서 고작 한참갈이의 작은 뙈기밭에 강냉이를 심고, 괭이와 호미로 파고 갈며 살고픈 소박한 바람을 노래했다. 구름이 언덕 너머의 세계로 나를 꼬여도 그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다. 630P
서로 그려 만나볼 길 다만 꿈길뿐이라
그대 날 찾아올 젠 나도 그댈 찾는다오.
원컨대 아마득히 다른 밤 꿈속에선
한때에 길을 떠나 길 위에서 만나요.
황진이의 한시 <상사몽相思夢>이다. 양주동 선생의 번역으로 더 유명하다.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그 임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이 뒤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지고.” 645~646P
모방에도 차원이 있다. 모동심이貌同心異의 모방이 있고, 심동모이心同貌異의 모방이 있다. 겉모습만 비슷하고 알맹이는 딴판인 것은 모동심이다. 하급의 모방이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데 알맹이가 같은 것이 심동모이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 있는 모방은 심동모이의 모방이다. 껍데기만 같으면 못 쓴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상동구이尙同求異다.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한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기에 같다는 말이다.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만나다. 한시와 현대시도 그렇다. 649P
3. 내가 저자라면
책의 목차와 전체적 뼈대에 대하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어왔을 시, 글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시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까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경험이고 또 방대한 내용의 정리라, 뭐라 평하기가 난감한 것이 지금의 내 마음이다.
우리의 풍습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로 주기 위하여 온 가족이 밤을 세워 소설을 필사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다고 한다. 주요 혼수품 목록에 필사본 소설책이었다는 이야기이다. 눈에 선하다. 출가하는 딸에게, 누이에게, 자매에게 한글자 한글자씩 온 가족이 필사를 하는 일. 그 책을 보면서 부모와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읽게 될 새색시의 모습도.
창작이라는 행위.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하는 작업은 아니다. 적어도 본 교재에 실려있는 한시들은 당시 글줄께나 하는 선비들의 전유물이었을 게다.
예를 들은 필사본 소설책도 양반가의 풍습이었겠지 싶다.
저자의 소신이 있는 선택, 대중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도 많이 어렵다. 특히 한자를 모르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목차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생각이 든다.
다만 한가지 생각은, 한시의 인용구를 보면 번역 글과 한자가 함께 적혀있다. 그리고 해설부분이 있다.
한시 원문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주석이나 부록으로, 음과 뜻이 함께). 읽을 줄 알고 그 뜻을 헤아려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한자가 한시에서 쓰여지는 의미, 느낌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감동적이었던 장절
비 개인 긴 둑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테나니
정지상(~1135)의 <송인送人>이란 작품이다. 정지상의 <송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심정을 절묘하게 포착한 작품이다. 떠난 이를 그리며 흘리는 눈물로 대동강 물이 마를 날 없다는 엄살은 허풍스럽기는커녕 그 곡진한 마음새가 콧날을 찡하게 한다. 이 섬세한 시심만으로도 과연 신운절창의 감탄은 있음 직하다. 다만 중국 사신들이 결정적으로 무릅을 치며 감타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2구의 ‘송군남포送君南浦’라는 표현에 있었다. 이 구절은 흔히 임을 남포로 떠나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남포란 단어에는 유장한 연원이 있다. 굴원屈原은 일찍이 <구가九歌> 중 <하백河伯>에서 “그대의 손을 잡고 동으로 가서, 고운 임을 남포에서 떠나보내네.”라고 노래한 바 있다. 그 뒤 많은 시인들이 실제 헤어지는 포구가 동포이든 서포이든 북포이든 간에 남포라고 말하곤 했다. 굴원의 이 노래가 있은 뒤로 ‘남포’란 말은 시인들에게 으레 ‘이별’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정운情韻이 담긴 말이 되었다.
위성의 아침 비가 가는 먼지 적시니
객사엔 파릇파릇 버들 빛이 새롭다.
그대에게 다시금 한 잔 술 권하노라
양관을 나서면 아는 이가 없을지니.
위성은 당나라 때 수도인 장안의 서쪽, 지금의 섬서성 함양시 동편 일대이다. 이른바 실크로드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당나라 때 장안에는 동쪽에는 파교가 있고 서쪽에는 위교가 있어, 동쪽으로 길 떠나는 나그네는 파교에서, 서쪽으로 길 떠나는 나그네는 위교에서 전별의 자리를 가졌다. 양관은 지금의 감숙성 돈황현에 있다. 당시에는 서역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황량한 사막 길을 오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인들은 이 길을 오가며 구슬픈 새하塞下의 노래를 불러 오늘까지 전하는 명편이 적지 않다.
작품을 감상해 보자. 여기서도 새봄을 재촉하는 빗속에 이별을 노래한다. 아침부터 내린 보슬비로 사람이 지날 때마다 길 위로 풀풀 날리던 먼지가 차분히 가라 앉았다. 그러나 실제로 촉촉이 젖은 것은 흙먼지이기보다 사랑하는 벗을 멀리 떠나 보내는 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비에 씻기어진 버들잎이 푸르다. 버들을 보면서 시인은 이별을 예감하고, 다시금 한 잔 술을 권한다. ‘다시금更進’이라 했으니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거나해질 만큼의 대작이 오갔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척박한 땅, 인적도 없는 사막을 지나 아득한 안서 땅까지 가야 할 벗이 이제 말에 오르려 한다. 이별이 아쉬운 시인은 “내 술 한 잔 더 받고 가게.” 하면서 소매를 잡는다. 양관 땅을 나서면 다시는 한 잔 술을 권해줄 벗은 없을 테니 하는 말이다. 붙잡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두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우리 옛 시조에,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임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란 것이 있다. 바로 이 정황에 꼭 맞을 듯하다. 2구에서 시인은 파릇파릇한 버들 빛을 헤아리며 이별을 예감한다. 당나라 때는 벗과 헤어지며 버들가지를 꺾어 이별의 정표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절류折柳’, 즉 ‘버들가지를 꺾는다’는 말에는 앞서 본 ‘남포’와 마찬가지로 ‘이별’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버들가지가 이별의 신표가 된 사정은 이러하다.버드나무는 꺾꽂이가 가능하다. 신표로 받는 버들가지를 가져다 심어두면 뿌리를 내려 새 잎을 돋운다. 보내는 사람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하는 심정으로 버들가지를 꺾어주었고, 또 꺾이어 가지에서 떨어졌어도 다시 뿌리를 내려 생명을 구가하는 버들가지처럼, 우리의 우정도 사랑도 그와 같이 시들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도 담겼다.
또 ‘류柳’의 중국 음은 머무른다는 의미의 ‘류留’와 똑 같다. 그러니 버들가지에는 가지 말고 머물러달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홍랑의 시조에, “멧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계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봄비에 새 잎 곳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라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당나라 때 시인 저사종은 <증별贈別>에서, “동성엔 봄풀이 푸르다지만, 남포의 버들은 가지가 없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남포’ 와 ’버들’ 이 이별을 상징하는 어휘로 동시에 쓰였다. 봄이 와서 풀은 푸른데, 떠나는 임에게 버들가지를 꺾어주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죄다 꺾어버려 남은 가지가 없다는 말이다. 126p
인간으로 사는 것과 사람으로 사는 것. 혼자로서의 나와 관계로서의 나.
혼자도 외롭지 않고 함께도 귀챦지 않은 삶이어야 자유로운 삶이라는 이야기가 새삼 와 닿는다.
인간으로의 삶에서 타인과의 감정의 교류가 가장 큰 기쁨을 주면서 고뇌를 안겨주는 일이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대머리가 될 지경인 대동강의 버드나무…ㅎㅎㅎ
나에게 버드나무에 대한 기억은 별다르다. 대학시절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동국대학을 찾았었다. 도서관 층간에 탱화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마 관세음보살형상이었지 싶다.
그 탱화의 버드나무……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일. 미풍에도 흔들리는 버드나무같이 중생을 살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의 서원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관세음보살의 서원誓願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은 늘 중생을 살핀다는 의미이다. 버드나무 가지가 진통제와 피부병 치료제로 쓰였던 점으로 보면 버드나무의 여러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보완점
한시의 높고 깊은 미학의 세계를 아주 조금 훔쳐본 느낌이랄까. 읽을수록 그 깊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를 보게 된다. 그리고 창작의 아픔도 본다. 아…교과서에 간간이 실렸던 작품들에서는 잘 몰랐던 아픔과 깊이를 느끼게 해준 한시미학산책…좀더 알고 싶은 탐구심에 한시 원문(음과 뜻이 기록된)이 실렸으면 한다.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옥편을 곁에 두고 읽지는 못했다. 인터넷을 찾는 정도. 내가 감으로 알고 있는 한자 정도였다.
잘 읽었습니다.^^
2차 레이스에서 읽어야할 책 제목을 받았을 때부터 한시미학산책에 대한 특별한 반가움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게다가 이길수님에게 시는 사랑이라고 하시니, 그런 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한자변환을 하시면서 즐거워하신 듯 합니다.
매일매일의 공부시간이 눈에 보이는듯 해 존경스럽니다. (그 과정을 좋아하신 듯 합니다.)
저자에 대해 저렇게 심층조사를 하셨군요.
아, 정민 선생님의 홈페이지도 있고, 본인 스스로 말한 정체성도 있구요.
후루룩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고, 링크해 주신 데 들어가 살펴보다 보면 더 많이 알게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압렵밥솥의 김이 다 빠졌으니 인제 밥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한 주 남은 레이스 밥 많이많이 드시고요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시를 좋아하시고,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적기도 하셨던 분의 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