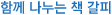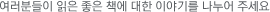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터닝포인트
- 조회 수 5369
- 댓글 수 4
- 추천 수 0
1. 저자에 대하여 - 정민
정민 교수는 그동안 한시, 한문학, 조선시대 지식인들에 관한 책을 꾸준히 내 왔다. 그 목록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시미학산책』(1996),『시대가 선비를 부른다』(1998),『책 읽는 소리』(2002),『비슷한 것은 가짜다』(2003),『미쳐야 미친다』(2004),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2006),『다산어록청상』(2007),『다산의 재발견』(2011),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2011) 등
정민 교수의 관심은‘사람’에 있다. 그 중에서도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을 연구하다 보니 18세기 학자들에게로 그의 관심이 넓어졌다. 그리고 그 관심의 확대가 고스란히 책으로 출판되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민 교수는‘심지 곧고 성실한 연구자’라 할 수 있겠다.
『한시미학산책』을 읽으며 독자의 입장에서 만난 그는 ‘친절한 정민씨’였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나타날라 치면 어느 샌가 나타나 설명을 풀어 놓았고, 한시의 해석에 끙끙대며 가슴이 답답해질 때쯤이면 가슴 툭 터지는 그림으로 위로해 주었다. 정민 교수는『한시미학산책』에서 시는 그 사람이라는 기상론(氣象論)을 언급했는데 나는 글을 보니 그의 성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절하고 따뜻한 스승, 후배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의 선배. 책에서 느낀 정민 교수는 내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마음속으로 들어 왔다.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연암이 이런 말을 했다. 시비와 이해의 두 저울이 있고, 행동에는 네 개의 결과가 나온다. 옳은 일을 해서 좋게 되는 경우, 옳은 일을 해서 해롭게 되는 경우.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 나쁜 짓을 해서 해롭게 되는 경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선택이다.
오늘날의 교육은 세 번째를 요구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고, 옳은 일을 하다 손해 보는 것은 바보라고 말한다. 교육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중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다. 황상은 두 번째의 길을 갔고, 이학래는 세 번째의 길을 갔다. 이 결과가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롭고 해로움의 문제 보다, 옳은 것의 가치가 인정받고 우선시 되는 사회를 강조하고 싶었다.
첫 번째 선택은 드물다. 두 번째는 싫다. 세 번째를 하려다가 네 번째가 되어 버리는 게 인생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판단에서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두느냐에서 삶이 엇갈린다. 내가 손해 보면서도 옳은 신념으로 버티는 힘을 공부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교편을 잡고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앞으로 직접 만나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민 교수의 책들을 읽으며 그와의 만남을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 8줄 이상 카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흐름상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내가 저자라면
- 글의 구성
<한시미학산책>은 동아시아의 한시 이론을 빌려 중국과 한국 한시를 주제, 형식, 작법에 따라 24개의 주제로 분석한 책이다. 중국의 두보, 이백은 물론이고 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정지상 등 국문학사를 장식한 대시인의 작품과, 계몽기의 언문풍월 등을 포함해 소재의 공간적ㆍ시간적 스펙트럼이 광대하다.
저자인 정민 교수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93년 12월 <현대시학>의 정진규 주간이 젊은 연구자였던 정민 교수에게 ‘옛 시인들의 한시 쓰기’에 대한 원고를 청탁한 것이 인연이 됐다. 그는 시인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94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현대시학>에 한시론을 연재했고 이 글들을 517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묶어 <한시미학산책>을 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24개의 강의로 구성된 <한시의 이해> 교양강좌.
정민 교수는 각 장에서 주제를 서두에 밝히는 양괄식을 택하고 있다. 먼저 이 장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명확히 한 후, 대가들의 시를 통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뒤 다시 한 번 그가 하고 싶었던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한시에 대한 기초지식이 일천하고 오래된 것은 재미없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대개의 일반인)에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 이유는 초반의 주제 설명을 통해 독자에게 한시를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이다. 한자도 한문도 제대로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한시를 감상하라고 억지로 읽히는 것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으니 이러한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한시에 거부감 없이 다가가게 하는 효과적 수단이라 평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양괄식 구성에서 초반의 주제설명이 설명한 바와 같이 독자를 위한 것이라면 후반의 주제 제시는 저자를 위한 부분으로, 저자는 마지막에‘이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한 거랍니다.’ 라고 다시금 주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괄식 구성은 스물네 개 각각의 장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이다.
구성면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 장마다 배치되어 있는 동양의 명화들이다. 저자는 주제 혹은 시와 가장 부합하는 그림을 배치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시와 해당 장의 주제를 음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 한시도 물론 좋았지만 이 그림들 또한 어찌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던지, 책을 읽으며 다음 그림에 대한 기대가 절로 됐었다. 별점 4점 이었던 구성점수가 5점 만점이 되는 순간이었다.
- 감동적인 장절
『에필로그 - 그대의 지금인 옛날: 통변론 通變論』 중
P. 659
그때의 지금인 옛날
《주역》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통하면 오래간다.’고 했다. 천지만물은 변화 유동한다. 한 시대가 가면 또 한 시대가 온다. 이 도도한 변화 앞에 옛것만 좋다고 우겨서야 될 일이 아니다. 새것은 또 옛것과 별개의 무엇인가? 그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과 저것이 다름을 확인함에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숨을 통하게 하여 오래 가게 만드는 일이다. 이른바 '통변通變'의 정신이 여기서 나온다.
P.660
옛것을 기준으로 지금을 보면 지금이 진실로 낮다. 그렇지만 옛사람이 스스로를 볼 때 반드시 자신이 예스럽다 여기진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보던 자도 또한 지금 것으로 보았을 뿐이리라. 세월은 도도히 흘러가고 노래는 자주 변한다. 아침에 술 마시던 자가 저녁엔 그 장막을 떠나간다. 천추만세는 지금부터가 옛날인 것이다.
연암의 〈영처고서〉일절이다. 천추만세는 지금으로부터가 옛날이다. 참 무서운 말이다. 옛날은 그때의 지금이었을 뿐이다. 지금은 훗날의 옛날이다. 현재에 충실하라. 그러면 그것이 훗날의 모범이 된다. 옛것을 맹종치 말라. 그 옛것도 그때에는 하나의 '지금'이었을 뿐이다. 세월은 흘러간다. 오늘의 주인공이 내일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지금'과 '여기'가 차곡차곡 쌓여 역사가 된다. 사람은 가도 문학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제가 오늘 되게 하고, 오늘이 내일 되게 하는 원형질이 여기에 담겨 있다.
P.662
사기의 불사기사
어떤 지금도 옛것의 구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옛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것을 어떻게 배울까? 그 껍질을 배우지 말고 정신을 배워야 한다. 당대唐代 고문古文운도을 제창한 한유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글을 지을 때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마땅히 옛 성현을 본받아야지." 그가 갸우뚱하면 다시 묻는다. "옛 성현이 지은 글이 다 남아 있지만, 그 말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신지요?" "하나도 같지 않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 정신을 본받아야지, 그 말을 흉내 내면 안 된다." 이른바 '사기의 불사기사 師基意 不師基辭'의 정신이다. 〈답유정부서〉에 보인다. 또 그는 옛사람의 정신을 본받되 '사필기출詞出己出', 즉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진언지무거陳言之務去', 진부한 표현을 내던지고 아류의 길을 버려 새 길을 열라고 주문했다.
P.669
이 책의 맨 처음을 연암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연암으로 끝을 맺겠다.
본분으로 돌아가라 함이 어찌 문장만이리오? 일체의 일이 모두 그렇지요. 화담 선생이 길을 가닥 집을 잃고 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더랍니다. "너는 왜 우는가?"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다섯 살에 눈이 멀어 이제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와 길을 가는데 갑가지 천지만물이 맑고 밝게 보이는지라 기뻐 돌아가려 하니, 골목길은 갈림도 많고 대문은 서로 같아 제 집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선생이 말했다. "내가 네게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도로 네 눈을 감아라. 그러면 바로 네 집을 찾을 수 있으리라." 이에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려 걸음을 믿고 도달할 수 있었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깔과 형상이 전도되고, 슬픔과 기쁨이 작용이 되어 망상이 된 것이지요.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수를 지키는 관건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보증이 됩니다.
〈답창애 答蒼厓 2〉이다. 20년 만에 눈이 열린 장님에게 다시 눈을 감으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기적같이 열린 광명한 세상을 거부하란 말인가? 연암이 던지는 이 새로운 화두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내가 나의 주인이 못 되고, 내 집을 찾아가지 못할진대 열린 눈은 망상이 될 뿐이다. 소화하지 못하는 지식을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눈뜬장님'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서구의 빛깔과 형상에 망상을 일으켜, 어느 골목이 바른 골목인지, 어느 대문이 제집인지도 모르고 길가에서 망연자실 울고 있는 눈뜬장님이었다. 연암은 간명하게 일러준다.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네 집을 찾으리라. 나는 그의 이 말을 외래의 것을 버려 자신의 소아 속에 안주하라는 말로 듣지 않는다. 주체의 자각이 없는 현상의 투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내가 본래 있던 그 자리, 미분화된 원형질의 상태로 돌아가라. 눈에 현혹되지 말라. 네 튼튼한 발을, 네 듬직한 지팡이를 믿어라. 갑자기 눈이 열리기 전 내 앞에 놓여 있던 세계, 익숙해져 있던 세계, 나와 사물 사이에 아무런 간극도 없던 세계로 돌아가라. 그 세계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래의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차차 새롭게 열리는 빛의 세계를 바라볼 일이다. 문학은 발전해왔는가. 아니다. 다만 변화해왔을 뿐이다. 다시 눈을 감아라. 먼저 네가 들어가야 할 대문부터 찾아라.
☞ 정민 교수는 마지막 에필로그 통변론을 통해 옛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옛것과 현재를 관통하는 원형질을 파악해서 껍질이 아닌 정신을 배우라 하고 있는 것이다. 되돌아 보면 《한시미학산책》은 정민선생이 하고 싶었던 이 말, '사기의 불사기사 師基意 不師基辭', '진언지무거陳言之務去'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같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옛 정신을 배워 나만의 길을 찾을 그 날을 위해 열심히 읽고 쓰고 생각해야겠다.
- 보완점
책을 읽으면서 한자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명심보감을 공부한 덕에 한문을 대강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일본어를 공부한 덕에 한자 실력도 나쁘지 않다고 자신해 왔으나 내게 <한시미학산책>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내가 이렇게 헤매는데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은 한문을 음미하는 한시 감상이 아닌 해석을 통해 읽는 한시감상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든 생각이 간단한 한문 독해법과 한시에 자주 쓰이는 한자가 부록으로 들어 있다면 책을 음미하기에도 한자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부록은 별책으로 편집해 모르는 한자가 나올 때 마다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편리할 것이란 생각이다.
3.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 한시미학산책
모든 장의 구절구절이 마음을 무찔러 들어와 정리하는 게 의미 없다.
지은이의 말
우리 전통 한시 작품과 이론 중에는 소중한 깨달음을 던져주는 값진 보석들이 많다. 특히 서구 문예이론에만 친숙해 있는 우리에게 한시의 높고 깊은 미학 세계는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서양의 경우, 미학가들 가운데 실제로 예술가였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반면 동양에 있어 미학은 시인 예술가들이 삶속에서 구분됨 없이 실천적으로 통합되어 추구되었다. 그르므로 이들이 던지는 미학적 물음에는 생생한 삶의 체취가 묻어난다.
첫 번째 이야기- 허공 속으로 난 길: 한시의 언어 미학
저 까마귀를 보라. 깃털이 그보다 더 검은 것은 없다. 하지만 홀연 유금(乳金)빛으로 무리지고, 다시 석록(石綠)빛으로 반짝인다. 해가 비치면 자줏빛이 떠오르고, 눈이 어른어른하더니 비췻빛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이를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고,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까마귀는 본디 정해진 색깔이 없는데,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버린다. 어찌 눈으로 정하는 것뿐이겠는가. 보지 않고도 그 마음으로 정해버린다. _연암 〈능양시집서 菱洋時集序)〉
연암은 이렇듯 시인에게 죽은 지식이나 고정된 선입견을 훌훌 털어버리고, 건강한 눈과 열린 가슴으로 세계와 만날 것을 요구한다.
P.18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뜨락에 이따금 새가 지저귄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쳤다. "이것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飛去飛來之字이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相鳴相和之書이로다." 오색채색을 문장이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나은 문장은 없을 것이다.
이른 아침 나무 그늘에서 노니는 새들의 날갯짓과 지저귐 속에서 연암은 글자로 쓰이지 않고 글로 표현되지 않는 문자를 읽는다. 옛 사람을 이를 '생취生趣' 또는 '생의生意'라 하였다. 말 그대로 살아 영동하는 운치인 것이다.
시는 언어의 사원이다. 시인은 그 사원의 제사장이다. 시는 촌철살인의 미학이다.
P.19
영양이 뿔을 걸듯
시인은 천기를 누설하는 자이다. 시를 쓰는 능력은 누구나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하지 않고 절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릇 시는 별도의 재주가 있다. 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에는 별도의 지취旨趣가 있다. 이치와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이치를 많이 궁구하지 않으면 지극한 경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른바 이치의 길에 빠지지 않고, 언어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윗길이 된다. 시라는 것은 성정을 읊조리는 것이다. 성당盛唐의 여러 시인들은 오직 흥취에 주안을 두어, 영양이 뿔을 거는 것과 같아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 까닭에 그 묘한 것은 투철하고 영롱하여 꼬집어 말할 수 없다. 마치 공중의 소리와 형상 속의 빛깔, 물속의 달, 거울속의 형상과 같아서, 말은 다함이 있어도 뜻은 다함이 없다.
'이치의 길에 빠지지 않고, 언어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언어에 끌려 다니지 말고 언어를 주재하라는 주문이다.
P.20
흥취를 지닌 시는 어떤 시인가. 그것은 투철하고도 영롱하여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엄우는 이를 다시 몇 가지 비유로 제시한다. 공중지음空中之音, 상주지색相中之色, 수중지월水中之月, 경중지상鏡中之象이 그것이다.
P.21
시인의 정신은 저만치 허공에 떠 있고 언어를 통해 수면 위에 그 정신의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다. 한 편의 훌륭한 시는 독자에게 느껴서 알게 할 뿐, 따져서 납득시키려 들지 않는다. 엄우는 '언유진이의무궁言有盡而意無窮'이란 말로 위 단락을 맺었다. 좋을 치면 종소리는 긴 파장을 내면서 허공으로 퍼져 나간다. 이렇듯이 시는 독자로 하여금 읽는 행위가 끝난 순간부터 정말로 읽는 행위를 시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의 언어는 젓가락으로 냄비 뚜껑을 두드리듯 해서는 안 된다. 범종의 소리와 같은 유장한 여운이 있어야 한다.
P.23
사물은 제 스스로 성색정경聲色情境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시인의 입과 손을 빌려 언어로 형상화될 뿐이라는 말이다.
시는 함축을 귀하게 여긴다. 시인이 직접 다 말해서는 안된다. 사물이 제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
P.31
다산 정약용도 〈초의승 의순을 위해 준 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뜻이 본시 낮고 더럽고 보면 비록 억지로 맑고 높은 말을 하더라도 알맹이가 없게 된다. 뜻이 좁고 비루하면 비록 툭 터진 말을 한다고 해도 사정이 꼭 들어맞지 않는다. 시를 배우면서 그 뜻을 온축하지 않는 것은 거름흙에서 맑은 샘물을 긷고, 고약한 가죽나무에서 기이한 향기를 구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번드르르한 거죽이 아니다. 속 알맹이다.
P.32
이명은 병인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화이니, 만약 그가 병 아닌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면 그 으스대는 양을 어찌 볼 것인가. 코골기는 병이 아닌데도 남이 먼저 안 것에 발끈하니, 정말 그의 병통을 지적해준다면 그 성내는 꼴을 또 차마 어찌 보겠는가.
두 번째 이야기 - 그림과 시: 사의전신론 寫意傳神論
P.41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예화는 모두 같은 원리를 전달한다. 즉, 그리려는 대상을 직접 보여주는 대신, 물 길러 나온 중, 말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나비, 난간에 기댄 소녀, 피리 부는 뱃사공, 남녀의 신발 한 켤레로 대신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나타내려는 본질을 감춰두거나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P.43
말하지 않고 말하기
요컨대 한 편의 훌륭한 시는 시인의 진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통학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로써 독자와 소통한다.
1920년대 이미지즘 시인 아치볼드 매클리시는 〈시의 작법Ars Poetica〉라는 시에서 "시는 의미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존재할 뿐이다. A Poem should not mean/But be"라고 했다. 그는 또 "시는 사실 그 자체를 진술해서는 안 되고 등가적이어야 한다. A Poem should be equal to/Not true"고 했다. 시는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경意境을 전달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P.45
시인이 시를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가운데서 불필요하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
P.50
다 말하지 않고 말하기, 다 그리지 않고 그리기, 시와 그림은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P.52
과장과 변형은 의경의 함축에 목적이 있다.
P.56
호리毫釐의 차이가 천 리의 현격한 거리를 낳는다. 이 이야기들은 기교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 속에 예리한 관찰과 예술가의 정신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P.59
관념화된 그림, 진정을 상실한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 정신은 간데없이 손끝의 기교만으로 그리려 드니, 난초를 그린다는 것이 파가 되고, 대나무를 그렸는데 갈대가 되고 만다.
화가가 형상을 핍진하게 묘사하거나, 시인이 대상을 방불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거기에 정신을 담는 일이다.
P.66
한 편의 훌륭한 시는 겉으로는 덤덤한 듯 하지만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그 행간에 감춰진 함의가 무궁하다.
아무리 훌륭한 뜻을 담고 있어도 올바른 표현을 얻지 못하면 읽는 이들은 외면하여 돌아보지 않는다. 또한 시는 본바탕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덕지덕지 화장한 여인의 분내를 경멸한다.
좋은 시는 독자에게 방심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허를 찔린 느낌을 준다.
세 번째 이야기 - 언어의 감옥: 입상진의론立象盡意論
P.72
본래 동양의 예술 정신은 다변과 요설을 싫어한다. 긴장을 머금은 함축을 소중히 여긴다.
P.73
실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는 부질없는 군더더기일 뿐이다.
P.76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글이다. 글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에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 말이 귀히 여기는 바는 뜻이다. 뜻에는 따르는 바가 있다. 뜻이 따르는 바는 말로는 전할 수가 없다."
'언어가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言不盡意.'는 생각은 고대로부터 널리 인식되어 왔다.
P.77
더는 나아갈 수 없는 깨달음은 말로는 가르쳐줄 수가 없다. 마음으로 깨달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이른바 심수상응心手相應이다.
P.78
내 혀가 있느냐?
"성인은 상象을 세워서 그 뜻을 다하고, 괘卦를 세워서 참과 거짓을 다하며, 문사를 이어서 그 말을 다한다."여기에서 '입상진의立象盡意'의 말이 나왔다. 말로 뜻을 다할 수 없다면 형상으로써 뜻을 전하라는 것이다.
P.90
시란 이와 같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와 닿아 있다. 무언가 꼬집어 말하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느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노래한다. 효용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저편에서 울려오는 떨림, 그 떨림의 미묘함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인간에게는 단지 입상을 통해서만 진의할 수 있는 묘오妙悟의 세계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이야기 - 보여주는 시, 말하는 시: 당시와 송시
P.98
무월은 〈논송시論宋詩〉란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시는 작약이나 해당처럼 짙은 꽃과 화려한 색채가 있다. 송시는 한매寒梅나 추국秋菊처럼 그윽한 운치와 서늘한 향기가 있다. 당시는 여지荔枝를 씹는 것처럼 한 알을 입 안에 넣으면 단맛과 향기가 양 볼에 가득 찬다. 송시는 감람橄欖을 먹는 것처럼 처음엔 떨떠름한 맛을 느끼지만 뒷맛이 빼어나고 오래 간다. 이것을 산수에 노는 것에 비유하면 당시는 곧 높은 봉우리에서 멀리 바라보매 의기가 드넓어진 것과 같고, 송시는 곧 그윽한 골짜기의 냇물을 찾아가 정경이 서늘한 것과 같다.
P.101
당시의 특징으로 거론한 '영묘影描'란 글자 그대로 그림자를 묘사하는 것이다.
'포진鋪陳'이라 함은 있는 그대로 펼쳐 진술한다는 의미이다.
당시가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취향이라면, 송시는 고전적이고 이성적인 취향이다.
"사람의 일생에서 소년 시절에는 재기가 발랄하여 마침내 당시의 기풍을 띠게 되고, 노년 시절에 이르면 사려가 깊어져서 송시의 시풍을 띠게 마련이다."
P.103
당음, 가슴으로 쓴 시
당시는 가슴으로 쓴 시이다. 여기에는 시인의 웃음과 눈물이 있어, 마음으로 전해오는 인간의 체취가 물씬하다. 이에 반해 송시는 머리로 쓴 시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싶고 담담한 과조와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조망이 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위안과 인간의 정신을 고원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에서 서정 함축을 중시하고 의흥意興이 뛰어난 시를 '당음唐音'이라 하고, 생각에 잠기고 이치를 따지며 유현한 맛을 풍기는 시를 '宋調'라고 일컬어 왔다.
P.111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알아 지저귀고 망울 부푸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구도의 깨달음도 이와 같다. 누가 알려주어서 관념으로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통연자득洞然自得, 활연관통豁然貫通해야 한다.
P.114
사람의 마음은 본디 순선純善하여 맑고 깨끗하기가 이슬 머금은 풀잎이나 일렁임 없는 수면과도 같다. 그러나 자꾸만 인욕이 끼어들어 순수를 잃게 만든다. 지금 시인은 제비가 물결을 차서 평정을 깰까 염려하듯 혹 자신의 삶에 인욕이 개입되어 본성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 시인이 표층에서 묘사하고 있는 외물은 시인이 전달코자 하는 내용의 표피에 불과하다. 그 안에는 깊고 유원한 사변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송시풍의 시는 이와 같이 담담한 가운데 깊이를 지녔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시가 대상 그 자체에 몰입함으로써 자연스레 시인의 정의情意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송시는 시인이 자신의 정의를 대상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
P.115
시는 우선 시가 되어야 한다. 당시와 송시의 구분이나 참여니 순수니 하는 변별은 그 다음 문제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이므로 좋고 싫음의 판단이 있을 뿐 우열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시인이 시적 언어의 규율을 무시하고 목청만 높이면 한때 대학가에 요란스레 나붙었던 대자보나 근엄한 목회자의 설교와 다를 바 없다. 시는 결코 관념의 퇴적장이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몽환적 어휘의 나열이나 이미지의 배합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혹세무민의 연금술사에 지나지 않는다. 시는 결코 독해할 수 없는 상형문자이거나 암호문일 수가 없다.
P.116
그러나 어찌하리. 현세에서 시인의 삶이란 곁에 누운 병든 아내의 신음처럼 고달프고 괴로운 것을. 그러고 보면 시란 까맣게 잊고 있던 신선세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피안의 세계를 향한 회귀의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 천상의 백옥루가 준공되었으나 상량문을 지을 사람이 없자 옥황상제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하李賀를 하늘나라로 불렀던 것처럼, 티끌세상의 귀양살이가 끝나 천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뱃속의 먹물이 다 마르도록 시인은 다만 깨어 노래할 뿐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 버들을 꺾는 뜻은: 한시의 정운미情韻味
P.121
남포란 단어에는 유장한 연원이 있다. 굴원은 일찍이 〈구가九歌〉중 〈하백河伯〉에서 "그대의 손을 잡고 동으로 가서, 고운 임을 남포에서 떠나보내네."라고 노래한 바 있다. 그 뒤 많은 시인들이 실제 헤어지는 포구가 동포이든 서포이든 북포이든 간에 남포라고 말하곤 했다. 굴원의 이 노래가 있은 뒤로 '남포'란 많은 시인들에게 으레 '이별'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정운情韻이 담긴 말이 되었다.
P.123
'기'는 글자 그대로 대상을 보면서 생각을 일으키고, '승'은 이를 이어받아 보충한다. '전'에서는 시상을 틀어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2구와 3구 사이에 단절이 온다. 그 단절에 독자들이 의아해할 때, 4구 '결'에 가서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완결된 구조를 이룬다. 3구에서 뜬금없는 강물 타령으로 화제를 돌려놓고, 4구에 가서 설사 강물이 자연적 조건의 변화로 다 마를지라도, 강가에서 이별하며 흘리는 눈물이 마르기 전에는 강물은 결코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P.125
2구에서 시인은 파릇파릇한 버들 빛을 헤아리며 이별을 예감한다. 당나라 때는 벗과 헤어지며 버들가지를 꺾어 이별의 정표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절류折柳', 즉 '버들가지를 꺾는다'는 말에는 앞서 본 '남포'와 마찬가지로 '이별'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버들가지가 이별의 신표가 된 사정은 이러하다. 버드나무는 꺾꽂이가 가능하다. 신표로 받은 버들가지를 가져다 심어두면 뿌리를 내려 새 잎을 돋운다. 보내는 사람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하는 심정으로 버들가지를 꺾어주었고, 또 꺾이어 가지에서 떨어졌어도 다시 뿌리를 내려 생명을 구가하는 버들가지처럼, 우리의 우정도 사랑도 그와 같이 시들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도 담겼다.
또 '류柳'의 중국 음은 머무른다는 의미의 '류留'와 똑같다. 그러니 버들가지에는 가지 말고 머물러달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홍랑의 시조에, "멧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계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고서. 봄비에 새 잎 곳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라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P. 129
그는 버드나무가 봄날의 서정을 촉진키는 환기물인 동시에 '이별과 재회에의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버드나무가 빈도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면, 그것은 봄날의 서정이나 이별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제일 많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P.130
가을 부채에 담긴 사연
'추선秋扇' 가을 부채는 한시에서 으레 '버림받은 여인'을 상징한다.
P.133
가을 부채가 버림받은 여인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것은 한나라 때 반첩여가 지은 〈원가행怨歌行〉이란 작품 때문이다.
제나라의 질 좋은 희 비단을 잘 말라서 둥근 합환선을 만들었다. 이를 임께 드리니 임은 늘 품속에 지니시며 더울 때 마다 부치신다. 그러나 혹 가을이 되어 더위가 수그러들면 임께서 이를 버리시지나 않을까 싶어 벌써부터 그녀는 한 걱정이다.
P.135
난간에 기대어
한시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중 하나가 누각 또는 난간에 기댄다는 말이다. 누각 위에는 왜 오르는가? 누각의 난간은 높은 곳에 있어, 그곳에서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난간에는 왜 기대는가? 기다림에 지친 까닭이다. 그래서 누각에 오르거나 난간에 기댄다는 뜻의 '등루登樓', '의루倚樓', 의란倚欄' 혹은 '빙란憑欄'등의 표현 속에는 '그리움'의 의미가 담긴다.
P.137
한시에서 '무제'를 표제로 내거는 것은 마땅히 붙일 만한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목을 붙이지 않은 채 오히려 독자의 적극적인 독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는 무제시는 이상은 이래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염정풍艶情風의 분위기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P.140
이해 못할〈국화 옆에서〉
어떤 시인이 부른 노래가 사람들의 정서를 파고들어 깊은 공감을 일으키면, 이것이 자주 여러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특정 단어 위에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정운이 얹힌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포南浦'나 '절류折柳', 그리고 '추선秋扇'과 '의루倚樓', '문적聞笛'들이 다 그런 예들이다. 한시에는 이런 정운이 풍부한 어휘들이 유난히 많다. 한시의 언어 특성상 이러한 어휘들은 시가 언어의 함축을 더욱 유장하고 깊이 있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시 감상에서 이러한 어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시를 전혀 엉뚱하게 곡해할 염려가 크다.
대개 특정의 어휘가 정운을 머금는 과정에는 동질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내적 교감이 전제된다. 같은 어휘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외국시를 읽을 때는 특히 이점이 어렵다. 이러한 어휘들은 시가 속에 감춰둔 암호와도 같아, 이것을 해독하지 않고는 그 시에 접근하는 통로를 열 수가 없다.
P.143
특정 어휘가 특수한 정운을 띠게 되면 요즘 식으로 말해 사은유 dead metaphor가 된다. 이것이 진부한 표현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시인은 늘 새로운 감성과 참신한 생각으로 이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진부한 것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 익숙한 것을 새롭게 만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시인의 창조적 정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마술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 즐거운 오독: 모호성에 대하여
P.150
오랑캐 땅의 화초
일상의 언어에서 의미는 어느 하나가 옳으며 나머지는 그른 것이 되지만, 시의 언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 대목에서 모호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면에서 시인은 이러한 언어의 모호성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다. 시 속에서 이러한 의미들은 오히려 풍부와 함축이 된다.
P.153
조선시대의 일이다. 어떤 고을 향시에 제목이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로 내걸렸다. 응시생들은 모두 와소군의 고사를 들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막상 장원에 뽑힌 작품은 덩그러니 제목을 네 번 반복해서 쓴 한 서생의 작품이었다.
오랑캐 땅 화초가 없다고 하나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엔들 화초 없을까? 胡地無花草
어찌 땅에 화초가 없으랴마는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네. 胡地無花草
어떤가? 같은 글자의 풀이가 모두 제각각이다. 한문 해석의 모호성을 말할 때 인용하곤 하는 이야기이다. 위 시는 흔히 김삿갓의 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P.158
《논어》〈위정爲政〉에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니라.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 是知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원문을 소리 내어 읽으면 꼭 제비가 지지배배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비가 《논어》를 안다고 하는 말도 있었다. 이렇듯 모호성은 문화적 교양이나 문학 관습을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즉각 손뼉이 터져 나왔을 대목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한시는 여백이 있고 이것은 모호성을 만든다. 이 모호성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에 바탕한 각기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시의 멋이 그리고 재미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P.172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인이 언어의 미로 위에 숨겨놓은 코드를 독자가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진진한 지적·감성적 여정이어서 때로는 오독도 즐겁다. 시인을 부러 말꼬리를 흐려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독자는 잠시 멍해 있다가 다시 코드를 찾아 나선다. 설사 가다가 길을 잠시 잃은들 어떠랴. 아니, 애초부터 길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일곱 번째 이야기 - 사물과 자아의 접속: 정경론情景論
P.175
경물은 이렇듯 시인의 눈 속에서 어느 순간 정으로 착색된다. 숲과 구름이 한데 합쳐지듯 경과 정은 하나로 결합되어 분리할 수가 없다.
명나라 때 사진은 《사명시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景은 시의 매개이고, 정情은 시의 배아다. 이 둘이 함하여 시가 된다. 몇 마디 말로 만 가지 형상을 부려서 원기가 혼성渾成하니 그 넓음이 가없다." 무심히 경물과 마주하여 마음속에 정이 일어난다. 경이 정의 매개가 되는 까닭이다. 가슴에 자욱한 정을 품고 경을 바라보면 무심한 경물이 내 마음의 빛깔로 물든다. 정은 경에 의미를 불어넣는 배아인 셈이다. 정만으로는 시가 되지 않는다. 경만 가지고 시가 되는 법도 없다.
P.179
정수경생, 촉경생정
양재楊載가 《시법가수詩法家數》에서 한 말이다. "경을 묘사함은 경 가운데 뜻을 머금고, 일 가운데 경을 보여주어야 한다. 섬세하며 맑고 담백해야지, 진부하거나 교묘하면 못 쓴다. 뜻을 묘사할 때도 뜻 가운데 경을 담아 의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경우費經虞는《아론雅論》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시는 정을 일으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다고 편편마다 정을 마구 늘어놓으면 마침내 제멋대로가 된다. 시는 경이 핍진함을 높이 친다. 다만 작품마다 경을 펼치면 조잡하고 천박해진다." 정과 경의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서로 긴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좋은 시다.
P.180
"사람이 천하를 널리 보지 못하면 시가 국한되고 만다."
P.183
간밤 비 맞아 꽃을 피우곤 花開昨夜雨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누나. 花落今朝風
슬프다 한바탕 봄날의 일이 可憐一春事
비바람 가운데서 오고 가노매. 往來風雨中
조선 중기 송한필의〈우연히 읊다〉이다. 1구와 2구는 다섯 글자가 정연한 대구를 이루었다. 꽃을 피운 것은 간밤의 비인데, 꽃을 떨어뜨린 것은 오늘 아침 바람이다. 참 얄궂다. 겨우 내 씨눈을 아끼고 부풀려 어렵사리 꽃 피운 보람이 무색하다. 시인이 이를 '가련可憐'으로 압축했다. 한 봄의 일이 비바람 가운데 오간다. 우리네 인생도 풍파 속에 덧없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겨를도 없이 허망하게 진 꽃잎이 세사에 어디 한둘이겠는가? 바람은 언제나 딴 데서 불어온다. 그 심술을 탓하기엔 꽃잎의 힘이 너무 여리다. 떨어진 꽃잎을 보고 정이 촉발되어 '일춘사'가 '일생사'로 확장되었다. 뭔가 행간이 있는 시다.
P.184
이정입경, 경종정출
심웅이 《고금사화》에서 말했다. "정은 경 때문에 그윽해진다. 정이 너무 두드러지면 의경이 노출된다. 경은 정으로 인해 아름답게 된다. 경만 있게 되면 엉기어 막히고 만다." 왕창령은 《시격詩格》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시가 뜻만 말하면 맑지 않아 맛이 없고, 경만 말해도 또한 맛이 없다. 모름지기 경과 뜻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좋다." 문제는 언제나 정과 경의 조화다.
문 앞 수레와 말 연기처럼 흩어지니
정승의 번화함이 백 년을 못 갔구려.
깊은 골목 적막해라 한식이 지났는데
해묵은 담장 가에 수유꽃이 피었네.
최경창의 시〈대은암 남지정의 옛집에서〉룰 읽어 보자. 대은암은 남곤의 옛 집이다. 기묘사화 때 수많은 선비들이 그의 손에 죽었다. 그가 잘나가던 시절엔 청탁하려는 수레와 말로 골목길이 미어졌다. 지금은 그때의 번화함이 흔적도 없다. 그 알량한 권세와 영화를 누리자고 뜻 높은 선비들을 그다지도 죽였던가. 남곤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쓴 시문을 다 불사르고 죽었다. 시에서 정은 경을 앞지른다. 준엄한 나무람을 앞세움 후 뒤를 경으로 받쳤다. 한식 지난 골목길, 묵은 담당 너머로 노란 수유꽃이 버짐 피듯 피었다. 다 부질없다고, 흩어지고 남은 것은 춘추에 더러운 이름분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P.189
정경교융, 물아위일
육시옹은 《시경총론詩鏡總論》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을 잘 말하는 자는 말이 깊은 듯 얕고 드러날 듯 감추어져서 그 마음의 무한함을 깨닫게 한다. 경을 잘 말하는 자는 형용함을 생략한 채 약간만 보태도 참모습이 또렷하고 생기가 넘쳐난다." 드러낼 듯 감추는 데서 정의 맛이 깊어진다. 시시콜콜한 묘사를 버리자 경이 한층 살아난다. 사실 녹아든 정과 경의 경계를 갈라 구분해내기는 쉽지가 않다.
집 모퉁이 하얖게 피어난 배꽃
화사함 지난해와 다름없구나.
봄바람 묵은 병이 애처로운지
약 달이는 창가로 바람 보낸다.
정렴의 〈배꽃梨花〉이란 작품이다. 봄기운을 타고 집 모퉁이에 배꽃이 활짝 피었다. 적막하던 마당이 환하니 밝다. 꽃은 지난해와 다름없는데 주인의 쇠락은 좀체 회복될 기미가 없다. 긴 병 끝에 맞은 꽃잔치는 마음 한구석에 애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래도 아직은 실망하지 말라는 듯, 추운 겨울을 견뎌 활짝 핀 꽃처럼 어서 빨리 회복하라고, 봄은 약탕관 위로 살랑살랑 바람을 보낸다. 어김없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무상을 되새기는 정조가 애틋하다. 물아일체의 호흡이 따뜻하다.
P.198
'시언지詩言志', 즉 시가 뜻을 말한다는 말은 《시경詩經》이래 가장 친숙한 시의 정의다. 시란 무엇인가? 품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뜻은? 나아가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는가? 문제가 여기까지 미치면 다소 복잡해지지만 위진 이전의 고시들은 영물보다는 영회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서거정은 《동인시화東人詩話》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뜻이란 마음이 가는 바이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장계가 《세한당시화歲寒堂詩話》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는 것이 시인의 본뜻이다. 사물을 노래하는 것은 시인의 여사餘事일 뿐이다."라고 한 것도 의미가 같다. 이제 경물 묘사 없이 정의의 표출만으로 이루어진 시를 몇 수 감상해 보기로 하자.
자장자장 우리 아가 울지 말아라
울타리 바로 옆에 살구꽃 폈다.
꽃 지고 살구가 곱게 익으면
너랑 나랑 둘이서 같이 따먹자.
아양연의 〈아가야 울지마라〉이다. 자장자장 자장가에 울던 아기가 방긋 웃는다. 아기의 웃음이 활짝 핀 살구꽃 같다. 저 꽃같이 예쁘게 무럭무럭, 토실토시 건강하게 자라다오. 손자를 안고 어르는 할아버지의 흐뭇한 꿈이 꽃처럼 벙긋벙긋 피어올라 살구처럼 영글어간다. 아기는 어느새 쌔근쌔근 꿈나라 속이다. 한시에서도 이런 호흡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 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건네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눈 앞에 영상이 펼쳐진다.
형님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던가
아버님 생각나면 형님을 뵈었었네.
오늘 형님 보고파도 어데 가 만나볼까
의관을 정제하고 시냇가로 나가본다.
박지원의 〈연암협에서 세상을 뜬 형님을 생각하며〉이다. 형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아버님 뵙듯 형님을 따랐다. 이제 형님마저 세상을 뜨니 어디 가서 그 모습을 볼 것인가. 가만히 의관을 갖춰 입고 시냇가로 나가본다. 시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려 함이다. 덤덤한 듯 별 말 하지 않았으되, 그리움이 메아리쳐 긴 울림을 남긴다.
P.202
진정한 시법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최후의 '현관玄關'이 있다. 그 현관 앞에 서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 문을 여는 법은 아무도 일러줄 수가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제 손으로 직접 열고 들어가야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 일자사一字師 이야기: 시안론詩眼論
P. 205
원매가 《수원시화》에서 “시는 한 글자만 고쳐도 경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도 다 같은 뜻이다.
한 글자가 시를 죽이고 살린다.
경구와 과주는 강물 하나 사이인데
종산은 몇 겹산을 격하여 서 있도다.
봄바람은 강남 언덕에 또다시 푸르건만
밝은 달은 언제나 가는 나를 비추려나.
왕안석王安石이 고향을 그리며 지은 시다. 홍매洪邁가 오나라의 한선비 집에 전해오던 초고를 보았다. 3구의 ‘춘풍우록강남안 春風又綠江南岸’이 처음엔 ‘춘풍우도강남안春風又到江南岸’으로 되어 있었다. 왕안석은 ‘도到’자 위에 ‘불호不好’라고 쓰고 ‘과過’자로 고쳤다. 다시 ‘입入’자로 고쳤다가 ‘만滿’자로 되고쳤다. 이같이 하기를 10여 차례 되풀이해서 겨우 ‘록綠’자로 결정하였다. 봄바람을 공감각적으로 초록이라 표현하자. 그저 봄바람이 강남 언덕에 이르렀다거나, 지난다거나, 가득한다는 등의 표현이 밋밋하기 짝이 없다. 봄바람이 강남 언덕 위로 불어 지나가자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순식간에 초록비츠로 변해버리는 경쾌한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용재속필 容齎續筆》에 보인다.
P.207
송나라 때 어느 원벽院壁에 두보의 <곡강에서 비를보며 曲江對雨>란 시가 저혀 있었다. “숲속 꽃잎 비 맞으니 연지가 촉촉한 듯 林花着雨臙脂濕”이라 한 구절의 마지막 ‘습濕’자가 떨어져 나갔다. 소식과 황정견과 진관과 불인 등이 제각기 ‘윤潤’과 ‘로老’, ‘눈嫩’ 과 ‘락落’으로 채웠다. 윤기난다, 시들었다, 곱다, 떨어지다 등의 표현도 좋지만 확실히 원시의 ‘습濕’이 주는 선명하고 촉촉한 느낌만은 못하다.
P.208
여러 글자를 차례로 원시에 대입시켜보면 의경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진다. 각 표현의 질량을 저울질하고 정서를 감별해낼 수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상승의 시인이다. 명나라의 사진은 시인이 한 글자의 선택을 위해 심혈을 쏟는 것을 모자 고르기에 비유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급하게 모자를 사려고 시장에 들어가 여러 개를 꺼내놓고 하나하나 써보면 반드시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모자 고르는 법을 쓸 수만 있다면 시안詩眼은 공교롭지 않음이 없다.
하나하나 골라 써보고 거울에 비춰 비교하듯, 글자를 바꿔 넣을 때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음미할 수 있어야 시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P.209
뼈대와 힘줄
정진규의 <몸시 26>에는 ‘자안字眼’이란 부제가 붙었다. “입술이든 자궁이든/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다른 곳으론 들지 않겠고/ 오직 네 눈으로만 들겠으며/ 세상의 모든 빗장도 그렇게 열겠다/ 술도 익으면 또록또록 눈을 뜨거니/ 달팽이의 더듬이가 바로 눈이거니/ 너와 함께 꺽은 찔레순이/ 바로 찔레의 눈이거니/ 모든 것엔 눈이 있거니/ 나는 오직 그리로만 들겠다.”고 하였다. 정말이지 시에도 눈이 있다. 시의 빗장을 옳게 열려면 시의 눈, 즉 시안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P.210
청나라의 유희재는 시안이란, 시의 어느 글자가 좋고 어느 구절이 뛰어나다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시의 핵심이 집중되어 ‘신묘한 빛이 엉겨 붙은 지점 神光所聚’을 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안은 글자 그대로 시의 눈알이다. 시안은 시에서 가장 정채롭고 시인의 정신이 집약된 지점, 하나만 건드려도 나머지가 따라 움직이는 일동만수 一動萬隨‘의 경락이다. 시안은 단순히 수사적으로 자구를 단련하는 기교의 문제가 아니다. 시가 예술의 의경미 意境美’를 형성하는 핵심처인 것이다.
P.213
한 편의 시에서 시안은 어디에 있는가? 《여씨동몽훈 呂氏童蒙訓》에서 반빈로는 7언시는 제5자가 울려야 하고, 5언시는 제3자 울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울린다響’는 것은 힘이 결집된 곳을 말한다면서 향자론響字論을 주장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언시의 경우 세 번째 글자가, 7언시는 다섯 번째 글자가 안자가 되는 수가 많다. 잠삼의 “외론 등불 나그네 꿈을 사르고, 다음이 소리 향수를 다듬질하네. 孤登燃客夢, 寒杆搗鄕愁.”의 ‘연燃’자나, 허혼의 “만 리의 산천에서 새벽꿈을 나누니, 이웃 노랫소리에 봄 근심을 전송하네. 萬里山川分曉夢, 四隣歌管送春愁”의 ‘분分’자가 모두 그렇다. 5언시의 경우 2·3으로 끊어 읽고, 7언시는 4·3으로 끊어 읽는다. 이때 제3자와 제5자는 이 둘의 경계에 놓인 글자다. 말하자면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묶는 자리다. 결합의 양상에 따라 의경이 달라진다. 이는 의미의 단위이면서 리듬의 한 매듭이다. 또한 흔히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놓인다. 위 예시에서 ‘고등孤燈’과 ‘객몽客夢’은 별개의 어휘인데, ‘연燃’자가 이를 매개함으로써 둘은 하나로 묶인다. 나그네는 등불을 밝혀둔 채 깜빡 잠이 들었다. 그가 고향 꿈을 꾸는 사이 ‘고등孤燈’만 외로이 그리움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안의 위치가 늘 일정한 것은 아니다. 시구의 다양한 어법 변화 만큼이나 유동적이다. 시안이 항상 제자리가 정해져 있다면 굳이 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지 않은가. 맹호연의 “기운은 운몽택을 푹푹 찌는데, 물결은 악양성을 흔들어대네. 氣蒸雲夢擇, 波撼奸岳陽성\城.”는 각 구절의 두 번째 글자가 안자다. 두보의 “시절 느껴 꽃보아도 눈물이 나고, 이별 한해 새소리에 마음 놀라네.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에서처럼 넷째 자가 안자가 되기도 한다.
P.220
일자사의 미감원리
일자사의 첫 번째 미감 원리는 ‘의미의 중복을 피하다.’는 것이다.
이 절제된 경지를 한유는 이렇게 말했다. “풍부하되 한 글자도 남지 않고, 간략하되 한마디도 빼먹지 않는다.” 한 글자만 더하거나 빼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글, 그런 시를 쓰라는 주문이다.
P.223
두 번째 미감 원리는 ‘여운을 남기고 후응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P.225
정지상과 김부식도 안자사에 얽힌 알화를 남겼다. 김부식이 정지상의 재주를 시기해서 죄로 얽어 죽였다. 김부식이 하루는 이런 시를 지었다.
버들은 천 실이 푸른 빛이요 柳色千絲綠
복사꽃은 만 점이나 붉게 피었네 桃花萬點紅
그러자 공중에서 홀연 정지상의 귀신이 나타나 김부식의 빰을 때렸다. “천사와 만점이라니, 네가 세어보았는가? 어찌 ‘버들은 실실이 푸르고, 복사꽃은 점점이 붉도다. 柳色絲絲綠, 桃花點點紅’라 하지 않는가?” 과연 ‘천千’과 ‘만萬’으로 한정짓는 것보다 ‘사사絲絲’와 ‘점점點點’의 모호가 한결 넉넉하다. 실실이 푸른 버들가지와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복사꽃의 정취를 어찌 숫자로 한정지을 수 있겠는가. 이규보의 《백운소설 白雲小說》에 실려 있다.
P.227
세 번째 미감 원리는 ‘시상詩想의 온유돈후를 중시하라’는 것이다 감각적 직설보다는 에둘러 말하는 데서 온건한 맛이 깊어진다. 모난 말보다는 각지지 않은 표현에서 중후한 체취가 풍겨난다.
P.230
시안은 꼭 한글자만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나라의 유희재는 《시개 時槪》에서 자구의 단련은 활처活處의 단련이라야지 사처死處의 단련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활처를 포착하는 관건은 시아을 찾아내는 데 달려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시안에는 시집 전체의 눈도 있고, 한 편의 눈도 있다. 몇 구절의 눈도 있고, 한 구절의 눈도 있다. 몇 구절로 시안을 삼는 경우도 있고, 한 구절로 시안을 삼는 경우도 있으며, 안두 글자로 시안을 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안의 의미 범주는 크게 확장된다. 시안론은 자칫 시인에게 수사적 기교에 탐닉케 하기 쉽다. 이때 유희재의 지적은 시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통쾌함이 있다. 청나라의 오대수도 그의 《시벌》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지금 사람은 시를 논하면서 한두 글자에만 천착한다. 이를 가리켜 옛사람의 시안이라 하니, 이것은 사안死眼이지 활안活眼이 아니다.” 나아가 그는 시에서 정채가 서려 얽힌 영롱한 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살아 있는 눈, 즉 활안을 포착하게 된다고 했다.
P.213
시인은 시안을 연마할 때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시안은 시안을 감추는 ‘장안 藏眼’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사물을 꿰뚫어보는 혜안과 통찰력 없이 그저 남의 눈이나 놀라게 만드는 수사적 기교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아홉 번째 이야기 - 작시, 즐거운 괴로움: 고음론 苦音論
P.235
예술과 광기
대상을 향한 미친 듯한 몰두 없이 위대한 예술은 이룩되지 않는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 했다. 미쳐야 미친다. 비록 하찮은 기예라 해도 자신을 온전히 잊는 몰두가 있어야 비로소 성취를 말할 수 있다. 예술의 천재들에게는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광기가 있다. 그들 안에서는 열정이 뿜어내는 거친 호흡과 다른 사람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느껴진다.
P.237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 잗다란 기교쯤은 까맣게 잊어라. 정신의 뼈대를 하얗게 세우고, 영욕도 득실도 생사까지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P.240
늙음이 오는 것도 모르고
권필은 평생 벼슬길에 몸담지 않았다. 이를 안타까이 여겨 벼슬을 권하는 벗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내게는 고서 여러 권이 있어 홀로 즐기기에 족하고, 시는 비록 졸렬하지만 마음을 풀기에 족하며, 집이 비록 가난해도 또한 막걸리를 댈만하다네. 매번 술잔 잡고 시를 읊조릴 때면 유연히 스스로 얻어 장차 늙음이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하니, 저 이러쿵저러쿵하는 자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타고난 시인 기질을 어쩌지 못해 불의를 좌시하지 못했다. 부딪치는 일마다 얼음에 숯 같았다. 시 지을 때만은 늦음이 장차 이르는 것조차 까맣게 몰랐으니, 그는 삶의 의미를 시 속에서 찾았던 타고난 시인 이었다.
-> 나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게 될까? 아니면 이미 찾았을까?
P.241
당나라의 천재 시인 이하는 매일 아침 파리한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섰다. 나귀 등에는 낡아 해진 비단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길가다 시상이 떠오르면 즉시 써서 주머니 속에 넣곤 했다. 저물어 돌아오면 그 어머니가 계집종을 시켜 주머니를 꺼내보았다. 써놓은 것이 많으면 “이 애가 심장을 다 토해야만 그만두겠구나.” 하면 한숨 쉬었다. 이하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쪽지를 가져다가 정성스레 먹을 갈아 또박또박 옮겨 썼다. 그러고는 다른 주머니에 담아 보관하였다. 술에 크게 취하거나 초상이 있는 날이 아니면 언제나 이같이 했다. 예전 원고는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렇듯 작시에 골몰한 나머지 건강을 해쳐 그는 스믈일곱 살의 아까운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죽기 전 비단 옷 입은 사람이 나무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말했다. “옥황상제께서 백옥루가 완공되어 그대를 불러 상량문을 짓게 하려 하신다.” 그는 얼마 뒤에 죽었다. 그후 세상 사람들은 아까운 인재가 요절하면, 천상에 또 백옥루가 완공된 모양이라고 말하곤 했다.
P.196 나빙 인물산수책
P.215 김홍도 백매
P.218 김홍도 주상관매도
P.263 열 번째 이야기 - 즐거운 손님, 시마
앞서 이규보의 〈시벽〉을 소개하며 시마에 대해 말했다. 여기서는 시마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시마는 ‘시 귀신’이다. 시마는 어느 순간 시인에게 들어와 살면서 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를 생각하고 시만 짓게 하는 귀신이다. 시마가 한번 붙으면 다른 일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시에만 몰두하게 된다. 더욱이 짓는 시마다 절창 아닌 것이 없다. 시마는 시인에게 즐거운 괴로움을 선사하는 모순적인 존재다.
☞ 아... 나에게는 ‘書魔’가 붙은 것일까? 반차까지 내고 책을 읽고 있는.. 그리고 회사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읽어야 할 책이 생각나 집중할 수 없는 요즘 정말 내게는 ‘書魔’가 붙었나보다.
P.276 김홍도 소림명월도
열 네 번째 이야기 - 놀이하는 인간: 잡체시의 세계 1
P.385
이상 간략히 층시와 회문시, 신지체 등으로 불리는 잡체시들을 몇 수 살펴보았다. 이 모두 한자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창작들이다. 물론 장난기가 다분히 서려 있지만, 적어도 내용 면에서는 진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마치 겉으로 그럴 듯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물건들을 숨겨둔 숨은 그림 찾기와 유시하다. 언어로 유희하는 퍼즐 놀이인 것이다. 이 밖에도 절로 무릎을 치게 하는 절묘한 잡체시가 수없이 많다.
조지훈의 〈백접白蝶>
밤 꽃 불 슬 고 정 가 병 하 너 조 기 가 작 꽃 별 노 한
진 다 픈 요 가 슴 들 이 는 촐 쁜 슴 은 피 섬 래
가 피 히 로 에 거 얀 갔 히 노 가 葬 는 겨
리 지 운 눈 라 花 구 사 래 은 送 밤
라 눈 물 아 瓣 나 라 숨 되 譜
물 지 픈 고 잊 진 진 고
고 가 운 히 白 뒤
슴 喪 지 蝶
章 안
아 는
가운데를 접으면 마치 한 마리 나비 모양이다. 일부러 9자구를 생략하여 나비 날개의 가운데 부분을 형상화했다. 시를 회화적 형상으로 나타내려는 시도는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 신기하고 재밌다.
P.370
회문시 중에는 글자를 하나씩 밀려서 읽는 것도 있다. 다음은 찻주전자에 흔히 써넣는 〈다호시茶壺詩〉이다. '가이청심야可以淸心也'라는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 이를 한 글자씩 밀면서 읽으면 이렇게 된다.
마음을 맑게 할 수가 있고 可以淸心也
맑은 마음으로 마셔도 좋다. 以淸心也可
맑은 마음으로도 괜찮으니 淸心也可以
마음도 맑아질 수가 있고 心也可以淸
또한 마음을 맑게 해준다. 也可以淸心
둥근 찻주전자에 돌려가며 쓴 글이라 사실 어느 글자부터 읽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 글자부터 읽더라도 뜻이 통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것은 '자자회문시字字廻文詩'라고 한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 실험정신과 퍼즐풀기: 잡체시의 세계 2
P.400
청나라 때 문인 사치엄이 9세에 현시에 응시했다. 현령이 다음 구절에 대구를 맞추게 했다.
한가로이 문 가운데 달은 보면서 閒看門中月
사치엄이 즉각 응대했다.
생각은 마음속의 밭을 간다오. 思耕心上田
'한閒'은 글자모양이 '문門' 가운데 '월月'이 들어가 이는 모양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思'는 '심心'위에 '전田'을 얹은 꼴이다. 대구가 절묘하다.
P.409
오늘날 잡체시가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언어의 부단한 실험정신, 질곡을 만들어놓고 그 질곡에서 벗어나기, 언어의 절묘한 직조가 보여주는 즐거움 외에도 잡체시는 오늘의 시단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준다. 젊은 시인들이 실험하고 있는 각종의 형태시들은 기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전통의 재현일 뿐이다. 세상은 돌도 돈다. 이 모든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수없는 상호 텍스트화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열여섯 번째 이야기 - 말장난의 행간: 한시의 쌍관의雙關義
P.420
광해군 때 평양 관찰사 박엽이 손님과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다. 장기수가 자꾸 막히자 머쓱해진 박엽은 곁에서 시중 들던 기생 소백주에게 그러고만 있지 말고 노래나 한 수 지어 불러보라 했다. 소백주가 낭랑하게 시조 한 곡조를 뽑았다.
상공相公을 뵈온 후에 사사事事를 믿자오매
졸직拙直한 마음에 병들까 염려러니
이리마 저리차 하시니 백년동포百年同胞하리이다.
나는 당신을 만나 뒤로 모든 일을 당신께 의탁하고자 해도, 혹 임의 마음이 변해 나를 버리시면 어쩌나 하여 병이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리 하마 저리하자는 딴청만 하시니, 그러지 말고 함께 품어 백년해로하자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읽고 말 일이 아니다. 시조의 원문을 가만히 읽어 보니 장기판의 짝패인 상象·사士·졸卒·병兵·마馬·차車·포包의 음이 다 들어 있다. 그 뿐 아니다. 더 음미해보면 절묘하게도 지금 그녀는 능청스레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으리! 저쪽에서 상象으로 공격해올 때 두 사士를 믿으셨던 모양인데, 졸卒이 있기는 해도 병兵으로 쳐들어올까 걱정입니다. 마馬를 이리로 옮기시고 차車를 저리로 뽑으시면 그 뒤에는 포包가 버티고 있어 끄덕없을 것이옵니다." 깜찍하고 맹랑하다.
☞ 접대하기도 바쁜 시간. 언제 훈수를 둘 만큼 장기에 신경 쓰며, 쌍관의를 갖는 시조를 지을 수 있었을까... 대단한 재치다.
스무번째 이야기- 산과 물의 깊은 뜻: 산수시
P.537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떳떳한 삶의 모습을 일깨워준다. 일사에 찌들어 생기를 잃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자연은 인간에게 소생의 원기를 불어넣어준다.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때의 고금을 떠나서 자연이 예술의 변함없는 경배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연이 아무나 자신의 품에 끌어안는 것은 아니다.
P.538
요산요수의 변
공자가 《논어》에서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 이후로 산수에서 노니는 일은 자못 철학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 주자는 공자의 이 말을 이렇게 풀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여 두루 통해 막힘없는 것이 물과 같으므로 물을 좋아한다. 어진 사람은 의리에 편안하여 중후하여 옮기지 않는 것이 산과 같기에 산을 좋아한다."
자공子貢이 물었다.
"선생님, 군자는 어째서 큰 강물과 만나면 반드시 바라보곤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물을 덕德에 비유한다. 두루 베풀어 사사로움이 없으니 덕과 같고, 물이 닿으면 살아나니 인仁과 같다. 낮은 데로 흘러가고 굽이치는 것이 모두 순리에 따르니 의義와 같고, 얕은 것은 흘러가고 깊은 것은 헤아릴 수 없으니 지智와 같다. 백 길이나 되는 계곡에 다다라도 의심치 아니함은 용勇과 같고, 가늘게 흘러 보이지 않게 다다르니 살핌과 같으며, 더러운 것을 받아도 사양치 아니하니 포용함과 같다. 혼탁한 것을 받아들여 깨끗하게 하여 내보내니 사람을 착하게 변화시킴과 같다. 그릇에 부으면 반드시 평평하니 정正과 같고, 넘쳐도 깎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법도와 같고, 만 갈래로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꺾이니 의지와 같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큰 물을 보면 반드시 바라볼 뿐이다."
☞ 나는 산보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공자의 말이 반갑다. 이제 왜 물이 더 좋냐면 해야할 말이 생겼다.
한나라 유향劉向의 《설원說苑》에 나온다. 원래 《순자荀子》〈유자 宥坐〉에 실린 글을 유향이 더 부연했다. 물의 여러 속성을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덕목과 나란히 견주었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여 으뜸가는 선을 물에 견준 일이 있다. 물은 언제나 낮고 더러운 것에 처하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 노자는 물에서 '유약겸하柔弱謙下'의 교훈을 읽어, 처세훈의 요체로 삼았다.
P.540 정선, 대좌관폭
여보게! 저 폭포 좀 보아. 겁도 없이 제 몸을 내던지네그려.
우리는 너무 비겁하게 살았어. 아등바등 전전긍긍 설설 기며 살았어.
P.541
산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고 다 산수시가 아니다. 산수와 인간이 만나 나누는 교감이 있어야 한다. 산수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수 쪽으로 향해 가서 어느덧 물아 物我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동화가 있어야 한다.
스물한 번째 이야기 - 실낙원의 비가: 유선시
P.557
풀잎 끝에 맺힌 이슬
인간에 낙원은 있는가? 낙원은 없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절망과 비탄의 연속일 뿐이다.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사랑하던 사람마저 하나 둘 떠나보낸 후 빈 들녘을 혼자 헤매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뒤돌아보면 뜻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다.
P.558
도연명도 이런 비탄을 금하지 못했다.
인생이란 마치도 꿈과 같은 것 人生似幻化
종당에는 허무로 돌아가거늘. 終當歸虛無
닫힌 세계 속의 열린 꿈
P.560
유선시는 고대인이 꿈꾼 상상의 세계를 노래한다. 그것은 아득한 은하수 저편 아홉 층의 하늘을 지나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황금 궁전이거나, 동해 너머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거대한 여섯 마라 거북이가 등에 업고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상상의 섬 삼신산으로 나타난다. 아니면 서쪽 하늘 건너편 아득한 그곳, 하늘에 맞닿을 듯 솟아 있는 옥으로 된 곤륜산도 있다 곤륜산의 둘레에는 새의 깃털조차 가라앉아버린다는 약수弱水란 강물이 300리에 걸쳐 흐른다. 날개가 아니고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곤륜산 정상에는 요지瑤池란 연못이 있어 밤에 천상에서 신선들이 용이나 기린, 또는 봉황을 타고 내려온다. 그곳의 주인은 서왕모西王母이다. 그녀가 주재하는 파티가 밤마다 열린다. 안주는 한 알을 먹으면 3,000년을 살 수 있다는 반도蟠桃나 1,000년쯤 너끈한 안기생安期生의 대추이다. 술은 옥玉을 녹여 고은 경장瓊漿 또는 안개의 수분을 빚어 걸러낸 유하주流霞酒다. 입는 옷은 어떤가. 동해의 일곱 빛깔 무지개 실을 자아 지은 옷이다. 천의무봉이라 바느질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P.566
선계의 형상은 현실에서의 억압이 역으로 투사되어 열린 세계로의 비상을 꿈꾼 결과다. 꿈은 무의식의 세계이다. 인간의 의식이 한계에 도달할 때 무의식이 열린다. 무의식의 세계는 원초적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 상징은 좌절되었던 본능적 충동을 만족시키려는 욕구와 관련된다. 이러한 상징들은 꿈을 통해 신비한 세계를 열어 보임으로써 현실에서 상처받고 왜소해진 자아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소생시켜준다.
P.571
이러한 관념의 밑바닥에는 개인의 힘의 한계를 훨씬 웃도는 현실에 대한 우울한 비관주의가 가라앉아 있다. 스스로를 적선으로 생각할 때 유선 행위는 언젠가 자신의 속해 있었던 잃어버린 낙원, 또는 본향으로의 귀환이며, 동시에 불완전한 현재에서 완전했던 과거로의 회귀라는 성격을 띤다.
P.572
현세에서 득의가 주어졌더라면 이들은 결코 선계를 꿈꾸지 않았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하계를 향한 혐오감의 표현은 반동형성에 의한 양가감정의 투영이다. 현실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선계는 미화되고 하계의 모습은 일그러져 나타난다.
P.576
선계로의 비상은 이카로스의 날개를 연상시킨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는, 날개를 만들어 태양 가까이까지 날아올랐다가 날개가 녹아 떨어져 죽었다. 한계를 초월코자 하는 비상의 욕구는 결국 죽음의 형벌을 부르고 말았다. 초월의 소망을 담은 유선의 행위가 현실의 새로운 비전과 연결괴지 못한다 해서 선계를 향한 꿈 자체를 배격할 필요는 없다. 실현될 수 없다 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이 배격되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절망이요 공포가 아닐 수 없다. 유선의 과정에서 만끽한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해방감은 세속적 가치의 무의미함과 인간 존재의 왜소함을 새삼 인식케 함으로써 현실의 불우와 모순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준다.
유선시는 '중세적 꿈꾸기'의 산물이다. 이러한 꿈꾸기는 허망한 몽상이나 환상이 아니다. "문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꿈을 꿀 수가 있다. 문학이 다만 실천의 도구일 때, 사회는 꿈을 꿀 자리를 잃어버린다. 꿈이 없을 때 사회 개조는 있을 수 없다." 김현의 이 말은 바로 유선시에서 '중세적 꿈꾸기'가 갖는 의미를 매우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의 혈관 속에 내재한 원초적 상징들을, 까맣게 잊고 있던 그 기호들을 유선시는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스물두 번째 이야기 - 시와 역사: 시사詩史와 사시史詩
P.583
시로 쓴 역사, 시사
시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시의 거울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바람과 애호나이 그대로 떠오른다. 한 편의 시는 방대한 사료로 재구성한 어떤 역사보다 더 생생하다. 사람들은 이를 일러 시사詩史라 한다. 맹계孟棨가 《본사시本事詩》에서 말했다. "두보가 안녹사의 난리를 만나 농촉 지방을 떠돌며 시 속에 이때 일을 모두 진술하였다. 본 것에 미루어 감춰진 것까지 남김없이 서술하였으므로 당시에 이를 이럴 시사라 하였다." 이것이 시사란 말의 첫 용례이다. 이 때 두부는 기주 지방까지 떠돌며 많은 시를 남겼다. 뒷사람들은 그곳에 시사당詩史堂을 세워 두보의 화상을 걸어놓고 그의 시정신을 기렸다.
P.585(한자 보충)
흔히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을 말할 때 백골징포白骨徵布니 황구첨정黃口簽丁을 말한다. 이러한 폐단이 낳은 비극을 노래한 다산 정약용의 〈애절양哀絶陽〉을 감상해 본다.
갈밭 마을 젊을 아낙 곡소리 구슬프다
현문縣門 향해 울부짖다 하늘에 호소하네.
구실 면제 안 해줌은 있을 수 있다지만
남근을 잘랐단 말 듣도 보도 못하였소.
시아버진 세상 뜨고 아이는 갓난앤데
삼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렸구나.
억울함 하소해도 문지기는 범과 같고
이정里正은 고래고래 소마저 끌고 갔네.
칼 갈아 뛰어들자 피가 온통 낭자터니
아들 낳아 곤경 당함 제 혼자 한탄한다.
잠실蠶室의 궁형이 어이 잘못 있었으랴
민 땅의 자식 거세 진실로 슬프고나.
자식 낳고 사는 이치 하늘이 준 바여서
건도乾道는 아들 되고 곤도坤道는 딸이 되네.
말 돼지 거세함도 가엽다 말하는데
하물며 백성이 뒤 이을 일 생각함이랴.
부잣집은 일 년 내내 풍악을 울리면서
쌀 한 톨 베 한 치도 바치지 않는구나.
다 같은 백성인데 어찌 이리 불공평한가
객창에서 자꾸만 시구편을 읊는다네.
다산이 강진 유배 때 직접 보고 들을 사실을 시로 쓴 것이다. 노전蘆田사는 백성이 아들을 낳았다. 이정이 사흘 만에 찾아와 군적에 올리고 세금 대신 소를 빼앗아갔다. 그는 방에 뛰어 들어가 "내가 이것 때문에 곤액을 당한다."며 칼을 뽑아 가지의 남근을 스스로 잘라버렸다. 그 아내가 남근을 들고 관가로 가니 피가 아직 뚝뚝 떨어졌다. 문지지가 가로막아 하소연조차 하지 못했다. 그나마 이들은 벌써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군포도 꼬박꼬박 내고 있던 터였다.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의 사망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산사람에게 청구하듯 군표를 계쏙 받는 것이다. 황구첨정은 출생신고를 갓 마친 아이에게 징집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눈도 뜨지 못한 핏덩이더러 빨리 입대하든지 군포를 내라고 야료를 부린다. 집안에 장정이라곤 남편 하나뿐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난 지 사흘밖에 안 된 핏덩이의 군포를 독촉하다 이정은 목숨보다 중한 소를 끌로 가버렸다. 눈이 뒤집힌 가장은 칼을 뽑아 이정을 찌르지도 못하고 애꿎은 자신의 남근을 자르고 말았던 것이다. 《목민심서》는 이렇게 말한다. "심하게 배가 불룩한 것만 보고도 이름을 짓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 강아지 이름을 혹 군안에 기록하지, 이는 사라믜 이름이 아니라 정말 개다. 절굿공이의 이름이 혹 관첩에 나오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절굿공이이다." 웃어야 할 일인가, 울어야 할 일인가. 어쨌건 삼정의 문란을 말할 때 당시 이를 증명하는 어떤 통계수치보다도 우리는 이 〈애절양〉한 편을 통해 그 시대 백성의 절규를 실감으로 듣는다. 시는 이렇게 역사가 된다.
P.601
사시史詩 또는 영사시는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쓴 시다. 차고술금借古述今, 옛일을 끌어와 지금을 말하는 것은 한시의 오래 관습이다. 시인은 맥없이 옛일을 들추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우회 통로를 찾고 있다.
P.603
역사란 무엇인가? 현재의 퇴적일 뿐이다. 지금 시대의 자취를 일러 후세는 옛날이라 한다. 그렇다면 굳이 지나간 옛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겠다. 지금 여기 충실하면 그것이 곧 옛날이다. 시사는 시인의 충실한 증언이 뒷날의 역사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사시는 시인이 과거의 거울에 비춰 현재를 읽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어제의 태양은 오늘도 그대로 뜬다. 지나간 역사가 오늘을 비추는 등불인 까닭이다.
스물네 번째 이야기 - 한시와 현대시, 같고도 다르게: 상동구이론
P.629
동서양의 수법 차이
"낮은 소리 가만히 그리웠냐 물어보니, 금비녀 매만지며 고개만 까닥까닥低聲~."여기에 동양의 수법이 있다. 서양의 시인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시도 잊을 수 없어요."하고 빨간 입술을 내밀었을 것이다. 어느 것이 낫다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표현 방법에서도 동양의 수법은 신비롭다.
조지훈이〈또 하나의 시론〉에서 한 말이다. 그가 말한 동양의 수법이란 한시의 수법이다. 직접 말하지 않는다. 다 보여주지 않는다. 이미지를 세워 대신 말한다. 현대시도 같다. 현대시와 한시는 여러모로 참 닮았다.
*깔밋하다: 1.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아담하고 깔끔하다. 2.손끝이 야물다
*헤살: 1.일을 짓궂게 훼방함. 또는 그런 짓.2.물 따위를 젓거나 하여 흩뜨림. 또는 그런 짓.
P.645
서로 그려 만나볼 길 다만 꿈길뿐이라
그대 날 찾아올 젠 나도 그댈 찾는다오.
원컨대 아마득히 다른 밤 꿈속에선
한때에 길을 떠나 길 위에서 만나요. - 황진이〈상사몽相思夢〉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 임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 뒤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 양주동
☞ 가곡으로 먼저 알게 된 한시. 너무 반가워 적어둔다. 황진이가 이 시를 지었을 줄이야!
P.649
모방에도 차원이 있다. 모동심이의 모방이 있고, 심동모이心同貌異의 모방이 있다. 겉모습만 비슷하고 알맹이는 딴판이 것은 모동심이다. 하급의 모방이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데 알맹이가 같은 것이 심동모이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 있는 모방은 심동모이의 모방이다. 껍데기만 같으면 못 쓴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상동구이尙同求異다.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한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기에 같다는 말이다.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만난다. 한시와 현대시도 그렇다.
에필로그 - 그대의 지금인 옛날: 통변론通變論
P.654
지금과 옛날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 시간의 강물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깊은 밤 연구실에 앉아 백광훈의 시를 번역하다가, 권필의 시를 소리 내어 읽다가 몇백 년 전 그들과 어제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가 울면 나도 울고, 그가 웃으니 나도 좋다. 회심會心의 글귀와 쾌재快哉의 문장을 만나면 공연히 마음이 설렌다. 옛것이 어째서 오늘에 감동을 주는가? 그들은 내가 아닌데 왜 나와 같을까? 그와 나를, 그들과 미당을, 그들과 목월을 이어주는 원형질은 무엇일까? 저 1920년대의 시조부흥운동도 좋고, 이즈음의 생활시조운동도 소중하다. 하지만 형식의 복고에 앞서 이 원형질을 찾아나서는 일이 우선해야 할 것 같다. 형식은 변한다. 생각도 변한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이 강산, 이 흙 밟고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민 정서는 세월로도 씻을 수 없는 원형질로 남는다.
P. 659
그때의 지금인 옛날
《주역》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통하면 오래간다."고 했다. 천지만물은 변화 유동한다. 한 시대가 가면 또 한 시대가 온다. 이 도도한 변화 앞에 옛것만 좋다고 우겨서야 될 일이 아니다. 새것은 또 옛것과 별개의 무엇인가? 그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과 저것이 다름을 확인함에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숨을 통하게 하여 오래 가게 만드는 일이다. 이른바 '통변通變'의 정신이 여기서 나온다.
P.660
옛것을 기준으로 지금을 보면 지금이 진실로 낮다. 그렇지만 옛사람이 스스로를 볼 때 반드시 자신이 예스럽다 여기진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보던 자도 또한 지금 것으로 보았을 뿐이리라. 세월은 도도히 흘러가고 노래는 자주 변한다. 아침에 술 마시던 자가 저녁엔 그 장막을 떠나간다. 천추만세는 지금부터가 옛날인 것이다.
연암의 〈영처고서〉일절이다. 천추만세는 지금으로부터가 옛날이다. 참 무서운 말이다. 옛날은 그때의 지금이었을 뿐이다. 지금은 훗날의 옛날이다. 현재에 충실하라. 그러면 그것이 훗날의 모범이 된다. 옛것을 맹종치 말라. 그 옛것도 그때에는 하나의 '지금'이었을 뿐이다. 세월은 흘러간다. 오늘의 주인공이 내일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지금'과 '여기'가 차곡차곡 쌓여 역사가 된다. 사람은 가도 문학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제가 오늘 되게 하고, 오늘이 내일 되게 하는 원형질이 여기에 담겨 있다.
P.661
예전 창힐은 천지만물의 형상을 살펴 글자를 만들었다. 그가 글자를 만들자 밤에 천둥번개가 치고 귀신이 울었다고 옛 기록은 적고 있다. 천기가 누설됨을 슬퍼한 것이다. 시인의 정신은 마땅히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시인은 자신의 노래로 귀신이 울게 해야 한다. 제자 안연이 젊은 나이에 죽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망치는 구나!'하며 아프게 울었다. 하지만 남긴 글이 없으니 그의 상쾌한 정신은 만나볼 길이 없다. 내가 만일 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그가 나였다면? 시인의 기상은 모름지기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창힐의 정신으로 안연의 마음을 담는다면 옛날과 지금의 경계는 더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때'의 '지금'이었던 왕희지의 글씨가 후대 서가書家의 기준이 되듯, '오늘''여기'서 부르는 내 노래는 뒷날 시가詩家의 보석이 된다.
P.662
사기의 불사기사
어떤 지금도 옛것의 구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옛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것을 어떻게 배울까? 그 껍질을 배우지 말고 정신을 배워야 한다. 당대唐代 고문古文운도을 제창한 한유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글을 지을 때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마땅히 옛 성현을 본받아야지." 그가 갸우뚱하면 다시 묻는다. "옛 성현이 지은 글이 다 남아 있지만, 그 말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신지요?" "하나도 같지 않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 정신을 본받아야지, 그 말을 흉내 내면 안 된다." 이른바 '사기의 불사기사 師基意 不師基辭'의 정신이다. 〈답유정부서〉에 보인다. 또 그는 옛사람의 정신을 본받되 '사필기출詞出己出', 즉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진언지무거陳言之務去', 진부한 표현을 내던지고 아류의 길을 버려 새 길을 열라고 주문했다.
P.668
한유가 말한 '정신을 배울 뿐 표현은 본받지 않는다'는 원리를 환기한다면 우리가 한시를 통해 퍼 올릴 수 있는 샘물은 무궁무진하다. 기갈에 바짝 타는 목을 축이고 더위에 찌든 몸에 상쾌한 등목을 해줄 수 있다. 가야 할 미지의 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다. 짧은 두레박줄을 길게 늘이고, 먼 길에도 부르트지 않도록 들메끈을 고쳐매야 할 것이다.
P.669
이 책의 맨 처음을 연암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연암으로 끝을 맺겠다.
본분으로 돌아가라 함이 어찌 문장만이리오? 일체의 일이 모두 그렇지요. 화담 선생이 길을 가닥 집을 잃고 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더랍니다. "너는 왜 우는가?"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다섯 살에 눈이 멀어 이제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와 길을 가는데 갑가지 천지만물이 맑고 밝게 보이는지라 기뻐 돌아가려 하니, 골목길은 갈림도 많고 대문은 서로 같아 제 집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선생이 말했다. "내가 네게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도로 네 눈을 감아라. 그러면 바로 네 집ㄹ을 찾을 수 있으리라." 이에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려 걸음을 믿고 도달할 수 있었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깔과 형상이 전도되고, 슬픔과 기쁨이 작용이 되어 망상이 된 것이지요.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수를 지키는 관건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보증이 됩니다.
〈답창애答蒼厓 2〉이다. 20년 만에 눈이 열린 장님에게 다시 눈을 감으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기적같이 열린 광명한 세상을 거부하란 말인가? 연암이 던지는 이 새로운 화두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내가 나의 주인이 못 되고, 내 집을 찾아가지 못할진대 열린 눈은 망상이 될 뿐이다. 소화하지 못하는 지식을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눈뜬장님'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서구의 빛깔과 형상에 망상을 일으켜, 어느 골목이 바른 골목인지, 어느 대문이 제집인지도 모르고 길가에서 망연자실 울고 있는 눈뜬장님이었다. 연암은 간명하게 일러준다.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네 집을 찾으리라. 나는 그의 이 말을 외래의 것을 버려 자신의 소아 속에 안주하라는 말로 듣지 않는다. 주체의 자각이 없는 현상의 투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내가 본래 있던 그 자리, 미분화된 원형질의 상태로 돌아가라. 눈에 현혹되지 말라. 네 튼튼한 발을, 네 듬직한 지팡이를 믿어라. 갑자기 눈이 열리기 전 내 앞에 놓여 있던 세계, 익숙해져 있던 세계, 나와 사물 사이에 아무런 간극도 없던 세계로 돌아가라. 그 세계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래의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차차 새롭게 열리는 빛의 세계를 바라볼 일이다. 문학은 발전해왔는가. 아니다. 다만 변화해왔을 뿐이다. 다시 눈을 감아라. 먼저 네가 들어가야 할 대문부터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