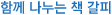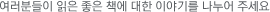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햇빛처럼
- 조회 수 14516
- 댓글 수 2
- 추천 수 0
이 주전 일요일 아침에 라디오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었다. 책 읽어 주는 남자 장진 감독이라는 분이 소개를 해 준 책이다.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새 책들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속독의 유혹을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것이 요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집어준 책이다.
=
장면1.
그날 초대 손님으로 나온 권해효씨와 장진 감독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권해효씨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하여 말을 한다. 대학교 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최소한 A4 용지 서너장은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다.
책을 읽었지만 그 정도로 내 생각을 정리할 정도로 깊게 읽어본 적은 크게 없는 것 같다. 그게 나의 문제였다.
장면 2.
얼마전 "미"와 "용"의 결혼 때문에 동기들과 사부님이 만났을 때 사부님은 여러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그 중의 하나가 아무 자료도 없는 강연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흔히들 요즘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강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강의를 갔다온 사부님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야기 할 내용들이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본인의 몸을 통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릴 수 있었다.
좋은 글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지만 입에서만 혹은 머리에서만 맴돌 때 나 자신의 무엇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재료들을 발효시켜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서 내 뱉을 수 있을 때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닐까?
장면 3.
학창시절의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언제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짧았고 끝에 가서는 밤샘을 하지 않으면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들은 늘 남아 있었다. 일년전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참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잘 하는 과목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못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내신 성적을 잘 받도록 조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보다 최종성적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나는 수학을 참 좋아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렵고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이 쉬운 시험에서는 저 앞에 링크 되다가 그 반대일 때는 상당히 쳐지게 되는 그런 진폭이 심한 그런 전략적이지 못한 공부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록 내신은 잘 못 받았을 지 몰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
내가 다 보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 내가 했던 생각과 태도가 오늘 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마리를 주는 것 같다. 시험범위까지 다 보지 못한 과목들에 대하여 밤을 샐 것인가 아니면 자고 일어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언제나 자는 것을 택했던 것 같다. 자고 일어나서 볼 수 있는데 까지 보자. 보지 않은 문제들은 포기하고 공부를 한 범위의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최상의 성적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내가 본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쏟아지는 책에 대하여 유지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한다.
=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의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책은 “단 한 권을 읽더라도 뼛속까지 완전하게 빨아들여라”라는 말로 슬로리딩을 권장하고 있다. 슬로리딩은 단순하게 천천히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읽는 책을 자신의 것으로 삼키고 소화를 시키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으로 읽혀진다.
내가 책에 대하여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상기 시켜준 책이다.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연하게 만난 책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자주 한다. 그것이 작가의 이야기 처럼 저자의 의도를 오독하는데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오독은 오히려 권장을 한다.
나의 책에 대한 문제가 책을 너무 읽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읽은 책 조차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 준 책이다. 책에서 읽은 좋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러 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임을 깨달을 때가 많아졌다. 책을 거울로 사용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책 읽기가 나에게 체질적으로 맞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오늘도 여전히 책꽂이 앞에서 읽지 못하고 사놓은 책들 사이에서 헤매겠지만 오늘도 인터넷 서점에서 또 무슨 책이 나왔는지 헤맬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이 읽은 것을 내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기본임을 마음에 새긴다.
저도 한 때는 콩나물키우기를 비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콩나물을 키울 때 물만 주는데 물에 담궈놓는 것이 아니라 물을 위에서 뿌려주면 구멍 뚫린 시루로 바로 내려가지요. 그런 물을 가지고 콩나물은 자라게 되지요. 속독 혹은 비슷한 분야의 책을 여러권 읽는 것은 콩나물키우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한 책을 여러권 읽는 것과 한 책을 숙독을 하는 것 모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맞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이제서야 저는 히라노게이치로의 방법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게 더 편안하고요.
그렇게 느낀 이유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말에 내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채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백번 머리로 알고 암기하고 남에게 충고를 하는 것보다 결국 그 내용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