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정화
- 조회 수 4206
- 댓글 수 5
- 추천 수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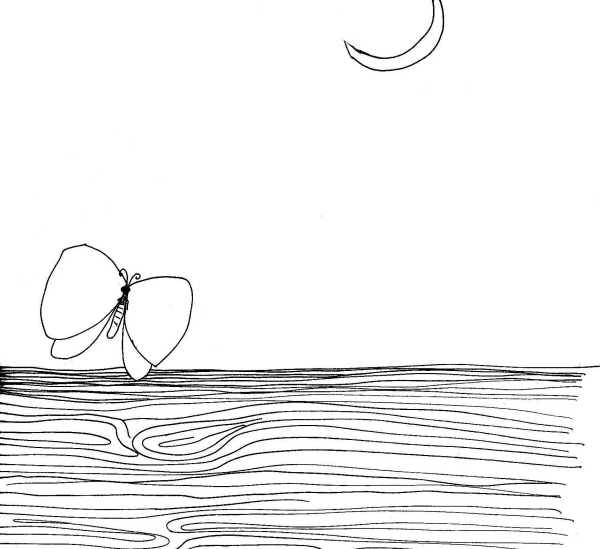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를 듣다가 2010.02.08.에 그린 그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를 듣다가 그렸다. (2010.02.08 그림)
첫째 연이 이렇게 시작한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는 이렇지 않은데, 시를 듣는 내게는 겨울바다는 이렇다.
내가 아는 겨울바다는 외롭고 춥고, 또 겨울바다를 나는 새는 갈매기 조나단 처럼 힘찰거란 생각이 들었었다.
김남조님의 '겨울바다'의 마지막 연은 이렇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이렇기 때문에 겨울바다를 찾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게 아닐까.
날고 싶다.

김소월의 시 '산유화'를 듣다가 2010.02.11 그림
내가 알고 있던 산유화와 상품으로 만들어진 산유화는 달랐다. '산유화'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검색해 보니 '풍년초' 닮은 꽃을 그린 손수건과 티셔츠가 나왔다. 그와 짝을 이룬 것은 김소월의 다른 시 '진달래꽃'이었다.
내가 품고 있었던 산유화의 이미지는 진달래꽃이나 철쭉꽃 종류였는데 충격이었다. 철쭉이 산유화의 그 꽃이 아니라면 어떤 꽃일까하고 꽃사진들을 검색해 보고 그 중에 수수하고 '저만치 멀리서 피어 있을' 법한 것으로 골랐다.
왠지 산 속에 피어 있는 꽃은 그럴 것 같다.
저만치 멀리서 피어 있는 꽃.
보는 이가 없어도 피는 꽃.
'아주 깊은 산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산에서, 커다란 나무 하나가 쓰러졌어.
아주 커다란 나무여서 쓰러지는 데 소리가 무척 컸어.
그런데, 거긴 너무나 깊은 숲속이라 그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어.
그럼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났을까?'
이것에 대해 전에 들었던 답은 그 나무가 쓰러질때는 아무 소리가 안났다'였다. 그러나 나는 이 답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산에는 꽃이 피기 때문이다.
수많은 나뭇가지에 가려져 꽃이 핀다 해도, 보는이가 없어도, 산에는 꽃이 핀다.
내가 아는 산유화는 그렇다.
===
읽거나, 듣거나, 보게 되면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다. 글로 기록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게는 '그림그리기'라는 행위가 필요하다.
낙서교실의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두려워하고 못그리는 이유를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셨다. 우리가 '눈으로 먹고는 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밥을 먹었으면 싸는 것이 당연하듯이, 봤으면 느꼈으면 그리던가 쓰던가 자기 밖으로 그것을 다시 배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안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연구원 몇명과 모임을 가졌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방안을 얘기해보라고 했다. 그동한 하고 싶었던 것을 연결해서 말했다. 100일 창작이란 것을 하고 싶어서 멤버를 모으고 있는 중이서 그걸 떠올렸다. 그림으로 일기를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까짓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과 매일 글 쓰는 사람도 있는데, 매일 그리는 게 뭐 대수야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작하는 사람들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짜증도 많이 났었고 해서 '100일동안 100장의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선언해 버렸다.
어쩌면 200,300장을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난 그저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 그동안 눈으로 이미지를 사냥하던 것을 사냥을 하면 그것을 먹어서 그림으로 배출하고 싶다.
이미지 사냥을 한다고 훌터보는 그림책을 베껴그리고, 들렀던 장소를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그려보고 싶다. 어디까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려보고 싶다. 그냥 좀 그림과 놀고 싶다. 그림때문에 내 자신에게 짜증나는 거 좀 풀고 싶다.
댓글
5 건
댓글 닫기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