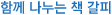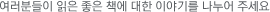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승완
- 조회 수 14054
- 댓글 수 4
- 추천 수 0
첼로의 거장인 파블로 카잘스는 <첼리스트 카잘스, 나의 기쁨과 슬픔>에서 “내 일은 내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첼로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음악 인생을 끝장낼 뻔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01년 미국 연주 여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카잘스가 친구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어느 산을 오를 때 큰 바위가 그를 덮쳤습니다. 카잘스는 가까스로 바위를 피했지만 바위가 그의 왼손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왼손은 첼로의 현을 누르는 손이었습니다. 피투성이인 그의 손을 보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꾸준한 치료와 연습을 통해 그의 손은 넉 달만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고에 대한 카잘스의 반응입니다. 망가진 손을 보고 그에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아이구 다행이다, 이제 다시는 첼로를 켜지 않으면 되겠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음악과 첼로 연주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즐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魂)을 쏟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재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쏟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카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악은 수도꼭지처럼 켰다가 금방 잠가버릴 수 있는 어떤 것 아니라, 완전한 자기 전체성으로 다가가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명과 같은 일은 황홀함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진을 빼 놓기도 합니다. 카잘스는 “사실 예술에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일종의 노예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연 전에는 항상 지독한 불안감에 사로 잡힌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대가도 “연주회 막간에 가끔씩 탈진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때에는 나 자신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합니다. 제 생각에 예술만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
책을 쓰다보면 여러 번을 글을 고쳐야 합니다. 쓰는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적으면 몇 번이고, 많으면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을 고치기도 합니다. 몇 번을 고치든 ‘아, 이제 더 이상 못 고치겠다. 원고만 봐도 토할 것 같아’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고치기, 이것이 글의 품질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요함이 습관이 될 때 어떤 경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 필요한 건 헌신입니다. 헌신 속에는 재미와 기쁨과 전진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땀과 눈물과 고통, 정체와 후퇴도 섞여 있습니다. 카잘스가 “내 일은 내 생명입니다”라고 말한 것에는 아마도 이런 헌신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술가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을 실현하는 과정을 보면 나 역시 하나의 육체 노동자입니다. 나는 일생 내내 그래왔어요.”
- 파블로 카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