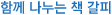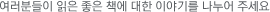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한명석
- 조회 수 14586
- 댓글 수 2
- 추천 수 0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의 로댕, 안상원역, 미술문화 1998
시립미술관으로 로댕전을 보러 간 것은 순전히 ‘릴케의 로댕’ 때문이었다. ‘릴케의 로댕’, 1902년에 릴케가 완성한 로댕론이다. - 1907년에 강연록을 2부로 첨부함- 릴케는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전기를 쓰지 않았다. 이 책에는 연대기적인 서술이나 가족, 연애사 같은 것은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예술사조나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도 하지 않는다. 오직 로댕의 작품에 의해서만 로댕을 말하고 있다.
이 책 전체가 모조리 로댕에게 바쳐진 헌사요 산문시이다. 저절로 베끼기 시작했을 정도로, 릴케의 시를 찾아서 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빼어난 문장이 가득하다. 대부분의 문장은 아주 짧다. 그런데 많은 말을 한다. 어찌나 울림이 깊은지 이마를 얻어맞은 듯 멍해진 눈으로 그 문장을 하염없이 읽게 된다.
육체의 원래 주인인 조각은 아직 육체를 알지 못했다. 여기에 하나의 과제가, 세계만큼 위대한 과제가 있었다.
시립미술관 2,3층을 가득 채운 그의 조각을 보니 알겠다. 이전의 조각은 육체를 알지 못했다. 로댕에 이르러 육체를 발견했다. 로댕에게 육체는 삶이자 종교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인간이 이토록 많은 것들을 이토록 아름답게 빚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로댕 작품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시물을 보고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영감이니 천재성이니 하는 말은 거론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평생을 작업일 하루처럼’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었다. 육체의 발견! 그것을 릴케는 ‘세계만큼 위대한 과제’라고 말한다. 맞는 말 아닌가? 어떤 시대사상, 어떤 황제가 위대한 예술가의 세계만큼 영원히 우리를 위무하며 현존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돌들이 말했다.
그에게 말을 건 것은 그의 일 뿐이었다. 일은 아침에 깨어날 때 그에게 말을 걸었고, 저녁에는 연주를 마치고 내려놓은 악기처럼 그의 손 안에서 여음을 울렸다.
릴케의 함축적인 문장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어, 나는 단숨에 로댕의 작업방식을 떠올릴 수 있었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움직임들과 도는 모습들, 반쯤 도는 모습들을 노트하고 40개의 크로키와 80개의 프로필’을 그리는 그의 모습이 보인다. 로댕은 옷을 입은 조각에 착수할 때도 나상부터 습작했으며, 조각의 일부인 손과 발, 두상을 따로 제작하기도 했다. 제각기 다른 조각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 붙여 보며 실험을 즐기기도 했다. 이처럼 일일이 ‘수공’을 통한 로댕의 ‘작업’태도는 릴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릴케는 로댕과의 만남을 통해 주관적이고 몽상적인 서정시에서 탈피하여 언어의 조형성을 모색하게 된다.
육체의 어떤 부분도 무의미하거나 하찮지 않았다. 살아 있기 때문이었다. 시계의 숫자판과 같은 얼굴에 나타나는 삶은 쉽게 읽을 수 있고 시간과의 관련으로 가득하지만, 육체 속에 있는 삶은 더 분산되어 있고 더 위대하며 더 신비스럽고 영원하였다. 육체 속에서 삶은 위장될 수 없었기에, 게으른 사람의 육체에서는 삶도 게을렀고 거만한 사람에게서는 거만하게 나타났다.
‘아무리 엄격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형상에서 생명력이 덜하거나 분명하지 못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자리를 찾아낼 수는 없으리라’고 릴케가 극찬한 ‘청동시대’는 정말 그랬다.
완벽한 비례, 강인하고 탄력 있는 젊은이의 몸은 고스란히 생에 대한 찬사였다. 반대로 ‘지옥의 문’을 장식한 육체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동물들’ 이었다. 우리가 아차 하는 실수로 나락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음험한 아귀들을 본 것 같았다. 나는 ‘청동시대’에서 감탄하고, ‘지옥의 문’에서 진저리를 쳤다. 정말로 육체는 위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로댕은 인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사실성을 획득했고, 육체에 살아있는 삶을 포착함으로써 그 대상에 영원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로댕의 모든 작품은 기념비가 된다. 릴케가 현란한 찬사를 바치는 ‘발자크상’만이 아니라 ‘입맞춤’이나 ‘영원한 우상’같이 말랑말랑해 보이는 작품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들은 육체의 접촉이라는 열락의 기념비다. 오래도록 살아남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영원히 상기시켜 줄 것이다.
마치 자신의 제국에 도시 하나를 건설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왕이 그런 특전을 허락해도 좋을지 숙고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그 터를 직접 둘러보기 위해 나서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간 왕이 완성되어 서 있는 거대하고 튼튼한 도시를, 영원에서부터 존재했던 양, 성벽이며 탑들이며 성문들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도시를 발견하는 것처럼, 대중은 마침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서는 로댕의 작품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작업으로 점철된 오랜 칩거 끝에 로댕이 인정받는 장면을 묘사한 문장이다. 로댕의 작품, 로댕의 시대사적 의미를 꿰고 있는 적확한 비유 자체가 하나의 구조물처럼 견고하고 아름답다. 로댕은 릴케의 내면에 존재하는 요구와 잠재력에도 불을 붙였다. 한 번은 릴케가 파리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불안감을 로댕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로댕의 대답은 “계속해서 일하십시오”였다. 로댕의 이 한마디 대답은 릴케에게 삶의 원칙으로 각인되었고, 진흙이 아닌 언어로 예술사물을 창조하는데 더욱 전력투구하게 되었다는 것.
릴케는 시인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한 평전으로 로댕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개별작품에 투영되는 릴케의 감수성으로 해서 로댕의 의도가 완성된다. 로댕은 치열한 작업정신을 보여줌으로써 릴케에게 새로운 시적 전환을 주었다. 로댕의 독자성과 자기 완결성은 릴케의 예술론을 완성시켰다. 릴케의 로댕, 로댕의 릴케... 아름다운 뒤엉킴이다. 로댕이 아름답게 재현해 주는 에로티즘에 절대 뒤지지 않는 합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