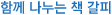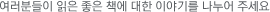
- 유재경
- 조회 수 10213
- 댓글 수 6
- 추천 수 0
1. 저자에 대하여
김용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튀빙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자그마한 정원이 있는 청파동 벽돌집에서 피아니스트 아내와 호기심 많은 딸과 살고 있다.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에서 향을 피우고 커피를 마시며 문학작품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소설가다. 그의 책들은 철학과 인문학을 맛깔스럽게 버무려 내어, 현대인의 삶과 인문학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지식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알도와 떠도는 사원>과 <다니>로 철학과 사회 사상, 과학 지식, 진화론, 인류학 등 다양한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 형식으로 풀어냈다. 인문학적 교양이 현실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대중적 철학서와 인문교양서, 지식소설을 집필, ‘한국의 움베르토 에코’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우리시대의 독서고수인 소설가 장정일은 그의 광팬으로 독자들에게 그의 저서들을 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필명인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그의 전달자로서의 임무를 의미한다.

그는 전문가들과의 논담보다는 대중과의 소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철학자다.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폭넓은 만남이 바로 그가 책을 집필하는 이유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쓸 때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을 고민하여 스스로 질문한다. 이 책에서 그는 디아트리베라는 고대의 수사학을 채용했다. 고상한 전문용어를 사용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피하고 생동하는 일상용어를 사용해 독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는 인문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그는 철학과 신학을 문학, 역사, 미술, 음악 등과 아울러 한편의 대서사시가 되는 ‘철학 내러티브’를 창안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나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생각과 그것이 스며든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철학 내러티브’는 창조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와 다양한 자양분을 제공한다.
저서로는 독특하고 다양한 맛의 지식을 철학과 함께 버무려낸 <지식을 위한 철학 통조림>, 문학 특유의 감수성을 빌려 철학의 이해를 이끈 <철학카페에서 문학 읽기>, 영화를 철학과 신학을 통해 해석한 <영화관 옆 철학 카페> <데칼로그> <타르코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십계명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한 <데칼로그>, 말과 글을 단련해 설득력을 키우는 도구로서 논리학을 풀어낸 <설득의 논리학> 자기계발 팩션 <기적의 양피지>등이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인물 검색, 북데일리 뉴스, 알라딘 서재 http://blog.aladin.co.kr/bookeditor/4322845
<설득의 논리학> <철학 카페에서 문학읽기>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저자 소개
김용규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독일 유학 전에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의 책 또한 별다른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딱딱하지 그지 없는 말투로 800페이지가 넘게 자신의 주장을 이어온 제레미 리프킨도 <공감의 시대>에서 자신의 자란 지역이나 자신의 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다. 하지만 저자는 어림도 없다. 그는 절대 작은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딸을 두고 있다는 그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서재에게 딸에게 들려주듯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철학과 딸에 대한 그의 애정이 느껴졌다. 그는 또한 맺음말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기술해 놓은 것으로 보아 꽤나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부까지 각 부를 시작하면서 유려한 문체로 신비로운 광경을 묘사한 글 솜씨는 그의 철학 소설가로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책을 읽으며 그가 기독교도인지 궁금했다. 그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할까? 정말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의 개념을 동일한 하나가 아닌 통일적인 하나로 알고 있을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P8 서양문명에 대한 이해를, 그 세계가 오랫동안 숭배해 온 기독교의 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비록 흔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썩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서양문명을 심층적으로 파약하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바로 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할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P31 신은 전혀 인간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신이 인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오해하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35 르네상스는 신 중심의 중세 문화를 깨트리고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리자는 것이었지요. 따라 이 시대 예술가들은 신보다는 인간을, 신앙보다는 이성을, 종교보다는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그들 작품 속에 재현했습니다.
P36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신은 인간을 이상화하거나 그 능력을 극대화한 존재였습니다. 일종의 초인적 영웅이었던 셈이지요. 그들이 신에게 인간의 육체를 부여한 것은 신들을 폄하했다기보다 인간의 육체를 그만큼 신성시했다고 보아야 하지요.
P37 인간이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는 없어도 심성과 육체를 단련하여 신처럼 위대해질 수는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P39 고대나 중세 기독교에서 인간의 육체는 언제나 욕정과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숨기고 가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P43 미켈란젤로는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던 이데아의 미가 작품에서 물질성을 소멸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초월적 세계로 이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P44 에로스에게 달린 날개가 우리의 영혼이 단순히 감각적 대상에 머물지 않고 이데아의 미를 거쳐 궁극적으로 신에게로 상승하게 됩니다.
P45 에로스는 우리 영혼을 본향인 ‘이데아 세계’로 귀환시키기 위한 혼의 날갯짓이고 상승적 창조자입니다.
P47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이같이 다원적이고 심층적인 이유에서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규칙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모방했습니다. 그 결과 성서 이야기를 다룬 이들의 작품에도 그리스 문화가 자연스레 혼합되었습니다.
P48 그리스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 와서야 신인동형설과 신인동감설에서 벗어났습니다.
P50 만일 당신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신학자는 물론, 서야 근대철학자나 신학자의 글에서도 ‘운동’이라는 말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변화’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P51 이러한 사변적 논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의 궁극적인 바탕으로서 자신은 탄생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탄생과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무형의 원리를 가정해 ‘부동의 운동자’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했지요.
P54 외적 형태를 의미하던 히브리어 ‘첼렘’과 ‘떼무트’를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떤 내적 본성을-지성과 이성이건, 선성이건 또는 순결성이건 –뜻하는 신학적 용어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어 이데아나 에이도스가 본래는 어떤 사물이 ‘눈에 보이는 모양’ 곧 ‘형상’이라는 단순한 뜻이었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물 안에 깃들어 있어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실체’라는 매우 특별한 철학적 뜻을 갖게 된 것과 매우 흡사하지요.
P55 기독교의 신 개념은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신 개념만을 계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인들의 존재론적 신 개념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을 종합한 것인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신앙과 이성이라는 그 이상 간데없이 뻗은 양극을 휘어 하나로 결합하는 것 같은 극적 종합이었습니다.
P56 성서의 종교에는 존재론적 사상이 없다. 그러나 성서의 그 어떤 상징도 그 어떤 신학 개념도 존재론적 함축성을 갖지 않은 것이 없다.
P56 신은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는 바탕입니다. 즉 모든 존재물은 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존재를 부여받아 존재하지요. ‘신은 존재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신은 우주마저 자기 안에 포괄하며, 무소부재하고 신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 유일자다’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또한 자신의 내적 법칙인 ‘말씀’에 의해 모든 존재물을 창조하지요. ‘신은 창조주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단히 자신의 피조물들과 관계하여 그들을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가지요. ‘신은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P59 이렇듯 다분히 존재론적이며 동시에 종교적이기도 한 이유로 신은 인간이 도무지 벗어나거나 떠날 수 없는 대상이며, 그의 ‘말씀’은 순종하면 필히 복을 받지만 거역하면 부득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P65 ‘알면 믿는다’는 입장도 있고 ‘믿으면 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당연히 후자를 견지합니다만, 이 문제는 차치해 두고 일단 알아봅시다.
è 나는 이른바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끌려가 이야기를 들었다. 시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골방에서 회유를 당하기도 했고 영어로 설교를 한다는 교회 신자들에게 영어로 전도를 다하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은 ‘일단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답하곤 했다.
P75 신을 가리키는 어떤 명칭보다 더 근원적인 명칭은 ‘있는 자’다. 이 명칭, 즉 ‘있는 자’는 그 자체 안에 전체를 내포하며 무한하고 무규정적인 실체의 거대한 바다와도 같이 존재자체를 갖고 있다.
P81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자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사실상 일종의 또 다른 자기가 될 수 있었다.
P83 존재론 전통에 의하면 만물의 궁극적 근원인 신에게는 이름이 없고 또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P83 세상 만물을 모두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그 ‘무엇’이 우리가 부르는 그것의 ‘이름’입니다.
P83 그런데 신은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라는 자신의 속성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자, 그 무엇으로도 한정할 수 없는 무한정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 될 수 없지요.
P85 엄밀한 의미에서 전체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언가가 빠져 바깥에 있다면 빠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P86 만일 신에게 본질이 있어야 한다면 –따라서 신에게도 이름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존재’뿐입니다.
P87 탈레스의 동료이자 최초의 지도 제작자이기도 했던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하는 아페이론은 우선 시간적으로 변화를 통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죽음도 쇠퇴도 모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이지요.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너무나 광대무변하여 크기를 측정할 수 없으며, 만물을 자신 안에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페이론은 신적인 것으로서 만물을 포괄하고 횡단하며 보호하고 조종하지요.
P92 그런데 뜻밖에도 신이 선뜻 자기 이름을 밝힌 겁니다. “에흐예 아세스 에흐예”라고 말이지요.
è 신이 자신의 이름을 밝힌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참으로 신기하다.
P94 신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임을 알린 것이지요.
P95 모세에게 ‘나는 존재다’라고 밝힌 직후 신은 야훼가 자신의 영원한 이름이며 칭호라고 선포했지요.
P99 신을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존재물로 파악한 것,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룬 신 개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P100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일찍이 모세가 구분한 존재와 존재물 사이의 엄연한 차이를 “신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상이성” 또는 “시간과 영원의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실존철학을 쌓아 올리는 초석으로 삼았지요.
P101 신은 세상의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존재하지도 않지요. 신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합니다.
P101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무신론인 것처럼 긍정하는 것도 무신론이다.
P104 기원전 5세기쯤 그리스인들은 ‘세상 모든 존재물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하는 물음으로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궁극적 근거를 ‘아르케’라고 불렀지요. 탈레스는 물,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아르케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라고라스는 수와 질서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인 엘레아 출신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의 궁극적 요소가 ‘존재’라고 주장했지요.
P106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인식만이 진리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존재물을 변한다. 그러므로 존재물들에 대한 모든 인식은 거짓이다.
P109 기독교인에게도 진실하고 참된 세상은 우리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어떤 다른 세상이지요. 곧 플라톤에게 이데아의 세계였던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불변하게 존재하며, 그렇기에 참되다는 것이지요. 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렇기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P110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을 계승한 플라톤은 불변하는 실체인 존재를 이데아라고 불렀고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을 확장했지요. 플라톤의 주장에 의하면 개개의 사물 안에는 이데아가 들어있습니다. 이 들어 있음을 통해 개개의 사물들은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그것의 본질은 물론, 있음이라는 존재를 부여 받게 되지요.
P114 신은 단일하고 영원불변하며 우주만물에 ‘본질’과 ‘존재’ 그리고 ‘이름’을 주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우주만물은 다양하고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불완전자다. 따라서 신만이 진리의 근거이며, 우주만물에 대한 지식은 단지 불완전한 지식일 뿐이다.
P117 이미지 à 사물 à 수학적 대상 à 이데아로 올라갈수록 질적인 면은 점점 좋아지지만 양적으로는 점점 적어진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P117 플라톤이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제공한 피라미드형 층계는 우리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의 사다리”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자연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론>>에서 식물 à 동물 à 인간이라는 ‘존재물의 계층 구조’를 떠올리는데 기여했어요. 또한 플로티노스가 물질 à 영혼 à 정신 à 일자라는 ‘존재의 계층 구조’를 구성할 때도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P122 그는 일자(신)는 참됨, 선함, 아름다움, 생명, 예지, 능력 등 모든 가치에서 최정상이지만 거기서 유출되어 나온 존재들은 계층구조의 밑으로 갈수록 –마치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듯이 – 점차 결핍된다고 교훈했습니다.
P123 그들은 신을 – 최고 생명, 최고 이성, 최고 행복, 최고 정의, 최고 지혜, 최고 진리 등등 – 어떠 어떠한 가치들의 정점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이 바로 이 같은 가치들에 의해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같은 가치들을 추구하며, 이 같은 가치들에 의해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외연인 동시에 그것들의 정점”이라는 말의 시원이 바로 여기지요.
P127 소명의식이란 모든 인간은 신의 계획을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각각 특정한 부름을 받았으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이 무엇이든 – 설령 아무리 비천한 것일지라도 – 거기에 충실한 것이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는 인식이지요.
P131 히브리인들의 존재 개념은 만물을 생성 소멸시키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리 개념 역시 불변성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히려 생성 소멸하는 작용, 곧 변화시키는 본성을 근거로 하지요. 천지를 창조한 ‘신의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의 말은 만물을 생성 소멸시키고 의롭게 만드는 작용을 하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P133 일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리고 완전하기 때문에 넘쳐흐르고, 그 넘치는 풍요함이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
P134 정신이 곧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데 모범이 되는 틀입니다.
P136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에서는 정신이 ‘창조주’이기는 해도 다만 ‘창조의 틀’로만 작용할 뿐이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일은 영혼이 합니다. 영혼은 비물질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사이에 존재하며, 그 둘의 연결고리로서 위로는 정신을, 아래로는 자연계를 바라보며 만물을 창조하지요.
P141 플로티노스의 세계구조에서 물질세계를 유출시킨 일자, 정신, 영혼은 영원불변하는 ‘신적 존재’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일자는 창조의 바탕이고, 정신은 창조의 틀이며, 영혼은 창조의 우너리지요.
P145 그리스 언어가 정지적인 데 반해 히브리 언어는 역동적 성격을 갖고 있지요.
P146 히브리인들에게 ‘존재’는 영원불변한 것인 동시에 생성, 작용하는 실재입니다.
P148 세상 만물은 그 무엇이든 끊임없는 자기동일적 생성과 작용을 통해서만 불변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생성, 작용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고, 불변하는 것은 변화할 때에만 불변할 수 있다니!
P150 그리스인들은 존재든 존재물이든 모두 탈시간화함으로써 그 변치 않는 본질을 통해 ‘개념적으로’ 파악했고, 히브리인들은 신이든 인간이든 모두 시간 안에서 그 운동과 변화릍 통해 ‘실존적으로’ 파악했지요.
P152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논리학은 이처럼 철저하게 탈시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변화도 전혀 다룰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파르메니데스가 시작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논리학의 전통이자 한계이며 그것을 통해 사유해 온 서양문명이 탈시간화된 이유이고,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이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시간화된 새로운 논리학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P153 존재란 생성과 작용의 ‘탈시간화’된 모습이고 생성과 작용이란 존재의 ‘시간화’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불변이란 변화의 탈시간화된 현상이고, 변화란 불변의 시간화된 현상일 뿐이지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인 야훼의 속성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서양문명을 이해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지요.
P154 신은 ‘시간 밖에서는’ 영원히 안식하지만 ‘시간 안에서는’ 부단히 활동한다는 것이지요.
P155 그러한 개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종교적 미덕이라고 여김으로써, 신에 관한 개념이 인간정신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더욱 탁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P157 히브린인들의 이러한 언어적 인식과 종교적 체험이 기독교인들에게로 이어져 기독교 신론인 삼위일체설의 ‘종교적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P157 자신을 무한한 ‘존재의 장’으로 펼쳐 그 안에 피조물을 생성하고 또한 그들에게 부단히 작용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이끄는 존재,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자신을 야훼라고 계시한 신이자, 히브리인들이 하야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신이지요.
P159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퍼텐셜이야말로 발 그것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존재하며 소멸하는 장이 아니던가?
P161 프네우마는 어떤 정신과 의지가 아니라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미세한 원시물질입니다.
P163 무와 물질의 중간에 있는 – 따라서 무는 아니지만 거의 무에 가까운 – 이 무형의 원물질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형상 없는 땅”이고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퍼텐셜이라고 할 수 있지요.
P166 신에 대한 모든 상상, 모든 형상화, 모든 규정과 언급은 사실상 부질없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P171 신이 유일하다는 교리를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선포가 아니라, 존재의 바다가 무한히 광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포괄하며 그 바깥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172 존재의 바다라는 이 비유는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뉨 속에서도 연합해’ 있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셋’이라는 신의 삼위일체 속성을 어려움 없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P177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봐야 하지요. 하나는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이지요.
P178 하이데거는 기획투사함으로써, 사르트르는 앙가주망함으로써 인간은 실존한다고 했지요. 기획투사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 그 자신을 던진다는 의미이고, 앙가주망을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제 스스로를 잡아 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P182 비판의 핵심은 우리의 정신에 존재하는 관념이 무엇이든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P184 ‘가장 완전한 존재’는 존재의 완전성인 현존을 ‘필연적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185 칸트가 볼 때 존재론적 증명에는 이처럼 개념의 필연성을 뜻하는 ‘논리적 술어’와 현실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실재적 술어’에 대한 혼동이 들어 있습니다.
P186 철학이나 신학에서 얼핏 난해한 것처럼 들리는 말에는 뜻밖에 흥미롭고 유익한 사실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지요.
P187 현실적 대상은 나의 개념 중에 분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의 개념에 종합적으로 보태지기 때문이다.
P189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들이 모두 – 안셀무스의 증명들처럼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고 –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P191 비판의 핵심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감각적 경험에서 논증을 시작한 것은 옳지만 오직 사고만으로 ‘우연적 존재’의 현존에서 ‘필연적 존재’의 현존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은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P198 흄은 우연에 의해서도 세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추론에 의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부질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P202 진화론은 자연의 복잡성과 합목적성을 – 페일리가 제시한 ‘신의 섭리에 의한 합목적적 창조’라는 추상적 개념을 빌리지 않고 – 당시 서구의 지식인들이 선호했던 귀납법을 사용해서 경험적, 실증적으로 설명해 주었지요.
P203 진화론은 기독교를 향해 ‘자연을 위한 신의 개입은 처음부터 아예 필요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의 창조주는 자연선택이라는 기계적 메커니즘이고 그것에는 아무런 예정된 목적도 없기 때문이지요.
P205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개혁신앙의 구호를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신의 존재 및 진리의 근거를 초이성적 계시에서 구하지 않고,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자연에서 구하려는 자연신학을 강력하게 거부하지요.
P208 안셀무스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을 전개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을 펼쳤던 것 기억나지요?
P209 플라톤에게 진리는 우리가 정신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에 대한 지식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에이도스의 대한 지식입니다.
P212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성이 없으면 어떠한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성이 없으면 어떠한 대상도 사유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그러므로 개념을 감성화하는 일(개념에 대해 그 대상을 직관을 부여하는 것)은 직관을 오성화하는 일(직관을 개념 아래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 둘의 종합에 의해서만 인식이 나올 수 있다.”
P213 인간의 이성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지만 감성이라는 섬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한마디로 감성의 한계가 곧 이성의 한계지요! 감성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사고는 가상이고 오류의 원천입니다.
P215 논증으로만 신의 현존을 증명하려는 일체의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P216 19세기 신학자들은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인간은 그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P217 기독교에는 세 가지 위대한 집단이 있고 그 각각에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다고 주장했지요. 동방정교에는 플라톤이, 가톨릭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테스탄트에는 칸트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P217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는 말을 통해 칸트는 이성을 감성의 테두리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후 근대 학문에서는 중세에 비해 경험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강조되어 진리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었지요. 진리는 타당할 뿐 아니라 건전해야 한다는 것인 것 타당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건전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다는 말입니다.
P220 기독교에서도 신에 대한 모든 지식은 인간이 철학과 같은 “초등학문”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신과 인간 사이의 쌍방적 인격관계를 통해 파악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강했지요.
P221 종교적 경험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진술이나 추론, 비판, 반성 같은 지적 활동의 산물인 철학적, 신학적 이론은 부수적 요소라는 말이지요.
P222 모든 사람이 종교적 경험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종교적 경험 자체를 일종의 심리적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사 그것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종교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그것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P224 신비적 형태의 종교적 경험은 보통 어떤 종교적 내용이나 대상이 물질적 세상을 잠시 잊게 함으로써 인식 전체를 채워 주는 의식 상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P227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형태란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같은 일상적 종교생활에서 종교적 깊이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성스러운 경험을 말합니다.
P227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이란 본디 그 자체가 신념과 가치 체계이자 동시에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과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둘은 사실상 서로 뒤엉켜 있는 하나의 혼합물이지요.
P228 보기에 따라서는 오리로도, 토끼로도 보이는 이 그림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또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무엇으로 본다(또는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결국 우리의 인식은 일종의 해석인 것입니다.
P229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주만물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개의 사건들 모두가 역사를 움직이는 신의 참여와 인도를 표상하는 증거들인 동시에 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논거들인 것입니다.
P230 ‘신의 현존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결국 당신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졌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잇습니다.
P230 신의 현존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신의 현존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신도들의 이성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행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P232 우리는 ‘아주 인상적이고 기억되는 사건’들을 통해 신비적 형태의 종교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삶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는 ‘의미의 중심점 이자 삶의 전환점’이 되어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쿤의 용어로 말하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P233 바울은 자신의 ‘신비적 경험’을 통해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보는 새로운 안목을 터득했고, 삶 전체가 바뀐 것이지요. 그에게는 메타노미아, 곧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이로써 신은 그를 통해 역사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P248 마니교의 중심 사상은 영혼과 물질, 선과 악,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대등한 원리이자 존재론적 실재로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는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P253 암브로시우스는 다른 설교자들과는 달리 복음을 권위에 기대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플라톤주의 이론을 빌려 이성적으로 가르쳤지요. 그럼으로써 신도들이 복음을 신앙만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왔습니다.
P261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시기에는 마니교를 논박하며 주로 인식론과 신론을 정리했고, 두 번째 시기에는 도나투스 분파 문제에 골몰하여 교회론과 성례전을 정리했으며, 세 번째 시기에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싸우며 은총론과 예정론을 확립했다는 것이지요.
P261 화이트헤드 교수의 말처럼 서양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각주이듯 서구의 기독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라고 말할 수 있다.
P265 인간의 삶이란 – 자신의 삶이 그랬듯이 – 오직 신의 섭리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 주기 위해서였지요.
P265 신율은 자율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키지요. 요컨대 신율은 섭리에 의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성숙되어 초월적으로 실현되는 자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틸리히는 “자신의 신적 근거를 알고 있는 자율이 곧 신율이라고 규정하지요.
P266 <고백록>은 비록 회고록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눈물로 쓴 기나긴 신앙 간증이자 탁월한 신학자가 쓴 성서 해석서가 되었습니다.
P268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이 증명하듯이,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 또한 어떤 우연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에 의해 창조되고 보존되며 인도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이지요.
P276 신은 시간 밖에서는 안식하고 시간 안에서는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P277 창조론과 빅뱅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유사성에 먼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종교와 과학이 설사 같은 용어로 같은 내용을 말할지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역시 적잖은 놀라움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종교와 과학이 한편으로는 날카롭게 대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 주도권은 거의 과학으로 넘어갔지만 말입니다.
P277 이를 통해 우리는 대립하는 두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히브리적 요소와 그리스적 요소, 유신론적 성격과 유물론적 성격, 종교적 믿음과 이성적 사고가 여전히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서양문명의 이중적 성격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P287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우주가 탄생할 때 어떤 식으로든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일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지금 존재하는 이 우주의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P292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이 기막힌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하며, 그의 계획에 의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겠는가?
P299 기독교 신학에서 신이 세계 이전, 곧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창조했다는 말은 일단 신이 시간이나 공간 그 어느 것의 제약도 받지 않고 절대적 독립성을 가진 ‘세계초월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의 ‘세계초월성’을 신의 ‘전지전능성’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P302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모든 ‘언어놀이’에는 그 언어놀이를 구성하는 풍습, 제도, 역사, 문화를 비롯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언어란 그 언어가 사용된 언어놀이 안에서만 일정한 의미를 갖지요. 그러므로 “언어놀이가 변하면 그때는 개념상의 변화가 생기고 개념과 더불어 단어들의 의미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P303 삶의 양식, 곧 문법은 한 세계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삶의 통찰을 제공하지요.
P305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과학과 종교의 대립에서도 이들이 전혀 다른 문법으로 서로 다른 언어놀이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311 과학과 종교간에 이뤄져야 하는 대화와 소통의 조건이자 목표는 어떤 합의나 일치를 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 담론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다.
P314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세계로부터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 독립성을 가졌다는 의미인 세계초월성과 세계에 부단히 참여하며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인격적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인 세계내재성을 동시에 지는 유신론적 신입니다.
P317 태초는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밖을 뜻합니다. 그런 만큼 이 말은 신이 ‘시간 밖에서’ 우주를 창조했고 창조와 동시에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해야 하지요.
P321 미래란 장차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시간적 과정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점차 자라나듯이 영원한 신의 의지가 인간의 시간인 역사로 순차적으로 침입해 들어옴일 뿐이지요.
P323 플로티노스는 “그런 것이기에 영원은 장엄하고 이를 통해 신을 이해하게끔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은 일종의 신이다’라고 말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영원을 찬양했습니다.
P325 이데아와 영원은 모두 원형이고 개개의 사물들과 시간들은 각각의 모상이지요.
P326 공간이 연장을 재는 척도이듯 시간이란 지속을 재는 척도이며, 그러한 시간을 파악하는 주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없다면 지속과 운동은 있을지라도 시간은 없다는 것이지요. 시간은 마음 밖에서 파악할 수 없고 오직 마음 안에서 드러나며 마음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시간도 변하지요.
P327 시간은 영혼이 잽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신의 영원성이 들어 있기에,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혼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시간도 변하므로 시간은 곧 영혼의 삶입니다. 영원은 신에 속하는 동시에 값어치 있는 것이고 시간은 인간에게 속하는 동시에 세속적이고 부질없는 것이지요.
P331 일자, 곧 신에게로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함! 바로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발견한 영원한 삶을 얻는 구원의 방법이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종교적 언어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한 의도이며, 우리 삶이 주어진 시간의 궁극적 의미이고 가치지요!
P334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시간’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신적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P334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입니다.
P334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여 마치 눈앞에 보이듯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진 이런 능력을 ‘상기의 힘’이라고 불렀지요.
P335 상기의 힘은 개인적 차원에서든 역사적 차원에서든 모든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 깔린 심오한 사유입니다.
P342 인간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무의지적 기억’은 단지 잊었던 옛 추억을 떠올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상기’처럼 –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겹쳐 놓음으로써 시간에 의해 분산된 여러 가지 상들을 모아 이전까지는 감춰져 있던 삶의 진실을 드러내 보여 주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아 주는 일을 하지요. 또한 미래를 기대하게도 만듭니다.
P346 물리적 시간으로 자신의 삶과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심리적 시간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으로 바꾸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지요.
P349 그는 시공조차 아직 열리지 않은 태초에, 신이 창조한 그 천지를 각각 지혜의 하늘과 형상없는 땅으로 해석했습니다.
P352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형상 없는 땅은 우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형성해내는 원물질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P359 성서에 기록된 야훼의 창조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데미우르고스의 창조 사이에는 아주 많은 유사성이 있어서 둘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지요. 첫째 완전한 신이 여러 번 ‘우주의 창조자’와 ‘아버지’로 불린다는 겁니다. 둘째 창조 이전에 어떤 혼돈의 상태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셋째 세계와 인간들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과 신이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P363 기독교인들은 오직 그들의 삶에서 체험하는, 막막한 절망과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 손을 뻗어 해결해 주는 신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 지어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해했을 뿐입니다.
P371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과 세계가 불온전하게 될 가능성, 곧 타락할 가능성을 가진 이유는 그것들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P373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는 전혀 다릅니다.
P384 기독교는 성육신과 함께 시작했고 성육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점에서 기독교는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삼는 또 다른 종교인 유대교나 이슬람교와도 완전히 갈라서지요.
P387 불변하는 진리인 로고스와 역동적인 다바르의 종합을 통해 신약성서에 기록된 ‘말씀’이 단순한 진리뿐 아니라 행위와도 연관된다는 사실 역시 더욱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P393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 창조가 태초에 이루어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보존하고 인도하는 신의 사역으로 재차 강조되었지요.
P400 일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충족적’이기에 풍요성을 갖게 되었고, 그 풍요성이 급기야는 자기 바깥으로 넘쳐흘러 자연스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P402 루터 신학과 프로테스탄트 일반에서는 창조가 ‘피조물과의 친교’를 위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칼빈 신학과 개혁파 교회 전통에서는 청조의 목적을 ‘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P405 하나는 자연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다윈이 발견한 ‘자연 선택’이라는 기계적 매커니즘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선택이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에 따라 진행될 뿐이므로 그것에는 아무런 목적도 예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도킨스는 곧바로 무신론을 이끌어 내는데, 한마디로 세계를 창조하고 자신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는 신은 – 니체의 말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지요.
P413 <종의 기원>은 대중적 성공을 거둘 만한 장점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내용인데 <종의 기원>이 내포하는 유물론적, 실증주의적 경향이 당시 지식인들의 취향과 맞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윈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무신론적 경향도 한몫을 했지요. 다른 하나는 서술 방식과 관련되는데, 풍부한 사례와 뛰어난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한 다윈의 표현 기법이 대중을 매혹시키는 데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P421 요컨대 19세기 서양 사람들의 믿음은 자연적인 것은 사회적이기도 하다 – 또는 사회적이어야만 한다 - 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사회다윈주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근원적 이유였습니다.
P422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매커니즘을 사회진보와 역사발전의 원리로 삼은 사회다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란 실현될 수도 없고 또한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불순한’ 개념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걸러진 우수한 개인, 계층, 계급, 국가, 인종만이 살아남는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퍼뜨렸어요.
P424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도 치열한 생존경쟁 관계가 존재하고 그 결과 적자생존이라는 비정한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부당한 조건과 환경을 시정해 갈 수 있으며 또 부단히 그래야만 하는데, 어떤 것이 일단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나는 그것을 시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지요.
P426 러시아에서 망명한 무정부주의 혁명가 포트르 크로포트킨은 나중에 <상호부조 진화론>으로 출간될 일련의 논문을 통해서 경쟁이나 이기주의가 아닌 상호부조와 이타주의를 다윈의 진화설로부터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P427 일찍이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교훈했듯이 나쁜 선택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요.
P431 그는 <인간의 유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비록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은 것은 아니지만 유기체 중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다.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 먼 미래에 더 높은 운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P433 신의 창조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교리입니다.
P435 19세기 유럽인들도 나날이 발전하는 산업과 과학을 통해 현세에는 물질적 삶을 충분히 즐기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종교생활을 통해 내세에서는 영원한 삶을 얻으면 그만이라는 세속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è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싶다.
P436 다윈 자신은 물론이고 헉슬리 같은 당시 다윈주의들이 진화론이 반드시 무신론과 연결된다고는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현명하게도 이른바 불가지론을 내세웠습니다.
P439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에 대적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진화론 외에도 이신론, 인류교, 자유주의 신학, 실증주의, 유물사관 등의 부단한 도전에 지쳐 있던 19세기 후반의 교회가 약삭빠르게 진화론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지요.
P443 사실상 오늘날 사려 깊은 많은 유신론자는 진화가 다위주의 이전의 세계관이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여긴다.
P444 호트에 의하면, 진화가 창조의 메커니즘 가운데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복잡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자기조직을 하는 본유적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복잡성 과학이 밝혀 낸 결과인데,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신의 속성에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진화는 이렇게 생명 없는 물질에까지 이미 널리 퍼진 자기조직이라는 신의 창조적 경향 가운데 극히 작고 거친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세한 또 다른 근거는 – 가톨릭 신자 칼 라너가 주장했듯이 – 무한자인 신의 사랑을 유한자인 우주가 받아들이려면 ‘진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진화가 맹목적으로, 즉 미결정적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창조한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세계에 일정한 자유와 우연성을 허락하는 것이, 강제하는 것보다는 설득하기를 원하는 신의 사랑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P449 신은 세계를 직접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계영혼(또는 성령)에게 ‘세계를 현실화하는 질서와 과정’을 부여해 그에 의해 창조가 차례로 일어나게 했다는 말이지요.
P451 창조가 신이 직접 그리고 일시에 실행한 사건이 아니라, 신이 창조해서 위임한 어떤 원리나 법칙을 통해 점차 이뤄졌다는 이론은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한 이론으로 정립되었습니다.
P460 신학은 특정 교리를 영구불변하는 진리로 주장하는 체계라기보다는, 그것은 시대적 해석이 적절한지 또는 수용 가능한지를 늘 질문하면서 성서와 전통적 사상들을 통해 부단히 재고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P470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예지는 같은 범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P472 이미 주어진 저차원의 질서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고차원의 새로운 질서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을 복잡성 과학 또는 창발이라고 부르지요.
P482 불완전한 피조물이 신의 온전성에 도달하는 것, 신의 선성을 닮는 것, 곧 ‘구원’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생각은 문인들에게도 전해졌지요.
P482 칼 바르트도 창조를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이뤄지는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보았어요. 창조가 없었으면 구원 사역도 불필요했다는 게 바르트의 논리로, 그에게도 창조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은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P483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초기 교부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내용으로 보자면 창조의 신과 구속의 신,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보편적인 하나님 사이에 놓인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본질적 간격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P484 우리가 창조의 나쁜 신과 구속의 좋은 신을 갖지 않기 위해,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기 위해 – 창조의 신과 구속의 신은 하나여야 하고 창조의 목적이 곧 구속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P497 평소 세네카는 친구들에게 인간의 삶을 연회에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연회에 초대된 사람은 너무 일찍 자리를 떠나 주인을 섭섭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늦게 떠나 주인에게 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è 천상병 시인은 삶을 잠시 와 놀고 가는 소풍으로 비유했는데 삶을 연회에 비유한 것도 참으로 절묘하다. 두 가지 다 잠깐 즐기다 가는 것이니.
P500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바로 “항상 살아 있어서 왕의 법령이라도” 감히 어길 수 없는 하늘의 법, 곧 자연법입니다.
P503 세네카는 이렇듯 섭리를 필연적인 것, 즉 운명으로 생각했는데요, 이는 스토아 학파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섭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분개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신의 뜻이지요. 독일의 문화철학자 오슈발트 슈펭글러가 <서구의 몰락>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한, “네가 동의하면 운명은 너를 인도하고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명은 너를 강제한다”라는 세네카의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P503 고대철학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도사린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P507 ‘인간의 이성(또는 도덕)에 의한 인간구원’이 ‘신의 은총에 의한 인간 구원’을 – 다시 말해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를 – 적어도 19세기까지 부단히 위협했다는 뜻입니다.
P528 신의 인격성은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루는 근간이자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의 신의 인격적 속성을 통해서만 신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데 신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비록 신을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적으로 신앙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P529 그리스인들은 철학의 천재들이었지 종교의 천재들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최고의 존재로 파악하고 그로부터 세계와 인간 삶에 관한 모든 지혜를 계시로 받고 있을 때,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사변적 세계 안에서 신들에게 어떤 위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이성으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P532 자연신론에서 신은 야훼처럼 창조주이며 세계를 초월하지요. 그러나 그는 야훼와는 달리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인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세계는 오직 그가 만든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에 의해 자동으로 운행될 뿐이지요.
P543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기독교 신학은 마르틴 루터가 한마디로 선언했듯이 “신앙을 통해 신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지요.
P556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신의 인격성이란 단순히 신이 피조물들에게 ‘참여와 인도’라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P559 신의 인격성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대응이 곧 기도입니다.
P560 신은 자신의 섭리에 합당한 기도에만 응답하고 그렇지 않은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답이지요. 그래야만 그 어떤 것에도 구속 받지 않는 신의 절대적 독립성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P561 신의 섭리에 의한 강제는 선한 목적과 의도에 따른 것이어서 신의 인격성을 더 잘 드러낸다는 말이지요.
P563 바울은 신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지요. 하지만 그는 고통의 배후에는 언제나 신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P567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가르침을 기도란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합당한 것을 청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래야만 기도는 우리가 신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가 됩니다.
P571 예수가 말한 신이 더해 줄 “모든 것”이란 ‘신이 보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신은 오직 그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뜻이지요.
P575 신의 강제적 섭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왜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원하던 응답을 받으면 받은 대로, 또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대로 그 결과를 자신을 향한 신의 섭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è 정말 기독교의 교리는 참으로 용의주도하게 짜인 것 같다. 기도가 응답 받든 그렇지 않든 유익하다니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인 중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위험한 지경까지 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는 그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자 섭리라고 말해 놀란 적이 있었다.
P576 신의 섭리를 믿는 사라이라면 기도로 신의 섭리를 바꿀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P577 부단한 자기 체념과 자기부정을 통해서만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누구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신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P585 힘과 건강과 부와 사랑 등 욕망 속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비록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필경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 당신은 알고 있나요? 절망의 끝자락에서야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법임을!
è 박노해 ‘길이 끝나면’이란 시의 맨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최선의 끝이 찯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나 역시 바랄 수 있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절망했다. 하지만 절망한 후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P585 그러면 그대 속에 깃들인 경솔한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요동치는 정신처럼 그리고 망령처럼, 그대에게는 이미 상실된 세계의 폐허 속에서 헤매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절망하라. 그러면 그대 정신은 결코 더 이상은 우울 속에서 신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비로 그대는 그 세계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볼 것이지만, 다시금 그대에게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즐거운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대의 해방된 정신은 자유의 날개로 날개 치며 솟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P593 인간은 오직 뉘우침과 죄의식이라는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만 ‘무한한 자기체념’을 할 수 있게 되며, 그제야 비로소 신을 발견하게 되고,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종교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è 나의 오만함과 세속적 욕망에 대해 뉘우침과 나니 그제야 신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생각하니 마음의 평화가 나를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단계>인가 보다.
P621 기독교인이 “신은 유일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뜻을 단순히 독선적 종교의 오만한 선포나 배타적 종교관에서 나온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è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의 유일성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 싶다.
P633 플라톤은 만물의 궁극적 근거인 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그 본질은 선이라고 주장했지요.
P643 플로티노스의 일자에는 정신과 영혼이 순차적으로 유출되었고 이것이 각각 분리된 채 하나의 자립체로 존재하기는 해도 어쨌튼 일자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며 분리되지도 않고 서로 동등하지요.
P659 삼위 일체, 곧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말은 신이 ‘바깥으로 나타난 위격으로는 셋(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권능(사고, 의지, 행동)에서는 하나라는 뜻이지요.
P718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삼위일체적 본성에서 사랑(성령)에 의한 동등한 사귐과 교제로서의 ‘인간 공동체 원형’을 발견하고 주장했다는 사실이지요.
P719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적이고 동등한 사귐이 곧 신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본받으라는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P720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사랑, 선물, 친교로 파악했고, 우리도 성령에 의해 서로 간이 친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삼위일체의 신과도 친교를 이룰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사유인가요! 우리는 이 같은 사유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단지 교훈으로 선포된 종교가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 행위로 실천된 종교이기 때문이지요.
P725 몰트만에 의하면, 삼위가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서로 안에서” 완전한 통일성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삼위를 하나로 묶는 이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것만 받아들이는 동종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까지 받아들이고 포괄하는 이종사랑이라는 겁니다.
P731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동일한 하나’가 아니라 ‘통일적인 하나’라는 말인데요.
P732 따라서 누구든 “신은 유일하다”라고 외치려면, 그는 그 말이 ‘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망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상호내주적이고 상호침투적인 포용과 사랑을 베풀어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실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엄중한 선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만 하지요.
è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밥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P737 애초 마르시온은 구약의 신을 ‘악의 신’이라 부르고 신약의 신을 ‘선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영지주의자 케르도의 영향을 받아 ‘공의의 신’과 ‘사랑의 신’으로 고쳐 불렸지만, 여전히 구약의 신을 ‘율법의 신’이라며 거부한 채 신약의 신만을 ‘복음의 신’으로서 받아들였지요.
P739 기독교가 구약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일신 사상을 계승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있는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폭력적인 요소는 모두 걷어 냈지요. 이 일은 누가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예수와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그 당시에 이미 한 일이지요.
P741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가진 유일성은 결코 배타성이 아닌 포괄성이고요, 일치를 원하는 사랑이 아닌 조화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P742 최선인 것의 부패는 최악이다.
P748 이스라엘의 역사 흐름에 따라 야훼가 감정이 격한 절대적 폭군에서, 스스로 세운 계약에 충실한 입헌군주를 거쳐, 사랑이 넘치는 민주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갔던 것은 신이 그렇게 변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신을 그런 식으로 경험했다는 말일 뿐이지요.
P753 존재이자 창조주인 신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불변하고 유일하지만, 인간에게 계시되는 신은 역사 안에서 진보하는 인간정신과 문화에 따라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고 표현된다는 것이지요.
è 신의 모습, 태도, 의미, 역할 등이 인간정신과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
P769 선재적 그리스도론을 통해 예수와 복음을 몰랐던 유대교인들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된다는 포용성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유일신의 종교인 기독교가 가진 배타성과 폭력성을 실천적으로 극복한 고대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P769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가톨릭교회는 1965년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며, 양심의 명령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지요.
è 처음 듣는 말이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P781 서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종교들 사이의 대화를 이끌고, 종교들 사이의 대화가 종교들 사이의 평화를 낳으며, 종교들 사이의 평화가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말이지요. 이는 ‘신은 언제나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외연이며, 동시에 그것들의 정점이다’라는 내가 이 책에서 기본 강령으로 삼은 것과 깊숙이 연관된 문제의식입니다.
P799 이 같은 자기 성찰을 문명의 자기 파괴적 잠재력이 상존하는 ‘위험사회’에서 피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유동하는 공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이 같은 자기 성찰을 얼마나 철저하게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을 겁니다.
P802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P803 근대 이후 서양문명은 애석하게도 신과 그의 이름으로 언급되던 최고의 가치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역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신은 사회제도에서도, 관습에서도, 생활규범에서도, 학문에서도, 또한 문학, 미술, 조각, 건축, 음악, 공연 같은 예술로부터도 점차 분리되어 잊혀 가고 있지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서양문명을 위기도 몰아가는 주된 원인입니다.
P803 신의 죽음이 곧바로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최고의 가치의 탈가치화는 동시에 세속적 가치들의 탈가치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불 보듯 뻔하게 드러내 보였지요.
P805 문제는 우리가 ‘큰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과 영웅 그리고 자기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는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성과 주체 그리고 사회적 진부와 혁명에 대해서도 근대적인 것이라며 입을 닫고 있지요. 그리고 오직 탈근대적인 이야기들, 즉 세속적인 것, 일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 상대적인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과 세계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며,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공포로부터 방어막이 되어 주던 모든 것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è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약 1300만명(개신교 810만, 천주교 510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P806 세계는 이제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자연적, 사회적 재난들이 삽시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위험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곳에서 이제 당신과 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자’로서 모든 당혹스러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모든 위험한 선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하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입니다.
è 일본 지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지구가 위험사회임을 실감했다. 남편은 미국회사에 다니는데 본사의 임원이 일본의 원전 폭발로 한국 출장의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바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불 경우 한국에 있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위험사회니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P808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취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컨대 작은 이야기들도 하되, 큰 이야기도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큰 이야기가 동반되는 폭력성도 차단되고, 작은 이야기가 가진 맹목성도 제거되지요. 칸트의 유명한 경구를 흉내 내어 표현하자면 작은 이야기 없는 큰 이야기는 공허하며 큰 이야기 없는 작은 이야기는 맹목이기 때문입니다.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견제하게 하자는 거지요.
P809 그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이 신 사랑과 이웃사랑의 공허함을 해소하고, 신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의 맹목성을 바로잡아 줍니다.
P809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온전한 담론’이 되게 하자는 것이지요.
P810 이제 우리도 새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의 인문학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3. 내가 저자라면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신은 무엇인가 / 2부 신은 존재다 / 3부 신은 창조주다 / 4부 신은 인격적이다 / 5부 신은 유일자다) 이를 뼈대로 9개의 장에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각 부의 첫 부분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슈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시작하는데 상세한 묘사로 장면을 세세히 그려줘 유익하고 재미있다. 이 책은 또한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으로 쓰여졌다. 저자는 이 수사법을 통해 독자가 딱딱한 강의실이 아닌 서재나 카페에서 흥미로운 환담에 초대된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수사법이 마음에 든다. 초등학생을 위한 신문 기사에서 본 듯한 말투가 친근하고 어렵지 않았다. 특히 글의 말미에 ‘자 정리해 볼까요?’라며 요점을 정리해주는 저자의 친절함이 참으로 고마웠다.
이 책은 쉽게 풀어 쓴 종교철학서의 느낌을 준다. 하지만 문학 전반에 대한 그의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은 참으로 경이롭다. 대학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한 내가 괴테의 시를 읽으며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서양문명을 이해하는 디딤돌인 ‘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글에 숨겨진 키워드를 해독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 나는 대학시절에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오직 점수를 위한, 취직을 위한 공부에 몰두한 내 젊은 날이 부끄럽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실로 오랜만에 노트 필기를 했다.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주요 내용을 베끼고 도식도를 그리며 그의 이야기를 따라갔다. 다섯 페이지에 달하는 필기 내용을 훑어보니 대략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을 끄는 문구도 다시 보인다. 세네카가 말한 “네가 동의하면 운명은 너를 인도하고,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명은 너를 강제한다.” 운명이 이끄는 길을 걸으며 살고 싶다.
나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교양으로 성경은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성당에 몇 번 가긴 했지만 교리 공부를 하지 않은 까닭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도 아직 잘 모르겠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내가 저자라면 성경에 대한 설명도 뒷부분에 부록으로 추가해 놓을 것 같다. 고미숙은 그의 책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열하일기의 원 목차, 열하일기 등장 인물 캐리커쳐, 주요 용어해설들을 덧붙여 놓아 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내가 저자라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이야기 흐름과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덧붙일 것 같다.
또한 맺음말에 제시한 ‘왜 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다. 근대 이후 서양문명이 신과 그의 이름으로 언급되던 최고의 가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로 인해 서양 문명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은 다소 비약이 아닌가 싶다. 서양이라 일컫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모르겠지만 내 주위 사람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다. 신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신을 만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신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결론은 큰 이야기(신, 영웅, 자기희생, 봉사, 이성, 주체, 사회적 진보, 혁명에 대한 담론)와 작은 이야기(세속적인 것, 일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 상대적인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a href="http://www.viviennewestwood-jp.com">ヴィヴィアン</a>いま、彼女は森林伐採を自分のリストに追加します。アンビルニットウエアーと協力して、<a href="http://www.viviennewestwood-jp.com/index.php/cPath,566">ヴィヴィアンウエストウッドハンドバッグ</a>熱帯雨林の国家の森林伐採を禁止することを支持するため、限定版のtシャツを販売始ります。<a href="http://www.viviennewestwood-jp.com/index.php/cPath,565">ヴィヴィアンウエストウッド財布</a>とても有名のデザインナーは環境保護に影響を与えますか。ウエストウッドの答えは「はい」です。<a href="http://www.viviennewestwood-jp.com/index.php/cPath,561">ヴィヴィアンウエストウッドイヤリング</a>
それで、私はこれらの靴画像を描けます、すばらしいファッションモデルです。ヴィヴィアンウエストウッドはパンクロックに一番大きい影響を与えます、彼女もオリジナルで影響力のあるデザインナーにな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