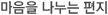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은주
- 조회 수 4795
- 댓글 수 8
- 추천 수 0
Oh! GOD, Oh! my DOG
이 글은 6기 연구원 (용장리 작은 성당에 사는 춘향이에게 빙의가 된) 이은주 님의 글입니다.
나는 시골 작은 마을 성당 마당에 산다. 이름은 춘향이. 목줄을 해놓고 동네 수캐들을 다 꼬신다고 본당신부가 붙여준 이름이다. 덕분에 원치도 않는 새끼를 일 년에 두 번씩 낳았다. 배가 부른 줄도 젖이 부른 줄도 아무도 몰랐다. 새끼가 태어나 꼬물거리는 것이 보이면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새끼 숫자를 세며 초복이, 중복이…….음 말복이 까지 딱! 셋이네 하는 말을 거침없이 했다. 개의 청력은 3만 5천OHZ 사람의 청력의 8배 나 되는 먼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사람의 주둥이를 물고 싶은 분노가 나의 허연 이를 들어나게 했다. 옛날에는 나무와 동물도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낀 나무와 동물을 입을 다물어버렸다. 관계와 소통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아껴 둘 때 쌓이는 에너지로 뚫리는 터널 같은 것이라는 모르고 있었다.
하느님은 내가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 모양이다. 나의 단단한 목줄이 풀어지는 기적을 주옵소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당 마당에 두 채의 집에는 각각 신부와 두 수녀가 살고 있다. 일요일 마당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자, 두 수녀는 바빠졌다.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 반가운 미소를 마구 날렸다. 신부는 허리에 디스크란 병이 걸렸는지 구부러지지 않는다. 마당의 번잡함이 고요로 바뀔 쯤 스피커로 신부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귀라도 좀 잘 들리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소리는 내 고막을 울렸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세요. 주위에는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신부는 ‘사랑’ 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다. 사랑을 부르짖는 신부나 수녀로부터 밥 한 번 제대로 얻어먹은 적도 없었다. 추운 겨울 타들어가는 갈증에 물을 먹으려 혀를 빼어 물면 영락없이 얼은 물에 혀가 달라붙었다. 밥그릇에는 계절마다 다른 것들이 들어앉아 있었다. 꽃씨, 누런 소나무 잎, 단풍, 그리고 소복한 눈. 무언가 들어있지 않은 날은 먼지가 풀풀 날렸다.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 날 때 밥을 주었다. 나는 늘 배가 고팠다.
수녀들은 아기를 낳아 보지 않아서인지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어미의 허기를 알지 못했다.
본당 신부는 마당에서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다이어트 이야기를 신자들과 침이 튀며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공통된 화제는 늘 살빼기와 건강식이었다. 나누어 먹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뱃살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건강 할 수 없다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밤이 되면 나의 빛이 되어주는 달에게 목을 길게 빼고 이야기를 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여 마음과 귀를 열어 들어라. 컹컹 컹컹컹컹~~
난 내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허기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는 그녀의 자동차 소리도 알 수 있다. 멀리서 그녀의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두 발을 들고 목줄이 묶인 채 뛰고 뱅뱅 돌았다.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오지는 알 수 없다. 배가 고파도 살 수 있었고 사랑이 부족해도 살 수 있었다.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개’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 말할 나위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다림’ ‘희망’ 은 배고프고 힘든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갔다. 그녀가 챙겨오는 우유와 밥이 말아져있는 걸쭉한 국물보다 좋은 것은 그녀의 ‘체온’이었다. 따뜻한 손으로 잘 있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나는 살포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두 발을 모으고 머리를 그녀에게 맡겼다. “잘 있구나! 배 많이 고팠지?” 그때 비로소 몹시 배고픔을 느꼈다. 그녀는 우유를 그릇에 부었지만 나는 달려드는 새끼들을 위해 양보를 했다. 말라붙은 공갈젖꼭지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새끼들이 먹을 수 없는 우묵한 그릇을 준비해왔다. “네가 먼저야.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네 배가 부르면 네 젖꼭지에서 나오는 따뜻한 우유를 새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 그건 네가 너를 사랑한 선물이란다.” 하며 나부터 챙겨주었다. 허기를 채우고 옆으로 누웠다. 달려드는 새끼들을 뒷발로 밀어내던 나는 그제야 그들을 품이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나는 기적이나 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신을 만날 수 있었다. 물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발과 손에서 나오는 사랑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갔다. 새끼들은 나의 몸에 엉겨 붙어 잠이 들었다. 행복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속에서 빛났다.
안녕하세요.은주씨..
송년회에서 잠깐 인사는 드린것 같은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에 함께 했었습니다.
재동씨 사진에서 강아지 사진을 말씀하신것 같아서
갤러리에 올리자니 좀 어색했는데 마침 글이 올라와서 댓글로 올립니다.
혹 사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원본을 보내드릴께요. 많이 크기변환을 한거라서 느낌이 덜하네요.






와이너리에 살고 있어요.

나도 와이너리에 산다우.

나야, 나 위에 와이너리에 산다구..



아아~~~ 너무 예쁘네요.
제가 이탈리라 여행을 함께 하지 못했더니 이런 아쉬운 사진들을 놓치고 말았군요.
하지만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개들은 이탈리아 남자들같이 안 느끼하게 생겼네요.ㅎㅎㅎ
원본 사진 필요하지요.
메일로 사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칼럼들도 찾아서 읽어 보았습니다.
제 블로그 글 하나 링크해 놓을께요.
http://blog.naver.com/qksfu1225/50057930535
잠시 키웠던 스피츠 지솔에 대한 얘기예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6 | 고양이에게 먼저 고백하다 - 이은남 | 옹박 | 2012.05.09 | 4260 |
| 95 | 먼 길 (by 이선이) | 승완 | 2012.05.07 | 4572 |
| 94 |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 - 김민선 | 옹박 | 2012.05.02 | 4314 |
| » | Oh! my GOD, Oh! my DOG (by 춘향이) [8] [1] | 은주 | 2012.04.27 | 4795 |
| 92 | 내 삶의 거울 - 송창용 | 옹박 | 2012.04.26 | 4419 |
| 91 | 몰입 : 창조적 인재의 핵심키워드 (도명수) | 경빈 | 2012.04.24 | 5169 |
| 90 | 그 여자는 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by 오병곤) | 승완 | 2012.04.23 | 4371 |
| 89 | 그는 과연 변할 것인가 (by 선형) | 은주 | 2012.04.20 | 8443 |
| 88 | 쌍코피 르네상스 (by 좌경숙) | 희산 | 2012.04.20 | 4459 |
| 87 | 자신의 미래를 보는 사람 - 한정화 [1] | 옹박 | 2012.04.18 | 7040 |
| 86 |
일상에 스민 문학- 이동 축제일 (정재엽) | 경빈 | 2012.04.17 | 6720 |
| 85 | 은남 언니에게 | 승완 | 2012.04.16 | 4382 |
| 84 | 영혼이 있는 공무원 - 최영훈 | 옹박 | 2012.04.11 | 4715 |
| 83 | 내 일상은 왜 이렇게 칙칙해? - 좋아하는 색깔 바지 입기... | 경빈 | 2012.04.10 | 4911 |
| 82 | 말바위로 가는 숲길에서 | 승완 | 2012.04.09 | 4589 |
| 81 | 여행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1) | 최코치 | 2012.04.05 | 3975 |
| 80 | 은빛 파도의 기억 - 김도윤 | 옹박 | 2012.04.04 | 4701 |
| 79 | 여행의 즐거움 (박소정) | 경빈 | 2012.04.03 | 4527 |
| 78 | 삶이 말을 걸어올 때 (by 최우성) [1] [1] | 은주 | 2012.04.01 | 6553 |
| 77 | 역사속 소심 위인 탐구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 | 최코치 | 2012.03.29 | 6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