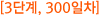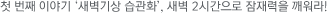
- 센티팍-박현진
- 조회 수 2503
- 댓글 수 3
- 추천 수 0
오전 반차를 내고 혜화동엘 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회사 복귀까지 남은 시간동안 뭐할까 하다가 아르코 미술관에 갔습니다.
전시를 하더군요.
일단 들어갔습니다. 입구가 반지하이기도 한데다가 작품이 빛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는지 어두웠죠.
바깥은 매우 환하고 밝은데 암실같은 곳을 들어가기가 썩 내키진 않았어요.
대충 둘러보고 나와야지 싶었는데 어느 설치물을 발견했지요. (아래 사진에 나오는 작품)
일종의 무대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무대 앞을 보도록 의자도 마련되어 있어요.
성큼성큼한 발걸음으로 스무폭쯤 되는 너비로 겉면은 유리창이고 그 안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작품은 매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유리 안쪽에 천천히 회전하는 나무가 있어요. 수증기가 서서히 공간을 채웠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관객으로서 가만히 앉아 작품을 보고 있자면 안개의 짙고 옅음에 따라,
물체의 회전 각도에 따라 안에 내용이 보였다 말았다 해요.
버드나무 가지로 추측은 하지만 움직임에 따라 그것은 늘어진 가지같기도 하고
거대한 코끼리의 그림자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천조각 나부랭이 같기도 해요.
문득 저것이 우리가 탐구하려는 내면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유리막이 가로막혀 있어 그 안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안의 공간도 안개 때문에 명료하게 보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요.
이것이 [단군의 후예]들이 새벽마다 겪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복과 천직을 찾고 내적인 고난을 견디는 과정이요.
외면과 내면의 경계, 인내의 담아 깊게 관찰해야 내면의 형상을 마주볼 수 있다는 것이 말이지요.
늘 제가 겪고 있고 관심있는 일에 비추어 사물을 보았더니 전시도 그렇게 연관을 찾게 되네요.
근래 드물게 묘하게 저의 상황에 감정이입하여 본 작품이었습니다.
ps.
3층 아카이브에서 작가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이 작업의 계기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것이래요.
작업장에 있다보면 애매함을 느낀대요.
본인이 작가인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인지, 아빠인지..
그저 명료하지 않은것이 아름다운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윤곽을 지우고 싶은 느낌. 애매하게 사라질 마음의 한구석…그런 상태를 표현하려고 했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