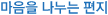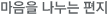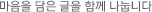
- 김용규
- 조회 수 3829
- 댓글 수 5
- 추천 수 0
이번 추위는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며칠째 산방의 수도에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도가 언 것입니다. 나의 산방은 숲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 수도관으로 끌어 쓰고 있는데, 이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느티나무 아래 옹달샘의 물을 길어다가 쓰며 원시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계절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흐르는 저 옹달샘이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는 홀로 이 옹달샘을 ‘생명을 키우는 샘’이라 부릅니다.
여름 한 철 농부는 이곳의 물을 떠 갈증을 지웠고, 나는 이 물을 길어 쓰며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대도 알듯이, 저 옹달샘에는 나만이 아닌 수많은 생명이 기대어 살아갑니다. 샘 위에 앉은 느티나무는 수십 년을 저 샘에 기대고, 또한 수호신처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봄, 도롱뇽은 이곳에 알을 낳았고, 청개구리는 무시로 이곳을 오갔습니다. 지난 여름 두꺼비 한 쌍도 몇 주일 이곳에 머물다 숲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머위와 이끼는 이 옹달샘의 물을 머금어 삶을 잇고, 제법 많은 곤충들이 저 물속에서 우화할 것입니다. 산방 앞 밭의 여름 밤을 수놓았던 반딧불 중 몇 마리는 아마 이곳 샘의 물이 흐르는 언저리가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 샘이 있어 내가 살아가고 다른 많은 생명들도 살아갑니다.
아랫마을 어르신들은 어느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차오르고 흐르는 이 샘을 신이 주셨다고 합니다. 옆에 사는 나더러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몇 개월의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까닭은 저 숲에 사는 생명들의 다양성 때문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숲에 옹달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나무들만 사는 숲에는 옹달샘이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작은 나무나 풀들만 있는 숲에도 옹달샘이 솟을 리 없습니다. 비가 올 때, 작은 나무와 풀과 이끼들은 큰 나무가 놓치는 빗방울을 한 번 더 거르며 잡아둡니다. 작은 그들은 줄기와 잎을 활용해서 빗물의 유속을 줄이고 그들의 뿌리 근처 땅 속으로 스미는 물을 잡아둡니다. 큰 나무들은 자신의 깊은 뿌리줄기를 통해 더 깊숙이 스며든 물들을 잡아당깁니다. 식물들 각각의 뿌리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 토양의 각기 다른 층에 물이 머물고 흐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생명들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며 드넓게 퍼져 살아갈 때 숲은 마르지 않는 스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의 뿌리 깊이가 다를수록 숲을 지나는 물의 발걸음은 느려지고 숲은 더욱 푸르러집니다. 그러한 곳이라야 비로소 ‘생명을 키우는 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숲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추운 겨울, 수도가 얼면 겪게 될 절박한 갈증을 해소해 줄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사람의 숲에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를 적시고 다시 누군가의 갈증을 적시며 생명 서로를 키워낼 수 있는 샘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시대 우리는 너무 같은 길을 걷도록 튜닝 되고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만 내라 합니다. 더 빨리 크고 곧게 뻗는, 큰 나무들만이 사는 숲이 되자 합니다. 그러나 그 숲에는 옹달샘이 생겨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꼴이 자연의 이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샘은 다양성 속에 거(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썽이리님_ 말씀대로 숲이 보여주는 균형은 바로 각자의 숲 생명체가 보여주는 '和而不同'의 모습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숲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다양성이 장려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종되어가는 세상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써 본 글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파_ 자주 보지 않아도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듬직한 그리움은 가끔 보게 되는 것 만은 못합니다. 책의 원고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카메라 무겁게 들고 찾아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