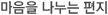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인센토
- 조회 수 2228
- 댓글 수 2
- 추천 수 0

기억이란 게 서툰 초고의 글귀처럼 끊임없이 수정되고 각색되는 것이라 믿을 순 없지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생애 첫번째 기억은 다음과 같다. “이사를 하는 날, 나는 파란 용달 트럭의 앞 좌석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 차창으로 뽀얀 햇살이 번져 들어오고, 섬과 육지 사이에 놓인 다리 아래로 하얗게 출렁이는 바다를 지나 어딘가 낯선 곳을 향해간다.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작은 가슴이 콩닥거린다.”
순진하게도, 또 한편으로 영악하게 나는 첫 직장을 얻기 위한 자기 소개서에 이 기억을 되살려 이런 요지의 뻔한 홍보성 문구(?)을 적었다. “제가 하는 일은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일, 그 둘 사이에 놓여 있는 다리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낯뜨거운 글이다. 그렇지만 한 때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놓여진 다리 같은 것이 있으리라 믿었다. 최선을 다하다보면 그 ‘보이지 않는 다리’가 내 눈 앞에 선명히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우리의 삶은 예쁜 동화가 아니다. 아니, 백번 양보해서 동화같은 것이라 해도 아주 잔혹한 동화이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놓인 다리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길을 찾아 헤맸다. 모든 것은 잘못된 교육 탓이다. 쓸데없이 주입된 영양가 없이 비쩍 마른 이론 탓이다. 아니, 내 탓이다. 편한 것에 익숙한 ‘작은 인간’으로 길들여져 보잘것 없는 나약한 어른이 된 탓이다. 그러니 아직도 주위를 곁눈질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방법‘ 같은 것을 찾아 헤맨다.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론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장자의 ‘바다새’ 우화처럼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이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일종의 파시즘이다. 바다새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을 연주해주고, 맛있는 고기를 준다 해도 '새를 기르는 방법'이 아닌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론 새는 결국 굶어 죽을 뿐이다. 공자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했다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일이 상대방에겐 그토록 간절히 원해 왔던 일인지도 모른다.
‘너’란 타자는 항상 미지의 세계이다. 미지의 세계는 걸어서 갈 수 없다. 타인이란 섬에 닿기 위해선 여기에서 날아올라야 한다. ‘기존’의 나란 안전한 땅을 떠날 때에만 거친 바람을 타고 보이지 않는 그 섬에 가닿을 수 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결사적인 도약’salto mortale의 지점이리라.
시인 이성복은 “방법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설가 김연수도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우린 노력해야 한다. 비록 그 곳에 가 닿지 못한다 할지로도 우린 날아올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