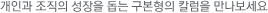

- 구본형
- 조회 수 14542
- 댓글 수 14
- 추천 수 0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왜 우리는 웃게 될까 ? 왜 우리는 양쪽 눈을 동시에 깜박일까 ? 어른에게는 모든 놀라움이 익숙한 것이 되었다. 놀라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어른의 조건인지도 모른다. 세계는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다. 사과가 떨어질 때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이 왜 떨어지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당연히 떨어져야지. 무거우니까' 그들은 대충 이쯤에서 만족한다. 바로 이 대답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기에 뉴튼의 발견은 인류의 과학적 진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호기심으로 조건없이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사물을 새롭게 바라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힘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21세기 인재들이 갖추어야할 최고의 미덕이다.
창의성의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온다. 철학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를 묻는 질문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질문이 위대한 것이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질문할 수 있는 호기심과 자유의 힘을 빼앗아 간 것이다. 너무도 빨리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을 제쳐두고, 아직 절실하지 않은 세상의 대답들을 외우게 함으로써 질문의 힘을 죽여 버린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는 순간 학생들은 이 세상에는 정답이란 애초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때그때 가능한 복수의 답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몇 개의 가능한 답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답을 찾아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는 힘이다. 질문이야 말로 멋진 답으로 가는 마법의 길인 것이다.
질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 익숙하여 신기할 것이 없는 것을 낯설게 보는 훈련으로부터 온다. 나는 이것을 '시인의 시선'이라고 부른다. 수십 번 수백 번 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적이 없는 것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산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느닷없이 재미있는 세상으로 인도 된다. 시인처럼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원칙을 정해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시를 재미있게 써서, '구라' 황석영 선생도 '내가 너에게 졌다'라고 항복한 후배 시인으로 입담이 걸걸한 이정록 시인이 있다. 그의 시를 보면 시인의 시선을 갖기 위한 초보적 훈련의 교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사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불러 보는 것이다. 그는 콘돔을 가지고 '작명의 즐거움'이라는 시를 지었다. 콘돔을 대신할 우리말 공모의 대상으로 '애필(愛必)-사랑할 때 필수품'이 선정되었는데, 애필이라는 진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로 그만 무산되고 말았단다. 대상은 못되었지만 수많은 가작들이 즐비했으니 대충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똘이옷 고추주머니 밤꽃봉투 물안새 꼬치카바 거시기골무 여따찍사 쭈쭈바껍데기 즐싸 솟아난열정내가막는다 등등이 있었단다. 그는 그게 시(詩)란다. 하나의 사물을 이리보고 저리보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낸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선이 자란다. 그러면 간단히 연습해 볼까 ? 나는 나를 무어라 부르면 좋을까 ? 명함 속에 적힌 나를 대신할 새로운 이름의 나는 무엇일까 ?
둘째는 비교해 보는 것이다. 도토리와 상수리는 어떻게 다를까 ? 이정록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드러누워 배꼽에 얹어놓고 흔들 때 굴러 떨어지면 상수리, 잘 박혀 있으면 도토리, 귓구멍에 박아 넣어 쏙 빠지면 상수리, 큰일났다 싶어지면 도토리, 줍다가 말벌에 쏘이면 상수리, 땅벌에 쏘이면 도토리, 떨어질 때 산토끼 다람쥐가 깜짝 놀라면 상수리, 아무도 모르면 도토리'라고 말한다. 긴 설명으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모자라는 것을 운율타고 시처럼 읆는다. 이때 문득 삶은 시가 된다. 비교하라. 그러면 네가 내가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니라 나는 유일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셋째는 삶에 농(弄)을 치는 것이다. 웃음이야말로 순식간에 우리를 '문화적 복제'에서 떨어져 나오게 만든다. 웃음은 자유다. 어디서나 웃을 수 있다면 아직 삶이 자유로운 것이다. 나는 커다란 바위틈에 콩을 넣고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 콩이 불어나 바위를 쪼개는 것을 보았다. 웃음은 삶의 중압과 스트레스라는 바위를 쪼갤 수 있는 콩이다. 다시 이정록 시인의 시에 이런 게 있다. '원고지 처음 만난 4학년. 뭘 써도 좋다 원고지 다섯장만 채워라 처음 원고지 펼쳐보니 10x20 답은 200 원고지칸 마다 200이란 숫자를 가득 써냈다. 너 같은 놈은 교사생활 삽십년에 처음, 개교 이래 처음, 그로부터 15년 나는 작가가 되었다.' 웃음이 울음이 되는 것이다. 또 울음이 웃음이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삶이란 눈물 콧물 웃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자각이다. 아주 가까이서 그놈을 지켜보고 만져보고 말시켜보고 핥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듯이 아주 낯선 얼굴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아야 한다. 낯선 여인이 늘 신비하듯, 낯선 삶이 흥미진진하다.
(부산일보/대구매일신문 8월 19일 기고문)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3 | 하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새로운 균형이 시작된다 [5] | 구본형 | 2010.10.04 | 9675 |
| 502 | 미래를 경영하는 법 [5] | 구본형 | 2010.09.25 | 8797 |
| 501 | 영웅들의 비밀 [4] | 구본형 | 2010.09.16 | 8872 |
| 500 | 박노진의 책 추천사 - [4] | 구본형 | 2010.09.15 | 9310 |
| 499 | 먼저 나를 따르라 [6] | 구본형 | 2010.09.14 | 8313 |
| 498 | 과잉 책임감이라는 덫 [2] | 구본형 | 2010.09.13 | 8787 |
| 497 | 젊음, 꿈, 투지 [7] | 구본형 | 2010.09.08 | 9606 |
| » | 익숙한 것 낯설게 보기 [14] | 구본형 | 2010.08.31 | 14542 |
| 495 | 매니 이야기- 회심(回心), 메타노이아(metanoia), 위대한 정신적 전환 [4] | 구본형 | 2010.08.30 | 9130 |
| 494 | 산토리니 당나귀가 가르쳐준 소통의 원칙 [5] | 구본형 | 2010.08.26 | 8703 |
| 493 | 델피에서 - 배우려는 자는 무지에 통곡해야한다 [6] | 구본형 | 2010.08.19 | 8635 |
| 492 | 나눔의 경영학 [7] | 구본형 | 2010.08.05 | 9303 |
| 491 | 아침에 비 [8] | 구본형 | 2010.08.02 | 8913 |
| 490 | 변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8] | 구본형 | 2010.07.29 | 9718 |
| 489 | 나의 독서법 - SBS 와 함께하는 독서의 기쁨 캠페인 [12] | 구본형 | 2010.07.22 | 11647 |
| 488 | 두 번 의 여행 [4] | 구본형 | 2010.07.21 | 8050 |
| 487 | 놓아두자, 인생이 달려가는 대로 [9] | 구본형 | 2010.07.19 | 10794 |
| 486 |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6] [1] | 구본형 | 2010.07.15 | 10035 |
| 485 | 올해는 제발 떠나시게, 미루지 말고 [8] | 구본형 | 2010.07.13 | 10131 |
| 484 | 아프리카로 가자, 순수한 인류의 소년시대로 - 카를 구스타프 융, 생각탐험 26 [7] | 구본형 | 2010.07.07 | 13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