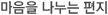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인센토
- 조회 수 1905
- 댓글 수 2
- 추천 수 0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니?”
내게 대답했다.
“삼촌, 내가 있잖아요. 숲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마침내 통나무집을 발견했걸랑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삼촌이 나오잖아요!”
꼬마는 갑자기 눈이 똥그래져서 내게 묻는다.
“말해줘요, 삼촌. 그 집에서 뭐하고 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대체 나는 그의 꿈 속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때로 삶이 온통 꿈일 때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곧잘 현실 속에서 백일몽의 세계로 빠져들곤 한다. 하지만 젊음의 왕관을 벗고 현실과 대면하는 순간, 높은 벽과 같은 현실이 앞을 가로막으며 정신차리라 한다. 이제 어른이 되라며 따귀를 때린다. 하지만 삶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실과 꿈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 생각이란, 한 사람의 인생이 수천 수만의 순간들과 날(日)들로 혼합되어 있더라도, 그 많은 순간들과 그 많은 날들은 단 한순간, 즉 인간이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함께 산다.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푸코가 말했듯 명확한 정체성을 지닌 “인간은 근대의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 뱀이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듯, 달이 지고 다시 차듯 우리는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 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의 어느 찰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예감하게 된다.
“어느 사람이 세상을 그리는 작업에 나섰다. 오랫동안 그는 한 공간을 시골들, 왕국들, 산들, 해안들, 배들, 섬들, 물고기들, 방들, 기계들, 행성들, 말들 그리고 사람들로 채워갔다. 죽기 얼마 전, 그는 그 끈질긴 선의 미로들이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그런 날들이 있었다. 여기도 저기도, 그 어디에도 가닿지 못한 날들. 여기도 저기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날들. 아마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으리라. 그런데 돌아보니 여기도 저기도 나의 자리가 아니었다. 오직 내가 서성이던 그 사이의 날들이 바로 나였다. 다시 보르헤스의 말이다.
“어쩌면 멜로디 한 소절보다 짧을지도 모르는 인간은, 결국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순간의 꿈이자 영원이다.
-------------------------------------------------------------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 전기에서 재인용
** 보르헤스, 문학을 말하다 중
***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 전기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