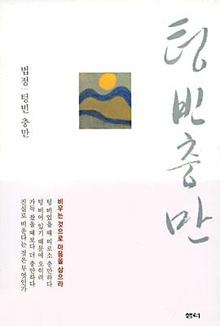- 승완
- 조회 수 2730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직장인, 책에서 길을 묻다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가죽 소파를 구매했다. 용달비 포함 10만원. 새것이 보통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거저나 다름없다. 2주 동안 인터넷에서 ‘잠복 근무’를 한 결과다. 근무 시간에도 30분마다 스마트폰으로 소파들을 검색해야 했다. 집에 들여놓고 보니 사용 흔적이 거의 없이 깨끗하다. 오랜만의 횡재에 부부는 행복해 하며 맥주잔을 기울인다.
문제는 다음날부터였다. 용달비를 아끼려고 혼자 소파를 들었던 남편은 다음 날부터 허리를 펴지 못했다. 꼬박 일주일을 한의원 신세를 졌다. 아내는 새로 산 소파가 다칠세라 소파 패드와 쿠션을 구매하기로 했다. 소파가 10만원인데 패드와 쿠션은 20만원이 넘는 불편한 진실. 게다가 툭하면 소파에 올라 다이빙 자세를 취하는 세 살짜리 아이를 위해 아내는 이제 십 몇 만원의 유아 매트를 고르고 있다. 그 동안 쏟은 시간과 돈, 정력을 고려하면 이 부부는 한 달 째 소파와 씨름 중인 셈이다. 이쯤 되면 부부가 소파를 깔고 앉은 걸까, 아니면 소파가 부부를 깔고 앉은 걸까.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유를 당한다는 것이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얽매어 버린다. 평생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았던 법정 스님은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 말라’고 강조한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싸게 살지’ 고민하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지만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가지면 그 하나의 소중함 마저 잃고 만다. 스님은 경험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한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몇 사람이 오디오를 설치해 주었다. 한 일 년쯤 듣다가 또 변덕이 일어나 되돌려 주었다. 음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소유의 더미가 싫어서였다. 치워버릴 때는 애써 모았던 음반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린다. 그렇게 한 동안 음악을 듣지 않으면 내 감성에 물기가 없고 녹이 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중략) 이제 내 귀는 대숲을 스쳐오는 바람소리 속에서, 맑게 흐르는 산골의 시냇물에서, 혹은 숲에서 우짖는 새소리에서 비발디나 바하의 가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만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 보다 더 충만해진 것이다. ”
‘텅 빈 충만’-이 역설의 의미를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분에 넘치는 소유는 오히려 존재를 가로막는다. 물건을 새로 사들이고 한동안 지니다가 시들해지면 내다 버리는 순환에 갇혀 있는 한 맑고 투명한 존재의 충만감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소유가 높아지면 존재는 사그라진다. 텅 비울 수 있어야 비로소 존재가 가득해진다. 가녀린 촛불 하나가 빈 방을 가득 채우듯.
보통 깊이 있는 책은 어려워 잘 안 읽히고 읽기 쉬운 책은 깊이가 부족한 데 반해, 법정 스님의 책은 중학생도 읽을 만큼 쉽지만 그 깊이는 삶의 심연에 이른다. 바쁜 틈에 잠시 읽으면 시간이 멈추고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글 또한 스님을 닮아 맑고 투명하기 때문이리라. 하얀 눈이 내리는 이 겨울, 텅 비어서 티 없이 맑았던 그가 그립다.
- 박승오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directant@gmail.com
*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직장인, 책에서 길을 묻다' 12월 9일자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0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