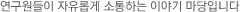
- 도명수
- 조회 수 3199
- 댓글 수 3
- 추천 수 0
삶과 죽음
집안의 어른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에 사셨던 누님이, 올해는 집안의 최고 어른이셨던 아버님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늘 외로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누님이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넘어가 고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아버님은 22년 전 저의 어머님이자 당신의 아내를 잃어 홀로 남은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최고 어른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에 이를 것이고 죽음 앞에서 저의 존재를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단지 죽음의 세계에서 잠시 삶을 느꼈을 뿐입니다. 죽음은 영겁에 가까우나 삶은 그야말로 찰나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비좁아 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삶이 너의 삶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는 데 익숙하며, 익숙하기 보다는 변화를 사랑하며, 변화보다는 혁신을 즐기는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찰나의 삶은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변경연의 연구원이 그러한 삶을 갈구하고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알 되 우리의 삶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삶의 찰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그래서 슬픔이 아닙니다. 그 분도 찰나의 삶에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묘지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국가가 마련한 묘지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부름으로 상한 몸을 이끌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희생은 영생을 보장하는 가 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러한 한 사람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후의를 베풀어준 연구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동일한 일이 일어나면 잊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늘 행복과 건강이 가정아래 꽃피우기를 갈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6. 7
분당 정자동에서 도 명수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