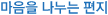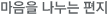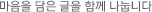
- 이철민
- 조회 수 1332
- 댓글 수 3
- 추천 수 0
전국에 크고 작은 전통시장은 약1500개 정도입니다. 파이낸셜 뉴스(2018.1.7.일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과 소점포에 지원한 정부예산은 3조 2249억 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3541억 원입니다. 그 중 약 2조원 가량이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쓰였습니다. 비 가림을 위한 지붕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등이 주사업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각납니다. 대형 쇼핑센터와 할인매장의 난립,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부문의 약진 등이 우선 생각납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회의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부지원을 줄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마저 없었다면 전통시장의 현실은 더욱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혁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요? 만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간의 지원은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 1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2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 상권에서 또는 그 분야에서 1위가 아니라면
당신은 ‘좋아지기’보다는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전통시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립을 위한 사업 다양화에도 애를 씁니다.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인터넷몰이니 청년몰이니 등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그 예입니다. 아쉬운 건 하나의 사업이 히트를 치면 전국의 시장들이 모두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처음엔 혁신을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나머지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업들이 대동소이해 집니다. 그러니 결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2단계는 소프트웨어를 찾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역사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배경으로 우리 지역만의 전통시장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예산들이 시설개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별 전통시장들이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험하고 적용해보도록 자원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은 ‘다름’에서 나올 테니까요.
*) “파는 건 똑같은데 왜 그 가게만 잘될까 (북포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