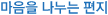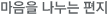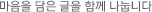
- 정재엽
- 조회 수 1188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일상에 스민 문학]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띄우는 마음편지도 뉴욕에서 보냅니다. 이제 저의 출장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출장이 장기화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들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아는 분들 집에 초대를 받아 뉴욕시 교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미국 생활을 하신지 20년이 넘은 분들이십니다. 이제 막 대학 입학을 앞두고 원서를 지원하느라 무척이나 분주한 생활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곳의 교육열도 한국에 못지않아 아이들의 대학 입시에 오매불망하는 모습들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사회에 대한 소외감들을 ‘적어도 나의 아이들 세대에는 되돌리게 하고 싶지 않아’, ‘교육’을 통해 사회의 중심부로 침투시키려는 욕망들이 아주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러한 욕망을 나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보를 만드는 삶이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실력인데,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그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교육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붓는 그들의 절실함이 무척이나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유태인 의대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이민자들의 교육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특히 아시아 학생들이 성적과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실용 학문들에만 너무나도 신경을 쓰다 보니, 인문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학생이 되어 방황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속적인 돌봄 프로그램들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청새치를 낚았건만 상어 떼가 다 떼어먹고, 결국 남은 것은 앙상한 뼈밖에 안남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다시 미국이라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껴, 자기 자신이 마치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며 다그치는 부모님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유 중 상당수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라고 대답했기에, 오히려 좋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면 부모들은 심한 죄의식에 빠진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함께 하시던 지인께서 갑자기 시계를 만지작거리시더니, 방과 후 학교 과정을 막 끝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며, 커피를 마시다 말고는 바로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덧붙이십니다.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산 정상에 와 있고, 비록 상어 떼가 다 잡아 먹었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삶의 깊이는 남다를 것이다.”
저는 당장 서점에 들러 영문판 <노인과 바다>를 사서 대학을 앞둔 아이에게 선물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먼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 지원해야 할 원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깜깜한 방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바라보는 <노인과 바다>.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해줄까요? 이곳 뉴욕의 가을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후에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노인과 바다>를 요약본만 읽었지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서 읽어야겠어요. 써주신 메모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노인과 바다가 가지는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려구요.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가면 바로 이 책, <노인과 바다>를 읽어볼 생각입니다.
정재엽 (j.chung@hanmail.net)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