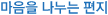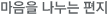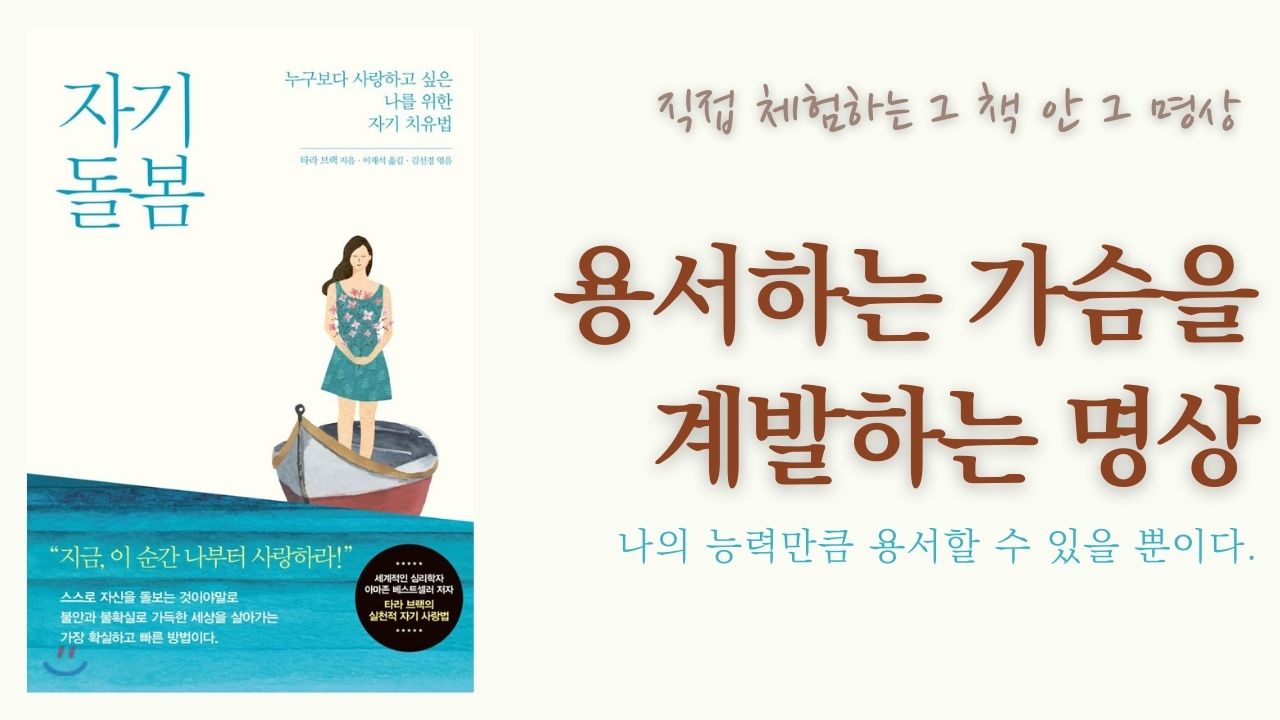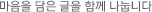
- 아난다
- 조회 수 2731
- 댓글 수 2
- 추천 수 0
‘자기돌봄 명상’, ‘인요가 몸챙김 명상’, ‘책 명상’, 내가 만들어 놓은 유트브의 재생목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살림 명상’, ‘글쓰기 명상’, ‘먹기 명상’, ‘돈 명상’ 등등 만들고 싶은 영상 목록에도 어김없이 ‘명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요가채널’이라고 만들어놓고, 한달간 만들어낸 영상 17개 가운데 요가 영상은 달랑 3개다. 그 영상들에도 어김없이 ‘명상’이라는 태그가 달려있다. 이쯤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너에게 명상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 습관적으로 책을 찾았다.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데 힌트가 될 만한 책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읽어댔다. 혹시라도 ‘열심’이 부족해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는 것은 단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삶에 대한 무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변하는 희열을 맛 볼 수 있었다. 이리 저리 헤매 다니다가도 ‘아하! 그렇구나!’하는 순간 온몸에서 느껴지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함이 있었다.
그러다 서른 다섯즈음 오랜 시간 용케도 피해 다니던 난감한 질문세트와 딱 마주치고야 말았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등등. 남는 시간에 짬짬히 답을 찾아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이었다. 도망쳐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봤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차피 답해야할 질문이라면 작정하고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10년을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둘러대곤 했지만, 긴 휴직을 거쳐 결국은 퇴직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른다. 10년 동안 내가 책 속에서 찾은 답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책 속에는 답이 없다.”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그동안 나를 통과해간 나름 수많은 ‘좋은 책’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 ‘네가 찾는 대답은 다른 그 어디도 아닌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진실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동료 인류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운명을 살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작품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이 명백한 진실에 이른 이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책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 ‘결국은 나로 돌아 가야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중에도 이 과정을 실제로 도와주는 책들을 나는 ‘실용서’라고 부른다. 내가 소위 ‘명상서적’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최고의 실용서로 꼽는 이유다.
하지만 훌륭한 건강 서적이 건강을 만들어줄 수 없고, 훌륭한 재테크 책이 돈을 가져다주지 않듯이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아무리 ‘실용적인’ 실용서라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데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다. 특히 ‘내 안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명상 서적을 그냥 책으로만 읽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직접 여행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수없이 많은 여행팁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했더랬다. 여행서적과 여행의 간극을 메워주는 여행도우미처럼, 누군가 명상서적과 명상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책은 몸으로 읽을 때만 삶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절실한 갈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침내 내 스스로 그 역할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신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를 보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한 이유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다.
‘직접 체험하는 그 책 안 그 명상’이라는 기획은 바로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긴 첫 번째 시도다. 가슴을 울렸던 책 안의 명상 프렉티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https://youtu.be/YsG4-R3eZ5w
일곱 개의 영상(아픈 나를 위로하는 명상, 나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명상, 나의 두려움과 눈 맞추는 명상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절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안의 기쁨이 깨어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깨어난 나의 기쁨이 나만큼 간절하고 절실한 당신의 기쁨을 깨워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조용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