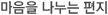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김미영
- 조회 수 3027
- 댓글 수 0
- 추천 수 0
***
담이 들었다. 어젯밤에 누워 있다가 연락을 받고 큰딸과 출동하면서 그랬나 보다.
작은딸이 첨으로 ‘감성 주점’에 간다고 했단다. 동행한 친구가 큰딸에게 전화했다.
만취해서 화장실에 뻗어있는 모양이었다. 모자를 뒤집어쓰고 달려가서 모시고 왔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을 챙기기엔 버거웠다. 다음엔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등이 뜨끔뜨끔 아프고 뻐근했다. 가만히 있기도 어려웠다. 점점 심해졌다.
핑곗김에 애정하는 마사지를 받으러 찜질방 사우나에 다녀왔다.
몇 번 앓는 소리 내고 났더니 한결 나아졌다. 마사지 아주머니 짱이다.
엄마 노릇도 체력이 달려서 못 해 먹겠다.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
작은 녀석은 운이 좋았다. 어제 같은 주말에 엄마도 언니도 집에서 맨정신이었으니까.
만취 사건 두 번째다. 작년엔 친구랑 둘이서 마시곤 친구를 응급실에 보내버렸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그 친구를 어제 만났는데, 인사하기 바쁘게 집에 보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고 치는 사이인가? 요즘 유행하는 절친인가?
누구 닮았겠나? 부모가 허구한 날 술 퍼마시는 걸 봤으니 겁 없이 마신 모양이다.
2년 전쯤 큰애도 친구들 전화에 불려 나가서 끌고 들어온 적이 있다. 혼자 애먹었다.
무서웠는지 그 뒤론 조심하고 조절해서 정신 차린다고 한다. 맘대로 되면 다행이다.
동생을 보더니 잔소리 대마왕으로 변신해서 호되게 혼을 냈다. 이런 게 든든해도 되나?
다 큰 딸이랑 산다는 건, 여자이기 이전에 엄마로 사는 일이고, 귀찮고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도 올해, 떠나려고 했었다.
자식에게 희생하는 엄마, 신이 모두에게 올 수 없어서 대신 왔다는 엄마, 나는 아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나쁜 엄마다. 다른 사랑을 꿈꾸는 이상한 엄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동안 날개옷을 처박아둔, 그 날만 기다려온, 날라리 엄마다.
‘엄마’라는 이름의 유효기간은 이미 넘겼다.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제 와서 내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반길까? 내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과 같을까?
오늘은 ‘아빠를 만나는 날’이라고 둘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챙기고 나갔다.
문득, 나도 가끔 ‘엄마를 만나는 날’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결혼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을 선택했고, 나머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하다.
뭔가 선택하면 나머진 감당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떠나고 싶었다.
남편 하나 정리했는데 오만 인간관계가 싹 다 정리됐고 그리곤 그만이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몹시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걸 알았다.
별로 내키지도 않았다. 대충 '엄마‘라는 이름의 가면 뒤로 숨는 게 나았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기가 그랬다.
별로 내키지 않았다.
너무 불편했다.
‘여자’이기가, ‘나’로 살기가, 내 ‘욕망’에 다가가기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나로 살고 싶던 그 언젠가가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모습이기가, 그렇게 살기가, 그 길을 선택하기가, 선뜻 나서기가 더딘 거다.
아직은 ‘엄마’라는 이름의 가면이 더 필요한가 보다.
그 나머지를 감당하기가 더 수월한가 보다.
어느 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까지는.
**
12:00 배, 과채 주스(토마토, 포도)
배고프다는 딸들에게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을 잘라서 내밀었다. 채소도 있다고 큰소리쳤다. 휴일 아침에 이런 대화는 정말이지 참으로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하는 내가 낯설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다 우연히 선택한 디톡스가 준 선물, ‘낯설게 하기’다.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고, 잠시 후에 말없이 집어먹었다. 대성공이다.
3:30 두유, 아몬드, 호두
개운하게 사우나를 다녀와서 마시는 무첨가 두유는 정말이지 잊고 싶은 맛이다. 그냥 물을 마실 걸 그랬나, 이게 몸에는 좋은 게 맞나, 에이, 언제 또 마셔보겠나 하면서 즐겼다. 아니, 즐기려고 노오력을 했다. 엄청 했다. 노력하느라 출출해서 아몬드와 호두를 곁들였다. 그나마 얼마나 고마운가. 견과류는 정말 훌륭한 간식이다. 두유의 뒷맛을 말끔히 가져갔다.
6:30 오렌지, 오이, 현미밥, 야채볶음, 상추, 된장국(다시마, 시금치, 두부)
엊그제 먹다 남긴 나또는 아직 냉장고에 있다. 못 본 척했다. 아마 당분간 안 보일 예정이다. 좀처럼 드문 경우이긴 하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바꿔야겠다. 먹다 남겼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쨌든 놀랍고도 대단한 발견이다. 만약 안 먹고 버리게 된다면 또 하나의 발견이다. 버리기 직전의 음식도 가린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
간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일주일 후 식단에 관심이 생겼다. 7일 동안 어떤 음식을 차례대로 식단에 추가할지 고르느라 뇌가 팽글팽글 회전을 했다. 한참 굴려도 딱히 떠오르는 메뉴가 없다. 과일과 채소를 챙기다가 그새 음식을 다 까먹었나? 뭐가 먹고 싶었더라? 뭘 좋아했었지? 수육? 김치찌개? 스테이크? 치킨? 잔치국수? 냉면? 회? 햄버거? 피자? 계란말이? 만두? 김밥? 엽기 떡볶이? 쟁반 짜장? 삼선짬뽕? 참이슬? 처음처럼? 기네스? 지평? 끼안티?
왜 별다른 감흥이 없지?
식욕이 다 어디로 간 거지?
바보가 됐나? 그럴 리가….
에잇! 다들 딱 기다려라.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16 | 정예서/ 쪽파 다듬는 남자 | 효우 | 2017.09.14 | 2877 |
| 615 | 정예서/소비의 쾌감 | 효우 | 2017.08.23 | 2924 |
| 614 | 정예서/ 시간의 가치 | 효우 | 2017.08.17 | 2820 |
| 613 | 정예서/ 아버지의 초상 | 효우 | 2017.08.09 | 2924 |
| 612 | 정예서/ '나는' 이라 쓰고 | 효우 | 2017.07.12 | 2916 |
| 611 | 정예서/ 고수와 허수 | 효우 | 2017.07.05 | 2949 |
| 610 | 정예서/ 제구포신 | 효우 | 2017.06.28 | 3222 |
| 609 | 정예서/ 한 사람의 생 | 효우 | 2017.06.21 | 2969 |
| 608 | 정예서/ 순한 者 | 효우 | 2017.06.14 | 2890 |
| 607 | 정예서/침묵의 시간 | 효우 | 2017.05.31 | 2979 |
| 606 | 디톡스 다이어리 24 - 꿈 토핑, 10대 풍광 [2] | 김미영 | 2017.05.23 | 2954 |
| 605 | 디톡스 다이어리 23 - 다시 디톡스 | 김미영 | 2017.05.22 | 2924 |
| 604 | 디톡스 다이어리 22 - 노는 게 제일 좋아 | 김미영 | 2017.05.21 | 2971 |
| 603 | 디톡스 다이어리 21 - 엉뚱한 일상, 여행여락 | 김미영 | 2017.05.19 | 2944 |
| 602 | 디톡스 다이어리 20 - 정양수 선생님께 [2] | 김미영 | 2017.05.18 | 2899 |
| 601 | 디톡스 다이어리 19 - 닿지 못한 체르코리 | 김미영 | 2017.05.17 | 2984 |
| 600 | 정예서/ 왜 배우는가 [1] | 효우 | 2017.05.17 | 3053 |
| 599 | 디톡스 다이어리 18 - 랑탕마을 [2] | 김미영 | 2017.05.16 | 3068 |
| 598 | 디톡스 다이어리 17 - 포스트 디톡스 | 김미영 | 2017.05.15 | 2935 |
| » | 디톡스 다이어리 16 - ‘엄마’라는 가면 | 김미영 | 2017.05.14 | 3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