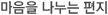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옹박
- 조회 수 4462
- 댓글 수 1
- 추천 수 0
이 글은 3기 연구원 김민선(호정)님의 글입니다.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있는 한 편의 글을 쓰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일련의 정신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머리고 마음이고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떠 있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무엇이 고민이고 문제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그 ‘무엇’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리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 속이 뒤죽박죽 카오스 상태라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할 도리 밖에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머리와 가슴을 열고 죽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전처럼 되지가 않네요. 몰입해서 흡입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여유도 줄어들어 남을 생각하기가 인색해집니다. 배려의 폭이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좁아진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일은 해야 되겠어서 일부러 조금 더 발랄해집니다. 일부러 더 열심히 합니다. 일부러 더 웃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한편 이러는 내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냥 시간에 쫓기지 않고, 걱정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지는 좀 되었던 듯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일을 접고 몇 달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것을 열렬하게도 바래왔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에 몸담고 있고 휴가가 자유롭지 못한 나로서는 비현실적인 바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주 만이라도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역시 시간 내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속도 모르는 소리, 너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총체적인 회의와 의문이 듭니다. 그토록 온 힘을 다해 매진했던 일, 의심의 여지 없이 매달렸던 것들에도 좀처럼 푹 빠져들어 가지지 않습니다. 난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답하지 못하겠는 질문은 계속 맴돌고 나는 그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토록 강렬히 원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에 다시 눈이 힐끔 돌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후회하는 건 아닐까. 이 후회를 덮을 만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옵니다.
사실 이런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때가 당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나의 대응 방식은 흐지부지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말고, 생각을 하다 말고, 정리를 하다 말고, 그러니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때는 최소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조차도 실제적으로 온갖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선 순위를 내주고 말아요. ‘해야 할 일’ 이란 회사 일, 학생 때는 수업과 시험 준비, 집에서 바라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각종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절실함의 강도가 옅어진 나는 다시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약간의 찝찝함을 남겨 놓고 다람쥐 쳇바퀴를 굴립니다. 시지프스 신화의 주인공처럼 매일매일 떨어질 돌을 또 짊어집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 자기가 하는 일,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재고, 의미 부여, 그것에 따른 새로운 결심, 각오 다지기 등등 자기 알기와 진로 다듬기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정을 하거나 변화를 주어야 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에 따르는 여유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잘 안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여유를 내어서 모종의 끝장을 내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인간은 도대체 조그마한 사고도 칠 줄을 모릅니다. 일을 못 저지릅니다.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속이 문드러져도 반차 휴가 한 번 쓴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 티도 잘 못 냅니다. 며칠 집 떠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고 대단할까요. 하지만, 무책임하게 해야 할 일 다 팽개치거나 끈기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잠적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가 힘들어도 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더더욱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때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도 하지 말아주세요. 가깝지 않은 타인에게 징징거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이럴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며 1년 365일 내내 고민하며 침잠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면 철저하고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바닥 근처에 도달했다가 나와서 무엇 하나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이 부족했다. 깊이가 깊지 않았습니다.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철저하지 못합니다. 어설프게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어설픕니다. 숨 좀 돌리는가 싶으면, 어느 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놓여 있는 일상이 닥치고 맙니다.
때때로 정리를 하고 방향을 잡아 봅니다. 지금 이러이러 한 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식으로. 사실 지금도 그런 식의 서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그 때마다 내가 끌어낸 결론은 나의 진실이 반영됨이 부족했던 듯합니다. 나는 진정 어떤 인간이고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의 토대가 부실했습니다. 당장 그럴싸한 결과물을 보여야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공감을 못 얻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순간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얕고 허황된 결론은 이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나에게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에 둘러 싸여 있다가 흐지부지 술에 물타기식으로 끝나버리는 대응은 사절하고 싶어졌습니다. 독주는 독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거짓된 결론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어쩔 것이냐고요. 글쎄요. 떠오르는 것들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 적지 않습니다.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가슴으로 와 닿는 구절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히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중 아래 구절이 떠오릅니다.
生의 馬車를,
불성실하게 끌어온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발바닥 붙이지 못하고
당황한다,
임종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은
아닌 줄 알면서
안될 줄 알면서도
무엇인가,
아무꺼구
손에 잡히는대로
이 약
저 약, 목에 주워 넣는다.
- 錦江, 제20장 中. 신동엽.
불성실하지 말지어다. 불성실이란 단순히 ‘결석하지 않거나 과제를 누락하지 않음’의 종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1년의 경험으로 10년을 반복’하듯 사는 것도 불성실입니다. 자신의 그릇을 깨닫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리지 못함도 불성실입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입니다. 불성실한 삶을 뒤로 하고는 죽음이 목전이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 그러하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변화하고 발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집약하고 시기를 포착하여 단칼에 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노력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수련과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거창하고 힘들고 어려운가요. 변화라는 것이 이래야만 하는 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구하라>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조직의 변화를 두고 나온 이야기인 듯 하나 개인의 변화를 놓고 볼 때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변화란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활동이다.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변화는 한 발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되돌아와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궤멸시키게 되는 단어인 것이다.”
“변화가 전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단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너무 비장한가요. 상관 없습니다. 필요한 면입니다.
얼마 전 'You raise me up'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아하던 선율의 곡이었는데, 작사자가 누구인지 이번에는 가사가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 번 듣다 보니 이제 외울 지경입니다.
(첨부를 클릭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다가와 내 곁에 머물러주길
나는 이곳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 어깨에 기댈 때 난 강해 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니까요
There is no life -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없는 삶이란. 그런 삶이란 없습니다.
불안정한 우리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뜁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가와 나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울 때는
내가 어렴풋이 영원함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는 ‘You’ 는 무엇일까요.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가만히 내게로 올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 나를 경이로 채우는 사람. 누구일까요. 실제로 이 곡은 가사내용으로 인해 모 종교에서 참 좋아한다지요. 네. 종교에서는 절대자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스승일 수 있고, 애인일 수 있고, 책 한 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타자는 상호 보완과 참조의 대상입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빛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축복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 변화를 끌어낼 주체는 언제나 자신입니다. ‘You’ 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I raise me up.
김민선_변화경영연구소 3기 연구원(spr325@naver.com)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36 | 갈림길에서 길찾기 | 경빈 | 2012.02.14 | 3721 |
| 635 | 드디어 방송을 타다 - 송창용 | 옹박 | 2012.02.15 | 4280 |
| 634 | 어느 사부(射夫)의 일기 | 최코치 | 2012.02.16 | 3933 |
| 633 | 나의 보물창고, '동대문 종합시장' (by 심신애) | 희산 | 2012.02.17 | 8992 |
| 632 | 마켓팅의 시작 (by 김인건) | 은주 | 2012.02.17 | 3981 |
| 631 |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 승완 | 2012.02.20 | 6694 |
| 630 | 권태 | 경빈 | 2012.02.21 | 3820 |
| » | You raise me up - 김민선 [1] [13] | 옹박 | 2012.02.22 | 4462 |
| 628 | 기회는 기회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 [3] | 최코치 | 2012.02.22 | 4554 |
| 627 | 나에게는 성환이라는 친구가 있다 (by 정철) [2] | 희산 | 2012.02.24 | 4661 |
| 626 | 무기력 학습 하나: 호스피탈리즘 | 은주 | 2012.02.25 | 5115 |
| 625 | [뮤직 라이프] 나에게 쓰는 편지 | 승완 | 2012.02.27 | 4581 |
| 624 |
하늘은 네 머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 경빈 | 2012.02.28 | 4388 |
| 623 | 과거로의 외출 - 이은남 | 옹박 | 2012.02.29 | 4304 |
| 622 | 파우스트와의 거래 – 어느 화가의 이야기 | 최코치 | 2012.03.01 | 4321 |
| 621 |
[소셜빅뱅] 3. 소유에서 공유로, 소셜 쉐어링 | 승완 | 2012.03.05 | 5807 |
| 620 |
일상에 스민 문학 - 책 읽어주는 여자 (by 정재엽) | 경빈 | 2012.03.06 | 5380 |
| 619 | 오늘을 살기 - 박승오 | 옹박 | 2012.03.07 | 4747 |
| 618 | 강을 지나 바다에 닿은 그들 | 최코치 | 2012.03.08 | 3949 |
| 617 | 신발끈을 다시 매고 (by 정세희) | 희산 | 2012.03.09 | 4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