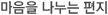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옹박
- 조회 수 3295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이 글은 변화경영연구소 3기 연구원 신종윤님의 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창문으로 거북이마냥 목을 쭈욱 내밀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가 온 뒤에 아직 개지 않은 탓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새 선선해진 밤공기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가 애잔하게 들립니다. 한참을 창문에 매달려 서있었습니다. 그렇게 흐린 가을 밤하늘과 서늘한 밤공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한가득 별이 쏟아지던 눈부신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몽골에서 맞이한 세 번째 밤은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했던 밤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 하나를 더듬어볼까 합니다.
다닥다닥 모여 앉아서 기질과 강점에 대한 수업을 마친 우리는 꽤 늦은 시간에 게르를 빠져 나왔습니다. 하늘 가득 펼쳐진 별들을 보고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시골집 앞마당에서 보았던 원시의 밤하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가려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보이지 않았던 솔직한 밤하늘의 모습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삼삼오오 캠프파이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조금 느린 제가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한창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르를 설치하기 위해 마련된 원형의 공간은 불을 피우고 둘러 앉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긴 의자에 몇 명씩 나누어 앉았습니다. 준비한 술을 하늘 높이 들고 '위하여'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밤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로 시작된 오병칸과 허르헉의 공연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몽골의 초원에 펼쳐진 기타 연주는 흥을 북돋워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론 빠른 노래를 부르며 모두 뛰어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술에 적당히 취했고 그렇게 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어느새 술병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는 태울 장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르고 싶은 노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우리는 자리를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약해지자 약간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불이 꺼지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자리를 떠나 게르로 돌아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작은 사건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깔고 앉아 있던 긴 나무 의자를 불길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우리의 축제가 조금 더 길어지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우지 말아야 할 것을 태우는 것에 대한 묘한 일탈의 쾌감이 술기운과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재빨리 불가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 의자를 잡아 빼냈습니다. 그의 거친 동작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것을 나무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끝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가 의자를 다시 불 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시도보다 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느꼈던 일탈에 대한 충동과 축제를 연장하고 싶은 마음을 그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 시도는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처음 의자를 구출했던 그도 이번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번엔 다른 이가 불가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힘겹게 의자를 구해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의 공격과 두 번의 수비가 서로 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 마실 술도 태울 나무도 떨어졌으니 축제를 계속하기는 무리일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몇 명은 급히 손전등을 들고 초원에 떨어진 나무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다른 몇 명은 주방으로 달려가 마실 것을 공수해왔습니다. 아슬아슬 꺼져가던 축제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몽골의 전통 솥에다 끓인 라면으로 힘을 보충한 우리는 조금 전의 의자 사건은 잊고 새벽까지 진탕 놀았습니다. 한 조각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작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몽땅 태워서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의 세 번째 밤이 저물었습니다.
화려했던 캠프파이어가 모두에게 하나로 기억되었다면 그 중간에 벌어졌던 '의자 투척 사건'은 각자에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일정 동안 때때로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개인의 기질과 연관해서 의미를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의자를 구해낸 두 사람에게 '원칙주의자'라는 별명을 달아주었습니다.
만약 두 번째로 의자가 불에 던져져서 그냥 타버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꺼내진 의자를 다른 누군가가 다시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래서 의자가 불에 탔다면 우리는 더 흥겨웠을까요? 의자를 태우지 못한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의자를 태웠더라면 그것은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후회로 남았을 것입니다. 날이 밝은 후 던져 넣은 사람들과 꺼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보니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지키자면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결국 후회로 남는 것, 이것이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과 후회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선택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몽골의 캠프파이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원칙'에까지 닿고 보니 조금은 엉뚱하게도 안철수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원칙은 매사가 순조롭고 편안할 때에는 누구나 지킬 수 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하여 한두 번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원칙이 아니며, 현명한 태도도 아닐 것이다. _안철수
다시 창 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흐린 하늘 사이로 예쁘게 찌그러진 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는 사이로 한층 더 몽골의 그 밤이 그리워졌습니다. 달콤한 바람과 시원한 별빛 그리고 그 아래서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의 순간이 무척이나 그리운 밤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의자, 아니 원칙을 사수하라_신종윤 | 옹박 | 2012.07.11 | 3295 |
| 555 | 보험 컨설턴트를 위한 변명 (by 박중환) [1] | 최코치 | 2012.07.11 | 4223 |
| 554 | 샤먼이 되고 싶은 소녀 (by 박정현) | 희산 | 2012.07.12 | 3968 |
| 553 | 내 존재에 대한 조감도를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 (by ... | 은주 | 2012.07.14 | 4080 |
| 552 | 직장을 내 인생 반전의 기회로 삼아라 (by 오병곤) | 승완 | 2012.07.16 | 3680 |
| 551 | 감사(感謝)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도명수) | 경빈 | 2012.07.16 | 5453 |
| 550 | 창조할 수 없는 예술가여,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 (by 박... [1] | 은주 | 2012.07.19 | 3593 |
| 549 | 노화가 멈춰버린 나 (by 양재우) | 최코치 | 2012.07.20 | 3397 |
| 548 | 너도 해볼래? (by 이선이) | 승완 | 2012.07.23 | 3729 |
| 547 |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 지는 법 (한명석) | 경빈 | 2012.07.23 | 3488 |
| 546 | 신화 속으로 들어가다_김도윤 | 옹박 | 2012.07.25 | 3780 |
| 545 | 여행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2) (by 오현정) | 최코치 | 2012.07.26 | 3895 |
| 544 | 선조의 붉은 편지 (by 박정현) | 희산 | 2012.07.27 | 3490 |
| 543 |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 망설이지 않기 (by 이은주) | 은주 | 2012.07.28 | 3453 |
| 542 | 주말부부 (by 김미영) | 승완 | 2012.07.30 | 4218 |
| 541 | 나를 설득시켜야 남에게 다가갈 수 있다 | 경빈 | 2012.07.30 | 3596 |
| 540 | 베트남과 두바이의 아름다움에 대하여_최영훈 | 옹박 | 2012.08.01 | 4092 |
| 539 | 회사 인간 (by 오병곤) | 승완 | 2012.08.06 | 3542 |
| 538 | 나의 연구원 1년 (박소정) | 경빈 | 2012.08.07 | 3534 |
| 537 | 손 내미는 아티스트_한정화 | 옹박 | 2012.08.08 | 3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