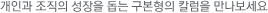

- 구본형
- 조회 수 9641
- 댓글 수 7
- 추천 수 0
이럴 수가 있나? 니체를 읽다 나는 깜짝 놀란다. 그리고 실망한다.
니체는 두 권의 자서전을 썼다. 한 번은 삶의 초기에 또 한 번은 삶의 말기에 썼다. 니체에게 철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실험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삶은 철학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에 대하여 글을 쓰는 것 , 그것이 니체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삶에 따라 몸으로 사유했다.
나는 오십이 되던 해부터 매 10년 마다 자서전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첫 번 째 자서전, '마흔 세 살에 다시 시작하다'를 썼다. 나 역시 나의 삶이 기록 되어야하고, 나 역시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삶이 나의 연구의 대상이고 내 삶이 나의 예술이라 생각했다. 니체를 모방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따른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했다. 그러나 또한 흥미롭다.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를 지지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응원인가 ?
니체의 삶에 대한 사유를 관통하는 일관된 생각은 삶의 예술가 정신이었다. 언젠가 그가 말했다.
Wir aber wollen die Dichter unseres Lebens sein
우리는 우리 삶의 시인이고자 한다
나는 변화경영전문가로 마흔 세 살에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십의 중반에서 '변화경영의 사상가' 로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시인이 되고 싶어한다. 이미 내 명함의 한 자락에 'Life As a Poem' 라는 글귀를 맞추어 두었다. '삶을 시처럼 산다' 이것이 말년의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려했다.
니체를 읽다 나는 실망한다.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죽은 그가 이미 그렇게 살고 싶어 했었다. 또 그는 나를 앞지른다. 그러나 또 얼마나 훌륭한 응원인가 ?
언젠가 철학사가 들뢰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은 철학사를 뒤적이다 마음이 끌리는 철학자를 만나면 그 철학자를 뒤에서 덮쳐 '계간(鷄姦)을 했다' 라고 말이다. 예를들면 칸트 철학에 대한 주해서는 칸트를 뒤에서 덮쳐서 만들어 낸 칸트와 자신의 사생아인데, 아마 칸트가 본다면 놀라 자빠질 만큼 끔찍한 얼굴을 가진 사생아라는 것이다. 니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니체를 뒤에서 덮쳐 사생아를 만들려고 하니, 어느새 니체가 자신을 덮치고 있더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니체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사생아가 아니라 니체의 사생아였다는 뜻이다. 아마 들뢰즈의 사유에 니체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오늘 생각한다. 니체는 얼굴이 없다. 너무도 무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변모의 달인이며 변신의 귀재다. 디오니소스인가하면 쇼펜하우어이고 바그너이며 차라투스트라다. 그는 "계속되는 변화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자기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니체는 방랑자였다. 늘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떠나온 사람이었다. 그가 옳다. 항상 자신을 떠나지 않고는 자신을 찾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