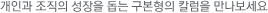

- 구본형
- 조회 수 7899
- 댓글 수 4
- 추천 수 0
‘현자들의 거짓말’, 장클로드 카리에르, 영림카디널, 2007년
‘농담따먹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 테드 코언, 이소출판사, 2001
(이코노믹 리뷰)
가을은 방에 처박혀 책을 읽기에는 너무도 현란하고 아름답다. 그저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단풍을 구경하고 낙엽 쌓인 정경에 가벼운 우수를 즐기면 더 없이 좋다. 그래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연히 마음 싱숭거리지 말고 깨끗이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책이나 보라고 말이다. 이번 주는 마지막 가는 가을을 위해 아주 가벼운 책 한 권과 가벼워 보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책을 묶어 두 권을 한꺼번에 소개할까 한다. 둘 다 여행길에 가져가 짬짬이 낙엽이 지는 막간에 잠깐의 무료를 달래 줄 책들이다.
첫 번 째 책인 ‘현자들의 거짓말’은 프랑스의 동양학자이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한 저자가 여러 문헌과 구전자료들을 뒤져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300여개 모아 둔 책이다. 한 마디로 ‘농담 따먹기’들을 모아 둔 이야기책이다. 한 두 가지 맛을 보면 이런 것들이다.
한 판사가 시골에 있는 사촌 집으로 휴가를 보내러 갔다. 사흘째 되는 날 판사는 시골의 단조로움에 심심해 졌다. 그래서 일손이 바쁜 사촌에게 도와 줄 일이 있는 지 물어 보았다. 사촌이 볼 때 판사가 할 줄 아는 시골일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쉬운 일을 찾아 주었다. 판사를 창고로 데리고 가서 방금 캐 온 감자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자, 이것을 하게. 여기 있는 감자들은 세 종류 그러니까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으로 나눠 놓도록 하게. 그럼 저녁에 보세”
농부는 창고를 나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 밤이 다 되었을 때 창고 문을 열었다. 감자는 아침에 있던 그대로 놓여있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된 판사가 기진맥진 헝클어진 머리로 창고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 감자하나를 들고 말이다.
농부가 놀라 물었다.
“어찌된 일인가 ? ”
판사는 농부에게 손에 잡은 감자를 내밀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큰 거요 ? 작은 거요 ? 중간 거요 ? ”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독일의 행정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농담류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중간 쯤 재미있는 이야기에 속한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다. 물론 독자에 따라 그 취향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보자.
런던의 어느 달동네에서 두 사람의 재단사가 서로 마주 보고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늘 그렇게 서로 마주 보며 일해 왔다. 어느 날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물었다.
-금년에 휴가 갈 건가 ?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번째 재단사가 불쑥 말을 꺼냈다.
-1964년에 휴가를 갔었지.
-그래 ? 어디로 갔었나 ?
첫 번째 재단사는 무척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득차서 그때 그 휴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랐다.
-난 그 때 벵갈로 호랑이 사냥을 갔었지. 빛나는 금빛 총을 두 개나 들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만났지. 내가 총을 쏘았어. 그러나 그 놈은 내 총알을 피하고 나를 덮쳤지. 내 머리가 그 놈 이빨에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리고 나를 먹기 시작했어. 마침내 그 놈이 내 마지막 살 한 점까지 다 먹어 버렸어.
깜짝 놀라서 첫 번 째 재단사가 소리쳤다.
-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호랑이는 자네를 삼키지 않았어. 자넨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 ?
그러자 두 번째 재단사가 다시 실과 바늘을 잡으며 슬프게 말했다.
- 자네는 이걸 살아 있다고 생각하나 ?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직장 생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지옥’이라고 표현한 스터즈 터클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 직장인이 지금하고 있는 일을 품삯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천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지 자문해 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 책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수준급에 속하는 놈이다. 물론 나의 기준에 의하면 말이다.
이쯤에서 잠시 또 하나의 책을 살펴보자. ‘농담 따먹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는 이 책은 2001년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이 책에도 웃기는 이야기가 몇 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우습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 누군가에게 우스운 농담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우습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농담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공통적 전제를 기초로 해야 한다. 말하자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농담이 통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 집단적 성격의 차이등에 의해 설명되지 않아도 통하는 기본적 전제를 공유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불통을 보여주며 저자는 농담에 대한 농담학을 펼쳐낸다.
우리가 농담을 나누는 이유는 우스개의 성공적인 교환을 통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느낌이 통했다’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농담은 주장과는 달리 뒷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수용자의 변화를 억지로 끌어내지도 않는다. 농담이 썰렁한 반응으로 끝나도 그 이유를 캐물을 필요도 없다. 다만 농담의 실패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다가가려는 친교의 시도가 어벙하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가 교감하지 못함으로 ‘만남의 실패’로 이어 진 것이다. 반대로 농담의 성공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간격에 소통 가능한 다리가 하나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농담을 할 때 조심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행위는 상대방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유하는 기존 전제를 통해 듣는 이를 내쪽으로 끌어 들이려면 가르치려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가르치려한다는 것은 농담에 관한한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농담의 기존 명제, 즉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무엇’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진다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농담이 아니다.
결국 농담이 성공할 때 ‘친교’는 두터워 지는 것이다. 친교란 무엇인가 ? 그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웃는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같이 웃는다는 것은 그 순간 뿌리 깊은 인간적 갈망이 충족되는 순간이다. 같이 느끼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서로에게 닿는 것이 바로 농담인 것이다. 이 가을엔 농담을 많이 하자. 같이 웃어 보자. 웃음이 하루를 단풍처럼 장식하는 계절로 만들어 보자. 아, 그렇지 단풍처럼 야한 농담도 많이 하자. 농담은 야해야 제 맛이니까.
IP *.128.229.81
‘농담따먹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 테드 코언, 이소출판사, 2001
(이코노믹 리뷰)
가을은 방에 처박혀 책을 읽기에는 너무도 현란하고 아름답다. 그저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단풍을 구경하고 낙엽 쌓인 정경에 가벼운 우수를 즐기면 더 없이 좋다. 그래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연히 마음 싱숭거리지 말고 깨끗이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책이나 보라고 말이다. 이번 주는 마지막 가는 가을을 위해 아주 가벼운 책 한 권과 가벼워 보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책을 묶어 두 권을 한꺼번에 소개할까 한다. 둘 다 여행길에 가져가 짬짬이 낙엽이 지는 막간에 잠깐의 무료를 달래 줄 책들이다.
첫 번 째 책인 ‘현자들의 거짓말’은 프랑스의 동양학자이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한 저자가 여러 문헌과 구전자료들을 뒤져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300여개 모아 둔 책이다. 한 마디로 ‘농담 따먹기’들을 모아 둔 이야기책이다. 한 두 가지 맛을 보면 이런 것들이다.
한 판사가 시골에 있는 사촌 집으로 휴가를 보내러 갔다. 사흘째 되는 날 판사는 시골의 단조로움에 심심해 졌다. 그래서 일손이 바쁜 사촌에게 도와 줄 일이 있는 지 물어 보았다. 사촌이 볼 때 판사가 할 줄 아는 시골일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쉬운 일을 찾아 주었다. 판사를 창고로 데리고 가서 방금 캐 온 감자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자, 이것을 하게. 여기 있는 감자들은 세 종류 그러니까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으로 나눠 놓도록 하게. 그럼 저녁에 보세”
농부는 창고를 나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 밤이 다 되었을 때 창고 문을 열었다. 감자는 아침에 있던 그대로 놓여있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된 판사가 기진맥진 헝클어진 머리로 창고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 감자하나를 들고 말이다.
농부가 놀라 물었다.
“어찌된 일인가 ? ”
판사는 농부에게 손에 잡은 감자를 내밀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큰 거요 ? 작은 거요 ? 중간 거요 ? ”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독일의 행정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농담류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중간 쯤 재미있는 이야기에 속한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다. 물론 독자에 따라 그 취향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보자.
런던의 어느 달동네에서 두 사람의 재단사가 서로 마주 보고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늘 그렇게 서로 마주 보며 일해 왔다. 어느 날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물었다.
-금년에 휴가 갈 건가 ?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번째 재단사가 불쑥 말을 꺼냈다.
-1964년에 휴가를 갔었지.
-그래 ? 어디로 갔었나 ?
첫 번째 재단사는 무척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득차서 그때 그 휴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랐다.
-난 그 때 벵갈로 호랑이 사냥을 갔었지. 빛나는 금빛 총을 두 개나 들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만났지. 내가 총을 쏘았어. 그러나 그 놈은 내 총알을 피하고 나를 덮쳤지. 내 머리가 그 놈 이빨에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리고 나를 먹기 시작했어. 마침내 그 놈이 내 마지막 살 한 점까지 다 먹어 버렸어.
깜짝 놀라서 첫 번 째 재단사가 소리쳤다.
-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호랑이는 자네를 삼키지 않았어. 자넨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 ?
그러자 두 번째 재단사가 다시 실과 바늘을 잡으며 슬프게 말했다.
- 자네는 이걸 살아 있다고 생각하나 ?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직장 생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지옥’이라고 표현한 스터즈 터클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 직장인이 지금하고 있는 일을 품삯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천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지 자문해 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 책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수준급에 속하는 놈이다. 물론 나의 기준에 의하면 말이다.
이쯤에서 잠시 또 하나의 책을 살펴보자. ‘농담 따먹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는 이 책은 2001년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이 책에도 웃기는 이야기가 몇 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우습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 누군가에게 우스운 농담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우습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농담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공통적 전제를 기초로 해야 한다. 말하자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농담이 통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 집단적 성격의 차이등에 의해 설명되지 않아도 통하는 기본적 전제를 공유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불통을 보여주며 저자는 농담에 대한 농담학을 펼쳐낸다.
우리가 농담을 나누는 이유는 우스개의 성공적인 교환을 통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느낌이 통했다’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농담은 주장과는 달리 뒷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수용자의 변화를 억지로 끌어내지도 않는다. 농담이 썰렁한 반응으로 끝나도 그 이유를 캐물을 필요도 없다. 다만 농담의 실패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다가가려는 친교의 시도가 어벙하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가 교감하지 못함으로 ‘만남의 실패’로 이어 진 것이다. 반대로 농담의 성공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간격에 소통 가능한 다리가 하나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농담을 할 때 조심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행위는 상대방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유하는 기존 전제를 통해 듣는 이를 내쪽으로 끌어 들이려면 가르치려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가르치려한다는 것은 농담에 관한한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농담의 기존 명제, 즉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무엇’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진다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농담이 아니다.
결국 농담이 성공할 때 ‘친교’는 두터워 지는 것이다. 친교란 무엇인가 ? 그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웃는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같이 웃는다는 것은 그 순간 뿌리 깊은 인간적 갈망이 충족되는 순간이다. 같이 느끼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서로에게 닿는 것이 바로 농담인 것이다. 이 가을엔 농담을 많이 하자. 같이 웃어 보자. 웃음이 하루를 단풍처럼 장식하는 계절로 만들어 보자. 아, 그렇지 단풍처럼 야한 농담도 많이 하자. 농담은 야해야 제 맛이니까.
댓글
4 건
댓글 닫기
댓글 보기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63 |
작은 자그레브 호텔 | 구본형 | 2009.08.21 | 7909 |
| 362 | 우리는 아주 많은 인생을 가지고 있다 [3] | 구본형 | 2002.12.25 | 7914 |
| 361 |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법 [5] | 구본형 | 2007.01.18 | 7915 |
| 360 | 직장 행복의 조건 [2] [2] | 구본형 | 2006.02.17 | 7917 |
| 359 |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법 [3] | 구본형 | 2003.11.20 | 7922 |
| 358 | 가장 자기다운 것을 만들자 [4] | 구본형 | 2002.12.25 | 7929 |
| 357 | 최고의 리더 [4] | 구본형 | 2007.09.28 | 7944 |
| 356 | 하루를 창조하라 [5] | 구본형 | 2007.09.28 | 7949 |
| 355 |
의미있는 변화, 그것이 공헌이다 - 생각탐험 5 | 구본형 | 2010.04.26 | 7951 |
| 354 | 서비스의 수혜자, 그들을 사로 잡아라 [5] | 구본형 | 2008.06.14 | 7952 |
| 353 | 칭찬의 효용에 대한 지나친 남용에 대하여,, [7] | 구본형 | 2004.10.08 | 7956 |
| 352 | 직장인들이여, 이제 예술가가 되자 [5] | 구본형 | 2010.06.24 | 7962 |
| 351 | 하루 속에 변화를 데려오는 법, [2] | 구본형 | 2004.12.31 | 7963 |
| 350 | 네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라 [2] | 구본형 | 2007.07.21 | 7966 |
| 349 | 평범과 탁월의 분기점 [2] | 구본형 | 2003.12.17 | 7967 |
| 348 | 트랜드는 물결과 바람이다 [4] | 구본형 | 2004.12.04 | 7971 |
| 347 | 낯선 곳에서의 아침-2007 년 개정판 서문 [7] | 구본형 | 2007.12.19 | 7973 |
| 346 | 사람에게서 구하라 - 글로벌 시대의 인재경영 [3] | 구본형 | 2008.01.23 | 7977 |
| 345 |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번 사랑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 - 알베르 카뮈, 생각탐험 16 [5] [1] | 구본형 | 2010.06.01 | 7980 |
| 344 | 프리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 [2] | 구본형 | 2002.12.25 | 7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