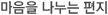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인센토
- 조회 수 1816
- 댓글 수 2
- 추천 수 0



오후의 묘지를 걷다 뜬 눈으로 꿈을 꾸었네. 그는 죽음을 향해 걷고 있었다.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터벅 터벅 아래를 바라보며 걸어갔을 뿐. 한참을 걷다보니 커다란 검은 문 앞에 사람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그 줄의 끝에 서서 앞에 선 이에게 물었다. '저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는 대답없이 웃기만 했다.
푸른 하늘에는 은빛 달 하나 걸려 있고, 초승달은 그믐달이 되어 사라져 갔다. 어둠이 눈을 뜨고, 빛이 실눈을 감고. 한줄기 바람이 불고 팔랑개비 돌아간다. 이제는 묻지 않으리. 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냐고. 그저 여기,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이 곳에서 한잠 단 꿈을 꾼다.
-------------------------------------
도쿄에는 (아니, 일본에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심심찮게 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들이 있는 곳에 무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묘지란 곳은 어딘가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에 대한 선입관 탓이겠지만,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인데도 어딘가 서늘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어쨌던 이 곳, 일본에서는 삶과 죽음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잠시, 제가 좋아하는 아즈텍의 이름 모를 시인의 문구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지구별에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는 잠자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지.”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진 마세요. 시인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살기 위해 이 곳에 온 게 아니라, 잠을 자고 꿈꾸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물론 산다는 것은 엄중한 일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누군가의 명령만을 따르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작은 생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너무나 짧은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