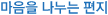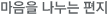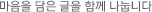
- 아난다
- 조회 수 1587
- 댓글 수 3
- 추천 수 0
‘평생직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무쌍해진 요즘, 일단 되면 죽을 때까지 현역에서 뛸 수 있는 평~~~생 직업이 남아 있습니다. 혹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엄마’(‘아빠’들의 간곡한 청원에 의해 ‘엄마’라고 쓰고 ‘부모’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
엄마가 무슨 직업이냐고요?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으니 풀타임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간 크게 아무 대책도 없이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낸 거겠지요? 출산준비물 세트를 완비하는 걸로 아이를 맞을 준비가 다 끝나는 줄만 알았으니 제 무지의 레벨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듯 하죠?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저서 <성과를 향한 도전>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경영자는 「불가능한 직무」, 즉 그저 정상적인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직무가 등장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직무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보기 드문 다양한 기질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인간은 노력에 의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고도의 갖가지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자신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갖가지 특수한 기질들을 요구하는 직무는「수행할 수 없는 직무」, 즉 「사람을 죽이는 직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피터드러커는 대표적인 「사람을 죽이는 직무」로 규모가 큰 미국 대학의 총장,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해외담당 부사장, 주요 강대국 대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모두 관리하다보면, 정작 자신의 제1업무에 쓸 시간이 없고 흥미마저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6개월 또는 1년 후,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실패자라는 낙인과 함께 그 직무를 떠나게 되며 이 자리를 물정 모르는 예비 실패자가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어이없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 직무들이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엄마’라는 직무만 할까요? 거액의 연봉과 사회적 인정, 뭐 이런 이야기는 다 그만두더라도 결정적으로 ‘엄마’는 일단 되고 나면 죽기 전에는, 아니 죽어서도 절대로 그만 둘 수 없는 종신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고삐를 붙잡고 아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부자를 향해 “당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동물인 데 마치 상전 모시듯 한다”며 조롱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당나귀 등에 아들을 태우고 간다. 마을 정자를 지날 때쯤 노인들은 큰 소리로 “아버지가 아들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다”며 꾸짖는다. 훈계를 받은 아버지는 아들 대신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 길을 재촉한다.
빨래터에서 이를 본 동네 아낙들은 “아들을 나 몰라라 하는 매정한 아버지”라고 맹비난한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 길을 간다.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저러다가 힘에 부친 당나귀가 쓰러져 죽을 거다”며 혀를 끌끌 찬다.
어찌할 줄 모르는 아버지는 “부자(父子)가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것”이라는 한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리를 건널 때 당나귀가 갑자기 바동거린 바람에 당나귀는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이솝우화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콩쥐밭쥐만 큼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엄마가 되고 다시 만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물론 깜짝 놀라 얼른 눈물을 훔치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가 잠든 후 다시 나와 펴들고 혼자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면되는 거냐고! 좋은 엄마는 바라지도 않아!!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나쁜 엄마를 면할 수 있는 거냐고!!!’
듣기만 해도 갑갑하시다구요? 과거 어느 시절의 당신을 보는 듯해 짠하고 안타까우시다구요? 그렇더라구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모든 당혹이 억세게도 무능하고 불행한 제게만 주어진 시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육아의 목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디서 또는 언제 그것을 할 것인가’ 이 답 없는 질문에 대한 저마다의 답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부모님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그렇게 스스로 찾아낸 답을 소위 ‘육아철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기만도 벅찬 부모의 삶 속에서 ‘철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절감합니다. 스스로 납득할 만한 ‘육아철학’ 없이는 주위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다 결국은 당나귀마저 잃게 된 아버지의 오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을요.
그렇게 부모로서 15년을 살면서 저는 부모라는 직무의 제1업무가 ‘육아철학’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칫「사람을 죽이는 직무」가 되기 쉬운 부모 역할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때도 육아철학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체험으로 납득하게 되었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계실 당신의 철학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철학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의 철학이 보다 깊고 풍성하게 익어가기를,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P.S. <살롱 울프>( https://blog.naver.com/myogi75/221503297305 )는 바로 그런 이유로 펼쳐진 만남의 장입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직 꺼내놓을 이야기가 없으시다구요? 그렇다면 더더욱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같은 열망을 가진 에너지장이 당신 안의 당신도 모르던 이야기를 찾아줄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