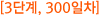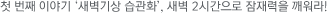
- 박정례
- 조회 수 5500
- 댓글 수 13
- 추천 수 0
세기의 사과 그리고 폴 세잔
10월 5일 애플의 창업자가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그가 창업한 회사의 이름이자 상징 기호인 ‘애풀’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운명을 변화시킨 4개의 사과’라느니 ‘인류를 변화시킨 4개의 사과’라면서 사과와 얽힌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사과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로는 성서의 창세기편에 나오는 ‘이브의 사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 왕자의 사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스위스의 명사수 ‘빌헬름 텔’의 사과,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를 꼽는 다. 대신에 ‘파리스의 사과’와 ‘빌헬름 텔의 사과’를 빼고 ‘폴 세잔느의 사과’와 ‘스티브잡스의 사과'를 꼽는 사람도 있었다. 필자는 후자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폴 세잔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폴 세잔느의 사과’라면 미술책이나 화집을 통해서 기억하는 몇 개의 정물화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가시지 않는 궁금증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미술이론이나 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탓에 자신의 귀를 잘랐다거나, 37살의 나이에 권총 자살을 하는 등 극적인 삶을 살다간 고호나 수많은 기행과 염문을 퍼뜨리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피카소 같은 화가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으나 사실 세잔에 대해서는 그리 가깝게 느껴보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왠지 세기의 명작이라고 일컫는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과 ‘생 빅토르산’ 같은 작품의 진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격지심과 답답함이 내게는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25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전’을 보게 되었다. 작품수가 총 134점이나 되는 대형전시회였는데 그 감동을, 거기다 세잔느에 대한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한 여름 유명작품을 보려고 늘어선 지루한 줄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눈에 번쩍 띄는 작품이 있어서 다가가니 세잔이었다. 그곳에는 ‘카드놀이 하는 사람’과 ‘아내의 초상’과 그 유명한 정물화 한점이 스스로 빛나고 있었다. 불멸의 화가가 나를 반겨주는 순간이었다. 순간 나의 가슴은 뻥 뚫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니, 완벽하잖아?”하고 동생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뱄었다. 동생이 답하기를 폴 세잔느의 기량은 화가들 중에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할 정도로 최고로 빼어나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세잔느의 작품은 붓 터치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주제를 말하고 구도의 완벽함을 보여줬다. 그 순간 드는 생각, 그렇다면 입체파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명작이라는데 세잔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정물 하면 세잔느이고 세잔느(?) 하면 정물인데 후기 작품 ‘생 빅토르산’은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화법이 비슷했기 때문에 늘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무슨 이유야? 하고 자문해왔던 것이다.
아, 세잔느의 ‘목욕하는 사람들’이나 ‘생 빅토르산’은 입체파 즉 큐비즘을 탄생케 한 가교역할을 한 위대한 작품이었다. 세잔느는 사과를 그리면서도 기존의 원근법의 파괴를 통해서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기법을 사용했고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창출하여 입체파 화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연은 구형, 원통형, 원추형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로 사물을 단순화된 기본형체로 집약하는 화면구성을 구축하고, 색채분할법을 시도하고 명암과 원근법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물 고유의 입체감을 살려 인위적인 명암법을 구사하였다. 세잔이 1880년대 그린 인물화와 정물화는 바로 이 같은 형태와 구성이 빚어낸 조형적 질서를 추구하는 한 방편이었던 셈이다.
프랑스의 화가이자 평론가인 모리스 드니는 세잔의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평범한 화가의 사과는 먹고 싶지만 세잔의 사과는 껍질을 깎고 싶지 않다. 잘 그리기만 한 사과는 군침을 들게 하지만 세잔의 사과는 마음
에 말을 건넨다.”
세잔의 사과는 기존의 개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조를 여는 위대한 창조행위의 실험이었던 것이다.
세잔의 사과, 지금도 살아서 빛나는 마음을 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