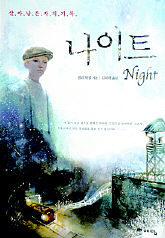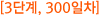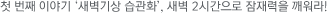
- 뫼르소
- 조회 수 4098
- 댓글 수 11
- 추천 수 0
벌써 37일차입니다.
오늘은 엘리웨젤의 소설 <나이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엘리 위젤(79)은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으로 2차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생존자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나이트(밤)〉(1958)는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참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자전 소설로,
1986년 그가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간 첫날 이미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77쪽)에 압도당한 엘리 위젤은,
침묵하는 신을 향한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수형을 당하거나 산 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동포들을 하릴없이 지켜보면서 그는,
바로 자신들의 하느님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는 하느님을 탓하고 꾸짖는 처지가 됩니다.
“나는 고발자였고, 고발당한 쪽은 하느님이었다.”(128쪽)
소설 〈나이트〉는 독일군의 전세가 불리해지는 가운데,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 수용소를 전전하는 동안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기까지의 끔찍한 경험들을 별다른 문학적 가공 없이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절망과 분노가 지배하는 가운데 드물게 감동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생사의 기로를 헤매던 어느 날 밤 막사 안에 문득 한 줄기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르샤바에서 온 소년 율리에크가 유대인에게는 금지되었던 독일 작곡가 베토벤의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리에크의 영혼이 바이올린 활이 된 것 같았”으며 “율리에크는 자신의 목숨을 연주하고 있었다.”(168쪽)
날이 밝기 전에 율리에크 역시 뻣뻣한 주검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173쪽)던 밤도 지나가고 새벽이 옵니다.
엘리 위젤은〈나이트〉에 이어,
1960년에는 이스라엘 건국 전야를 배경으로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의 윤리적 갈등을 다룬 소설〈새벽〉을 발표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이 시간,
유태인 학살과도 같은 잔인한 밤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동트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자, 이 새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