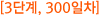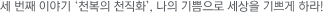
- 오승건(오짱)
- 조회 수 2124
- 댓글 수 12
- 추천 수 0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장르를 이야기하면 생활과 동떨어진, 고상한 것으로 알고 손사래를 칩니다. 시나 소설, 수필 같은 장르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는 노래가 되고, 노래 가사 중 시와 같은 감동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뮤지션 중에는 음유 시인으로 불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은 가곡으로는 물론 마야가 가요로 불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는 가수 유심초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제목으로 발표해 크게 히트했습니다. 화가 김환기는 그의 그림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가 노래가 되고, 시가 그림 제목에 사용된 것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는 이동원ㆍ박인수가 불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수 송창식이 부른 노래 <그대 있음에>는 가요는 물론 가곡으로도 불리는데, 김남조 시인의 시입니다. 송창식이 부른 <푸르른 날>은 서정주 시인의 시이며, 활주로가 부른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는 김소월의 시, 높은 음자리가 부른 <바다에 누워>는 박해수 시인의 시입니다. 이렇듯 시는 우리 생활과 가깝습니다.
시는 생활입니다. 노래 가사가 시이며, 광고 카피가 시입니다. 시를 생활과 분리하지 말고 생활 속의 노래와 말로 편하게 생각합시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최미경님의 단군일지에 고 은 시인의 시가 보여 반가웠습니다. 시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지만 울림은 크고, 감동은 무겁고, 깊지요. <누우면 끝장이다. / 앓는 짐승이 / 필사적으로 / 서 있는 하루 // 오늘도 이 세상의 그런 하루였단다 숙아>
시에 한 번 도전해 봅시다. 단군이께서는 <그까이것 뭐~ 대충~~> 몇 자 끄적끄적 하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이번에는 시를 가지고 놀아봅시다. 몇 번 시도하면 시가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위에 예를 든 글은 짧은 시 3편입니다. '아~ 나도 이 정도를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지요. 20자 안쪽으로도 시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짧은 시도 있지요. 수십년 전에 들은 아직도 시가 생각납니다. '그리움'이라는 제목이었고 전문은 <우체통에 쌓인 먼지>였습니다. 8자도 시가 됩니다. <첫사랑> <무진장> <무궁화> 중에서 이 시를 쓴 시인(3명)의 이름을 아시는 분께는 선물(선착순 3분)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