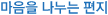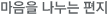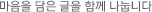
- 장재용
- 조회 수 1493
- 댓글 수 0
- 추천 수 0
내가 묻고 한나 아렌트가 답한다.
질문: 월급쟁이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의 삶은 ‘너는 노예다’라는 사실을 매일 입증해준다. 때문에 노예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실존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노예인지 주인인지 기억하고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자신이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 ‘월급쟁이에게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그러므로 나는 노예인가? 주인인가? 를 따져 묻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노예로의 전락은 운명이며, 죽음보다 못한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길들여진 동물과 비슷한 존재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노예가 갖지 못하는 두 가지 자질이 있다. 첫째, 노예는 스스로 숙고해서 결정하는 능력이 없다. 둘째, 노예는 앞날을 예견하며 선택하는 능력이 없다. 당시 가난한 자유인은 먹고 사는 일이 불안정하더라도 정규적인 일보다 비정규적인 일을 선호했다. 왜냐하면 정규적으로 보장된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까닭에 이미 노예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유인은 가혹하고 고통스런 노동을 가내노예들의 안일한 생활보다 선호했다. 이와 같다면 외로움, 불안은 자유의 조건이다. 집단에 속한 소속감으로 외로움은 사라진다. 소비로 인해 얻어진 소유가 불안을 줄여 준다. 그대신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자신의 생각을 지우면 편안하다. 집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양 할 수 있어서다. 굳이 힘들게 자신의 생각을 쥐어짤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 감정, 나의 사유, 나의 취향은 사라진다.
어제 어질러 놓은 것을 매일 다시 정돈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는 용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늘 반복해야 한다는 지겨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생산적 노예와 비생산적 자유 사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매우 고통스런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해야 한다. 이것이 근대 사회가 내린 판결문이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지금껏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다른 누구와 동일하지 않다는 방식으로만 우리 인간은 동일하다. 월급쟁이에게
자유는 ‘나는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때, 외로움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홀로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