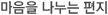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신재동
- 조회 수 2187
- 댓글 수 4
- 추천 수 0
' 재미있게 놀아보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 회사라는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면 돌아오는 반응들이 그닥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배부른 소리다, 잘 맞아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냐 되겠느냐 등등..
불만족스러운 상황의 개선보다는 체념에 중심을 둔 말들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의문은 멈출 순 없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왜 어려울까?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도달했던 결론은 '일이 재미있지 않아서'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곤 했지요. 일이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그에 따르면 결국 회사라는 곳은 재미 없어도 무작정 참고 견디며 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 무작정 참고 견디며 -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배우들마냥
- 존재 여부도 확실치 않은 - 고도를 무작정 기다리는 권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놀이'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놀 때면 재밌더군요.
회사 내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하니
회사 밖에서 놀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듣는 것이 귀찮아서
혼자, 조용히, 몰래 놀았구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읽던 중, 놀이를 한없이 옹호하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제 입장에선 참 반가운 내용이었지요.
그 구절을 옮기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
실러는 인간이 본능만의 지배를 받는 미개한 상태나 이성만의 억압을 받는 야만적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놀이를 하는 아이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놀이를 하는 아이'는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때 그리 하듯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구현하는 인간의 상징입니다.
놀이에도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에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지요.
< 철학카페에서 문학 읽기 中 - (김용규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