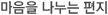- 정수일
- 조회 수 1660
- 댓글 수 4
- 추천 수 0
 [2006. 03, 구미]
[2006. 03, 구미]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카메라를 애써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었다_루이스 하인”
사진은 시다.
요즘 데카상스 동지들과 사진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대부분 ‘좋은 카메라 어디서 싸게 팔더라’ 정도로 시작되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진을 잘 찍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에 관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진찍기는 글쓰기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글쟁이들이니까 사진이 땡기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죠. 인간의 기록본능은 문명을 만들고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붓을 만들고 만년필을 만드고 연필을 만들었듯이 말이죠.
제가 글을 잘 썼더라면 사진을 찍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찍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구본형 선생께서 새벽 글쓰기를 하시면서 매일의 힘을 키우시고, 당신께서 잘 하시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 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훈련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이때마다 이분의 말씀을 떠올리지요. “이 양반은 이게 즐거웠다고?” 그런데 ‘글’을 ‘사진’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 되고 맙니다.
“피울님! 사진이 시에요.”
제 사진을 좋아해 주시는 시인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잠언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입니다. 사진을 잘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필을 들고 썼는데 어떤 글은 낙서가 되고 어떤 글은 문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만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 같은 카메라로 찍었는데 어떤 사진은 쓰레기가 되고 어떤 사진은 감동을 줍니다. 글이 연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듯이 사진도 카메라로 찍히는 것이 아니로군요.
그러고 보니 교류하는 사진가들 가운데 글쟁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이 사진도 잘 찎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이야기이기 때문일겁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또 사진을 ‘본다’고 하지 않고 ‘읽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제법 쓸 수 있는 것 처럼 사진을 읽을 수 있으면 제법 찍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혼자 배우고 수련할 수도 있게 될테지요. 카메라 하나 장만했다고 하루아침에 덜렁 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해언이 사진 잘 찍고 싶다길래 “설명하려 하지 말고 느낌으로 찍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복사하려 하지 말고 시를 쓰듯 찍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증 샷(?)이 유행이죠. 이런 사진들처럼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사진으로는 이야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진찍기는 글쓰기와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두발로 움직여야 찍힌다는 정도가 다를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학교다닐 때 ‘시’쓰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더군요.
“피울! 사진 잘 찍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칠만큼 경험과 내공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 할 줄 아는 것 가지고 부품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재주는 괜찮은 편입니다.^^